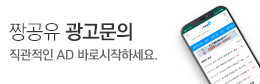최근 방문
[5ch] 먼 곳에 사는 여자친구
대학생 시절 이야기다.
친구 A에게 먼 곳에 사는 여자친구가 생긴 듯했다.
매일 같이 염장을 질러대서 지긋지긋했다.
어느 날, A네 집에서 놀던 때였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A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그러자 나랑 마찬가지로
A의 염장질에 질릴 대로 질려 있던
친구 B가 이런 제안을 해왔다.
[A 여자친구한테 장난전화라도 해보자.]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고 반성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때는 어쨌건 나도 흥에 취해 있었다.
A의 휴대폰을 찾아 몰래 열고,
일단 문자를 좀 살펴보기로 했다.
슬쩍 보니 달달한 내용투성이였다.
보낸 문자함에도 비슷한 내용이 산더미 같아서,
나와 B는 낄낄대며 웃어버렸다.
동시에 마음속에 질투의 불길이 일었다.
본격적으로 장난전화를 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어쩐지 착신 내역에는 A 여자친구의 이름이 보이질 않았다.
결국 주소록에서 찾아서 전화를 걸었다.
받을지 받지 않을지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찰나
방 안에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네 거냐?]
B가 물었다.
[아니, 내 거 아닌데.. 네 거 아냐?]
방에 있는 건 나와 A, B, 3명..
내 휴대폰이 아니다.
B의 휴대폰도 아니다.
A의 휴대폰은 지금 우리가 쥐고 있다.
이 방 안에 휴대폰이
한 대 더 있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
A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순간
울리기 시작한 의문의 휴대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A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열어보니 하늘색 휴대폰이 하나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봤다.
휴대폰 화면에는
A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 자식, 뭐하고 다니는 거야..]
B는 완전히 질린 것처럼 보였다.
나도 소름이 끼쳐서 술이 확 깼다.
천만다행으로 A는 계속 자고 있었다.
우리는 A의 휴대폰 2개에서 각각 발신, 착신 이력을 지운 뒤,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그 이후, 어쩐지 A와는 소원해졌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여자친구 자랑을 들었었다.
별것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었다.
출처: VK's Epitaph
 금산스님의 최근 게시물
금산스님의 최근 게시물
-
[2][5ch] 불투명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