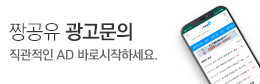최근 방문
[AI] 푸른 멍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AI로 작성한 글 올립니다.
AI로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 글이네요. ㅎㅎ
푸른 멍울
새벽 안개처럼 희뿌연 기운이 낡은 체육관 바닥에 낮게 깔렸다.
먼지 쌓인 링 위, 한때 ‘링의 악마’라 불렸던 에이든은 섀도우 복싱 동작을 느릿하게 반복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전의 날렵함 대신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젊은 날의 영광은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과 함께 산산이 조각났고, 그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실망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밝은 미래에 검은 잉크를 쏟아버린 것처럼.
어느 날, 체육관 구석의 낡은 거울 속에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흐릿한 안개 너머로 한 여인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검고 긴 머리카락, 묘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듯 신비로운 미소. 그녀의 이름은 리화.
그녀가 언제부터 그 거울 속에 머물렀는지, 혹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혼을 빼앗을 듯 매혹적이었고, 동시에 섬뜩한 기운을 풍겼다.
리화는 에이든에게 속삭였다. 그의 부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가 가장 빛나던 순간,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었다고.
에이든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망상이라 치부했지만,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그의 낡은 상처 위를 스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한 기운과 함께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리화는 에이든에게 희망을 속삭였다.
그녀의 곁에 머무른다면, 잃어버린 그의 영광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달콤한 독처럼 그의 절망에 스며들었다.
에이든은 점차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어두운 나날에 희미한 빛줄기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나지막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그의 텅 빈 마음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기적처럼, 에이든은 다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다.
리화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인지, 아니면 그녀의 기묘한 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전만큼 날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다시 링 위에 오를 날을 꿈꿨다. 리화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맴돌며, 그의 재기를 은밀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듯, 혹은 지루한 듯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에이든이 다시 희망을 품고 재활에 매진할수록, 리화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의 훈련에도 무관심해졌다.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이 시들해지듯, 그녀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에이든은 훈련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체육관 구석의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에는 더 이상 리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텅 빈 거울 속에는 그의 지친 얼굴만이 어둡게 비춰지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절망감이 다시 스며들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환상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제야 에이든은 깨달았다.
그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리화, 그 몽환적인 마녀가 그의 빛나는 순간을 질투하여 그의 날개를 꺾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절망을 먹고 살았고, 그가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 흥미를 잃고 그를 버린 것이다.
그의 재기는 그녀에게 그저 잠시의 유희였을 뿐이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에이든은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다. 그
의 부상은 여전했고,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는 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그를 붙잡아 줄 환상조차 없었다.
체육관 바닥에 드리운 새벽 안개처럼, 그의 미래는 한없이 불투명하고 암울하기만 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에이든은 텅 빈 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함께, 거울 속에서 사라진 리화의 잔상을 쫓고 있었다.
그의 삶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덧없이 부서지고 흩날리는 운명이었을까.
그는 영원히 이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새벽의 침묵 속에서,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싸늘한 공포가 푸른 멍울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였다.
 loooov의 최근 게시물
loooov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