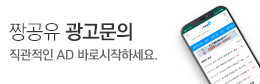문서 검색 결과(67);
-
-
-
-

[자유·수다] 형제의 나라 터키
터키'라는 국가를 말하면 우리는 이스탄불, 지중해의 나라, 형제의 나라 등 여러 수식어를 떠올리지만 정작 우리나라와 터키가 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워지는 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를 아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25 때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파병 된 15,000명이 넘는 터키군 대부분이 자원병이였으며 그중 3,500명이 사망(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할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견했으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터키에 가면 관공서나 호텔의 국기대에 터키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터키인들 역시 한국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Brother's country 라 부릅니다.또, 한국말과 비슷한 단어가 많은 헝가리 사람들 역시 한국이랑 헝가리랑 sister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여기, 한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시 참고해보도록 하지요.터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투르크'라고 부른다.우리가 코리아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역사를 배웠다면과거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돌궐'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을 것이다.투르크는 돌궐의 다른 발음이며..같은 우랄 알타이 계통이었던 고구려와 돌궐은 동맹을 맺어 가깝게 지냈는데돌궐이 위구르에 멸망한 후, 남아있던 이들이 서방으로 이동하여결국 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원래, 나라와 나라사이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지만돌궐과 고구려는 계속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 불렀고 세월이 흘러 지금의 터키에 자리잡은 그들은,고구려의 후예인 한국인들을 여전히, 그리고 당연히'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즉,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형제의 관계였던 것이다.6.25 때부터가 아니고.그렇다면 의문점 하나.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그리고 터키인들은 왜 아직도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까?답은 간단하다.역사 교과서의 차이다.우리나라의 중,고 역사 교과서는 '돌궐'이란 나라에 대해단지 몇 줄만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돌궐이 이동해 터키가 됐다느니 훈족이 이동해 헝가리가 됐다느니 하는 얘기는 전무하다.터키는 다르다.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경험했던 터키는 그들의 역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학교에서 역사 과목의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며돌궐 시절의 고구려라는 우방국에 대한 설명 역시 아주 상세하다.'형제의 나라'였다는 설명과 함께.그래서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한국을 사랑한다.설령 한국이 그들을 몰라줄지라도..실제로 터키인들은 한국인들 역시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한국인들도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 칭하며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1988년 서울 올림픽 때터키의 한 고위층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자신을 터키인이라 소개하면 한국인들에게서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그렇지 않은 데 대해 놀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터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돌아온 답은 대부분 '아니오'였다.충격을 받고 터키로 돌아간 그는 자국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한다.'이제.. 짝사랑은 그만합시다..'이런 어색한 기류가 급반전된 계기는 바로 2002 월드컵이었다.'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 터키를 응원하자'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타고 여기저기 퍼져나갔고터키 유학생들이 터키인들의 따뜻한 한국사랑을 소개하면서 터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게 되었다.6.25 참전과 올림픽 등에서 나타난 그들의 한국사랑을 알게 된 한국인들은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터키의 홈구장과 홈팬들이 되어 열정적으로 그들을 응원했다.
하이라이트는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자국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대형 터키 국기가 관중석에 펼쳐지는 순간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터키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한다.경기는 한국 선수들과 터키 선수들의 살가운 어깨동무로 끝이 났고터키인들은 승리보다도 한국인들의 터키사랑에 더욱 감동했으며그렇게.. 한국과 터키의 '형제애'는 더욱 굳건해졌다.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터키가 형제의 나라가 된 궁극적인 이유를 모르면KBS의 어느 아나운서가 패널이었던 터키인에게 '아우님'이라 불렀던어리석은 짓도 가능한 것이다.형제는 '형과 동생'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다.그들에게 형제는 곧 친구며 우방이니까.- 10월 16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대전지역 98.1MHz)
--------------------------------------------------------------------------------터키의 언어에는 순우리말과 비슷한 단어가 참 많습니다.말뿐 아니라 음식, 문화, 습성, 국민정서 (터키인 우월주의에, 감정적 다혈질이면서 반대로 다정다감하고, 거나하게 놀기 좋아하고, 어쩜 그렇게 성질 급한 것까지..)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유럽인치고는 흔하지 않게 몽고반점도 있습니다.과거 돌궐(투르크 => 터키)과 고구려는 그냥 우방이 아니라, 이와 잇몸 같은 관계였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돌궐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을 정도니까요. 고구려 멸망 후 돌궐도 망했으며 서쪽으로 옮겨 서돌궐을 건국하게 됩니다. 서돌궐이 훗날 오스만 제국... 그리고 터키가 됩니다. 혈통이 고구려와 혼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의 역사 교과서에서 돌궐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돌궐의 위치 때문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사서에는 고구려와 돌궐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돌궐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고구려의 영토가 중앙아시아, 즉 실크로드(서안) 부근까지가 영토라는 이야기가 됩니다.그리고 돌궐은 만주 지역에까지 영토를 넓힌 적도 없습니다.따라서, 고구려의 영토가 만주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 아시아 까지(돌궐과 맞닿은), 매우 방대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중국이 동북공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터키'라는 나라는 과거 청동기시대인 배달국, 고조선, 부여 시대에는 동이족에 속해 있다가 고구려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고구려가 부여를 정벌하자 그곳에 살던 원주민(예맥 동이족)들이 요하를 건너가 이루게된 민족입니다. 돌궐족은 중국의 대부분을 수나라가 통일하자 고구려와 돌궐은 연합하여 수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나라의 침략을 받아 요서지방은 수나라에 점령되고 돌궐은 서쪽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들이 서쪽으로 이주해 정착하여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건설하였고, 아랍과 발칸반도를 지배하며 강성했던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19세기 중반부터 쇠퇴하면서 주변의 영토를 잃고(소수민족 모두 독립) 지금에 터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같은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는 중국의 영향으로 한문을 사용했고, 터키는 아랍의 영향을 받아 언어는 전혀 다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유전학이나 인류학적으로도 터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몇개 안되는 북방계 몽골리언국가(몽고, 한국, 일본, 에스키모, 인디언) 중 하나로, 헝가리 와 함께 북방계 몽골리언의 유전자가 많이 남아있는 유럽국가입니다.터키인은 '코리아'의 어원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영문표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형제사랑이지요..그렇다면, 북한도 같은 민족인데 어째서 한국과 형제인 터키가 6.25 때 남한편에만 병력을 파병했을까..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이나 아르메니아인들과 터키는 견원지간입니다. 아니, 원수지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네요.과거 아르메니아인(오스만 기독교인들)들이 터키인(투르크 이슬람교도)에게 대학살을 당했기 때문이지요.과거 오스만터키에서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면서 쇠약해진 국력과 맞물린 굴절된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아르메니아인 수천명이 죽임을 당하는 1차 대학살의 참사가 벌어집니다.유럽으로 남진하려하는 러시아의 힘을 얻어 루마니아와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게되고 오스만터키의 아르메니아 영토 대부분을 러시아가 차지하는 셈이 되자 이에 분노한 투르크인들이 러시아와 붙어먹은 아르메인들을 표적으로 인종청소라는 대학살을 감행한거죠. 1차 대학살 20년후 또 다시 오스만터키 정부의 도움을 받은 투르크 이슬람교도들은 아르메니아인 5만명에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2차대학살) 게다가 정부는 학살된 아르메니아인 외 175만명을 추가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로 추방하고 그 추방하는 과정에 60만명이 사막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894년~1915년까지 250만명이였던 아르메니아인은 30만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후 1912년 발칸전쟁 때 몬테니그로, 불가리아, 그리스가 오스만터키에서 독립할 때도 알게모르게 러시아가 개입하여 아르메니아인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터키는 그 반대 쪽인 남한에만 병력을 파견한 거지요.물론 혹자는 당시 터키가 미국과의 우방적 연계로 말미암은 국제적 이득을 노린 선택일 뿐이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역사의 흐름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본다면,터키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의 동맹국 중의 하나였던 이유가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적대 관계일 수 밖에 없는 과거사 때문이였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형제의 나라..한국의 경제성장을 자기일처럼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는 나라, 2002년 월드컵 터키전이 있던 날 한국인에게는 식사비와 호텔비를 안받던 나라.. 월드컵 때 우리가 흔든 터키 국기(國旗)가 터키에 폭발적인 한국 바람을 일으켜 그후 터키 수출이 2003년 59%, 2004년 71%나 늘어났다는 KOTRA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닌, 자기 나라로부터 수백만리 떨어진 곳에서 보내는 의리와 애정을 받는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출저 : 와고
 소통령작성일
2012-08-16추천
3
소통령작성일
2012-08-16추천
3
-
-
-

[엽기유머] 아직도 터키 형제의 나라 드립이 먹힌다는게 엽기
한국과 터키가 형제국이 된 것은 고구려와 돌궐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터키가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건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였던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환단고기라는 판타지 소설책의 내용을 사실인양 홍보하던 붉은악마란 단체가 터키 응원을 주도하면서 퍼뜨렸던 것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당시 주위엔 중국, 일본, 북한 등 우리 역사에 아픔을 주었던 이웃들 뿐이었고,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는 미국도 당시 벌어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해 반미감정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라 한국인들은 꽤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등장한 '터키가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아주 반갑게 다가왔을 겁니다. 가깝지는 않더라도 이 지구상에 한국을 지지해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소리니까요.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게 된 이 이야기는 급기야 한국과 터키의 3.4위전 관중석에 대형 태극기와 아이일디즈(터키기)가 동시에 펼쳐지게 만들었고, 이는 방송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터키까지 전해져 터키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덕분에 터키인들이 터키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음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왜 터키가 우리를 형제국으로 생각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형제가 아닌 칸가르데쉬, 즉 피를 나눈 형제로 생각하는지 말이죠.
6.25 전쟁때 터키가 미국에 이어 2번째 규모로 파병을 단행했던 것이 그 첫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15000명을 파병한 터키군에서는 3500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발생했죠. 대단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체 왜 터키가 한국에 파병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주장이 '원래 터키는 고구려 때부터 우리를 형제로 생각해왔고 그때문에 형제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파병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정통을 이어받은 국가를 남한으로 한정했다는 그 발상도 웃기지만, 아무튼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수당시절 고구려와 터키의 전신인 돌궐이 동맹을 맺고 중국에 대항을 했었고, 터키에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자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럴듯한 내용은 순식간에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옮겨져 사실인 양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제 조카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국사교사란 양반이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합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구려와 돌궐이 형제를 운운할 정도로 깊은 동맹관계였던 적이 있었는가? 과연 터키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가?
제가 가진 역사지식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관련 자료들을 뒤지며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몇가지 기록을 살피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동로마제국의 역사가 Theophylactus Simocatta가 613년에 저술한 《Historiam》이란 역사서의 <VII. Origin of the Avars>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륙의 북부 전체를 지배했던 강력한 유목민족인 Avars는 그들의 서쪽 관할구에서 흥기한 신흥민족 Turks에게 멸망당했다.그리고 그 잔당들은 Turks로부터 동남쪽으로 1500마일 떨어진 Taugast로 달아났다. Taugast는 India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국가인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barbarian들은 매우 용감하고 그 수가 많아 세상에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 그곳에서 Avars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Taugast의 공격을 받고 다시 한번 비참하게 몰락하여 Taugast와 동쪽으로 이웃해있는 Mouxri로 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 Mouxri라 불리는 나라의 국민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일상처럼 행해지는 혹독한 군사훈련으로 그 투지가 매우 높았다.
...So, when the Avars had been defeated (for we are returning to the account), some of them made their escape to those who inhabit Taugast. Taugast is a famous city, which is a total of one thousand five hundred miles distant from those who are called Turks, and which borders on the Indians. The barbarians whose abode is near Taugast are a very brave and numerous nation, and without rival in size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Others of the Avars, who declined to humbler fortune because of their defeat, came to those who are called Mucri; this nation is the closest neighbor to the men of Taugast; it has great might in battle both because of its daily practice of drill and because of endurance of spirit in danger.
http://faction.co.kr/140095546231
여기서 일반적으로 Avars는 유연, Turks는 돌궐, Taugast는 북제(탁발선비), Mouxri는 고구려로 비정합니다.
돌궐은 시베리아에 있었던 고구려의 강력한 동맹 유연을 멸망시키며 등장한 유목국가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유연의 잔존 세력들은 돌궐에 쫓겨 북제로 달아났다가 그곳에서도 쫓겨 결국 고구려에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돌궐이 자신들의 적과 동맹이었던 고구려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고구려로서도 돌궐의 등장은 위협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기록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양원왕 7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을 9월에 돌궐이 와서 신성을 에워 쌌다가 이기지 못하고 백암성으로 옮겨 공격하므로 왕이 장군 고흘을 시켜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대항하게 하여 이기고 적 1000여명을 살획하였다.
秋九月, 突厥來圍新城, 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 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
양원왕 7년은 A.D.551년으로, 552년 초 돌궐이 지금의 하북성 북단인 회황진 북쪽에서 유연을 격파하였으므로 551년에 돌궐이 신성까지 진출하긴 어려울 것이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수서> 권84 돌궐전 문제 개황 2년(A.D.582)의 조서내용에 "왕년에 돌궐의 이계찰이 고려 말갈에 크게 격파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시기가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돌궐의 동방진출 초기인 582년 이전 양자간에 어느정도의 충돌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라 진흥왕이 함흥까지 진출하는 상황에서도 고구려가 그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서북방의 돌궐이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또, 당시 고구려 주변국들의 동향을 살펴보아도 돌궐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당서> 권199 말갈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말갈은 무릇 수십 부로 나뉘어 있으며, 그 각각에 추수(酋帥)가 있어 혹은 고려에 복속하고 혹은 돌궐에 신속하였다.
其國凡爲數十部, 各有酋帥, 或附於高麗, 或臣於突厥.
기존에 대체로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있던 말갈의 일부 세력이 돌궐에 신속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돌궐의 영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말갈은 속말말갈(후에 발해를 세운 말갈인 대조영의 출신부, 구당서 권 39 지리지 2 하북도 신주 및 여주조에 속말말갈을 부유말갈로도 적고 있고, 후에 속말말갈의 돌지계가 부여후로 책봉된 것으로 보아 속말말갈은 멸망한 부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로, 마침 돌궐이 실위에 지방관인 토둔을 두며 고구려 서북방면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6세기 후반 고구려를 자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수서 권81 동이 말갈전)
속말부는 고려와 접하고 있으며, 승병이 수천이고 대부분 용맹하여 자주 고려에 침공하고 노략질하였다.
粟末部, 與高麗相接, 勝兵數千, 多驍武, 每寇高麗中
그런데 동시기 속말말갈은 돌궐과는 싸운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속말말갈의 북쪽에 위치한 실위까지 남진한 돌궐에 속말말갈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돌궐에 신속했다는 말갈(或臣於突厥)은 이 속말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83년 돌궐이 양분되어 수에게 대파되는 시기, 속말말갈은 고구려에게 패해 돌지계 등이 속말말갈의 8부 승병 수천명을 이끌고 수에 내부하게 됩니다(태평환우기 권 71 하북도 연주조 인용 북번풍속기). 이는 속말말갈이 그간 돌궐의 후방지원에 힘입어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줍니다.
또한 547년 이후 물길의 퇴조와 함께 끊겼던 중국에 대한 조공이 563년부터 말갈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위서, 북제서, 책부원구 조공문에 의해 노태돈이 작성한 표 참고)되는데요, 고구려사의 권위자 노태돈교수는 물길(勿吉)과 말갈(靺鞨)의 고음운이 똑같이 Mat-kat으로 같은 민족을 지칭한다고 해도 그 음사의 변동은 그 정치적 주체가 바뀐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고구려와 극렬한 항쟁을 한 속말말갈로 꼽았습니다. 노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속말말갈이 조공을 하러 가기 위해선 고구려의 세력권인 요동을 거쳐 현재의 랴오닝성 차오양 지역인 유성에 진입하는것이 가장 빠르나 고구려가 이를 허락할리가 없고, 거란을 통과하자니 당시 속말말갈과 거란은 해마다 전투를 치루는 적대적 관계(其國西北與契丹相接, 每相劫掠, 수서 말갈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거란의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우회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루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곳은 돌궐의 영역이었으므로 돌궐을 우방으로 두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하는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수서 거란전에 의하면 거란 역시도 고구려와 돌궐의 핍박을 받으며(當後魏時, 爲高麗所侵, 部落萬餘口求內附, 止于白比河. 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각각에 차례로 복속되다 수가 강해지자 수에 내부하게 됩니다. 즉 고구려와 돌궐이 전쟁을 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두개 뿐이지만, 속말말갈과 거란의 당시 동향을 보았을때 양자는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돌궐이 우호적이었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당서> 권75 위운기전과 <신당서> 권116 위운기전, <자치통감> 권180 수기 4 양제 대업 원년(A.D.60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이 영주지역에 들어와 노략질을 하니 위운기에게 명을 내려 돌궐의 병사를 이끌고서 거란부락을 토벌하도록 보냈다. 돌궐의 계민가한이 병사 2만명을 동원했다. (중략) 운기가 거란의 경계에 들어갈 때에 돌궐의 병사 2만을 상인단으로 위장시켜 유성에서 고려와 교역하러 간다고 거란에게 속이고, 무리 가운데 수나라 사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감히 말하는 자는 죽여버렸다. 거란이 방어를 하지 않았다. 會契丹入抄營州, 詔雲起護突厥兵 往討契丹部落 啓民可汗發騎 (중략) 雲起旣入其界, 使突厥詐云向柳城郡 欲共高麗貿易. 勿言營中有隋使, 敢漏泄者斬之. 契丹不備
거란이 동돌궐과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2만명 규모의 교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이러한 교역이 몇차례 행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구려와 돌궐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607년, 수 양제는 동돌궐의 수장 계민가한이 고구려 사신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 18년, 내용 길어 원문 생략). 두 나라의 연합 가능성에 격분한 양제는 고구려에게 위협을 가하고 결국 4년 후 고구려를 친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에 지나치게 굴종적인 계민가한의 태도와 돌궐이 고구려를 도운 흔적이 없는것을 볼때 돌궐과 고구려의 연합은 시도 단계에서 끝나버린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수가 내부분열을 일으켰을때 돌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강성해져 고구려따위(?)와 연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곧이어 중국에 새로이 등장한 당 왕조에 굴복해 당의 고구려 원정에 다수의 돌궐인들이 동참(호쇼촤이담 퀼테긴비문)하게 됩니다.
즉, 고구려와 돌궐이 우호적, 혹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였던 기간은 길어봤자 돌궐이 수에게 굴복하기 시작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의 20여년 뿐이었고, 이 기간 내에서도 동맹이라고 까지 불릴 만한 관계가 형성된 적은 없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궐이 고구려와 피를 나눈 형제라 수당과 함께 맞서 싸웠었고, 이런 역사를 터키에서도 교육해 지금도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국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퍼지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정말 터키 교과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실었나 궁금하여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미 터키 대사관에 누군가 질문글을 올려놓은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사관측의 답변도 되어 있었구요.
질문: 터키역사교과서에서 '돌궐과 고구려'에 관한 이야기 사실인가요? [ 등록일 : 2006.06.15 ]
답변: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을 저희 공관 홈페이지에 남기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터키 교육부에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를 요청, 확인해 본 결과, 고구려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말도 당시에 쓰여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투르크가 돌궐의 다른 발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터키역사에서는 '굑 튜르크'로 알려진 국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인들은 터키를 튜르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튜르키예'라고 부르며, 튜르크는 터키인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ttp://www.mofat.go.kr/incboard/minwondetail.jsp?txtBoardId=M0023&txtBoardSeqNo=142505&txtCurrPage=1&txtLineNo=10&txtSerItem=TITLE&txtSerStr=고구려&txtPwd=&Category=tur-ankara&txtResultURL=sciconfirm.jsp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와의 동맹에 관련된 내용은 커녕 고구려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물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분들도 많지만)이 사실처럼 믿고 있었던 이야기가 완벽한 날조였던 것입니다.
사실 터키인들이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로 부르게 된 배경에는 이슬람권 특유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인 터키인들에게 피를 나눈 형제, 즉 칸가르데쉬라는 표현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람 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관계되는 나라들에는 사이가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모두 칸가르데쉬로 부른다고 합니다. 터키와 인접한 주변국들은 물론 유럽 국가, 중국 일본에게도 이러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 터키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을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실익을 보았습니다. 한국 역시 터키에게 이익을 주는 수많은 형제국중 하나인 칸가르데쉬 코리아가 된 것이죠.
몇달 전, 우리나라로 치면 파코즈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터키의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Donanim Haber에서 "터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제국가는(En sevdiğiniz kardeş ülke hangisi)?" 이란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forum.donanimhaber.com/m_28302100/mpage_2/tm.htm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한국,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기타의 항목중 한국은 1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태극기보다 큰 대형 터키기를 흔들며 형제를 반겼던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설문의 댓글들에는 일본, 쿠바,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등 수많은 나라들이 형제국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식민지배 했던 일본의 경우 수차례 언급되며 강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14%나 차지하며 선전한 건, 월드컵때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결국 터키인들에게 한국은 고구려 돌궐 관계사와는 관계없이 그저 한국전쟁때 인연이 있었던 친근한 국가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터키와 한국이 돌궐과 고구려 때부터 혈맹국이었다는 날조문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던 걸까요?
저는 사실 엉터리 선동문을 작성한 주인공보다, 날조된 내용에 감동받아 사실관계를 파악지도 않고 퍼다 나르기에 열심히였던 한국인들의 고질적 습성이 안쓰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도 네이트나 아고라에 상주하는 네티즌들의 행태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게시판과 댓글란엔 각종 음모론과 루머가 넘쳐나고 읽는 사람들은 먼저 의심하기 보단 고개를 끄덕이며 추천 버튼부터 닥치는대로 눌러댑니다. 2002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에게 먼저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가르쳐주는대로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주입식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같은 대한민국의 멍청한 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출처:http://faction.co.kr/140113894243 시원한냉면님 블로그
요약: 형제의 나라(칸카르데쉬) 는 외교적 언사이다. 고구려와 돌궐은 그다지 친한 외교관계가 아니다. 터키교과서에는 우리나라를 가르키지 않는다.
625전쟁에도 형제의 나라라서 참전한게 아니라 당시 흑해를 둘러싼 소련과의 마찰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거기에 서방국가와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해서임. 덕분에 전후에 터키는 바로 나토가입함.
625참전국 중 2위가 아닌 4위에 해당하는 참전국
미국 1,789,000영국 56,000캐나다 25,687터키 14,936호주 8,407필리핀 7,420타이 6,326
물론 625전쟁시 도움은 상당한 은혜인건 사실이고 양국간 외교관계도 상당히 친밀한 것은 맞지만 궂이 왜곡까지 하면서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깜장바위작성일
2011-08-26추천
8
깜장바위작성일
2011-08-26추천
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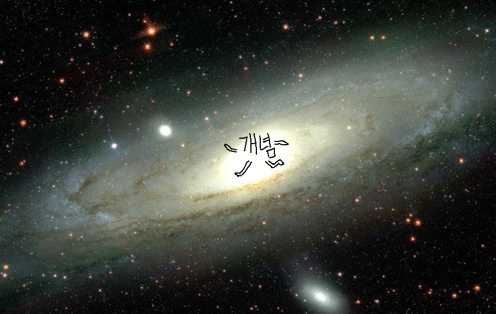
[무서운글터] 세계 고대 건축물들의 미스테리 *스압!
[세계7대 불가사의]
1.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pyramid) 피라미드에 대해 현재 남아 있는 최고(最古)의 기록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bc 5세기)의 <역사 designtimesp=14359 designtimesp=12265> 권2에 있다. 그는 기자의 대(大)피라미드에 관하여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건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쿠푸는 카이로 남서쪽 15 km에 위치한 기자에 최대의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것은 대피라미드 또는 제1피라미드라 일컬어지며, 높이 146.5 m(현재 137 m), 저변 230 m, 사면각도는 51 °52 '이다. 각 능선은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오차는 최대의 것이라도 5 °30 '에 지나지 않은 만큼 극히 정교한 것으로, 피트리에 의하면 평균 2.5 t의 돌을 230만개나 쌓아올렸다. 진정 세계 최대의 석조건물로서 그 장대한 규모와 간결한 미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다.
내부구조는 복잡해서 독일의 보르하르트에 의하면 계획이 2번 변경되었다고 한다. 북측의 지면에서 약간 위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 그대로 하강하면 암반 밑에 설치된 방에 도달한다. 이곳이 제1차 계획의 매장실이고, 그 위에 있는 통칭 ‘왕비의 방’이 제2차 계획의 매장실이다. 그리고 제3차 계획에 의해 피라미드는 완성되었다. 제1피라미드 남서쪽에 카프라왕의 제2피라미드가 있다. 높이 136 m, 밑변 216 m, 동쪽에 있는 장제신전에 450 m의 참배로가 뻗어 하곡신전에 이른다. 유명한 스핑크스는 하곡신전에 가까운 참배로 북쪽에 엎드려 있다. 기자에는 그 밖에 멘카우레왕의 제3피라미드와 왕족들의 소(小)피라미드 6기가 있
다.
2.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pharos) 등대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파로스 섬과 헵타스타디온이라고 불리던 1㎞정도의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곳의 동쪽 끝에 세계의 모든 등대의 원조격인 파로스 등대가 서 있었다. 대부분이 대리석 돌로된 등대의 높이가 135m로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으로 소스트라투스가 만들었다. 등대는 3개의 층계로 만들어졌다. 맨 아래층이 4각형, 가운데층이 8각형, 꼭대기 층은 원통형이었다. 각 층은 모두 약간 안쪽으로 기울게 지어졌다(기울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음). 등대 안쪽에는 나선형의 길이 있어서 등대 꼭대기의 옥탑까지 이어져 있었다. 옥탑 위에는 거대한 동상(여신상)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아마도 알렉산드 대왕이나 태양신 헬리오스의 모양을 본떴을 것으로 여기지고 있다.
등대 꼭대기의 전망대에서는 수십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먼 본토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7c이후 이집트를 정복했던 아랍인들에 따르면 램프 뒤쪽의 반사경으로 비치는 타오르는 불길은 43㎞정도 떨어진 바다에서도 볼 수 있었고, 맑은 날에는 콘스탄티노플까지도 반사경이 비쳤으며 또 햇빛을 반사시키면 160㎞ 정도 떨어져 있는 배도 태울 수 있었다고 한다.b.c280년경에 만들어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등대에 불을 지폈을까?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3.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세미라미스 공중 정원(hanging garden)
bc 500년경 신(新)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하여 수도인 바빌론에 건설한 정원이다.실제로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있다는 뜻이다. 지구라트에 연속된 계단식 테라스로 된 노대(露臺)에, 성토하여 풀과 꽃, 수목을 심어놓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삼림으로 뒤덮인 작은 산과 같았다고 한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물을 댔다고 전해진다.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왕비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바빌론의 왕이 되자 메디아 왕국의 키약사레스 왕의 딸 아미티스를 왕비로 맞았다. 산이 많아 과일과 꽃이 풍성한 메디아에서 자란 왕비는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빌론에 마음을 두지 못한 채 항상 아름다운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왕은 왕비를 위하여 메디아에 있는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을 바빌론에 만들기로 결심했다.왕의 명령을 받은 재주가 뛰어난 건축가, 기술자, 미장이들은 곧장 작업에 들어가 왕궁의 광장 중앙에 가로·세로 각각 400m, 높이 15m의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계단식 건물을 세웠다.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에 불과했지만 총 높이가 105m로 오늘날의 30층 빌딩 정도의 높이었다.
한 층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수천톤의 기름진 흙을 옮겨 놓고 넓은 발코니에 잘 다듬은 화단을 꾸며 꽃이랑 덩굴초랑 과일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한 이 파라미드형의 정원은 마치 아름다운 녹색의 깔개를 걸어놓은 듯이 보였다.그런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곳에서 이렇게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의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펌프로 길어 올리고 그 물을 펌프로 각 층에 대어줌으로써 화단에 적당한 습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그때그때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정원의 아랫부분에는 항상 서늘함을 유지하는 방을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창 너머로 바라보는 꽃과 나무의 모습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또한 방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방 위에는 갈대나 역청을 펴고 그 위에 납으로 만든 두꺼운 판을 놓았다.공중 정원에 대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 바빌론의 페허는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이 남아있다.
4. 에페수스(ephesus)의 artemis 신전
에페수스 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고대 이오니아 지방의 열두 개 도시 중 하나로서 b.c 6세기 경에 이미 서아시에서 상업의 요충지로 번영하여 가중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다. 이 곳을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다.이 신전은 당시 최고 부자였던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b.c 560∼b.c 546)때 세우기 시작하였다. 높이 20미터 정도의 훌륭한 이오니아풍의 백색 대리석 기둥을 127개나 사용한 이 신전은 완성되기 까지 120년이 걸렸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에페수스를 방문하여 이 신전을 돌아보고는, 기자에 있는 피리미드에도 떨어지지 않는 걸작으로 묘사하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그러나 헤로도토스가 에페수스를 방문한 지 1세기 정도 지난 뒤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전은 어리석은 한 인간에 의해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b.c 356. 10월 "어차피 나쁜 일을 하려면 후세에까지 알려질 수 있는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한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자가 신전을 계획적으로 불태워 버린 것이다.
그 후 디노크라테스가 불타 버린 신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에페수스의 여인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석 등을 팔았고, 왕들은 크로이소스 왕을 본받아 기둥을 기증하기도 했다. 더욱이 아시아 원정 길에 올랐던 알렉산더 대왕은 한층 완성중에 있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았겨 "만일 에페수스인이 이 신전을 나의 이름으로 세워준다면 모든 비용을 내가 내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페수스인들은 다른 나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야심이 강한 에페수스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을 지금까지 어떤 신전보다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신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파르테논은 길이가 69m. 폭이 30m, 높이 10정도로서, 대리석 기둥을 58개나 사용한 신전이었다. 에페수스인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의 두 배 정도의 규모로 만들기 시작했다. 높이 18m짜리 기둥을 127개나 사용했고, 길이는 120m, 폭은 60m로 했다. 또한 신전의 건축용 자재는 가장 순도 높은 백색 대리석만을 사용했으며 중앙의 넓은 홀에는 네 방향으로 대리석 계단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게 하였다. 그 규모나 화려함은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다.
5. 올림피아의 제우스(zeus) 신상(神像)
제우스 상이 있는 올림피아는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쪽 앨리스 지방에 있는 제우스의 신역으로서 완만한 구릉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로 예부터 잘 알려져 있다.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최고의 신 제우스를 믿었다. 제우스는 고대 로마의 최고의 신 '주피터'와 같이 고대 그리스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천둥, 번개와 비바람을 만드는 신이며, 그의 주 무기는 벼락이었다. 제우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며,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시마다 제우스 신을 모신 신전을 짓고 성대한 제사를 지냈다.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앨리스 등의 도시 국가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처음에는 땅의 신 크로노스와 여신 헤라를 숭배했지만 뒤에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되어서 b.c457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고 그 안에 '피디아스'가 만든 제우스 상을 안치하였다.제우스 신상과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네 여신상은 피디아스의 2대 걸작품으로 꼽힌다. 피디아스는 8년여의 작업 끝에 제우스 상을 완성했는데, 그는 제우스의 신성함 위엄과 함께 너그러움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걸작 중의 걸작 제우스 상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남아 있지 않다.
대지 위에 우뚝 세워진 신전에는 양옆에 열세 개씩, 양끝에 여섯 개씩 장엄하고 무거운 도리아식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완만하게 기울어진 지붕이 덮여 있다. 이 신전의 한가운데 있는 제우스 상은 높이가 90㎝, 폭이 6.6m인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12m 정도 되는 상은 거의 천장을 닿고 있다.제우스 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그 위에 보석과 흑단, 상아를 박아 장식한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금으로 된 발 디딤대에 올려져 있는 양다리는 거의 예배자의 눈높이와 일치하였다. 오른손에는 금과 상아로 만든 승리의 여신(nike)상을 떠받치고 있으며 왼손에는 황금을 박아 장식한 지팡이(왕홀)를 쥐고 있다. 지팡이 위에는 매가 앉아 있다. 상아로 만들어진 어깨에는 꽃과 동물이 새겨진 황금의 아름다운 망토가 걸쳐져 있다.
제우스 신전의 발굴 움직임이 18세기 경부터 일어났고 처음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다. 1829년 프랑스인이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를 발굴하기 시작하여 메도프, 기둥, 지붕 등의 파편을 발견하였다. 1875년경에 독일 정부의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의해 올림피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우스상이 있던 신전도 거의 드러나게 되었다. 1950년대 제우스 신전 터에서 피디아스의 작업장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제우스 상이 만들어진 연대가 확실히 밝혀졌다.
6. 할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의 마우솔러스 영묘(靈廟) - mausoleum
페르시아 제국 카리아의 총독 마우솔로스를 위하여 그리스의 할리카르나소스에 건조된 장려한 무덤기념물이다.면적 29×35.6 m, 높이 50 m. 할리카르나소스의 묘묘(墓廟)라고도 한다. 마우솔로스의 생전에 착공되었으나, 그가 죽은 뒤 왕비 아르테미시아가 계속 진행하였으나 완성된 시기는 왕비 아르테미시아가 죽은(bc 350) 뒤로 추측된다.설계는 사티로스와 피테오스가 하였다. 동서남북의 장식조각은 각각 스코파스, 레오카레스, 티모테오스, 브리아크시스가 담당하였다.각 면의 조각·프리즈는 발굴되어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또, 로마인은 비슷한 대규모의 분묘건축(墳墓建築)도 마우솔레움이라고 일컬었다. 마우솔레움은 그 특이한 모양과 복잡한 장식 때문에 세계의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혔다.
7. rhodes항구의 크로이소스 거상(巨像) - colossus
거상(巨像). 그리스어 콜로소스에서 유래한다.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 등을 보고나서 칭한 말이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대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로도스섬의 콜로서스이다.로도스 항구에 서 있던 태양신 <헬리오스 청동상 designtimesp=14403 designtimesp=12321>은 높이가 36 m나 되었으며, 린도스(로도스 섬 동쪽에 있던 고대 도시의 이름)의 카리오스에 의해 bc 280년경 건조되었는데 bc 224년의 지진 때 붕괴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현존하는 것도 많으나 모두 기념비적인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7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다.
1. 이집트의 피라미드
2. 로마의 원형극장(콜로세움)
로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유적지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이탈리아어로는 콜로세오(colosseo)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다.콜로세움이란 이름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콜로사레(colossale)에서, 또 하나는 경기장 옆에 네로 황제가 세운 높이 30m의 거대한 금도금 상 콜로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바로 그것인데 전자의 설이 유력하다.콜로세움은 기원후 72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네로 시대의 이완된 국가 질서를 회복한 후, 네로의 황금궁전의 일부인 인공호수을 만들었던 자리에 착공하여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80년) 때 완공하였다. 완성 축하를 위해 100일 동안 경기가 열렸으며, 그 때 5,000마리의 맹수가 도살되었다고 한다.
장대한 타원형 플랜이 있는 투기장은 아치와 볼트를 구사한 로마 건축기술의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조물로서 거대한 바위 축대위에 축조되었으며, 이 축대는 점토질의 인공호수위에 설치되어 지진이나 기타 천재로 인한 흔들림을 흡수하 도록 설계되었다.약 5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제국 최대의 투기장이었다.콜로세움은 최대 지름188 m, 최소 지름 156 m, 둘레 527 m, 높이 57 m의 4층으로 된 타원형 건물인데, 1층은 토스카나 식, 2층은 이오니아 식, 3층은 코린트 식의 둥근기둥으로 각각의 아치가 장식되어 있다.
또한 4층을 제외하고 원기둥과 원기둥 사이에는 아치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조상(彫像)이 놓여 있다.내부는 긴지름 86m, 짧은지름 54m의 아레나(투기장)를 중심으로 카베아(관객석)가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칸칸마다 나누어진 맹수들의 우리 위에 나무로 바닥을 만들어 지상과 지하를 분리시켰는데 지하의 방에는 맹수뿐만 아니라 검투사, 사형수들이 갇혀 있었다. 이 경기장은 지하의 대기실 및 천막 지붕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곳에서는 검투사의 경기, 맹수와의 싸움이 즐겨 행해졌으며, 심지어는 장내에 물을 채워 전투를 하는 모의 해전 등도 벌였다. 제정 초기 크리스트교 박해 시대에는 많은 신도가 이 콜롯세움에서 야수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다.콜로세움은 완공된 이래 300여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계속 벌어지다가 405년 오노리우스 황제가 격투기를 폐지함에 따라 마침내 처참한 역사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그 후 콜로세움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중세 교회를 짓는데 재료로 쓰이기도 해 외벽의 절반이 없어지는 수난을 겪었다.그러다가 18세기 경 교황의 명에 따라 기독교 수난의 현장으로 복구되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3. 영국의 거석기념물(巨石紀念物, 스톤헨지)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환상열석(環狀列石)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조물의 하나인 스톤헨지(stonehenge)는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야(salisbury plain)에 위치하며, 고대 영어로 '공중에 걸쳐 있는 돌'이라는 의미이다.천년전 이 곳엔 초기 석기시대 사람들이 정착했었다.그렇지만 그들은 별 흔적을 남기진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적들은 청동기인들의 업적이다.스톤헨지의 건조가 착수된 것은 기원전 2800년경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완성된 것은 기원전 156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톤헨지는 원형(圓形)의 유적으로 각각의 거석들은 모두 한 중심점을 향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바깥 도랑과 둑, 네모꼴 광장과 방향표시석인 힐스톤, 돌기둥을 세워 놓은 입석군(立石群), 중앙 석조물 등으로 이루어졌다.기원전 2100년경 스톤헨지로부터 자그마치 385km나 떨어진 웨일즈 남서부의 프레슬리산에서 청석(blue stone)이 이 곳으로 운반되어져 왔는데, 최고 5톤까지 나가는 이 돌들을 옮기는 일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썰매나 뗏목을 이용해 육로와 해상을 번갈아 가며 운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스톤헨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향표시석 힐스톤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그것도 하지(夏至)에 해가 뜨는 방향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하지날 힐스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해가 떠올라 중앙제단을 비췄던 시기는 천문학적으로 bc 184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그리고 힐스톤을 세운 시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한 연대와도 맞아 떨어져 기묘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상당한 천문학적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래서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완전히 파악하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환상열석 중심축에서 30m를 벗어난 자리에는「사르센 원」이라고 불리는 둥근 띠가 있다.사르센 원을 따라 가면 두개의 커다란 돌을 세워 놓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을 눕혀 놓은 삼석탑(三石塔)을 만난다.돌 한개의 무게는 25t에서 최고 50t까지 나간다. 기중기와 같은 기구가 없던 당시에 50t 무게의 돌을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는다.학자들은 지레 받침대와 밧줄을 이용해 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과학적인 추측을 할 뿐이다.
4. 이탈리아의 피사 사탑(斜塔)
이탈리아 중서부에 위치한 피사 대성당(duomo di pisa)의 부속건물(대성당, 세례당, 종탑)중 3번째이며 마지막 구조물로써, 중세 도시국가 피사가 팔레르모 해전에서 사라센 함대에 대승한 것을 기념하기위해 세워진 종탑이다.흰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꼭대기 종루를 포함해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는 55.8m, 무게는 14,500t 이나 된다.탑내부는 나선형으로 된 294개의 계단을 통해 종루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종루에는 각각 다른 음계를 가진 7개의 종이 걸려있다.1174년에 착공된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천재건축가 보라노 피사논의 설계도에따라 탑을 만들어가던 중, 3층까지 쌓아올렸을 때 공사관계자들은 지반 한쪽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책임 기술자였던 보나노 피사노는 기울어진 모양을 보정하기 위해 새로 층을 올릴 때 기울어져 짧아진 쪽을 더 높게 만들었으나, 추가된 석재의 무게로 건물은 더욱 가라앉게 되었다.기술자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몇 번씩 공사를 중단했으나 결국 1350년에 맨 꼭대기층이 기울어진 채 완성되었다.
물론 건축당시부터 의도적으로 기울어진 탑을 세운것은 아니다.1년에 1mm정도 기울어지는 미세한 자연 현상이 누적되다보니 오늘날과 같이 탑의 꼭대기가 수직선에서 무려 5m나 기울어졌다.현재는 탑의 기울기가 멈춘 상태다. 최근 영국 런던대학의 토질 기계학과 존 부를랜드 교수는 "피사의 사탑은 이제 기우는 것은 멈췄다. 이는 지난 7세기만에 이룩한 개가"라고 말했다.사탑이 이처럼 위태로운 상태에서도 수천년 동안 용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5. 이스탄불의 성(聖)소피아 성당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은 이스탄불(현재 터키의 수도이며 이슬람이 많은도시라는 뜻)이 비잔틴제국의 수도로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6세기에 건조되었다.비잔틴 문화의 최고 건축물로써 아야 소피아(aya sophia)라는 현지어로 불리며 현재 소피아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현재의 소피아 대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건립된 것(532~537년)으로 세계의 교회 중 4번째(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런던의 성 바울로 성당,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로 크며, 현존하는 교회 중 가장 오래됐다.소피아 대성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360년 나무 지붕의 작은 교회로 지어졌으나, 404년 알카디우스 황제 때 화재로 무너졌으며 그 후 데오도시우스 2세 때 두 번째 성 소피아 대성당이 완공(415년)되었다.
그러나 이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니카의 반란'으로 다시 파괴되었다.니카의 반란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황비인 데오도라(이집트 출신의 댄서) 때문에 생긴 반란이었다.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그러나 그녀가 천민 출신이라는 것과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의 단성론(콘스탄티노플에서는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하느님 자신이라는 양성론을 채택했다)을 믿는다는 것을 빌미로 히포드롬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 반란군의 기세에 눌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난을 피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려 했으나 그를 데오도라가 저지했다.다음 순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히포드롬에서 농성하는 반란군을 단숨에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제2차 소피아 성당이 파괴되었으며, 그 잔해 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제의 권위와 교회의 영광에 걸맞는 새로운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건축가 안테미우스와 수학자 이시도르를 투입하였다.건축을 시작한 후 5년 10개월 만인537년에 소피아 성당은 마침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6. 중국의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중국 역대 왕조가 변경을 방위하기 위해 축조한 대성벽으로써 보하이 만(渤海灣)에서 중앙 아시아까지 지도상의 총연장은 약 2,700km이나, 실제는 약 6,400㎞(중간에 갈라져 나온 가지를 모두 합하여)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유적이다.춘추시대 제(齊)가 영토방위를 위햐여 국경에 쌓은 것이 장성의 기원이며 전국시대의 여러나라도 이에 따랐다.
진(秦) 시황제(始皇帝)는 중국 통일(bc 221) 후 흉노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간쑤성(甘肅省) 남부로부터 북으로, 황하강(黃河江)의 대굴곡부(大屈曲部)의 북쪽을 따라 동으로 뻗어나가, 둥베이(東北) 지구의 랴오허강(遼河) 하류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는데, 절반 이상은 전국시대의 연(燕)·조(趙) 등이 쌓은 장성을 이용한 것이었다.근년에 이 장성의 동부 유지(遺址)가 둥베이지구에서 발견되고 있다.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허시후이랑(河西回廊)을 흉노로부터 지키려고 장성을 란저우(蘭州) 북방에서 서쪽으로 둔황(敦煌) 서편의 위먼관(玉門關)까지 연장하였다.
남북조시대에는 북방민족의 활동으로 장성 위치는 남하하여, 6세기 중엽 북제(北齊)는 다퉁(大同) 북서에서 쥐융관(居庸關)을 거쳐 산하이관(山海關)에 이르는 장성을 축성하였다.수(隋)는 돌궐·거란 방비를 위하여 오르도스(내몽골자치구의 중남부) 남쪽에 장성을 쌓았다.당대(唐代)에 들어서 북쪽까지 판도를 넓혔기 때문에 방어선으로서의 장성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대(五代) 이후에는 장성지대가 북방민족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었다.장성이 현재의 규모로 된 것은 명(明)나라시대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관광 대상이 되고 있는 바다링〔八達嶺〕 근처의 장성은 높이 8.5m, 두께는 밑부분 6.5m, 윗부분 5.7m이며, 위에는 높이 1.7m의 연속된 철자형(凸字形) 담인 성가퀴(城堞)를 만들고 총안(銃眼)을 냈고, 120m 간격으로 돈대(墩臺)를 만들어 군사의 주둔과 감시에 이용하였다.청대(淸代) 이후에는 군사적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본토와 만주·몽골 지역을 나누는 행정적인 경계선에 불과하게 되었다.
7.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 밖에 l.코트렐이 말한 7대 불가사의
① 크레타섬의 미노스 궁전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센 공주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테세우스는 트로이센에서 자랐다. 아버지인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에게 테세우스가 자라서 큰 바위를 들어내고 그 아래 감춰 둔 칼과 구두를 꺼낼 수 있을 만큼 장성한 후에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다. 테세우스가 장성한 후 아이트라는 아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테세우스는 그 큰 바위를 간단히 들어내고 칼과 구두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났다. 테세우스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아테네에 도착했다.
당시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부인은 마법사인 메데이아였는데 그녀는 마법으로 이 청년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테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독이 든 술을 권했다. 테세우스가 왕의 앞에 나가 독이 든 술잔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 아이게우스는 청년의 칼과 구두를 보고 자기 자식임을 눈치챘다. 그리고는 그 술잔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소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아시아로 도망을 갔고 테세우스는 친자 인정을 받아 왕위계승자로 결정되었다.당시 아테네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당시 강국이었던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청년과 처녀들을 각각 7명씩 산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해 온 것이었다.
미노스는 몸은 인간이고 머리는 황소인 미노타우로스에게 젊은 남녀를 먹이로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동물은 힘이 장사에다 성질이 난폭해서 특수 설계한 미궁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 이 궁전이 미노스 궁전 혹은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것이다. 테세우스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제물의 한명으로 자원해서 이 괴물을 처치하기로 마음먹었다.케세우스는 출항 전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만일 성공하면 검은 돛 대신 흰 돛을 배에 달고 돌아오기로 말이다. 크레타에 도착한 일행은 미노스 앞에 끌려 갔다.
이 때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는 일행 중에 끼어 있는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렸다. 아이아드네는 미궁의 비밀을 귀띔해 주면서 칼 한 자루와 실 타래를 주었다. 테세우스는 실 타래를 풀면서 미궁 안으로 들어가 괴물을 죽인 후 다시 실 타래를 따라 무사히 빠져 나왔다. 테세우스는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흰 돛을 단다는 것을 깜빡 잊어 버렸다. 이것을 멀리서 본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자결하고 말았다.이것이 궁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실재로 그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무도 그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트로이를 발굴하고 미케네, 티린스를 발굴한 독일의 쉴리만은 현지 총독과 협상하여 발굴권을 겨우 얻어냈다. 궁전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지주와 흥정을 했다. 지주는 2500그루의 올리브 나무 가격을 받아야 한다며 10만 프랑을 요구했다. 결국 4만프랑에 합의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던 중 나무가 888그루밖에 되지 않자 쉴리만은 화가 나서 발굴작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10여년 후 영국인 아서 에반스(arthur evans)가 상형문자 해석에 관한 그의 이론을 확인하고 위해서 크레타 섬에 오게 되었다. 그는 쉴리만이 했던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을 궁전의 위치라고 생각했다. 올리브 나무가 있던 지역은 크레타의 수도 헤라크 레이온(혹은 이라크 레이온)에서 5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었다. 에반스는 신화에서처럼 크레타에 반드시 미노스의 크노소스 궁전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발굴에 착수했다.발굴을 시작한 후, 거대한 궁전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이 1천개가 넘는 궁전은 3~4층으로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각방은 층계를 통해 각 층을 연결하고 있었다. 크노소스 궁전은 다이달로스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알려준 미궁 탈출 방법도 그가 알려준 것이라 한다.
궁전 안에는 수도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수도 시설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각 방의 밝기는 광정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 건물 내부를 밝혔다. 이 광정은 지붕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관통하는 공간인데 이것이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그들의 건축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방과 복도의 벽에는 화려한 프레스코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장난치며 물 속을 헤엄치는 돌고래들, 젊은 청년과 머리를 길게 땋은 젊은 여인들의 행렬, 돌진하는 황소와 곡예사들 등이 벽화를 장식하고 있다. 궁전 안에는 거대한 꽃병들이 발견되었는데 꽃병에는 문어가 한 마리씩 그려져 볼록한 꽃병의 윤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또 궁전 곳곳에서 라비린토스(lavyrinthos)라고 부르는 '쌍날도끼'가 발굴되었다.
이 쌍날 도끼는 일종의 종교 의식의 상징으로 많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악귀를 쫓는다든지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아 받치는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창고였던 것 같다. 이 항아리 모두에 올리브 기름을 채운다면 19,000갤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된다. 이 곳에서는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옥좌가 발굴되었다. 신하들이 앉는 긴 의자 사이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 몸에 독수리 머리와 날개의 괴물인 그리핀 두 마리가 새겨져 있는 옥좌이다.
아직도 의문인 것은 크노소스 궁전과 화려하던 미노아 문명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이다.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지진 등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궁전을 발굴해 낸 에반스는 궁전의 방에서 갑작스런 재해의 증거를 발견했다. 연장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완성되지 못한 예술 작품, 가사 도구가 그대로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크레타가 유럽에서 지진 활동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 재해에 의한 멸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에반스도 강도 높은 지진만이 크노소스 궁전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학자들은 에반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② 테베·네크로폴리스(묘지) 이집트의 룩소르에는 왕들의 무덤인 왕가의 계곡이 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 귀족들의 무덤인 네크로폴리스가 그것이다. 어떤 이들은 왕가의 계곡보다 귀족들의 묘인 네크로폴리스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얘기한다.네크로폴리스는 왕가의 계곡보다는 그 유명세가 덜한게 사실이다. 왕족들보다는 한단계 아래 계급인 귀족들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덤의 크기나 형태로 보면 결코 왕가의 계곡 무덤들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무덤들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묘와는 다르게 벽화나 조각이 무수하게 많으며 그림도 상당한 수준이다. 학자들은 이 귀족들의 무덤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무덤들 가운데 라후미라의 묘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라후미라는 기원전 1502년부터 1448년까지 제 18왕조 토우토메스 3세 때의 재상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무덤은 다른 것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벽화들로 장식되어 있다. 토우토메스 3세는 싸움에 능한 왕으로 전쟁을 즐겼으며 라후미라는 그 빈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아 관리하고 정리하였다.라후미라의 벽화를 보면 외국 사신으로부터 공물을 받는 그림이 몇 개 있으며, 수단 지방의 흑인종인 누비아인이 상아나 기린, 원숭이 그 밖의 아프리카 산물을 운반하는 장면도 있다.
또 시리아 인이 파라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그림도 있다. 미노아 시대의 크레타 섬에서 온 인물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미노아 궁전 안의 그림과 비슷한 점이 많다. 가령 미니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술잔을 든 인물처럼 아주 품위 있는 모습이다. 또한 미노아 특산의 항아리와 손잡이가 있는 술잔 그리고 은제 황소 머리상을 나르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들은 점령국가의 지배시민이 아닌 크레타 시대의 상인으로 나일 강을 거슬러 룩소르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다.
라후미라의 묘에는 파티의 흥겨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의 아내인 메리트가 정장을 하고 자랑스럽게 남편 옆에 서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여성 악사들이 하프, 리라, 탬 버린 등을 들고 풍악을 울리는 모습도 있다. 초대된 손님들은 남녀구분없이 아주 흥겨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남부 테베(현재 룩소르)의 장관이었던 센네펠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 그는 농업과 축산에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는데 그의 묘의 천장에는 포도잎과 늘어진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어 그의 생전의 직업을 연상할 수 있다.
또 하르에포의 묘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들도 남아 있다. 하르에프는 고대 이집트 18왕조 왕이었던 아멘헤테프 3세의 왕비였던 티이의 궁내 시종 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려져 있는 벽화는 왕비 티이와 여신 하트홀을 동반한 아멘헤테프 3세가 그들 부부를 칭송하는 춤을 관람하고 있는 장면이다.파라오의 전답을 관장했던 멘나의 묘에는 파피루스 풀로 만든 배를 타고 호수에서 여가를 즐기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른손에 투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오리를 겨누고 있는 모습이다.
네크로폴리스에는 라후미라, 센네펠, 하르에프, 멘나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그려져 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서민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벽화에 쓰인 물감은 눈부신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어떻게 몇쳔년 전의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③ 왕가(王家)의 계곡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500km떨어진 곳에 룩소르라는 관광지가 있다.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수도 테베의 남쪽 교외에 해당한다. 왕가의 계곡은 나일강 서안의 메마른 계곡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곳에는 아멘호테프 4세가 중부 이집트의 텔엘아마르나에 천도해 있던 시기를 제외하고 신왕국 제 18왕조(기원전 1400년경) 투트메스(thutmose) 1세에서 제20왕조 람세스(ramses) 11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왕의 암굴묘가 세워져 있다. 표고 450m의 알쿠른 바위산이 파라미드 형상을 한 산과 태양이 지는 나일강 서안은 죽은 왕의 매장지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대에는 타이네트(골짜기), 타세트아아트(위대한 장소)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와디알무르크(왕들의 계곡)라 불리고 있다.
왕들의 계곡은 동서로 갈리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여기의 묘와 20여개의 피트(지면에서 곧게 내리 판 굴)가 발견되었다. 1922년 투탕카멘(tutankhamen)의 묘가 발견된 이후 새로운 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새로운 묘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왕가의 계곡에 있는 무덤들은 모두 신왕국 때의 것으로, 왕들의 묘는 험한 바위산을 파고 낭떠러지의 중턱이나 아랫 부분을 파낸 곳에 세워졌다. 그리고 왕묘에 대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 이 묘들은 일반적으로 계단과 경사로로 구성되는 하강 통로, 여러 개의 부속실, 전실,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제 18대 왕조 시대에는 묘의 통로가 도중에 지각으로 구부러지는 직각형이 전형적인 형태였다.
제 18왕조인 이크나톤(ikhnaton) 왕은 도읍을 아마르나로 옮겼고 그 곳의 묘는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구조는 빛의 직진성과 관련되어 태양신을 숭배하던 당시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왕묘는 계속 왕가의 계곡에 세워지게 되었다. 제 18왕조 말의 호르멤헤브(hormemheb) 왕묘 이래로 묘의 구조는 직선형으로 변해갔다. 또 제 20왕조의 람세스 4세 이후는 거대한 입구를 가지게 되었다.1881년 7월, 텔엘바하리의 남쪽 낭떠러지에서 구멍 뚫린 샤프트 묘에서 놀라운 대발견이 있었다. 그 곳에는 금속기나 석제 그릇, 샤프트상 등을 비롯하여 5900점의 부장품과 50구가 넘는 미라가 발견된 것이다. 이 묘는 제 21왕조의 파누젬 2세와 그 가족을 매장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후에 제 22왕조 세숑크(sheshonk) 1세 때 신왕국 시대의 왕과 왕비 미라가 운반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텔엘바하리의 묘를 발견하게 된 것은 한 도굴범의 정보 제공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그의 진술에 따르면 1870년대 초에 이 곳을 발견하여 골동품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많은 부장품이 나돌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더 이상의 도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그로부터 17년 후인 1898년, 프랑스의 한 학자에 의해 왕가의 계곡에서 아멘호테프 2세의 묘가 발견되었다. 그 곳은 입구가 대량의 모래와 자갈에 의해 완전히 매몰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11구의 미라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8개가 왕의 미라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텔엘바하리와 왕가의 계곡에서 2군데의 왕의 미라를 숨겨 놓은 곳이 발견되었다. 왜 이 왕들의 미라는 자신의 묘가 아닌 다른 곳에 숨겨졌을까?신왕국 시대 말기에 왕가의 계곡에서 도굴이 성행하게 되어 많은 왕의 미라가 손상을 입었다. 이 사태를 우려한 아멘 대사제가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송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도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묻혀 있던 수많은 부장품과 금으로 도금한 관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아멘 신관단이 왕의 미라를 옮기면서 부장품을 약탈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합법적인(?) 도굴로 얻은 금은 보화는 아멘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테베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왕의 유체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벌인 일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왕들의 미라는 모두 33구이다. 그 중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은 13구의 미라이다. 그렇다면 또다른 은신처에 이 13구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군데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왕들의 미라를 안장한 목관이나 미라를 쓴 포대에는 미라가 여러 은신처로 이동, 운반되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호르멤헤브 왕묘에는 왕의 미라가 다른 장소로 운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제18왕조 말기에서 제19왕조 초기의 왕들의 미라는 발견되지 않은 제3의 은신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 앞으로의 발굴에서 새로운 왕묘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집트는 이미 기원전 3500년, 부족 국가들이 탄생을 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 경에 최초의 통일 국가인 제1왕조가 세워졌다. 이 때부터 약 2500년동안 26개의 왕조가 생겨났는데 제 10왕조까지를 고왕국, 제17왕조까지를 중왕국, 그 이후를 신왕국이라 부른다.
④ 시리아의 팔미라 고도(古都)사막 위에 솟아오른 환상의 도시 팔미라. 시리아의 동부 사막지대 한복판에 세워진 대도시 팔미라는 흔히 사막의 궁전으로 불리며,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과 경이로 채워준다. 팔미라는 동서를 잇는 교역도시였으며 그로 인해 사방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특유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팔미라가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강과 다마스쿠스 사이의 광할한 사막지대 안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다. 오늘도 이곳의 에프카(efqa)샘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나 일대를 풍요롭게 적셔주고 있다. 이 곳은 10m이상되는 아쟈나무들이 큰 숲을 이뤄 주변의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원래 이 곳 지명의 이름도 타드몰(tadmor : 고대 셈족어로 야자수)이었다.
팔미라는 동쪽의 페르시아 만과 이란, 서쪽의 지중해를 잇는 동서 무역의 중요한 중계지로서 번영하였다. 팔미라에는 많은 상인이 살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인도와 아라비아 산물을 로마 제국으로 운반하였다. 또한 사막을 왕래하며 장사를 하던 카라반(caravan)들이 피곤한 몸을 쉬고 물을 공급받던 사막의 경유지였다. 셀레우스코 왕조 때부터 중개무역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팔미라는 로마가 점령했던 기원전후 약 300년간 전*를 누렸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한 때 이 곳에까지 영향을 * 적도 있었다. 그러나 팔미라는 역사의 대부분을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였다. 이곳을 지나는 대상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사막 교역로를 지켜주는 대가로 통과세를 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팔미라는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희랍과 로마시대가 전*였으며, 이 때 타드몰에서 팔미라로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인 군대를 가진 강력한 도시국가로 발전하기에 이른다.오늘날 팔미라에 남아 있는 유적들의 대부분은 1~3세기의 로마시대에 건축한 것이다. 거친 표면이지만 세련미가 돋보이는 그래서 팔미라를 대표하는 신전인 벨 신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당시의 석조기술을 알 수 있는 원형극장, 벨 신전 맞은편에 있는 나부신전과 개선문, 정치집회장 혹은 시장으로 이용된 아그라와 그 밖의 많은 석주들. 이 모든 유적들을 보면 눈부시고 황홀한 팔미라가 계획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독자성을 유지했던 팔미라의 문화는 그 미술에서 특히 조각에서 확실히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주변의 구릉에 석회암이 풍부했던 덕택이기도 하다. 많은 팔미라의 조각은 양식화된 정적인 미술이고 서아시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팔미라의 서쪽 시외에 북시리아의 황야가 펼치지고 묘지의 계곡이라는 장소에 팔미라 시민의 묘가 있다. 묘는 영원의 집이라 불리며 팔미라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었다. 공동 묘지도 있었으나 유력한 가족은 일족의 묘를 가지고 있었다. 묘의 형식에는 탑묘(塔墓), 가형묘(家形墓), 지하 분묘(地下墳墓) 등이 있었으며 탑묘의 형식은 팔미라 독자의 양식에 근거하고 있다.
서기 260년대에 아데나투스 2세가 팔미라의 왕이 되었다. 그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능해서 팔미라의 융*를 구가했었다. 그러나 그는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272년 그의 왕비 제노비아는 아들에게 황제의 칭호를 수여하고 황제의 어머니로 자처했다. 로마의 황제가 이를 묵과할 리 없었다. 아무렐리안 황제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팔미라로 진군해 성을 포위했다. 제노비아는 포위망을 뚫고 팔미라를 빠져 나왔으나 유프라테스강을 건너려는 순간 로마 기병대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로써 팔미라의 역사를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팔미라는 로마 제국에서 이슬람 왕조로 지배권이 넘어가면서 교통과 군사상 요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오스만 제국 시대가 되자 급속히 쇠퇴하고 말았다. 더욱이 11세기에 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팔미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그 후 몰아치는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팔미라의 유적들은 모조리 모래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1930년대에 와서야 팔미라의 발굴과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16만평에 달하는 팔미라를 발굴하는 작업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금씩 발굴되고 있는 팔미라의 신전과 석주들이 화려했던 팔미라의 옛모습을 현대에 전해주고 있다.
⑤ 바위의 돔 기원전 950년경, 유다 왕국의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안의 동쪽편 산지에 순금으로 장식한 장엄미가 넘치는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성전이 세워진 후 이 지역은 성전산(temple mount)이라 불려지게 되었고 성도 예루살렘의 핵심부가 되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으로 그들 신앙의 중심지요 자부심의 원천이었다.기원전 6세기 초,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도성을 불질렀고 이 때 성전도 소실되게 된다. 유다 왕국의 멸망 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승리로 그들은 해방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폐허가 된 성전을 소규모로 재건하게 된다. 이 때가 기원전 515년경이었다. 성전산 위에 세워진 이 두 번째 성전은 페르시아, 희랍, 로마시대를 거치는 500여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기원전 37년에 로마제국의 후광으로 왕위에 오른 헤롯 왕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을 헐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대규모의 성전과 부속건물, 주변의 요새 등을 원래의 크기와 위용대로 재건하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성전이며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기도 하다.서기 1세기 중엽, 로마제국의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성전 터에 서기 135년경에 하드리안 황제가 이교도의 아도니스(adonis) 신전을 건설하였고, 비잔틴 시대에는 이곳을 통치했던 기독교 인들이 유대인 성전의 파괴를 보여주기 위해 황폐한 모습으로 성전산을 방치하였다. 오직 성전산의 서쪽편 축대인 "통곡의 벽"만이 남아 그곳의 역사를 가늠하게 해 줄 뿐이었다.
서기 638년 이곳을 통치했던 아랍인들은 성전산의 큰 바위 위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선지자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전설에 따라 그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는 바위를 종교적으로 기념 및 보존하기 위해 서기 692년 당시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압둘 말리크는 그들의 대사원을 건축하게 한다.오늘날도 성전산 위에 우뚝 서 있어 예루살렘의 대표적 건축물이 되고 있는 "바위의 돔"이 바로 그것이다. 지름이 78피트, 높이가 108피트인 돔은 구리와 알미늄의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태양빛이 비칠 때는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사된다. 1958~1964년 사이에 사원의 돔을 교체하면서 황금색 칠을 하여 황금사원이라고도 불린다.
정팔각형의 건물인 이 사원 실내 한가운데에는 폭 13m, 높이 1.25~2m, 길이가 18m인 나무로 둘러싸인 넓직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던 제단이라고 전해진다. 표면에는 골이 패어 있어서 제물의 피가 흘러 내리도록 되어 있다.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바위도 바로 이 바위다. 이 때문에 회교에서는 메카 메디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3대 성지로 꼽고 있다.바위의 돔 사원의 모든 벽면에는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랍 건축예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돔 내부에는 대리석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의 색깔, 높이, 두께 등이 모두 제각각이다. 그 이유는 이 기둥들이 비잔틴이나 로마시대 신전의 것으로 복잡한 배경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바위의 돔은 새 단장을 하게 되었다.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650만 달러의 사재로 돔을 24k의 순금으로 씌우게 했다. 1993년 시작된 공사는 15개월간 계속되어 1200장의 얇은 순금 판이 돔 위에 입혀져 진짜 황금의 돔이 되었다
⑥ 클라크 데 슈발리에(시리아의 십자군 성채) 1096년 유럽 기독교 국가들로 구성된 십자군의 대장정은 오늘날 터키의 최남단 도시 안디옥(현재의 안타키아)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진을 계속하여 1099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교도의 손에서 탈환하자는 구호 밑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승리였다. 이로써 200년간 계속된 십자군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십자군은 남북으로 700km나 되는 이 지역에 50개가 넘는 요새 성채를 축성하였다. 이 성채들은 십자군 건축 양식에 따라 하나같이 장대한 규모를 자랑했지만 13세기말 십자군의 패배와 함께 파괴되었다. 그 후 7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그 골격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 한 곳 예외가 있다. 십자군 시대 성채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 있다. 그 곳은 시리아의 클락 데 슈발리에(crac des chevaliers)라고 부르는 성채이다. 기사의 성채라는 뜻을 가진 이 곳은 당시 성채의 구조와 축성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중세 건축물 가운데 건축법이나 건축미가 매우 뛰어난 것 중 하나로 꼽혀 건축사의 연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십자군은 그 숫자로 볼 때 대군은 아니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십자군 수는 15,000명을 넘지 못했다. 그 후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십자군 기사들은 고작 300명 정도였다. 소수의 십자군이 다수의 적대적인 지역을 관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십자군은 수적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적 요지에 수많은 성채들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장악해 갔다. 십자군 성채는 군사들이 주둔하는 요새였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다. 클락 데 슈발리에는 모슬렘의 중요한 도시 홈스(homs)와 지중해를 잇는 중간지점의 전략적 위치에 세워졌다. 이 성채가 완성되었을 때 모슬렘 사가는 모슬렘 세계의 '목에 박힌 가시'라고 표현했다.
클락 데 슈발리에는 해발 750m의 칼릴(khalil)산 정상에 오각형 형태로 우뚝 서 있다. 길이는 남북으로 200m, 동서로 140m나 되며, 면적만 해도 1만평에 이르는 대단한 규모다. 이 성채의 특징 중 하나는 성벽이 완벽한 이중구조라는 것이다. 우선 든든한 외성이 있고 그 안에 외성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린 내성이 성채를 둘러싸고 있다. 외성과 내성 사이는 도랑을 깊게 파고 물을 채워 해자를 만들었다. 내성은 성벽을 직각으로 쌓지 않고 그 밑부분을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해자를 넘어온 적들이 성밑까지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성 밑부분은 경사지게 만든 것은 성벽자체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지녔다고 한다. 성내부에는 바닥이 꺼지면서 적을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장치, 가득 채우면 몇 년까지 버틸 수 있는 곡식저장소, 거대한 물 저장소, 120m에 달하는 대집회소, 예배소, 식당, 숙소, 미로같은 비밀통로 등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슬람교도인 모슬렘들은 이 성채를 빼앗기 위해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무적의 살라딘도 이 성채를 공략하러 갔다가 성공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다음날 철군했다는 일화도 있다.1271년 이집트의 술탄 베이발스(sultan baybars)는 군대를 이끌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 클락 데 슈발리에를 공격했다. 격전 끝에 외성을 뚫는데는 성공했지만 내성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를 함락시키는 것이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세이발스는 한가지 계략을 꾸몄다.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성안의 십자군들에게 한 통의 밀서가 전달되었다. 그것은 십자군 총사령관이 보낸 밀서였다. 거기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여 유럽으로 퇴각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저항하던 십자군들은 베이발스에게 유럽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귀로를 보장하면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베이발스가 이 조건을 수락하자 십자군 성채에는 백기가 휘날리게 되었다.
사실 그 밀서는 베이발스가 꾸며낸 가짜였다. 그러나 그의 밀서로 인해 성채는 파괴되는 운명을 면할 수 있었다. 1271년 이 성채의 함락을 시작으로 십자군 성채들은 차례로 모슬렘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20년 후인 1291년, 십자군 최후의 보루 아코(acco)가 함락됨으로써 십자군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⑦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를 지구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델포이(델피)를 지구의 배꼽이라 하며 신성시했다. 그리스의 유일한 고고학 유적지라 할 수 있는 델포이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탁의 장소이고 아폴로 신에게 소속된 그리스 최대의 성지로 통한다. 이곳의 델피 박물관에는 이 곳에서 발굴된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델포이 유적의 입구에서 파르나스 산의 구불구불한 참배의 길을 올라가다보면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 아폴로 신전을 볼 수 있다. 길 양쪽으로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헌납한 보물창고와 봉납비, 신상, 건조물이 늘어서 있었으나 지금은 그 대좌와 기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중 프랑스 고고학회가 재건한 아테네인의 보물창고가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는데 도리스식 기둥 2개의 한쪽면에 아테네가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인에게 승리한 것에 대해 아폴로신에게 헌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옆에는 브레프테리온이라는 전물터가 있는데 옛 제전의 평의원들이 사용했던 곳이다. bc 3-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폴로 신전의 내실에는 아폴로 상이 놓여 있었으며 지하실에는 대지의 배꼽(옴파로스)라는 돌이 보관되어 있었다. 현재 이 돌은 델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폴로 신전은 현재 그 기둥과 토대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아폴로 신에 대한 신앙과 그에 의한 신탁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신전이 만들어졌을 당시 그 신전에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곳 바위 틈에서 올라오는 물 기운을 마시며 황홀해진 신관이 아폴로 신에게 신탁을 고했다고 한다.
신전 전실의 벽에는 고대 현인 7명의 격언이 새겨져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아폴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광명, 의술, 궁술, 시, 음악, 예언, 가축의 신이다. 아폴론이라고도 한다. 그는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신이었고 또한 음악의 명수로서 예술의 수호신이 되어 뮤즈의 여신들이 그를 따른다. 그는 때로 태양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폴로가 그리스, 로마인에게는 지성과 문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7대불가사의(7wonders of the modern world)
1)유로터널(영불해협)
영국사람들은 도버해협이라고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칼레해협이라고 일컫는 영불해협의 정식명칭은 '채널(channel)'이라 하며, 이 해협을 육로로 연결시키는 터널의 공식명칭은 '채널터널(channel tunnel)' 또는 채널과 터널을 합성한 신조어인 '처널(chunnel)'로 명명된다.사실상 유로 터널(euro tunnel)이라는 명칭은 이 터널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의 이름이다. 이 회사는 영쇓불 양국정부로부터 건설공사 준공후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권한을 착공시점부터 55년동안 위임받아 관리한 후, 2042년에 양국 정부에 소유권을 넘 겨 주게 된다.
유로 터널사는 15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정부의 자금지이나 보증 없이 주식공모와 은행융자로 조달했다. 이 공사는 국가간의 초대형 인프라건설을 순수민간자본이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94년 터널의 개통이후,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직면했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채무액만 약 750억 프랑(한화 12조원)이고, 한해 지불이자액만 60억 프랑(한화 9600억원)이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96년 12월에는 터널 내부에서 차량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승객과 화물량이 격감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외신에 의하면, '97년도에 이뤄진 유로 터널사의 구 조조정에 이어, 최근 들어 승객과 화물량이 갈수록 폭증하여 머지 않아 흑자전환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즉, 2004년경이면 이자 지급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그 동안 체념(?)하고 있었던 주주들에게 이 익 배당까지 예상된다고 하니, 가히 지옥에서 천당으로의 위상변화 가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나아가서, 제2의 해저터널건설계획이 날 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기존의 포크스톤과 칼레를 왕래하는 기차전용의 터널은 201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제2의 터널은 기존의 터널과 나란히 달리는 자동차 전용터널로 건설되는데, 이 노선의 청사진은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cn tower(캐나다)
지상에서 높이 553m이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라 할만 하다. 워낙 높다 보니 바로 밑에서 보면 바람에 타워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남산 타워처럼 통신용으로 지었다가 개방하였는데 평일에도 줄을 서야 할만큼 붐비는 관광 명소이다.입구로 들어서면 매표소 앞의 인파부터 볼 것이다. 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시설은 빼고 엘리베이터 표만 사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다 보니 탑승 시간이 적혀 있다. 그 동안에는 밖에 나와 타워 외벽에서 등산 연습하는 사람도 보고 군것질 하면서 타워를 올려다 보는 것도 좋을 듯.
초고속 전망 엘리베이터는 58초 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 닿는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출입문 쪽에 서면 전망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줄서서 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보게 된다. 좋은 자리 얻는 것도 운이다.
3)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미국)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건축가 슈립 람하먼의 설계로 뉴욕 한복판에 102층 철골구조로 건축었으며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좁아져야 한다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계단식 설계로 되어 있다.381미터 높이에 6천 4백여 개의 창, 64대의 엘리베이터, 화장실만도 2천 5백 개가 넘는다. 청소부 2백여 명을 합쳐 모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빌딩 안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일 찾는 관광객만도 4만 명이다.
또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최단기 최고층 건설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불과 1년 45일 만에 당초 예정보다 크게 밑도는 비용을 들여 완공했는데, 빠른 시공과 함께 그 견고함은 지금은 건축가들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정도.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는 원래 뉴욕의 별칭이다. 1972년 맨해튼 남쪽에 세 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들어설 때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41년간 세계 최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지금도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린다
4)금문교(미국)
1933년에 착공하여 1937년에 완공한 다리로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머린군을 연결하고 있다. 길이 2730m, 폭 27m로 매일 10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경치를 바라보며 걸어서 건널 수도 있다. 다리의 양쪽에는 비스타 포인트라는 전망대가 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아름답다.
5)이타이푸댐(브라질/파라과이)
댐높이 196m. 길이 7.37km. 저수량 190억m3. 중공중력(中空重力), 록필, 어스필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조합한 콤바인댐으로, 1975년에 착공하여 1982년에 준공되었으며, 총출력 1만 2,600kw이다.
6)북해보호공사(네덜란드)
7)파나마운하(파나마)이다.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에서 대서양 연안의 크리스토발까지 전장 64 km. 카리브해(海)로 흘러드는 차그레스강(江)을 막아 축조한 가툰호(면적 약 420 km2) 안에 만들어진 34 km의 수로 및 파나마만(灣) 쪽의 미라플로레스호(湖) 안에 만들어진 1.6 km의 수로와, 이 두 호수 사이에서 지협의 척추 구실을 하는 구릉지를 15 km나 파헤쳐 만든 쿨레브라 수로(에스파냐어로 ‘새우’라는 뜻, 굴착 감독자의 이름을 기념하여 게일라드 수로라고도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가툰호와 쿨레브라 수로의 수면표고(水面標高)는 25.9 m, 미라플로레스호의 수면표고는 16 m이다. 이 두 호수 사이의 표고차는 물론 호수와 해면(海面)의 표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갑문방식(閘門方式)이 이용되고 있다. 파나마만에서 미라플로레스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2단식(二段式) 미라플로레스 갑문, 여기에서 쿨레브라 수로로 통하는 입구에는 1단식의 페드로미겔 갑문, 가툰호에서 카리브만으로 나가는 출구에는 3단식 가툰 갑문이 건설되어 있다. 연간 평균 이용 선박의 수는 1만 5000척, 운하를 통과하는 데에는 약 8시간이 걸린다.
이거쓴 사람... 그냥 인간 건축물이 다 미스테리라고 할사람인듯... 몇개는 나도 신기하지만.. ㅋㅋ
피라미드는... 아무리생각해도... 그시대에 어떻게 지었는지가 궁금...
-
-
-

[정치·경제·사회] 박정희 시대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의 경제쟁책들.. 그니까 5개년 경제개발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전부 박정희가 갈아엎은 장면정부가 구상해놓고 실행 준비하던 것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거기서 외자를 도입하려고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으며 졸속으로 일본과 수교를 맺고
베트남전에 국군을 보냈다고..
물론 저는 새마을 운동은 꽤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의 원인이 어떤 훌룡한 정책
그니까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 하루 18시간 동안의 노동을 강요하던 노동착취와
국군과 역사를 팔아서 벌어온 외자 덕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정부 당시에는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 교섭을 시도했고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이였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시에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독재체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분권적인 형태였고
북한에서도 평화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고, 그 명분으로 반공을 내세웠기 떄문에
그래서 무조건 적인 반공 정신을 세뇌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맹목적이면서도 극렬한 반공주의자가 생겼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배운거 하나 없는 이분들은 이승만으로부터 내려오는 한민당의 계보
(이승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이명박)
의 집권을 위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거죠
게다가 쿠데타로 인해 정통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만들기위해
교묘하게 지역감정을 유발시켰고, 아직까지 내려오는 지역간의 분쟁과 그에 따라는 폐단은 여기에 기인한다봅니다
다음은 박정희 시대의 여러가지 자료들입니다
1970년 노동착취에 항거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을 그린 영화의 한장면입니다
대선에서 박정희 630만표, 김대중 540만표
박정희가 휘하의 대략 100만명 가까이의 군인 밑 한민당 추종세력을 동원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김대중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시작하는 한편,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유신체제에서 박정희는 초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로서 설치되었습니다
위의 일들보다 조금 먼저 1965년에 있었던 베트남 파병입니다
가수 남진씨도 말했듯이, 겉으로는 의용의 모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것이였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발단이 된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사건입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를 비난하자
박정희는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해버립니다
그러자 부산-마산에서 부마시민항쟁이 터졌고 박정희가 이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려하던 시기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합니다
민중이 현재의 주체가 되려면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 박정희의 업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경제성장의 모습을 자세히 훑어보면 노동착취와 일부 재벌중심 기업구조 등등의 여러가지 폐단이 발견됩니다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보수계열의 언론이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박정희를 평가하는 과오를 범해선 안될거같습니다
출처 : 다음 - 이종격투기 카페 : 베르뎅님..
-

[밀리터리] 북한의 對南 기습전 시나리오. 주공은 육군, 조공은 해군
주공(主攻)은 ‘서울을 전투화로 밟아버리려는’ 지상전 세력 조공(助攻)은 ‘훅을 날리듯’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해군력이정훈 국방 전문기자가 분석하는 북한의 對南 기습전 시나리오
이정훈│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1월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나서서 전면대결을 선언하더니, 1월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이하 조평통)가 남북 간 모든 정치·군사상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평통 성명의 위협 수위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높았다. 조평통은 ‘리명박 패당’ ‘리명박 역도’란 단어를 써가며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火)과 불, 철(鐵)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 “역적 패당이… 북남 수뇌상봉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전면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론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반(反)공화국 대결 광란의 앞장에는 리명박 역도가 서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nll)상에서 도발할 수 있다. 북한의 협박은 예사로이 보아 넘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민들의 출어 횟수를 급격히 줄이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최악의 상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전면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역량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도발을 남북통일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일으킬 수 있는 전면전의 양상과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통일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자.
제약을 받는 북한군 기습
작전의 요체는 적은 수의 전력으로 최대 전과를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리에 내가 가진 모든 세력을 모아 ‘기습(奇襲)’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군은 ‘집중과 기습’을 핵으로 한 공격 작전을 펼친다. 하지만 집중과 기습 작전은 주변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남북한 군의 전력 차이, 남북한 국력 차이 등 주어진 조건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기습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기습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기습은 기습 대상 포인트로 부대를 기동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기동은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전 능력은, 특히 한미연합군의 정보전 능력은 대단히 발전했기에, 북한은 한미연합군 정보 부대를 완전히 속여 넘기면서까지 부대를 기동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군은 ‘연막’을 피운다. 내부적으로 ‘통상적인 훈련을 한다’는 등의 교신을 주고받으며 부대를 기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많은 부대를 기동시키면 한미연합 정보부대가 통상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므로, 꼭 기동시켜야 하는 부대만 움직인다. 나머지 부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실제 공격에 들어가는 ‘h-아워’를 기다리게 한다. 군사작전 용어 중에 tot라는 것이 있다. 포병사격 때 많이 쓰이는 말인데 ‘time on target’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tot 사격은 동일 시간에 모든 포탄을 같은 목표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기습을 할 때는 tot사격원리를 적용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서울은 휴전선에 아주 가까이 있어 기습전을 펼칠 대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서울이 점령되면 대한민국은 머리를 잡힌 뱀처럼 온몸을 꿈틀거려보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한다. 따라서 단시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미국 증원군이 한반도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기습전이 된다.
공격전은 ‘주공(主攻)’과 ‘조공(助攻)’으로 나눠 감행한다. 목표 달성은 주공세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조공이 달성하기도 한다. 상대가 아군 작전을 눈치 채고 주공 진격루트에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면, 조공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목표점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왼쪽 사진 앞)과 해성 함대함 미사일(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윤영하급 고속함. 한국의 수상함 전력은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경기만(灣) 상륙 노리는 북한 해군
서울은 휴전선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아주 가까이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주공은 ‘서울을 전투화로 밟아버리려는’ 지상전 세력이 되고, 조공은 ‘훅을 날리듯’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해군 세력이 된다. 그러나 조공인 해군 세력도 서울 점령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
휴전선 바로 북쪽에는 서쪽에서부터 4-2-5-1로 이어지는 북한 육군의 4개 전연(前緣) 군단이 있다. 휴전선에 붙어 있기에 북한은 이 군단을 동원해 휴전선 돌파라는 1차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은 바로 nll을 돌파하지 못한다. 이유는 주력 함정이 후방 수역에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데이’가 다가오면 북한 해군은 tot 사격 원리에 따라 후방에 있는 대형 함정을 먼저 기동시키고,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작은 함정을 움직여 모든 함정이 동일 시간에 nll 선상의 한 포인트로 몰려들게 한다. 이러한 공격전을 펼칠 때 북한 해군은 한국 해군(또는 한미 연합해군)과 맞서는 고전적인 해상전은 극력 회피한다. 이유는 북한 해군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이다.
80~100척의 北 수상전단
한국 해군은 만재 t수가 1만t이 넘는 이지스 구축함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은 1500t급인 나진급 구축함 2척뿐이다. 현재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 울산급 호위함 9척 등 1500t이 넘는 함정을 20척 보유하고 있어, 고전적인 해전을 벌이면 한순간에 북한 해군을 궤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해군은 한국 함대와의 교전을 피하며 nll상의 특정 포인트를 뚫고 들어가 인천을 비롯한 경기만(灣) 일대에, 한국 해군의 udt 부대와 비슷한 ‘해상저격여단’ 등 특수부대를 상륙시키는 작전에 주력한다. 해상저격여단을 상륙시킬 수 있다면 여타 함정은 ‘사석(捨石)’으로 버려도 좋다는 것이 북한 해군의 의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 해군은 이 돌격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후방에 있던 나진급 등 대형 함정은 nll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d 마이너스 1일이나 d 마이너스 2일부터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 듯한 교신을 주고받으며 남진에 들어간다. 그리고 소호급 호위함과 사리원급-소주급-오사급 유도탄정 등이 순차적으로 연쇄 남진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동을 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수상전단(sag·surface attack group)’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북한 함정들이 nll의 한 점을 향해 모여드는 것이 발견되면, 한국 해군은 ‘수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대응에 들어간다. 한국 해군이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 해안에 포진해 있는 지대함 미사일부대다.
과거 북한 해군은 서해를 향해 삐죽 나와 있는 황해도 남쪽 해안에, 본래는 구소련에서 개발됐으나 중국이 도입해 복제생산을 많이 했기에, 비단생산이 많은 중국을 빗대 nato가 ‘실크웜(silkworm·비단벌레)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지대함 미사일을 많이 배치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근래 이란 등에 수출하는 형태로 전부 폐기해버리고 자체 개발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최근까지 북한은 새로 개발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성능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면,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투의 기사를 반복해서 보도했다.
북한군이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을 가동하는 것은, ‘표적’인 한국 함정에 추적 레이더를 쏜다는 뜻이 된다. 한국 함정에는 상대가 쏜 추적 레이더파에 접촉됐음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있다. 이 경보가 울리면 한국 함정은 긴장한다.
전투를 할 때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 殺他)’다. 내가 살아야 상대를 죽일 수 있으니,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로 도피해야 한다. 레이더파 수신 경보장치가 울리면 한국 함정은 후방 수역으로 후퇴하거나, 레이더파가 닿지 못하는 섬 뒤로 숨는다. 그로 인해 nll의 방어가 약해지는데 그 틈을 타 북한의 수상전단 세력은 일제히 nll선을 넘는다.
이 수상전단 세력의 최선봉에 선 것이 유도탄정이다. 북한 유도탄정은 사거리가 46km 정도인 ‘스틱스(styx)’ 미사일을 달고 있다. 스틱스도 실크웜 못지않은 구식 무기다. 하지만 북한이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과 연동해 작전을 펼치면 위협이 된다.
유도탄정이 송곳처럼 nll을 뚫어주면 그 뒤를 따라 해상저격여단을 태운 공기부양정과 이들을 엄호하는 고속정 세력이 따라온다. 나진급 등 대형함정은 한국 미사일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지므로 nll 이북에 남아 탑재한 미사일로 엄호하는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도탄정을 선봉에 세운 공격부대의 침로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된다.
첫째 이유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로 침투해야 황해도 해안에 있는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상전단을 따라 들어올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의 특성 때문이다. 구축함이나 유도탄정은 덩치가 크고 탑재하는 연료도 많기에 파도가 높은 외해(外海)를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은 배가 작아 파도가 큰 외해에서는 제대로 항해하지 못한다. 탑재연료량도 적기에 이들의 작전공간은 ‘연안(沿岸)’으로 한정된다.
유도탄정도 한국 함정 기준으로 보면 고속정 크기에 불과하므로 이들도 외해 작전을 하지 못한다. 작은 함정으로 편성된 북한 해군의 한계가 ‘외해 작전 불가(不可)’라는 제약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만 침투라는 목적만큼은 추진해볼 수 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은 한국 해군의 고속정이 들어올 수 없는 수심이 얕은 바다와 갯벌 위에서도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기에, 한국 해군은 두 눈을 뜨고도 이들의 침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공기부양정 세력이 경기만 일대에 상륙해 해상저격여단원을 내려놓게 되면 상황이 급변한다. 경기만 일대는 인천을 비롯해 도시화된 지역이 많기에 상륙한 해상저력여단은 침투지에서 보급문제를 해결해가며 차량 등을 탈취해 서울로 진격하거나,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 수도권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게릴라전을 펼친다. 이것이 유사시 북한 해군이 펼칠 수 있는 기습전 양상인데, 이러한 ‘서든 어택(sudden attack)’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f-15k(왼쪽)과 kf-16(오른쪽)은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북한 육해공군부대를 날려버리는 기동타격대 역할을 한다.
한국 해·공군의 火網
한국군 총사령관은 대통령이다. 유사시 한국의 안전지수는 대통령이 언제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바다에는 숨을 곳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함정이 tot 사격 개념으로 수상한 기동을 하면 그 사실은 금방 한미연합 정보부대에 포착돼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때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대응작전 감행도 건의하는데, 두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바로 대응작전에 들어간다.
대응작전은 한국군 합참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한미연합사 주도로 한미 양군이 연합으로 할 수도 있다. 대응작전은 후방에 있는 북한 함정들이 발진하는 d 마이너스 2일 무렵에 시작된다. 한국 육군의 유도탄사령부는 현무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무는 정밀 타격을 하지 못하기에 함정처럼 작은 목표는 잡지 못한다. 몇 해 전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크루즈 미사일인 ‘천룡’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천룡은 크루즈 미사일이기에 초정밀 사격이 가능하다. 유도탄사령부는 천룡을 발사해 북한 함대기지를 공격한다.
현대전은 미사일과 공군기의 공간인 하늘에서 시작된다. 병력과 병력이 충돌하기 전에 미사일과 공군기가 까맣게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a(air)-데이 작전’이라고 한다. a-데이 작전의 주력은 굉음을 울리며 출격하는 전투기 세력이다. 합참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는 북한 지역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함정 공격에 나선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북한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전 거리가 긴 것은 대구기지와 해미기지 등에 포진한 f-15k와 kf-16이다. 이들은 함정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미제 ‘하푼’ 미사일을 달고 출격한다. 이러한 f-15k와 kf-16에 위협을 주는 것이 휴전선 북방에 포진한 북한의 대공(對空)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 부대다. 이들은 미 공군이 제공하는 대공(對空)제압기 세력으로 일거에 무력화한다.
해군도 a-데이 작전에 참여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천룡을 토대로 함대지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다. 한국형 토마호크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해군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다. 한국형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가 넘는다. 따라서 북한이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훨씬 뒤에서 북한 함정의 발진기지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을지문덕함을 비롯한 한국 해군 2함대 세력의 상당수는 국산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海星)’을 탑재하고 있다. 해성은 미국제 함대함 미사일인 하푼보다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다. 해성의 사거리는 150여 km로 알려져 있다.
북한 수상전단이 연안을 따라 남하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있는 육지로부터 꽤 떨어진 곳으로 항해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나간 한국 함정들은, 북한 수상전단을 해성 미사일 사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북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 포진한 해군 2함대 세력은 해성을 발사해 고속으로 남진하는 북한 함정을 날려버린다.
스틱스 미사일을 싣고 최선봉으로 돌진하는 북한의 유도탄정은 해성 미사일을 탑재한 한국의 윤영하급 고속함이 상대한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레이더파에 덜 접촉되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기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과 스틱스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 작전할 수 있다. 한국 해공군이 펼친 a-데이 작전에 상당수 북한 함정이 격파된다.
‘한국 해공군이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화망(火網)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란 문제는 북한 서해함대가 풀어야 할 최대 고민이다. 그래서 택한 전술이 이른바‘떼거리 전법’이다. 80~100척의 함정을 한꺼번에 돌격시키면, 상당수는 한국 해공군 방어??걸려 격파되어도, 일부는 살아남아 경기만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nll을 돌파한 공기부양정 세력이 경기만에 진입하면 한국 해공군은 한국 국민이 당할 피해를 의식해 마음껏 사격하지 못한다. 그 틈을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꺾으려면 한국은 해성이나 한국형 토마호크를 이용한 ‘큰 타격’이 아니라 북한 공기부양정을 족집게로 집어서 정확히 날려버리는 ‘작은 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륙한 특수부대 향해 포 사격
이러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가 바로 주한 미2사단의 ‘아파치 롱보 헬기 대대’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 간 작전권 이양 합의에 따라 이 대대는 오는 3월 한국에서 철수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간다. 한국으로서는 경기만을 지키는 ‘풀백’을 놓친 셈이 된다. 하지만 준비해놓은 ‘후보’가 있었다. 정식명칭이 공군 성남기지인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5혼성비행단 소속 ka-1 공격기 대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유사시 ka-1 부대는 작전에 큰 지장을 받는다. 긴급 출격하는 ka-1이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때문에 최근 공군은 아예 ka-1 대대를 서울공항에서 빼내기로 했다.
주전 풀백은 다른 팀으로 이전시키고, 후보 풀백은 작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빼내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되면 ‘골키퍼’가 페널티에어리어(육지)에 상륙한 상대 공격수(해상저격여단)를 막아야 한다. 경기도 서부지역을 지키는 ‘골키퍼’는 육군 17사단과 해병 2사단을 주력으로 한 육군의 수도군단이다. 그런데 해병 2사단은 김포반도와 강화도 방어에 주력하므로, 그 후방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해상저격여단을 막는 것은 육군 17사단의 몫이다.
미해군의 공기부양정 앞에서 상륙해 들어오는 한국 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위). 독도함에 전개된 헬기부대.
공격수는 아크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nll상에서부터 상대 수비수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페널티라인까지 들어왔기에 상당히 지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특공대원들이라고 하더라도 30노트(시속 약 60km) 이상으로 달리는 공기부양정을 타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수비수인 한국 해공군이 퍼붓는 화망을 뚫고 나와야 했으니 이들의 속은 까맣게 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7사단은 요소요소에 기동타격대를 배치했다가 이들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날아오면 긴급 출동하는 형식으로 대처한다. 그런데 기동타격대의 출동보다 더 좋은 제압법이 있다. 육지에 상륙한 해상저격여단을 향해 포 사격을 가하는 것이다. 포 사격은 ‘파김치’가 돼 상륙한 해상저격여단원을 기동타격대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강력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서해안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라 곳곳에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인이 희생되더라도 포 사격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17사단을 통제하는 수도군단의 오랜 고민이었다. 수도군단의 포병여단은 17사단의 포병대대보다 월등히 우수한 포를 갖고 있으므로 수도군단은 포 사격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격을 한다’는 것이었다. 대(大)를 위해서는 소(小)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포사격으로 해상저격여단은 거의 전멸될 것으로 보인다.
포사격으로 시작되는 지상전
이렇게 서해를 통한 북한 조공 세력의 공격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지상에서는 북한 주공 세력의 공격을 놓고 보다 심각한 전투가 벌어진다. 지상전은 포격으로 시작된다. tot 사격으로 적진을 초토화하는 틈새를 이용해 아군 기갑과 보병부대를 진격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돌격이기 때문이다. 휴전선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 전연군단도 이런 식으로 기습한다.
북한 화포가 불을 뿜으면 한국 육군 포병도 맞대응한다. 북한은 전연지대에 방사포 등 대형 포를 많이 배치했지만, 한국 육군도 k-9 자주포와 한국판 방사포인 mlrs(다연장로켓) 그리고 155mm 포 등 장사정포를 즐비하게 깔아놓았다. 이러한 장사정포 앞에 105mm 포대가 있다. 이들은 평상시 훈련받은 그대로 tot 사격에 들어간다.
북한군은 한미연합공군의 폭격을 의식해 장사정포를 갱도(지하)진지에 넣어놓았기에 평소에는 장사정 포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연합 정보부대의 고민이다. 그러나 한국 육군은 ‘대(對)포병 레이더’를 갖고 있다. 대포병 레이더는 미 공군의 대공(對空)제압기와 비슷한 구실을 한다. 적이 쏜 포탄이 발사된 곳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포병 레이더가 불을 뿜고 있는 북한군 장사정 포대의 위치를 잡아주면, 한국군 포병부대는 일제히 그쪽으로 화구를 돌린다. 북한군 장사정 포대의 위치가 확인되면 초정밀 레이저 유도폭탄인 jdam을 탑재한 공군기도 공격에 가세한다.
그로 인해 서울에 포탄을 떨어뜨려 공포감을 극대화하던 북한의 장사정 포대는 곧 잠잠해지게 된다. 이러한 포격전은 d 마이너스 2일쯤 시작돼 북한군 보병과 기갑부대가 실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d-데이, h-아워 직전까지 이어진다.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지는 포격전은 전면전으로 이해되기에, 한국 대통령은 이때쯤 수상전단을 만드는 북한 함정을 향한 해·공군의 사격을 ‘충분히’ 허락할 수 있게 된다.
대포병 레이더의 위력
포 사격전의 열세에도 북한군이 정해진 작계(作計)대로 전연군단에 배속된 기갑과 보병부대를 앞세워 군사분계선 돌파를 시도한다면 한국 육군도 대응작전에 들어간다. 4-2-5-1로 이어지는 북한의 4개 군단 가운데 주공은 서울 북방에 있는 4군단과 2군단이 맡을 전망이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5군단과 1군단은 조공이 된다.
각각의 북한 군단은 다시 주공과 조공을 편성하고, 한국 육군을 속이는 양동(陽動)작전을 구사한다. 양동작전이란 성동격서(聲東擊西)전법으로, 소규모 병력을 엉뚱한 곳으로 요란하게 기동시켜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을 전연(前緣)지역이라고 하는 데 반해, 한국군은 페바(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 전투지역전단) 지역이라고 한다. 한국 육군은 페바 지역에 서쪽에서부터 수도-1-5-6-2-3-8의 6개 군단을 깔아 놓았다. 이 가운데 수도군단은 군사분계선 구실을 하는 폭이 매우 넓은 한강 하구 남쪽에 있어 북한군과 직접적인 교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군단은 공기부양정을 타고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북한 해상저격여단을 막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따라서 5개 페바 군단이 북한의 4개 전연군단과 충돌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 주공세력인 4군단과 충돌하는 문산 라인의 1군단과 북한의 2군단과 싸울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 라인의 5군단이다. 한국군 1군단과 5군단에 주어진 최대 임무는 북한군의 돌격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거부 작전’이다.
gp, gop 부대의 기능
1군단과 5군단은 다른 군단보다 강한 포병여단을 갖고 있다. 북한군 4군단과 2군단 세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1군단과 5군단 포병은 계속해서 불을 뿜는다. 그러나 이 부대가 포탄을 떨어뜨리는 지점은 이동한다. d-데이, h-아워 이전에는 북한군 포대를 향해 포탄을 쐈으나 인민군의 진격이 시작되면 한국 육군 수색대가 들어가 있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군 수색대가 아군 포격에 희생될 수 있다. 그러나 수색대는 포격전이 시작되는 순간 ‘철옹성’으로 불리는 gp(guard post·경계초소)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안에는 식량과 탄약이 충분히 보관돼 있으므로 수색대원들은 포성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gp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밖에서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부대는 gp를 제압하지 못하고 통과한다. 이러한 수색대의 후방에 gop(general out post·일반전초) 대대들이 포진해 있다. gop 대대들도 후퇴하지 않고 진지 안에 숨는데, 이 진지 또한 난공불락이기에 진격하는 북한군은 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군 페바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 그때부터 gp와 gop에 숨어 있던 한국군들이 나와서 앞쪽으로 전진한 북한군 진격부대의 후방을 교란한다. 공격하는 부대는 숨을 곳이 없기에 방어에 취약하다. 남북한 군이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면 1군단과 5군단은 항공작전사에서 배속받은 코브라 공격헬기 여단과 예하 전차대대를 이용해 북한군 4군단과 2군단을 쓸기 시작한다.
남북한 군의 전력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한국군은 d 플러스 5일이 오기 전에 북한군의 공세를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거부작전이 실패해 서울이 위태로워지면 후방에 있던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이 참전한다. 한국군 7군단은 맹호(수도기계화보병사단)와 불무리 결전(20기계화보병사단) 두 개 사단으로 편성된 전형적인 기계화군단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 출동없이 1군단과 5군단은 북한전연군단의 공격을 막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이 북한군 진격을 막아 세우면 ‘전략 예비부대’인 7군단이 기회를 노린다. 공격하는 부대는 대오가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한미연합 정보부대가 그러한 틈을 찾아주면, 7군단은 전차여단과 장갑차여단을 동원해 벼락같이 그쪽으로 치고 나간다. 이름하여 ‘공세이전’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7군단이 공격에 들어갈 때 항공작전사령부는 코브라 헬기여단을 7군단 예하로 전환시켜준다. 7군단은 하늘에서는 코브라 공격헬기로, 땅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로 밀어붙이는 입체고속기동전을 펼치며 전과를 확대해간다. 7군단의 작전 목표는 경기 지역으로 밀고 내??북한군 4군단과 2군단 뒤로 들어가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 4군단과 2군단은 한국군 1군단과 5군단, 7군단에 포위돼 섬멸 위기에 빠진다. 북한군도 4개 전연군단 뒤에 전략 예비부대를 두고 있다. 815기계화군단-620포병군단-820기갑군단-806기계화군단이 그들이다(서쪽에서부터). 이 4개 기동군단의 임무는 4개 전연군단이 서울까지의 진격로를 뚫어주면 그 후 진격전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전을 하기도 전에 한국군 7군단이 들어와 4군단과 2군단의 후방을 차단해버리면 이 4개 기동부대는 7군단을 잡기 위한 기동에 들어간다. 이때 다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현무와 천룡 미사일을 운용하는 한국 육군의 유도탄사령부와 한국 공군의 작전사령부다. 두 부대는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 4개 기동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한반도 유사시 공군은 포커판의 ‘조커’처럼 활약한다. 육군과 해군은 북한군 주공·조공과 싸우는 고유 임무를 부여받지만, 남북한 공군력은 현격한 차이가 나기에 공군은 조기에 북한 공군을 격멸하고 적기(適期))에 육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을 펼친다.
한국 공군은 jdam을 비롯한 초정밀 무기 확보에 노력해왔다. 공군작전사령부는 개전 직후 예하 북부전투사령부와 전투비행단을 동원해 전연지대에 있는 북한군 레이더 기지와 방공미사일 부대를 격파하고, 7군단이 주도한 공세이전 작전이 성공하면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이 기동하지 못하도록 jdam 같은 초정밀 폭탄을 달고 가 이들을 공격한다.
전세를 결정짓는 공중전
이때 한국에 있는 미7공군은 물론이고 괌에 있는 미 13공군, 알래스카에 있는 미 11공군, 일본에 있는 미 5공군,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母港)으로 한 미 7함대 해군 전투비행단까지 가세한다면, 그리고 한국군 유도탄사령부와 미 7함대 함정이 일제히 현무와 천룡, 토마호크를 쏘아 올리면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돈좌(頓挫)한다.
그러는 사이 경기도 동부에 있는 한국군 6군단과 강원도 전선에 포진한 한국군 2-3-8군단이 북한의 5-1군단을 꽉 붙잡아 놓는다. 이로써 북한군 4-2군단은 고립무원이 돼 궤멸되고 만다. 그리고 a-데이 작전으로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이 꺽이고 동부전선의 북한군 5-1군단도 궤멸된다면 한국 육군은 ‘역사적인’ 격멸(擊滅)작전에 들어간다. 격멸작전은 북한정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격멸작전을 완수하려면 한국군(또는 한미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해야 한다. 전방의 북한 4개 전연군단, 그 후방의 북한 4개 기동군단을 궤멸시켰다고 하지만 북한에는 12-9-7-10-11-6군단과 특수8군단, 108기계화군단, 426기계화군단 그리고 평양방어사령부 등이 남아 있다. 이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격멸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격멸작전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 3원정군이 한반도로 이동해 한국 해병 1사단과 함께 북한 지역으로 상륙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 해병 제3원정군은 미 육군 군단에 비교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진 부대로 3해병사단과 1해병항공단을 주축으로 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이 1해병항공단이다.
1해병항공단은 4만t급인 미 해군의 상륙모함을 타고 이동해오는데, 상륙모함은 한마디로 헬기항모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독도함이 1만3000여t인데, 미 해군의 상륙모함은 2배가 넘는 4만t이니 훨씬 많은 헬기를 탑재한다. 상륙모함을 주축으로 한 미 해군의 상륙함 세력과 독도함을 앞세운 한국 해군의 상륙함정은 한미 해병대 병력을 태우고 발진한다.
역사적인 격멸작전
이때 한미 연합공군과 한미 연합함대는 일제히 항공기와 미사일을 띄워 한미 연합해병대가 상륙하려는 곳을 청소한다. 이러한 탄막을 이용해 북한 해안에 접근한 상륙함에서 일제히 헬기가 떠 해병대 보병대원들을 북한 해안선 너머에 있는 고지로 투하한다. 그리고 대소 상륙함에서 미 해병3사단과 한국 해병 1사단원을 태운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발진해 북한 해안으로 상륙한다.
한미 연합해병대가 바다를 통해 ‘거대한 훅’을 날릴 때 한국 육군은 미 지상군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린다. 이 작전에 주력으로 동원되는 것은 공세 이전 작전을 성공시킨 한국군 7군단이다. 미군에서는 주한 미 2사단을 참전시킨다.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은 코브라 헬기와 아파치 헬기, 그리고 각자가 보유한 k-1전차와 k-200장갑차(한국군), m-1전차와 m-2장갑차(미군)를 앞세워 돌격한다. 두 부대의 머리 위로는 한미 연합공군기가 출격해 ‘에어 캡(air cap)’을 씌워주고 시계청소를 해주므로 이들은 고속으로 진공해 평양을 점령한다. 그리고 해안상륙을 통해 평양까지 진격한 한미 연합해병대와 합세해 평북과 함북에 있는 북한군 부대까지 궤멸시킨다.
남북 간의 국력 차이, 군사력 차이, 더구나 미군의 참전까지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전면전을 살펴본다면 이 전쟁은 이라크전만큼이나 빨리 한미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염려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참전하는 것인데, 현재 중국이 처한 위치를 고려하면 중국군의 참전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권을 지키려면 전쟁을 도발해야 하는데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 선택한 ‘매직 카드’가 바로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다.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란 핵무기나 화학무기, 생물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처럼 국제사회가 조약이나 레짐(regime)으로 보유를 금하는 무기를 개발해 보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은 이 조약과 레짐에 가입했으나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6년 10월9일 조악한 형태의 핵실험을 했고, 화학무기 보유 순위는 세계 3위이며, 1998년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조악한 수준이긴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국가군(群)에 진입했다. 비대칭 전력 분야에서 북한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는 것이다.
북한민주화 혁명 유도해야
전략무기는 좀 더 안전한 후방에 배치하지만, 상대가 미처 방어 준비에 들어가지 못한 초기에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면전을 염두에 둔다면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일 먼저 사용한 후 해군을 동원한 경기만 기습과 지상군을 동원한 서울 공략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한미연합군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략부터 제거하려고 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을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것이므로 한미연합 정보부대는 평소 북한군 미사일 부대의 행적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그러다 이 미사일이 발사될 조짐을 보이면 미사일과 공군기를 동원해 선제 타격을 한다.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하면 패트리어트pac-3 등으로 요격함으로써 이 무기의 위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선제타격 문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나 한미연합사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사시 북한군 비대칭 전력을 선제타격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사전에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면전을 허용한 다음 북핵을 제거하고 김정일 정권을 없애는것은 부담이 크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무력도발을 하려는 시점을 김정일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운동을 일으킬 적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김정일 정권교체 외교를 펼치는 사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는 김정일 정권 붕괴 공작에 나선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내부 혁명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인들이 내부적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북핵 제거를 위한 회담만을 추진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헛된 노력일 뿐이다.(끝)
출처 신동아 3월호
저도 흥미롭게 읽은거라 퍼온건데요.
제가 재대한지가 좀 오래되서 그런진 몰라도...
gp/gop에 폭격에도 끄떡없는 난공불락 요세가 있다는 건 첨 듣는 소리네요.ㅎㅎ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니...
분란없히 재밌는 토론을 했어면 합니다.
-

[밀리터리] 도라!도라!도라!(태평양전쟁) ....11편
도라!도라!도라!.... 제 11편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대장은 1939년 8월 13일
일본 제국 해군의 최고 전투사령부를 지휘하는
중대한 지위인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에 임명
되었다. 평소 금주주의자였던 야마모토는
사령장관에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큰
컵에 가득 담긴 맥주를 단숨에 꿀꺽 들이켰다한다.
야마모토가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에 임명된
2주일 뒤,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일본이 조만간 틀림없이 이 전쟁에 휩쓸려
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전쟁준비를 위해서
일본 해군을 전통적인 맹훈련으로 단련하는
임무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나의 지휘 아래에서는 항공훈련에 최중점을 둔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가슴 속에는 만약 조국 일본이 무분별하게도 대미 전쟁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미국의 태평양함대를 격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궁리하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원래 전쟁 반대주의자였다. 이 때문에 일본 극우 정치가들의 비위를 거슬려
야마모토는 친미파로 낙인찍혔고 해군 차관 시절에도 반전 신념을 내세웠던 때문에
극우파로부터 암살위협을 받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미국 하버드대학 유학시절 워싱턴 주재 해군무관으로서 당시 미국의
거대한 공업력을 직접 보고 그 규모를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야마모토의 기질은 오직 무사도의 전통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황에 대해서 또 조국에 대해서 그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른 모든 것보다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궁극적 책무는 조국 방위였다.
야마모토는 1927년 부터 이미 항공력을 해군 전략의 새로운 결정적 요소로 보고 있었다.
그 이듬해 새로 건조된 항공모함 아카기의 함장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항공전쟁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간직했던 실제적인 여러문제에 전력을 쏟아 넣었다.
풍운아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39세에 해군 대좌(대령), 44세에 해군 소장,
이어 1937년에는 해군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일본의 허왕된 꿈을 보여준 야마토전함
1934년의 런던 해군군축회의에서 야마모토는 일본 대표단의 주요 수행원이었지만
이 회의 후부터는 일본은 대규모의 전함 건조 계획에 착수했다. 이것은 주력함의
우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거대한 전함 4척(18.1 인치 포 9문 장비)건조 계획 중
첫 번째 함인 야마또는 1941년 12월에 완공되었고 두 번째인 무사시는 그 여덟달 뒤에
완공했다. 세 번째 함인 시나노는 그 후에 설계를 변경하여 항공모함이 되었고,
이 후의 건조계획들은 모두 취소되게된다.
미국측에선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군함을 건조할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의 전통적인 이념에 따른 해전에선 총톤수가 우세한 거함거포야말로
일본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또 평화시에는 이 최신형 거대 전함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주고 미,영 양국과의 교섭에 커다란 이익을 주리라 기대되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철옹성과 같은 단단한 안전보장으로써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 제독들 가운데 단 한사람 야마모토만은 이와같은 거대 전함의 건조에 대해서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같은 거함은 아직 그 건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야마모토는 "이 거함들은 마치 노인들이 각 가정에 소중한 것처럼 걸어두는 정밀한
종교적 족자같은 것이다. 그것은 실용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지 신앙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근대 전쟁에선 사무라이의 칼 정도쯤밖에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으로선 장차의 해전에서 재해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열쇠는 순양함과 구축함에
둘러싸여 호위된 항공모함 함대라는 것이다. 거대 전함에 쓰여지는 막대한 돈은
항공모함과 비행기에 쓰여지는 편이 훨씬 좋으리라는 것이었다.야마모토는 어뢰를 장비한 뇌격기에 의한 공격이야말로 전함을 격파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임을 주장했다.
"아무리 큰 구렁이라도 수믾은 개미 떼한테는 당하지 못한다."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야마모토의 주장은 차츰 받아들여졌다.그의 끈질긴 주장으로 3만톤급 신형 항공모함 2척(35노트급-시속63km/h의 쇼가쿠,
즈이가쿠)이 건조되었다. 그리고 극비리에 신형 전투기가 생산 단계에 들어갔는데,
태평양 전쟁 개전 초기부터 2년동안 태평양을 주름잡는 제로 기였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항공기술력을 여전히 형편없는 것으로 얕잡아 보고 있었다.
야마모토 제독은 연합함대 사령관에 취임한지 두달이 채 못되어 일본 해군의
기본적인 전략 계획에 관한 일련의 대변혁 가운데서 최초의 개혁에 착수했다.
첫 번째 개혁작업은 가상적국 제1호였던 미국을 일본 근해에서 격멸한다는 기존의
작전계획을 변경하여 마샬제도를 포함시키는 동쪽방면으로의 확장계획이었다.이 변경은 사소한 것이었고 별로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령부에서는 의의없이 승인되었다.
야마모토의 다음 조치는 연합함대를 이름 그대로 충실하게 충족시키는 일이었다.
그가 사령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대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두 함대가 별도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데 통합하여 그의 직접 작전 지휘하에 두었다.
이리하여 항모와 전함, 순양함, 그리고 보조 함정을 모두 합동시켜,
단일의 강대한 함대로 만들었다.
1940년 봄 그의 지휘하에 실시된 최초의 해군 대훈련에서 야마모토는 항모를
기지로 하는 비행기로 적군함을 공격하는 훈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좀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실로 진주만 공격 감행하기 약 2년전의
일이었지만 야마모토 제독이 내린 훈시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엄격한 훈련 계획이
암암리에 실시되었던 것이다. 1941년 12월까지 일본 해군의 조종사들의
항공전투 기량은 극히 높은 수준까지 숙달되어 있었다.
일본은 절망에 가깝도록 석유가 부족해 있었다. 그리고 만일에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의 석유 자원이 단절된다면 일본 해군의 비행기마저 행동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 야마모토 자신이 정세를 판단한 것처럼, 일본군이 영국 및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대해서 남진한다면 그것은 대미전쟁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태평양 함대는 일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지만, 남방 지역의
일본군 파견부대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군의 보급선을
확보하는 단 하나의 방책은 미 함대를 그 기지에서 격멸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었다.
야마모토는 참모인 구사카 류노스케(진주만 공격의 제1 항공함대 참모장) 소장에게
은밀히 털어 놓았다.
"만일 우리들이 미국과 싸우라고 명령받는다면 치고 빠지는 힛트 앤드 런 방식으로
기발한 승리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손색없이 일본의
입장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년째 부터는 미군이 그 군사력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우리들이 최후 승리의 희망을 품고 싸우기란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야마모토의 진주만 기습 공격 구상은 러일 전쟁 당시의 도고 헤이아치로 해군 대장의
여순 항구 기습 작전, 비록 실패했지만 지중해에서 이탈리아군이 어뢰를 탑재한 항공기로
영국의 순양함 알렉산드리아를 격침하려했던 작전과 타란토 항의 이탈리아 함대를
공격했던 영국 구식 복엽기 소드 피쉬의 성공적인 기습공격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8인치 어뢰 발사 훈련중인 영국군 쇼드 피쉬
하와이 제도는 미국 본토인 샌프란시스코 서남으로부터 약 360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1941년 당시에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주민의 약 90%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하와이 제도의 진주만은 미 해군의 전략적 배치에 아주 적합한 항만이고
그 장소도 편리한 곳에 있는 이점이 있었다. 진주만은 1919년에 해군 기지가 되었지만,
미 함대가 거기에 항구적으로 배치하게 된 것은 1940년부터였으나 미해군 제독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던 곳이었다. 우선 4000km나 멀리 떨어진 미 본토의 서해안에서 직접
받아야하는 보급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것도 문제였지만, 이 항만은 완전히 육지에
둘러싸이고 출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항상 골치아픈 문제거리로 여겨졌다.
출입구인 해협에 단한척의 배를 가라앉히기만 해도 이 군항을 봉쇄할 수가 있었다.
또한 출입구인 해협을 지나 함대가 공해상으로 나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함대가 항내에 정박하고 있을 때에는 함선, 연료, 수리시설, 보급물자직접장 등 모든 것이
붐비고 하늘로부터의 공격을 유인하기 쉬운 목표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와이 수역에 주력함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지만, 급한대로
이 수역내에는 진주만 외에 그것과 비슷한 시설을 갖춘 항만이 아무데도 없었던 것이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리차드슨 대장은 진주만을 함대의 항구적 기지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는 미국 대륙 서해안의 좀 더 좋은 기지로 후퇴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까지 반대 의견을 상신했기 때문에 사령관직을 해임당하고,
킴멜 대장이 후임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타란토항에 대한 영국군의 기습공격을 바라본 미국이 그저 수수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헨리 녹스 해군 장관은 미일 전쟁이 발생하면 최대의 위협은 항공 어뢰에 의한 공격이며,
요격기, 대공포의 강화 및 레이더 시설의 증설을 최우선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1940년 12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킴멜 제독은 진주만에서의 어뢰방어망 설치는 해협의
통로를 좁게 하며 함선의 항해를 제약하게된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킴멜 제독이
어뢰방어망에 의한 예방조치를 거부한 거의 같은 무렵에 야마모토는 그의 참모장
후쿠도메 시게루 해군 소장에게 비로소 진주만 기습 공격의 구상을 털어 놓았다.
야마모토는 일본의 연안을 항해하며 해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장소를 물색하다가
큐슈의 가고시마 만의 지형이 진주만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함대를
이곳으로 이동했다. 매일같이 함재기는 해면을 스칠 듯이 비행하며 저공에서의
어뢰 발사와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지만 그 아무도 훈련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다.
야마모토는 진주만 기습공격작전의 암호명을 Z작전으로 명명하려 했는데,
이것은 36년 전 쓰시마 해전에서 저 유명한 " 황국의 흥망은 이 일전에 달려있다"고
절규하던 도고 제독의 Z신호를 본뜬 것이었다.
오니시 다키지로 해군소장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하기위해 야마모토는 믿을 수 있는 동지들을
골라 의견을 물었다. 우선 그가 점찍은 동지는 오니시 다키지로 해군소장이었다.
오니시는 해군에서 극히 드물게 항공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장성이었으며 훗일 전쟁 말기에 가미가제
특공대를 최초로 조직하게되는 인물이다.
제11항공함대의 참모장인 오니시 소장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가능한출격이긴 하지만 마샬제도의 일본군
기지로부터 하와이 공격작전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동남 아시아의 석유지대 점령을 노리는 작전의 선행준비로서 기습의 일격을 가해
미 태평양함대를유린해 버릴 작전계획의 기본 개요를 오니시에게 설명했다.
야마모토의 작전계획을 경청한 오니시는 겐다 미노루 중좌와 의논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뇌가 명석하고 경험이 풍부한 항공참모인 겐다 중좌는 규슈에서 항공모함
가가에 근무하고 있었다. 36살의 겐다는 영국 런던 주재 일본 대사관 해군 무관 보좌관
으로 해외근무를 갓 끝낸 직후였다. 그는 런던 주재 해군 무관 보좌관 자격으로 참관했던
타란토 항 기습작전의 보고서를 도쿄에 보낸 장본인이었다. 오니시나 야마모토와
마찬가지로 겐다는 해군 항공병력이 극히 중요하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타란토 항 공격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Z작전 계획에 찬성해 줄것으로 기대했다.
10일간에 걸쳐 겐다는 이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오니시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계획은 곤란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겐다 미노루 중좌
야마모토는 가장 먼저 미국의 전함에 공격을 집중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항공모함쪽이 공격 부대로서는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 대개의 미국인처럼, 또 대다수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전함이야말로
함대의 주축이며 이것을 격파함으로써 보다 괴멸적인 타격을 적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처음에는 공격기가 항공모함으로 귀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도
해보았다.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아군의 작전영역 밖으로 출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와이에는 그다지 근접할 필요가 없다. 또 공격기가 출격하자마자 조국을 향해
귀환 길에 오를 수도 있다. 공격이 끝나면 조종사는 해상에 불시착하여 구축함이나
잠수함의 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겐다는 이러한 구상에는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의 제일 목표는 항공모함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항모는
일본 해군에게 있어 최대의 잠재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 최상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항모는 되도록 진주만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살적인 무모한
공격은 조종사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준다.
또 전쟁이라는 중대국면에 비추어
섣불리 항공기와 조종사를 동시에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공격기의 귀함을
기다리지 않고 귀항길에 오른다면 미국측이 반격해 올 경우 이에 대항할 비행기가 없는
항모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항모 아카기
항모 가가
진주만 공격 작전에 유리한 하나의 요인은, 일본 해군이 충분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36500톤의 아카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력있는 항공모함의 하나였다.
이 항모는 미 해군의 렉싱턴이나 사라토가보다도 한층 대형함이었다. 아카기는
1936년부터 1938년에 걸친 개장작업으로 91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기와 비슷한 항모는 38200톤급의 가가였고, 이것보다 소형의 항모 히류와 소류도
취역하고 있었다. 각각 25675톤급인 다른 두척의 항모 즈이가쿠와 쇼가쿠도
1941년 8월에 취역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야마모토 함대가 확보한 항모는
모두 6척으로 증강되는 셈이었다.
겐다 중좌는 이 항모 6척 전부를 Z작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다는 오니시에게
첫째, 이 임무에는 가장 유능한 장교와 가장 잘 훈련된 조종사들만을 선발 할것과
둘째로는 공격 직전의 최후 순간까지 작전은 극비에 붙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란토 항을 공격했던 쇼드 피쉬에 장착된 18인치 (45.7cm)어뢰
야마모토 제독의 승인을 받아 오니시는 겐다로 하여금 작전계획 원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3월 말 경에는 계획 원안이 차츰 구체화 되어 갔다. 즉, 공격은 특별기동부대가
담당한다. 이 부대는 호위함을 동반한 약 20척의 이(伊)잠수함과 5척의 특수잠항정으로
구성된 선견부대와 6척의 항모를 중심으로 한 주력 공격부대로 편성된다.
이 기동부대는 이미 알려진 항로를 피하고 우회 루트를 이용한다.
이 루트로 하와이까지 360km의 지점에 접근하여 여기서 항모로부터 항공기가 출격하고
미군기의 초계비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믿어지는 공중을 따라 진주만을 향해 침입한다.
공격에는 360대의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급강하폭격기,
고도수평폭격기, 뇌격기, 전투기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뢰는 폭탄보다도 파괴력이 크다.
더구나 근거리에서의 공격에선 명중률이 높으므로 미 해군함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다.
진주만의 수심이 매우 얕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항공어뢰로서는
통상방법으로 발사한다면 해저에 부딪치고 만다. 그러나 타란토 항의 수심은 41피트
이하였으면서도 영국 해군은 항공기에서 어뢰로 적함을 격침할 수가 있었다.
진주만의 수심은 45피트이므로 이 문제는 명백하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폭탄의 경우는 미 전함 갑판의 장갑을 관통시키기 위해 대형의 철갑탄이 필
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습이 절대로 필요하다.
만일 기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을 받기 쉬운 귀항 도중에 기동부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습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전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측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군령부는 Z작전이 매우 무모한 짓이라며 반대했다.
오니시 자신도 이 작전의 성공률을 60%로 전망하고 있었고,
후쿠도메 참모장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마모토만은 역시 항공모함에 의한 진주만의 항공기습 공격은 실행 가능하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었다. 이리하여 3월 말 경까지는 계획이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누가 기습을 담당하는 기동부대의 지휘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야마모토는 자신이 몸소 지휘하고 싶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서, 그에게는 수 많은 임무가 있었다. 그리하여 하급자 중에서 한명을
엄중히 선발하여 임명해야 했다. 그 결과 선임 소장인 나구모 주이치 해군소장이
기동부대 지휘관으로 결정되었다. 나구모는 완고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고루한
해군장성으로, 항공기나 항모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의 전문지식이라고
한다면 항해기술에 관한 것 뿐이었다.
도중에서 연료를 보급하며, 탐지되지 않아야 하며 더구나 엄밀한 계획에 따라 태평양의
수천킬로를 항행하여 적의 군항 가까이까지 대함대를 통솔해 간다는 대임무가 맡겨지자
나구모는 대경실색 했다.
작전의 성공은 주로 기습에 달려 있다. 만일 순조롭지 않다면 일본은 해군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즉 그는 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 작전이 실시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구모 자신도 한시름 놓았다. 당시로서는
아직도 대미 개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진주만 기습 계획도 군령부의 승인을
아직 받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위 사진은 프랑스가 다시 인도차이나를 접수하는 시점의 인도차이나 주둔 일본군 모습이다
프랑스가 독일에 패한 것을 이용하여 1940년, 일본군은 비로소 중국 이남으로 진출했다.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베트남 지역)의 루트를 통해 중요 물자가 중국의
장개석군에게 수송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이 지역의 북부가 일본군에 의해 관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비시 정권에 대한 독일의 압박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에 대한 일본측의
협박이 겹쳐 마침내 일본군에 의한 북부 인도차이나의 점령에 동의하게된다.
일본군은 인도차이나에 진주한 다음, 다시 인도차이나 총독인 카토르 장군을 협박하여
인도차이나 전체를 일본군의 보호 아래에 둔다는 강요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인도차이나의 공군, 해군 기지를 장악하게된 일본군은 다시 태국으로의 남진 태세를 갖
추었다. 태국 정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예를 따르도록 강요 당한 끝에
일본 정부의 보호조치를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말았다.
일본이 동남 아시아의 극히 중요한 전략 지역에 강력한 군대를 진출시킨 사태에 분노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세 나라는 일본군의 점령확대가 결정된 48시간 이내에 일본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대일본 금수조치에 들어갔다. 그 며칠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일체의 석유 수출금지를 단행하였고, 이어서 네덜란드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유전에서의 대일 석유공급을 중지시켰다.
경제봉쇄에 직면하자 일본은 서서히 목이 조이듯 궁핍으로 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석유 금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유전을 점령하는 조치는 해군에 있어
사활의 관건이었다. 석유의 비축량은 불과 몇 달치밖에 없다. 문제는 유전을 점령해야
하는 필요성의 여부가 아니고 그것을 감행하는데 얼마만의 시간적 여유가 남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태에 직면하자 해군의 수뇌부는 수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
"일본은 석유가 필요하다. 전쟁이냐, 평화냐, 늦어도 10월까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워싱턴에서는 노무라 기찌사부로 주미 일본대사가 외교교섭에 나서고 있었지만
코델 헐 미 국무장관은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물러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다
제 12편에서 계속......
자료제공 : H/ 채널 (히스토리)
ㅎㅎ 목이 다 뻐근하네 ^^;; 캔맥주 한개 묵고 자야징 짱/밀리 가족여러분들 편안하고 포근한 밤이되실길
-

[밀리터리] 도라!도라!도라!(태평양전쟁) ....10편
도라!도라!도라!.... 10편
한편 아시아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에 실패한 때로부터 꼭 3세기가 지나고서 일본은
다시 중국침략전을 수립했다. 당시 러시아는 한반도에대한 세력확장을 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조선 국내에 있는 일본의 중요한 상업적 권익이 위협을 받았다.
또 한편 1898년에는 러시아가 만주의 여순을 획득하여 군대와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서
여순항구와 유럽방면을 철도로 연결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19세기 말까지 일본의 신문들은 거대국가인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었고 일본 육, 해군은 급속한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정식발효 되었지만 이미 이보다 48시간이나
앞서 러일 양군은 각각 최초의 일발을 쏘아대면서 불꽃을 튕기고 있었다. 여기서 야기된
상황은 이로부터 38년후 진주만에 대해 예견케하는 불길한 전조가 되었다.거대한 적국 러시아에 대해 인적으로나 물자면에서 매우 열세였던 일본의 희망은
제해권을 차지하는 일과 개전 초기에 조선을 지배하는데 있었다. 이 두가지 수단에 의해
러시아군은 일본 본토에 대해 군사작전을 강행할 수 있는 조선의 어떠한 항구도 모두
잃어 버리는 셈이 된다. 즉 조선 서해안의 항구는 어느 것이나 일본 함대의 기지로서
이용될 수 있는 좋은 항구였다. 그리고 일본군 부대는 러시아측이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압도적인 대군을 유럽방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이전에 해상과 육상의
두 루트에 의해 조선을 경유하여 만주에 출동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중립국인 조선의 인천항에서 러시아 군함 한척이 격침당했으며 일본군 부대가
조선에 처음으로 상륙했다.그 동안 도고 헤이아치로 해군대장이 이끄는 일본함대 주력은 여순 항구를 향해
고속 항진하고 있었다. 1904년 2월 8일 자정 조금 앞서 항구에 정박중이던 러시아
전함 3척이 일본 해군구축함들에게서 일제히 어뢰공격을 받았다. 그 이튿날 정오에
제2차 공격이 감행되어 러시아 순양함 4척에 어뢰가 명중했다. 그리고나서
도고 사령장관은 여순항을 봉쇄했다. 다섯달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여순 요새는
일본군 부대에 함락되고 러시아 함대의 잔여함정은 전부 일본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일본의 넬슨 제독이란 칭호를 얻은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영국 넬슨 제독은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멸시켰다.
영국 포트마우스 드라이 도크/ 도고 제독의 기함 미가사. 러일 전쟁 당시 영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였다.
여순 항구가 함락되기 몇 달전에 러시아측에선 여순항의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발트해 방면에 있었던 강력한 발틱함대를 파견하였다.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이 함대는
극동의 전역에 도달하기까지 실로 일곱달이나 걸렸다. 그리고 불과 하루새에
대한해협(일본은 일본해해전이라하며 전사는 쓰시마해전이라 함)에서 허무하게도
격멸당하고 말았다.
이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멸하기 위해 게양했던 상승 기인 Z깃발은훗날 진주만 기습공격 때 항공모함 아카기에 게양된다.이것은 러시아함대를 격멸한 일본이 세계열강 중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과함께
조선, 나아가 만주의 남부를 사실상 점유하는 결과가 되었다.
러일전쟁 동안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일본인 노동자의
물결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오는데 대한 미국인의 분노는 한층 높았다. 1905년 봄에는
일본인 이민을 저지하는 요구가 높아졌고 미국내의 일본인 상사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조와 더불어 상품 불매운동, 배일운동이 이는등 미,일간의 마찰이 증대되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 짐꾼들을 이용하여 보급품을 수송하는 모습이다.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조선은 나라를 잃는 비극을 맞게된다.
패전국 러시아는 일본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아시아 대륙 주둔 일본군에게
보급물자를 전달하는 것을 간섭할 수 없었다.
다시는 이러한 치욕스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여 정신차리자...
1898년, 미국은 하와이와 필리핀을 접수했으므로 이 새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가 필요했으며,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데오도어 루즈벨트는 7년간의 재임기간동안
미국해군의 규모를 두배로 확충하려 노력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대로 러시아함대를 격멸한 일본은 해군력을 더욱 더 증강해나갔다.
1913년까지 일본정부의 해군 지출은 국가 예산의 35%를 소요한다고 설명되었다.
더 나아가 1920년에 가결된 88함대 계획(대형 전함 8척, 고속 순양 전함 8척을
기간으로하는 편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이 태평양 제해권을 노리며 미국에 당당히 도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영국과 독일 양국간의 군함 건조 경쟁이 제1차세계대전을 조장한 유력한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일본, 미국, 영국의 해군력 확장경쟁이 그야말로 다음 전쟁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1920년대를 통해서 일본의 해군병력은 5:5:3의 비율 협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건조할 수 있는 주력함의 수가 5척인데 반해 일본은
겨우 주력함 3척만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의미했다.
(1922년, 워싱턴 군축조약이라 불리우는 해군 군비제한 협정에서 주력전함의
보유 비율을 미국과영국은 각각 5, 일본 3,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67로 합의하여
미국과 영국은 135000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60000톤,
일본이 81000톤으로하며 비율을 초과한 함정은 폐기처분한다는 것)
워싱턴 군축회의. 1921년 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군축조약은 사실상 일본을 3등국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었으며 또 일본 제국해군의
역할을 단지 전쟁억제력의 역할로만 담당하게끔 조치한 것이다. 우선 회의 벽두에
일본 전권위원 가또 도모사부로 해군대장은 미,영,일 3국의 함대비율을 10:10:7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의 해군 전문가들은 지키는 함대는 공격하는 함대보다
50%나 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10:7의 비율을 양보해서 인정
한다는 것은 미국 해군이 아슬아슬하게 우세한 한계를 잃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함에 관해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 대하여
이 비율을 수락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5:5:3의 비율은, 태평양에서 미국이 계속
우세를 유지하는 상태를 보증하는 것이었다. 태평양의 지배권을 결정할 항공모함에
관해 이 워싱턴 회의에서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각국 모두
항공모함은 다섯 손가락으로 헤일 수 있을만큼 불과 몇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수년동안 일본이 워싱턴 조약을 원칙대로 준수했으나 일본 해군력은 차츰
이 조약의 한도까지 확장되었다. 그런데 1930년까지 일본의 군국주의적 당파는
일본의 지배에 의해 움직이는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를 꿈꾸고 있었다.
그리하여 5:5:3의 불평등한 조약이 해군력의 확장에 방해가 되므로,
조약을 폐기시키든가 아니면 좀더 유리한 비율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1930년의 런던 군축회의에서는 워싱턴 조약의 폐기나 주력함 비율의 변경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이 일본정부 지배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들의 런던조약과 앞서의 워싱턴 조약에 대한 비난은 격화되었다.
이어서 제2회 군축회의는 1935년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맹렬한 항의가 높아져
갔으므로 예비회의를 그 전해인 1934년에 우선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는
해군 병력을 조약에 의해 제한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가 되었던 셈인데, 아직 시작도
되기도 전부터 실패가 운명되어져 있었다. 회담은 두 달동안이나 지연 되었으나
일본 대표단은 어떠한 협정도 성립시키지 않으리라는 움직임으로 보였다.일본이 요구한 것은 군비는 독립국 주권으로서 민족자결(民族自決)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력함 비율은 협정한 대로 존속시키는 한편, 얼마간의 타협을
모색한다는 영국과 미국의 제안은 단호히 거부되었다.
그해 가을에 일본은 워싱턴 조약을 금후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무익하다고 설명하고,
일본은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통고했다.
이당시 일본의 정권은 군인정치가들로 구성된 강경한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으므로,
전국에 소용돌이는 치는 전쟁의 물결을 저지하기란 극히 곤란했다.군축협정으로 인한 제한에서 탈퇴하자 일본은 제국 해군을 재정적 자원이 허락되는 한
확장하는데 자유로워 졌다. 1941년까지 일본 해군은 태평양 방면에서 미, 영 양국의
합동 함대보다도 더 강대해졌다. 즉 일본은 세계가 이제까지 본 일도 없는 최대의
전함 2척(6만9천톤급 거대전함 야마또와 무사시)을 보유할 뿐아니라 항공모함 10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당시 미국은 겨우 3척의 항공모함을, 영국은 단 1척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보다 더욱 중대한 일은 일본 제국 해군은 이미 공격용 병기로써 항공모함을 사용하는
새 전략을 채용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항공모함이 전함 그룹에
대공용으로서 우산을 제공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함 가가 진수식
1921년 고베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던 전함 가가는 워싱턴 조약에 의해 완공이 연기되었으나1928년, 고노카 조선소에서 항공모함으로 개조 되었다.(아래 그림)
여기서...
일본의 중국침략
만주를 침공, 점령한 일본 관동군 제12사단 병사들.상공에 애국 헌납 1호기인 K-37 경폭격기가 비행중이다
1931년에 일본은 만주 북부지방을 점령했다.
일본군의 주장에 의하면 이 결정은 오만하고 도전적인 중국군에 의해 떠 맡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급속한 군사작전의 확대로 인해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할 것을 미리부터
계획해왔다는 사실이 곧 폭로되었다.
그 진상은 바야흐로 일본 정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또한 애국적 열광을 국내에
부채질하고 있던 호전주의자들이 일본은 크게 발전되어야한다고 결정한데서 비롯되었다.
자신들의 조국 일본열도는 그 산이 많은 지세 때문에 현대산업에 공급하기위한
원료물자가 부족했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더 넓은 영토가 필요했다.
일본은 만주 점령 후 6년이 지나 중국대륙 침략을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8월까지 8년 동안이나 이 전쟁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일본군 96식 함상 폭격기 / 중국 전선
아무튼 1939년까지 일본은 전쟁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일본군이 아시아 대륙의 광대한 지역에서 연전연승을 할 때마다 호전파의
지배력은 팽창했으며 육군 장군들이 중국 북부에 더욱 더 깊숙이 전진하고 있을 때
해군 제독들은 일본이 소련과의 격돌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은 만일 일본이 강대국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 방향은
제국 해군의 실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미 중국 대륙에서 전쟁에 깊이 말려들어가 있었으므로 이 궁지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논리적인 방법은 육군 부대를 북쪽으로 진격시켜 소련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도 오히려 해군력을 중국 연안에 사용하는
일이라고 전망하였다.
해군은 육, 해군의 합동작전을 계속할 경우에 비교적 소수의 육군부대로 병력이 우세한
중국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또는 신축성있는 행동으로 대항사켜 사용할 수 있다면
이와같은 전술은 이중의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 보았다. 우선 첫째로는 일본보다 인구가
많은 두 개의 대륙국(중국, 소련)을 상대로 하는 소모전에서 일본이 수렁에 빠져 허덕일
위험은 적다. 둘째로는 동안 아시아 방면에서 작전을 전개할 강력한 일본 해군이
출항하는 것은 그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일본의 외교적, 상업적 기도를
크게 뒷 받칠 하게 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어떤 시기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와의
무역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했었다. 중국에 있어서의 전쟁의 긴장이 계속되고 게다가
석유를 비롯한 그밖의 중요한 원료물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자 해군 제독들에게
있어서 이 동인도 방면이 사활을 걸 만큼 중대한 지역으로 보이게 되었다.
일본군의 중국 대륙침략 / 일본군 94식 전차.
1938년까지 일본군은 항상 소련을 일본의 주된 가상적군이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일전쟁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압박을 가해 왔으므로
일본은 더 더욱 분노를 증대시켜 최대의 적을 소련에서 미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일본 육군수뇌부는 중국정복의 공로를 내세우며 과시했고
스스로 전능인 것처럼 광신하고 있었으므로 전쟁에 찬성했으며 또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삼국 동맹에 일본이 참가하기를 강력히 권하고 있었고,
일본의 장군들은 이 동맹에의 참가를 적극지지했다. 히틀러는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태평양을 맡아준다면 영국을 돕고 있는 미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영국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여 1940년 9월,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일본으로서는 독일이 유럽에서
프랑스를 누르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발판으로 남진하여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를 손에 넣는 기회를 잡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은 독일과 협상 끝에
9월 27일 베를린에서 3국동맹 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첫째,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하여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그들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하며
둘째, 독일과 이탈리아가 일본에 대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그 지도적 지위를 인정한다.
셋째, 동맹의 세 나라 중 어떤 나라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중, 일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는 세 나라가 모두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원조한다는 것 등이었는데
거기에 이 조약을 맺은 세 나라와 소련 사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음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명백했다.
하지만 육군과는 달리 대부분의 해군 제독들은 3국 동맹을 찬성하지 않았다.
왼쪽에서부터 일본 구르스 대사, 이탈리아 외상 치아노, 히틀러, 리벤트로프 독일 외상이
3국동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1940년 9월 27일 독일 베를린
3국 동맹을 축하하기 위하여 도쿄의 공원에 걸린 3국의 국기
그러나 동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이미 미 태평양함대에게 본토 서해안의
군항을 출항하여 태평양 상의 진주만 기지에 집결하도록 명령하였으므로 정세는
일변하고 말았다. 루즈벨트는 이미 일본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었고 그것은
차츰 일본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이 함대의 이동은 미국 대통령이
무력간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엿보이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결국 1941년 7월에 미국의 대일 통상무역이 단절되고
일본의 미국내 자산이 일체 동결당하자 전쟁은 눈앞에 닥친 것처럼 보였다
항모 사라토가
과연 일본은 정말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콧털만 뽑은 것일까??
11편으로 계속...
아공 나만 이런건가?? 인터넷 접속이 엄청느리고 자꾸만 짱공 웹사이트 에러가 뜨네요..
자료는 더 올리고 싶지만 오늘은 요기까만 할게요 ^^;;
-

[연예인] 이 정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화제를 모은 가수 이정이 KBS 2TV '해피선데이'의 '남자의 자격'에 깜짝 출연해 어머님께 인사를 전했다.지난 10월 20일 해병대에 입대한 이정은 26일 방송된 '남자의 자격'의 '남자, 그리고 두번 군대가기'의 일환으로 해병대 체험에 나선 멤버들 앞에 깜짝 등장했다.지난주 19일에 이어 해병대 체험에 나선 이경규, 김태원, 김성민, 김국진, 이윤석, 윤형빈, 이정진 등 멤버들은 해병대 출신 가수 남진의 지도하에 하룻동안 훈련을 마쳤다. 순검을 마치고, 취침에 들어가기 전 내무반에 가수 김흥국과 이정이 나타났다.이날 해병대 401기 출신인 김흥국과 현재 일병인 1080기 이정은 남진과 함께 해병대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이정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후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당당하게 입대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이제 후회할껄"이라며 독설을 날리기도 한 '왕비호' 윤형빈은 이정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 김흥국은 "내 자식도 아닌데 참고 이겨내라며 이정에게 해병대를 강요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고 전했다.이경규의 '몰래카메라'에서 해병대 입대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전한 이정은 이날 방송에서 "TV 통해 해병대 가겠다고 공언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고 우스갯 소리를 했다.해병대의 무한 사랑을 보인 남진과 김흥국은 "해병대 전우들 4,000여명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다. 또 WBC의 준우승을 이끈 김인식 감독도 축구 대표팀의 허정무 감독도 해병대 출신이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잘되면 해병대 때문이라고 자랑하던 선배 남진과 김흥국의 말에 이정은 "훈련소에 있을 때 항상 무언가를 배워갈 것 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전우애와 결속력인 것 같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정은 해병대의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러 늠름한 군인으로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특히 이날 이정은 어머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이정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해 걱정이 많으 실 것이다"며 "편찮으신 어머니 두고 입대를 하게 돼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지만, 건강하게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제대하고 나서 못다한 효도 다하겠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필승!"이라고 말하며 눈물이 맺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남자의 자격'에 깜짝 출연한 일병 이정. 사진 = KBS화면캡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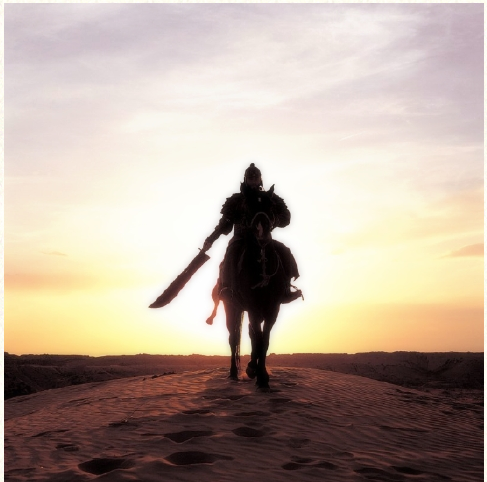 [엽기유머] 한민족 역대 최강 소드 마스터 척준경[펌] 옆에 게시물에 척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ㅋㅋ1. 국경선까지 남진한 여진족들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에서 임간을 파견했다가 임간이 대패하여 군진이 무너졌을 때 당시 중추원별가였던 척준경이 홀로 말을 타고 돌격하여 여진 선봉장을 참살하고 포로로 잡힌 고려군 200명을 빼앗아 왔다. 2. 윤관의 여진 정벌 당시, 여진족이 석성에 웅거하여 별무반의 앞길을 가로막자 윤관이 전전긍긍하였다. 이에 부관이었던 척준경이 이르기를 "신에게 보졸의 갑옷과 방패하나만 주시면 성문을 열어 보겠나이다" 라고 호언하였다. 척준경이 석성 아래로 가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성벽으로 올라가 추장과 장군들을 모조리 참살하고 성문을 열어 고려군이 성을 함락하였다 3. 윤관과 오연총이 8천의 군사를 이끌고 협곡을 지나다가 5만에 달하는 여진족의 기습에 고려군이 다 무너져 겨우 1000여 명만 남았고, 오연총도 화살에 맞아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 척준경이 즉시 100여기의 병력을 이끌고 달려왔다. 이에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이 이르기를 "적진이 견고하여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데 공연히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척준경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님을 봉양하라! 나는 이 한 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사내의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며 우뢰와같은 기합과 함께 100여기의 기병과 여진족의 후미를 돌파하기 시작하였다. 척준경은 단숨에 여진족 부관 10여명을 참살하고 적장을 활로 쏘아 거꾸러 뜨렸다. 척준경과 10명의 용사들이 분투하여 최홍정과 이관진이 구원하고 윤관은 목숨을 건졌다. (이 일로 윤관은 척준경과 부자의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4. 여진족 보병과 기병 2만이 영주성 남쪽에 나타나 고려군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윤관과 임언이 방어만 하려고 하자, 척준경은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출전하지 않고 있다가 적병은 날로 증가하고 성안의 양식은 다하여 원군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공들은 지난 날의 승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죽음을 힘을 다하여 싸울터이니 청컨데 공들은 성 위에서 보고 계십시오." 척준경이 결사대 100기를 이끌고 성을 나가 분전하여 적의 선봉장을 참살하고 적들을 패주시켰다. 5. 척준경이 방어하고 있던 성이 포위되고 군량이 다해가자 지휘를 부관에게 맞기고 척준경은 원군을 부르기 위하여 사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홀로 적진을 돌파하여 원군을 부르고 당도하여 원군과 함께 성을 포위하던 여진족들을 격파하였다. 6. 1126년 5월, 이자겸이 인종을 시해하려 수백의 사병을 동원하여 궁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편으로는 인종이 달아날것을 우려하여 자객 다섯명을 어전(왕의 거처)으로 미리 보내었다. 어전 내부는 유혈이 낭자하여 내시와 궁녀들이 살해당하였다. 자객들이 인종에게 다가가려 하자 왕을 모시는 상선(내시 우두머리)이 두 팔을 벌려 자객들을 가로막고 버티었다. 이에 자객 우두머리 주충이 일시에 상선의 목을 잘라버리니 이제 어전에는 인종과 사관밖에 남지않았다. 자객들이 인종을 시해하려 에워싸려 하자 인종은 대경실색하여 문밖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그 순간 어전문이 통째로 박살나며 한 거구가 손에 피묻은 거대한 태도를 든 채로 숨을 가쁘게 쉬며 들어섰다. 거구는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인종을 향해 우뢰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 폐하! 신 척준경이 왔사옵니다! " 척준경의 갑옷은 이미 한차례 전투를 벌였는지 넝마가 되어있었고, 투구는 고사하고상투가 잘려 봉두난발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마치 그 모습이 조조의 장수 악래 전위가 현신한 듯 하여 자객들과 주충은 감히 먼저 공격하지 못했다. 척준경은 즉시 인종을 등 뒤로 숨기고 자객들에게 달려들어 두명을 베어넘기고 삽시간에 나머지 세명 모두 죽이고 인종을 구하였다. 이 공으로 인종은 척준경을 <추충 정국 협모 동덕 위사공신(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상주국>에 임명하였다. 이듬해 권세를 함부로 부려 인종의 미움을 받다가 1127년에 “이자겸을 제거한 일은 일시의 공(功)이나 궁궐을 침범하고 불사른 것은 만세(萬世)의 죄다.”라는 좌정언(左正言) 정지상(鄭知常)의 탄핵을 받아 암타도(巖墮島)에 유배되고, 이듬해 곡주로 이배되었다. 1130년에 “죄는 중하나 또한 공도 적지 않다.”하여 처자에게 직전(職田)을 돌려주었다. 1144년에 지난날의 공으로 조봉대부 검교호부상서(朝奉大夫檢校戶部尙書)에 기용되었다가 곧 죽었다. 1146년 문하시랑평장사로 추복(追復)되었다.<개소문 닷컴 펌><Chuck 준경>
[엽기유머] 한민족 역대 최강 소드 마스터 척준경[펌] 옆에 게시물에 척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ㅋㅋ1. 국경선까지 남진한 여진족들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에서 임간을 파견했다가 임간이 대패하여 군진이 무너졌을 때 당시 중추원별가였던 척준경이 홀로 말을 타고 돌격하여 여진 선봉장을 참살하고 포로로 잡힌 고려군 200명을 빼앗아 왔다. 2. 윤관의 여진 정벌 당시, 여진족이 석성에 웅거하여 별무반의 앞길을 가로막자 윤관이 전전긍긍하였다. 이에 부관이었던 척준경이 이르기를 "신에게 보졸의 갑옷과 방패하나만 주시면 성문을 열어 보겠나이다" 라고 호언하였다. 척준경이 석성 아래로 가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성벽으로 올라가 추장과 장군들을 모조리 참살하고 성문을 열어 고려군이 성을 함락하였다 3. 윤관과 오연총이 8천의 군사를 이끌고 협곡을 지나다가 5만에 달하는 여진족의 기습에 고려군이 다 무너져 겨우 1000여 명만 남았고, 오연총도 화살에 맞아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 척준경이 즉시 100여기의 병력을 이끌고 달려왔다. 이에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이 이르기를 "적진이 견고하여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데 공연히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척준경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님을 봉양하라! 나는 이 한 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사내의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며 우뢰와같은 기합과 함께 100여기의 기병과 여진족의 후미를 돌파하기 시작하였다. 척준경은 단숨에 여진족 부관 10여명을 참살하고 적장을 활로 쏘아 거꾸러 뜨렸다. 척준경과 10명의 용사들이 분투하여 최홍정과 이관진이 구원하고 윤관은 목숨을 건졌다. (이 일로 윤관은 척준경과 부자의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4. 여진족 보병과 기병 2만이 영주성 남쪽에 나타나 고려군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윤관과 임언이 방어만 하려고 하자, 척준경은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출전하지 않고 있다가 적병은 날로 증가하고 성안의 양식은 다하여 원군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공들은 지난 날의 승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죽음을 힘을 다하여 싸울터이니 청컨데 공들은 성 위에서 보고 계십시오." 척준경이 결사대 100기를 이끌고 성을 나가 분전하여 적의 선봉장을 참살하고 적들을 패주시켰다. 5. 척준경이 방어하고 있던 성이 포위되고 군량이 다해가자 지휘를 부관에게 맞기고 척준경은 원군을 부르기 위하여 사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홀로 적진을 돌파하여 원군을 부르고 당도하여 원군과 함께 성을 포위하던 여진족들을 격파하였다. 6. 1126년 5월, 이자겸이 인종을 시해하려 수백의 사병을 동원하여 궁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편으로는 인종이 달아날것을 우려하여 자객 다섯명을 어전(왕의 거처)으로 미리 보내었다. 어전 내부는 유혈이 낭자하여 내시와 궁녀들이 살해당하였다. 자객들이 인종에게 다가가려 하자 왕을 모시는 상선(내시 우두머리)이 두 팔을 벌려 자객들을 가로막고 버티었다. 이에 자객 우두머리 주충이 일시에 상선의 목을 잘라버리니 이제 어전에는 인종과 사관밖에 남지않았다. 자객들이 인종을 시해하려 에워싸려 하자 인종은 대경실색하여 문밖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그 순간 어전문이 통째로 박살나며 한 거구가 손에 피묻은 거대한 태도를 든 채로 숨을 가쁘게 쉬며 들어섰다. 거구는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인종을 향해 우뢰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 폐하! 신 척준경이 왔사옵니다! " 척준경의 갑옷은 이미 한차례 전투를 벌였는지 넝마가 되어있었고, 투구는 고사하고상투가 잘려 봉두난발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마치 그 모습이 조조의 장수 악래 전위가 현신한 듯 하여 자객들과 주충은 감히 먼저 공격하지 못했다. 척준경은 즉시 인종을 등 뒤로 숨기고 자객들에게 달려들어 두명을 베어넘기고 삽시간에 나머지 세명 모두 죽이고 인종을 구하였다. 이 공으로 인종은 척준경을 <추충 정국 협모 동덕 위사공신(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상주국>에 임명하였다. 이듬해 권세를 함부로 부려 인종의 미움을 받다가 1127년에 “이자겸을 제거한 일은 일시의 공(功)이나 궁궐을 침범하고 불사른 것은 만세(萬世)의 죄다.”라는 좌정언(左正言) 정지상(鄭知常)의 탄핵을 받아 암타도(巖墮島)에 유배되고, 이듬해 곡주로 이배되었다. 1130년에 “죄는 중하나 또한 공도 적지 않다.”하여 처자에게 직전(職田)을 돌려주었다. 1144년에 지난날의 공으로 조봉대부 검교호부상서(朝奉大夫檢校戶部尙書)에 기용되었다가 곧 죽었다. 1146년 문하시랑평장사로 추복(追復)되었다.<개소문 닷컴 펌><Chuck 준경> [자유·수다] 형제의 나라 터키 터키'라는 국가를 말하면 우리는 이스탄불, 지중해의 나라, 형제의 나라 등 여러 수식어를 떠올리지만 정작 우리나라와 터키가 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워지는 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를 아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25 때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파병 된 15,000명이 넘는 터키군 대부분이 자원병이였으며 그중 3,500명이 사망(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할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견했으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터키에 가면 관공서나 호텔의 국기대에 터키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터키인들 역시 한국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Brother's country 라 부릅니다.또, 한국말과 비슷한 단어가 많은 헝가리 사람들 역시 한국이랑 헝가리랑 sister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여기, 한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시 참고해보도록 하지요.터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투르크'라고 부른다.우리가 코리아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역사를 배웠다면과거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돌궐'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을 것이다.투르크는 돌궐의 다른 발음이며..같은 우랄 알타이 계통이었던 고구려와 돌궐은 동맹을 맺어 가깝게 지냈는데돌궐이 위구르에 멸망한 후, 남아있던 이들이 서방으로 이동하여결국 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원래, 나라와 나라사이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지만돌궐과 고구려는 계속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 불렀고 세월이 흘러 지금의 터키에 자리잡은 그들은,고구려의 후예인 한국인들을 여전히, 그리고 당연히'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즉,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형제의 관계였던 것이다.6.25 때부터가 아니고.그렇다면 의문점 하나.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그리고 터키인들은 왜 아직도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까?답은 간단하다.역사 교과서의 차이다.우리나라의 중,고 역사 교과서는 '돌궐'이란 나라에 대해단지 몇 줄만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돌궐이 이동해 터키가 됐다느니 훈족이 이동해 헝가리가 됐다느니 하는 얘기는 전무하다.터키는 다르다.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경험했던 터키는 그들의 역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학교에서 역사 과목의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며돌궐 시절의 고구려라는 우방국에 대한 설명 역시 아주 상세하다.'형제의 나라'였다는 설명과 함께.그래서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한국을 사랑한다.설령 한국이 그들을 몰라줄지라도..실제로 터키인들은 한국인들 역시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한국인들도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 칭하며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1988년 서울 올림픽 때터키의 한 고위층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자신을 터키인이라 소개하면 한국인들에게서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그렇지 않은 데 대해 놀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터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돌아온 답은 대부분 '아니오'였다.충격을 받고 터키로 돌아간 그는 자국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한다.'이제.. 짝사랑은 그만합시다..'이런 어색한 기류가 급반전된 계기는 바로 2002 월드컵이었다.'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 터키를 응원하자'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타고 여기저기 퍼져나갔고터키 유학생들이 터키인들의 따뜻한 한국사랑을 소개하면서 터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게 되었다.6.25 참전과 올림픽 등에서 나타난 그들의 한국사랑을 알게 된 한국인들은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터키의 홈구장과 홈팬들이 되어 열정적으로 그들을 응원했다. 하이라이트는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자국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대형 터키 국기가 관중석에 펼쳐지는 순간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터키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한다.경기는 한국 선수들과 터키 선수들의 살가운 어깨동무로 끝이 났고터키인들은 승리보다도 한국인들의 터키사랑에 더욱 감동했으며그렇게.. 한국과 터키의 '형제애'는 더욱 굳건해졌다.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터키가 형제의 나라가 된 궁극적인 이유를 모르면KBS의 어느 아나운서가 패널이었던 터키인에게 '아우님'이라 불렀던어리석은 짓도 가능한 것이다.형제는 '형과 동생'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다.그들에게 형제는 곧 친구며 우방이니까.- 10월 16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대전지역 98.1MHz) --------------------------------------------------------------------------------터키의 언어에는 순우리말과 비슷한 단어가 참 많습니다.말뿐 아니라 음식, 문화, 습성, 국민정서 (터키인 우월주의에, 감정적 다혈질이면서 반대로 다정다감하고, 거나하게 놀기 좋아하고, 어쩜 그렇게 성질 급한 것까지..)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유럽인치고는 흔하지 않게 몽고반점도 있습니다.과거 돌궐(투르크 => 터키)과 고구려는 그냥 우방이 아니라, 이와 잇몸 같은 관계였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돌궐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을 정도니까요. 고구려 멸망 후 돌궐도 망했으며 서쪽으로 옮겨 서돌궐을 건국하게 됩니다. 서돌궐이 훗날 오스만 제국... 그리고 터키가 됩니다. 혈통이 고구려와 혼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의 역사 교과서에서 돌궐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돌궐의 위치 때문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사서에는 고구려와 돌궐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돌궐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고구려의 영토가 중앙아시아, 즉 실크로드(서안) 부근까지가 영토라는 이야기가 됩니다.그리고 돌궐은 만주 지역에까지 영토를 넓힌 적도 없습니다.따라서, 고구려의 영토가 만주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 아시아 까지(돌궐과 맞닿은), 매우 방대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중국이 동북공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터키'라는 나라는 과거 청동기시대인 배달국, 고조선, 부여 시대에는 동이족에 속해 있다가 고구려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고구려가 부여를 정벌하자 그곳에 살던 원주민(예맥 동이족)들이 요하를 건너가 이루게된 민족입니다. 돌궐족은 중국의 대부분을 수나라가 통일하자 고구려와 돌궐은 연합하여 수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나라의 침략을 받아 요서지방은 수나라에 점령되고 돌궐은 서쪽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들이 서쪽으로 이주해 정착하여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건설하였고, 아랍과 발칸반도를 지배하며 강성했던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19세기 중반부터 쇠퇴하면서 주변의 영토를 잃고(소수민족 모두 독립) 지금에 터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같은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는 중국의 영향으로 한문을 사용했고, 터키는 아랍의 영향을 받아 언어는 전혀 다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유전학이나 인류학적으로도 터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몇개 안되는 북방계 몽골리언국가(몽고, 한국, 일본, 에스키모, 인디언) 중 하나로, 헝가리 와 함께 북방계 몽골리언의 유전자가 많이 남아있는 유럽국가입니다.터키인은 '코리아'의 어원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영문표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형제사랑이지요..그렇다면, 북한도 같은 민족인데 어째서 한국과 형제인 터키가 6.25 때 남한편에만 병력을 파병했을까..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이나 아르메니아인들과 터키는 견원지간입니다. 아니, 원수지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네요.과거 아르메니아인(오스만 기독교인들)들이 터키인(투르크 이슬람교도)에게 대학살을 당했기 때문이지요.과거 오스만터키에서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면서 쇠약해진 국력과 맞물린 굴절된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아르메니아인 수천명이 죽임을 당하는 1차 대학살의 참사가 벌어집니다.유럽으로 남진하려하는 러시아의 힘을 얻어 루마니아와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게되고 오스만터키의 아르메니아 영토 대부분을 러시아가 차지하는 셈이 되자 이에 분노한 투르크인들이 러시아와 붙어먹은 아르메인들을 표적으로 인종청소라는 대학살을 감행한거죠. 1차 대학살 20년후 또 다시 오스만터키 정부의 도움을 받은 투르크 이슬람교도들은 아르메니아인 5만명에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2차대학살) 게다가 정부는 학살된 아르메니아인 외 175만명을 추가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로 추방하고 그 추방하는 과정에 60만명이 사막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894년~1915년까지 250만명이였던 아르메니아인은 30만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후 1912년 발칸전쟁 때 몬테니그로, 불가리아, 그리스가 오스만터키에서 독립할 때도 알게모르게 러시아가 개입하여 아르메니아인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터키는 그 반대 쪽인 남한에만 병력을 파견한 거지요.물론 혹자는 당시 터키가 미국과의 우방적 연계로 말미암은 국제적 이득을 노린 선택일 뿐이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역사의 흐름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본다면,터키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의 동맹국 중의 하나였던 이유가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적대 관계일 수 밖에 없는 과거사 때문이였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형제의 나라..한국의 경제성장을 자기일처럼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는 나라, 2002년 월드컵 터키전이 있던 날 한국인에게는 식사비와 호텔비를 안받던 나라.. 월드컵 때 우리가 흔든 터키 국기(國旗)가 터키에 폭발적인 한국 바람을 일으켜 그후 터키 수출이 2003년 59%, 2004년 71%나 늘어났다는 KOTRA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닌, 자기 나라로부터 수백만리 떨어진 곳에서 보내는 의리와 애정을 받는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출저 : 와고
[자유·수다] 형제의 나라 터키 터키'라는 국가를 말하면 우리는 이스탄불, 지중해의 나라, 형제의 나라 등 여러 수식어를 떠올리지만 정작 우리나라와 터키가 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워지는 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를 아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25 때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파병 된 15,000명이 넘는 터키군 대부분이 자원병이였으며 그중 3,500명이 사망(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할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견했으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터키에 가면 관공서나 호텔의 국기대에 터키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터키인들 역시 한국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Brother's country 라 부릅니다.또, 한국말과 비슷한 단어가 많은 헝가리 사람들 역시 한국이랑 헝가리랑 sister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여기, 한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시 참고해보도록 하지요.터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투르크'라고 부른다.우리가 코리아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역사를 배웠다면과거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돌궐'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을 것이다.투르크는 돌궐의 다른 발음이며..같은 우랄 알타이 계통이었던 고구려와 돌궐은 동맹을 맺어 가깝게 지냈는데돌궐이 위구르에 멸망한 후, 남아있던 이들이 서방으로 이동하여결국 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원래, 나라와 나라사이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지만돌궐과 고구려는 계속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 불렀고 세월이 흘러 지금의 터키에 자리잡은 그들은,고구려의 후예인 한국인들을 여전히, 그리고 당연히'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즉,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형제의 관계였던 것이다.6.25 때부터가 아니고.그렇다면 의문점 하나.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그리고 터키인들은 왜 아직도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까?답은 간단하다.역사 교과서의 차이다.우리나라의 중,고 역사 교과서는 '돌궐'이란 나라에 대해단지 몇 줄만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돌궐이 이동해 터키가 됐다느니 훈족이 이동해 헝가리가 됐다느니 하는 얘기는 전무하다.터키는 다르다.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경험했던 터키는 그들의 역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학교에서 역사 과목의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며돌궐 시절의 고구려라는 우방국에 대한 설명 역시 아주 상세하다.'형제의 나라'였다는 설명과 함께.그래서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한국을 사랑한다.설령 한국이 그들을 몰라줄지라도..실제로 터키인들은 한국인들 역시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한국인들도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 칭하며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1988년 서울 올림픽 때터키의 한 고위층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자신을 터키인이라 소개하면 한국인들에게서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그렇지 않은 데 대해 놀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터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돌아온 답은 대부분 '아니오'였다.충격을 받고 터키로 돌아간 그는 자국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한다.'이제.. 짝사랑은 그만합시다..'이런 어색한 기류가 급반전된 계기는 바로 2002 월드컵이었다.'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 터키를 응원하자'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타고 여기저기 퍼져나갔고터키 유학생들이 터키인들의 따뜻한 한국사랑을 소개하면서 터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게 되었다.6.25 참전과 올림픽 등에서 나타난 그들의 한국사랑을 알게 된 한국인들은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터키의 홈구장과 홈팬들이 되어 열정적으로 그들을 응원했다. 하이라이트는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자국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대형 터키 국기가 관중석에 펼쳐지는 순간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터키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한다.경기는 한국 선수들과 터키 선수들의 살가운 어깨동무로 끝이 났고터키인들은 승리보다도 한국인들의 터키사랑에 더욱 감동했으며그렇게.. 한국과 터키의 '형제애'는 더욱 굳건해졌다.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터키가 형제의 나라가 된 궁극적인 이유를 모르면KBS의 어느 아나운서가 패널이었던 터키인에게 '아우님'이라 불렀던어리석은 짓도 가능한 것이다.형제는 '형과 동생'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다.그들에게 형제는 곧 친구며 우방이니까.- 10월 16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대전지역 98.1MHz) --------------------------------------------------------------------------------터키의 언어에는 순우리말과 비슷한 단어가 참 많습니다.말뿐 아니라 음식, 문화, 습성, 국민정서 (터키인 우월주의에, 감정적 다혈질이면서 반대로 다정다감하고, 거나하게 놀기 좋아하고, 어쩜 그렇게 성질 급한 것까지..)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유럽인치고는 흔하지 않게 몽고반점도 있습니다.과거 돌궐(투르크 => 터키)과 고구려는 그냥 우방이 아니라, 이와 잇몸 같은 관계였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돌궐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을 정도니까요. 고구려 멸망 후 돌궐도 망했으며 서쪽으로 옮겨 서돌궐을 건국하게 됩니다. 서돌궐이 훗날 오스만 제국... 그리고 터키가 됩니다. 혈통이 고구려와 혼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의 역사 교과서에서 돌궐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돌궐의 위치 때문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사서에는 고구려와 돌궐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돌궐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고구려의 영토가 중앙아시아, 즉 실크로드(서안) 부근까지가 영토라는 이야기가 됩니다.그리고 돌궐은 만주 지역에까지 영토를 넓힌 적도 없습니다.따라서, 고구려의 영토가 만주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 아시아 까지(돌궐과 맞닿은), 매우 방대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중국이 동북공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터키'라는 나라는 과거 청동기시대인 배달국, 고조선, 부여 시대에는 동이족에 속해 있다가 고구려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고구려가 부여를 정벌하자 그곳에 살던 원주민(예맥 동이족)들이 요하를 건너가 이루게된 민족입니다. 돌궐족은 중국의 대부분을 수나라가 통일하자 고구려와 돌궐은 연합하여 수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나라의 침략을 받아 요서지방은 수나라에 점령되고 돌궐은 서쪽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들이 서쪽으로 이주해 정착하여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건설하였고, 아랍과 발칸반도를 지배하며 강성했던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19세기 중반부터 쇠퇴하면서 주변의 영토를 잃고(소수민족 모두 독립) 지금에 터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같은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는 중국의 영향으로 한문을 사용했고, 터키는 아랍의 영향을 받아 언어는 전혀 다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유전학이나 인류학적으로도 터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몇개 안되는 북방계 몽골리언국가(몽고, 한국, 일본, 에스키모, 인디언) 중 하나로, 헝가리 와 함께 북방계 몽골리언의 유전자가 많이 남아있는 유럽국가입니다.터키인은 '코리아'의 어원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영문표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형제사랑이지요..그렇다면, 북한도 같은 민족인데 어째서 한국과 형제인 터키가 6.25 때 남한편에만 병력을 파병했을까..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이나 아르메니아인들과 터키는 견원지간입니다. 아니, 원수지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네요.과거 아르메니아인(오스만 기독교인들)들이 터키인(투르크 이슬람교도)에게 대학살을 당했기 때문이지요.과거 오스만터키에서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면서 쇠약해진 국력과 맞물린 굴절된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아르메니아인 수천명이 죽임을 당하는 1차 대학살의 참사가 벌어집니다.유럽으로 남진하려하는 러시아의 힘을 얻어 루마니아와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게되고 오스만터키의 아르메니아 영토 대부분을 러시아가 차지하는 셈이 되자 이에 분노한 투르크인들이 러시아와 붙어먹은 아르메인들을 표적으로 인종청소라는 대학살을 감행한거죠. 1차 대학살 20년후 또 다시 오스만터키 정부의 도움을 받은 투르크 이슬람교도들은 아르메니아인 5만명에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2차대학살) 게다가 정부는 학살된 아르메니아인 외 175만명을 추가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로 추방하고 그 추방하는 과정에 60만명이 사막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894년~1915년까지 250만명이였던 아르메니아인은 30만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후 1912년 발칸전쟁 때 몬테니그로, 불가리아, 그리스가 오스만터키에서 독립할 때도 알게모르게 러시아가 개입하여 아르메니아인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터키는 그 반대 쪽인 남한에만 병력을 파견한 거지요.물론 혹자는 당시 터키가 미국과의 우방적 연계로 말미암은 국제적 이득을 노린 선택일 뿐이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역사의 흐름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본다면,터키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의 동맹국 중의 하나였던 이유가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적대 관계일 수 밖에 없는 과거사 때문이였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형제의 나라..한국의 경제성장을 자기일처럼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는 나라, 2002년 월드컵 터키전이 있던 날 한국인에게는 식사비와 호텔비를 안받던 나라.. 월드컵 때 우리가 흔든 터키 국기(國旗)가 터키에 폭발적인 한국 바람을 일으켜 그후 터키 수출이 2003년 59%, 2004년 71%나 늘어났다는 KOTRA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닌, 자기 나라로부터 수백만리 떨어진 곳에서 보내는 의리와 애정을 받는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출저 : 와고 [유머·엽기영상] 고려의 소드마스터 그의 활약상 1.국경선까지 남진한 여진족들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에서 임간을 파견했다가 임간이 대패하여 군진이 무너졌을 때 당시 중추원별가였던 척준경이 홀로 말을 타고 돌격하여 여진 선봉장을 참살하고 포로로 잡힌 고려군 200명을 빼앗아 왔다. 2.윤관의 여진 정벌 당시, 여진족이 석성에 웅거하여 별무반의 앞길을 가로막자 윤관이 전전긍긍하였다. 이에 부관이었던 척준경이 이르기를 "신에게 보졸의 갑옷과 방패하나만 주시면 성문을 열어 보겠나이다" 라고 호언하였다. 척준경이 석성 아래로 가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성벽으로 올라가 추장과 장군들을 모조리 참살하고 성문을 열어 고려군이 성을 함락하였다 3.윤관과 오연총이 8천의 군사를 이끌고 협곡을 지나다가 5만에 달하는 여진족의 기습에 고려군이 다 무너져 겨우 1000여 명만 남았고, 오연총도 화살에 맞아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 척준경이 즉시 100여기의 병력을 이끌고 달려왔다. 이에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이 이르기를 "적진이 견고하여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데 공연히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척준경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님을 봉양하라! 나는 이 한 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사내의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며 우뢰와같은 기합과 함께 100여기의 기병과 여진족의 후미를 돌파하기 시작하였다. 척준경은 단숨에 여진족 부관 10여명을 참살하고 적장을 활로 쏘아 거꾸러 뜨렸다. 척준경과 10명의 용사들이 분투하여 최홍정과 이관진이 구원하고 윤관은 목숨을 건졌다. (이 일로 윤관은 척준경과 부자의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4. 여진족 보병과 기병 2만이 영주성 남쪽에 나타나 고려군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윤관과 임언이 방어만 하려고 하자, 척준경은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출전하지 않고 있다가 적병은 날로 증가하고 성안의 양식은 다하여 원군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공들은 지난 날의 승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죽음을 힘을 다하여 싸울터이니 청컨데 공들은 성 위에서 보고 계십시오." 척준경이 결사대 100기를 이끌고 성을 나가 분전하여 적의 선봉장을 참살하고 적들을 패주시켰다. 5. 척준경이 방어하고 있던 성이 포위되고 군량이 다해가자 지휘를 부관에게 맞기고 척준경은 원군을 부르기 위하여 사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홀로 적진을 돌파하여 원군을 부르고 당도하여 원군과 함께 성을 포위하던 여진족들을 격파하였다. 6. 1126년 5월, 이자겸이 인종을 시해하려 수백의 사병을 동원하여 궁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편으로는 인종이 달아날것을 우려하여 자객 다섯명을 어전(왕의 거처)으로 미리 보내었다. 어전 내부는 유혈이 낭자하여 내시와 궁녀들이 살해당하였다. 자객들이 인종에게 다가가려 하자 왕을 모시는 상선(내시 우두머리)이 두 팔을 벌려 자객들을 가로막고 버티었다. 이에 자객 우두머리 주충이 일시에 상선의 목을 잘라버리니 이제 어전에는 인종과 사관밖에 남지않았다. 자객들이 인종을 시해하려 에워싸려 하자 인종은 대경실색하여 문밖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그 순간 어전문이 통째로 박살나며 한 거구가 손에 피묻은 거대한 태도를 든 채로 숨을 가쁘게 쉬며 들어섰다. 거구는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인종을 향해 우뢰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 폐하! 신 척준경이 왔사옵니다! " 척준경의 갑옷은 이미 한차례 전투를 벌였는지 넝마가 되어있었고, 투구는 고사하고상투가 잘려 봉두난발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마치 그 모습이 조조의 장수 악래 전위가 현신한 듯 하여 자객들과 주충은 감히 먼저 공격하지 못했다. 척준경은 즉시 인종을 등 뒤로 숨기고 자객들에게 달려들어 두명을 베어넘기고 삽시간에 나머지 세명 모두 죽이고 인종을 구하였다. 이 공으로 인종은 척준경을 <추충 정국 협모 동덕 위사공신(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상주국>에 임명하였다. 이듬해 권세를 함부로 부려 인종의 미움을 받다가 1127년에 “이자겸을 제거한 일은 일시의 공(功)이나 궁궐을 침범하고 불사른 것은 만세(萬世)의 죄다.”라는 좌정언(左正言) 정지상(鄭知常)의 탄핵을 받아 암타도(巖墮島)에 유배되고, 이듬해 곡주로 이배되었다. 1130년에 “죄는 중하나 또한 공도 적지 않다.”하여 처자에게 직전(職田)을 돌려주었다. 1144년에 지난날의 공으로 조봉대부 검교호부상서(朝奉大夫檢校戶部尙書)에 기용되었다가 곧 죽었다. 1146년 문하시랑평장사로 추복(追復)되었다.한반도 역사상 최강자 아닌가 싶음.2인자는 친구로 고려시대 장군 왕자지王字之
[유머·엽기영상] 고려의 소드마스터 그의 활약상 1.국경선까지 남진한 여진족들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에서 임간을 파견했다가 임간이 대패하여 군진이 무너졌을 때 당시 중추원별가였던 척준경이 홀로 말을 타고 돌격하여 여진 선봉장을 참살하고 포로로 잡힌 고려군 200명을 빼앗아 왔다. 2.윤관의 여진 정벌 당시, 여진족이 석성에 웅거하여 별무반의 앞길을 가로막자 윤관이 전전긍긍하였다. 이에 부관이었던 척준경이 이르기를 "신에게 보졸의 갑옷과 방패하나만 주시면 성문을 열어 보겠나이다" 라고 호언하였다. 척준경이 석성 아래로 가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성벽으로 올라가 추장과 장군들을 모조리 참살하고 성문을 열어 고려군이 성을 함락하였다 3.윤관과 오연총이 8천의 군사를 이끌고 협곡을 지나다가 5만에 달하는 여진족의 기습에 고려군이 다 무너져 겨우 1000여 명만 남았고, 오연총도 화살에 맞아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 척준경이 즉시 100여기의 병력을 이끌고 달려왔다. 이에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이 이르기를 "적진이 견고하여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데 공연히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척준경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님을 봉양하라! 나는 이 한 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사내의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며 우뢰와같은 기합과 함께 100여기의 기병과 여진족의 후미를 돌파하기 시작하였다. 척준경은 단숨에 여진족 부관 10여명을 참살하고 적장을 활로 쏘아 거꾸러 뜨렸다. 척준경과 10명의 용사들이 분투하여 최홍정과 이관진이 구원하고 윤관은 목숨을 건졌다. (이 일로 윤관은 척준경과 부자의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4. 여진족 보병과 기병 2만이 영주성 남쪽에 나타나 고려군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윤관과 임언이 방어만 하려고 하자, 척준경은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출전하지 않고 있다가 적병은 날로 증가하고 성안의 양식은 다하여 원군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공들은 지난 날의 승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죽음을 힘을 다하여 싸울터이니 청컨데 공들은 성 위에서 보고 계십시오." 척준경이 결사대 100기를 이끌고 성을 나가 분전하여 적의 선봉장을 참살하고 적들을 패주시켰다. 5. 척준경이 방어하고 있던 성이 포위되고 군량이 다해가자 지휘를 부관에게 맞기고 척준경은 원군을 부르기 위하여 사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홀로 적진을 돌파하여 원군을 부르고 당도하여 원군과 함께 성을 포위하던 여진족들을 격파하였다. 6. 1126년 5월, 이자겸이 인종을 시해하려 수백의 사병을 동원하여 궁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편으로는 인종이 달아날것을 우려하여 자객 다섯명을 어전(왕의 거처)으로 미리 보내었다. 어전 내부는 유혈이 낭자하여 내시와 궁녀들이 살해당하였다. 자객들이 인종에게 다가가려 하자 왕을 모시는 상선(내시 우두머리)이 두 팔을 벌려 자객들을 가로막고 버티었다. 이에 자객 우두머리 주충이 일시에 상선의 목을 잘라버리니 이제 어전에는 인종과 사관밖에 남지않았다. 자객들이 인종을 시해하려 에워싸려 하자 인종은 대경실색하여 문밖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그 순간 어전문이 통째로 박살나며 한 거구가 손에 피묻은 거대한 태도를 든 채로 숨을 가쁘게 쉬며 들어섰다. 거구는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인종을 향해 우뢰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 폐하! 신 척준경이 왔사옵니다! " 척준경의 갑옷은 이미 한차례 전투를 벌였는지 넝마가 되어있었고, 투구는 고사하고상투가 잘려 봉두난발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마치 그 모습이 조조의 장수 악래 전위가 현신한 듯 하여 자객들과 주충은 감히 먼저 공격하지 못했다. 척준경은 즉시 인종을 등 뒤로 숨기고 자객들에게 달려들어 두명을 베어넘기고 삽시간에 나머지 세명 모두 죽이고 인종을 구하였다. 이 공으로 인종은 척준경을 <추충 정국 협모 동덕 위사공신(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상주국>에 임명하였다. 이듬해 권세를 함부로 부려 인종의 미움을 받다가 1127년에 “이자겸을 제거한 일은 일시의 공(功)이나 궁궐을 침범하고 불사른 것은 만세(萬世)의 죄다.”라는 좌정언(左正言) 정지상(鄭知常)의 탄핵을 받아 암타도(巖墮島)에 유배되고, 이듬해 곡주로 이배되었다. 1130년에 “죄는 중하나 또한 공도 적지 않다.”하여 처자에게 직전(職田)을 돌려주었다. 1144년에 지난날의 공으로 조봉대부 검교호부상서(朝奉大夫檢校戶部尙書)에 기용되었다가 곧 죽었다. 1146년 문하시랑평장사로 추복(追復)되었다.한반도 역사상 최강자 아닌가 싶음.2인자는 친구로 고려시대 장군 왕자지王字之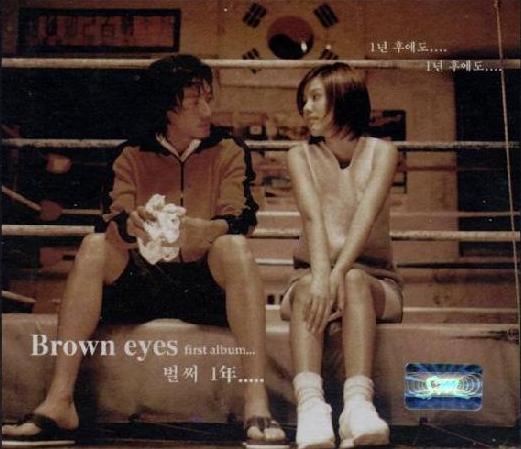 [엽기유머] 한국 대중가요 불후의 명곡 TOP100 * TVN 선정 한국대중가요 불후의 명곡 탑100순위산정방식 :시민 리서치조사(10~50대)+음악전문가 평가100위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 양수경 99위 아름다운세상 : 박학기 98위 님과함께 : 남진 97위 나를 돌아봐 : 듀스 96위 미지의 세계 : 조용필 95위 이밤의 끝을 잡고 : 솔리드 94위 그 남자 그 여자 : 바이브 93위 샴푸의 요정 : 빛과 소금 92위 행복의 나라로 : 한대수 91위 내일이 찾아오면 : 오장박 트리오 90위 사랑보다 깊은 상처 : 임재범, 박정현 89위 텔미 : 원더걸스 88위 별이 진다네 : 여행스케치 87위 가리워진길 : 유재하 86위 내사람 : SG워너비 85위 눈물나는 날에는 : 푸른하늘 84위 텅빈 거리에서 : 015B 83위 행복 : HOT 82위 매직카펫라이트 : 자우림 81위 꽃밭에서 : 정윤희 80위 편지 : 김광진 79위 너에게로 또다시 : 변진섭 78위 기억속으로 : 이은미 77위 지난날 : 유재하 76위 나뭇잎 사이로 : 조동진 75위 골목길 : 신촌블루스 74위 넘버원 : 보아 73위 텅빈마음 : 이승환 72위 붉은노을 : 이문세 71위 향기로운 추억 : 박학기 70위 미인 : 신중현과 엽전들 69위 한동안 뜸했었지 : 사랑과 평화 68위 그대에게 : 무한궤도 67위 TO HEAVEN : 조성모 66위 커피한잔 : 펄시스터즈 65위 여름안에서 : 듀스 64위 슬픈인연 : 나미 63위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 이승철 62위 사랑안해 : 백지영 61위 넌 내게 반했어 : 노브레인 60위 나 어떡해 : 샌드페이블즈 59위 달팽이 : 패닉 58위 I don't care : 2NE1 57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 양희은 56위 그것만이 내세상 : 들국화 55위 크게 라디오를 켜고 : 시나위 54위 여전히 아름다운지 : 토이 53위 사랑하는 이에게 : 정태춘, 박은옥 52위 바람이 분다 : 이소라 51위 보이지 않는 사랑 : 신승훈 50위 흐린 기억속에 그대 : 현진영 49위 너를 보내고 : 윤도현 48위 단발머리 : 조용필 47위 사랑할수록 : 부활 46위 그대와 영원히 : 이문세 45위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 드렁큰타이거 44위 젊은 그대 : 김수철 43위 꿈에 : 조덕배 42위 광야에서 : 노찾사 41위 동백아가씨 : 이미자 40위 런투유 : DJ. DOC 39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 조용필 38위 님은 먼곳에 : 김추자 37위 거짓말 : 빅뱅 36위 이등병의 편지 : 김광석 35위 하여가 : 서태지와 아이들 34위 말달리자 : 크라잉 넛 33위 그때 그사람 : 심수봉 32위 모두 다 사랑하리 : 송골매 31위 꿈 : 조용필 30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 패티김 29위 아니벌써 : 산울림 28위 아침이슬 : 김민기 27위 우리는 : 송창식 26위 비처럼 음악처럼 : 김현식 25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 이장희 24위 서른 즈음에 : 김광석 23위 잘못된 만남 : 김건모 22위 종이학 : 전영록 21위 미소속에 미친 그대 : 신승훈 20위 남행열차 : 김수희 19위 바람의 노래 : 조용필 18위 아름다운 강산 : 신중현 17위 비와당신의 이야기 : 부활 16위 행진 : 들국화 15위 천일동안 : 이승환 14위 사랑 : 나훈아 13위 여러분 : 윤복희 12위 고래사냥 : 송창식 11위 사랑하기 때문에 : 유재하 10위 벌써1년 : 브라운아이즈 9위 행복한 사람 : 조동진 8위 핑계 : 김건모 7위 사랑했지만 : 김광석 6위 마법의 성 : 더 클래식 5위 거위의 꿈 : 카니발 4위 난알아요 : 서태지와 아이들 3위 옛사랑 : 이문세 2위 친구여 : 조용필 1위 내사랑 내곁에 : 김현식
[엽기유머] 한국 대중가요 불후의 명곡 TOP100 * TVN 선정 한국대중가요 불후의 명곡 탑100순위산정방식 :시민 리서치조사(10~50대)+음악전문가 평가100위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 양수경 99위 아름다운세상 : 박학기 98위 님과함께 : 남진 97위 나를 돌아봐 : 듀스 96위 미지의 세계 : 조용필 95위 이밤의 끝을 잡고 : 솔리드 94위 그 남자 그 여자 : 바이브 93위 샴푸의 요정 : 빛과 소금 92위 행복의 나라로 : 한대수 91위 내일이 찾아오면 : 오장박 트리오 90위 사랑보다 깊은 상처 : 임재범, 박정현 89위 텔미 : 원더걸스 88위 별이 진다네 : 여행스케치 87위 가리워진길 : 유재하 86위 내사람 : SG워너비 85위 눈물나는 날에는 : 푸른하늘 84위 텅빈 거리에서 : 015B 83위 행복 : HOT 82위 매직카펫라이트 : 자우림 81위 꽃밭에서 : 정윤희 80위 편지 : 김광진 79위 너에게로 또다시 : 변진섭 78위 기억속으로 : 이은미 77위 지난날 : 유재하 76위 나뭇잎 사이로 : 조동진 75위 골목길 : 신촌블루스 74위 넘버원 : 보아 73위 텅빈마음 : 이승환 72위 붉은노을 : 이문세 71위 향기로운 추억 : 박학기 70위 미인 : 신중현과 엽전들 69위 한동안 뜸했었지 : 사랑과 평화 68위 그대에게 : 무한궤도 67위 TO HEAVEN : 조성모 66위 커피한잔 : 펄시스터즈 65위 여름안에서 : 듀스 64위 슬픈인연 : 나미 63위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 이승철 62위 사랑안해 : 백지영 61위 넌 내게 반했어 : 노브레인 60위 나 어떡해 : 샌드페이블즈 59위 달팽이 : 패닉 58위 I don't care : 2NE1 57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 양희은 56위 그것만이 내세상 : 들국화 55위 크게 라디오를 켜고 : 시나위 54위 여전히 아름다운지 : 토이 53위 사랑하는 이에게 : 정태춘, 박은옥 52위 바람이 분다 : 이소라 51위 보이지 않는 사랑 : 신승훈 50위 흐린 기억속에 그대 : 현진영 49위 너를 보내고 : 윤도현 48위 단발머리 : 조용필 47위 사랑할수록 : 부활 46위 그대와 영원히 : 이문세 45위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 드렁큰타이거 44위 젊은 그대 : 김수철 43위 꿈에 : 조덕배 42위 광야에서 : 노찾사 41위 동백아가씨 : 이미자 40위 런투유 : DJ. DOC 39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 조용필 38위 님은 먼곳에 : 김추자 37위 거짓말 : 빅뱅 36위 이등병의 편지 : 김광석 35위 하여가 : 서태지와 아이들 34위 말달리자 : 크라잉 넛 33위 그때 그사람 : 심수봉 32위 모두 다 사랑하리 : 송골매 31위 꿈 : 조용필 30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 패티김 29위 아니벌써 : 산울림 28위 아침이슬 : 김민기 27위 우리는 : 송창식 26위 비처럼 음악처럼 : 김현식 25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 이장희 24위 서른 즈음에 : 김광석 23위 잘못된 만남 : 김건모 22위 종이학 : 전영록 21위 미소속에 미친 그대 : 신승훈 20위 남행열차 : 김수희 19위 바람의 노래 : 조용필 18위 아름다운 강산 : 신중현 17위 비와당신의 이야기 : 부활 16위 행진 : 들국화 15위 천일동안 : 이승환 14위 사랑 : 나훈아 13위 여러분 : 윤복희 12위 고래사냥 : 송창식 11위 사랑하기 때문에 : 유재하 10위 벌써1년 : 브라운아이즈 9위 행복한 사람 : 조동진 8위 핑계 : 김건모 7위 사랑했지만 : 김광석 6위 마법의 성 : 더 클래식 5위 거위의 꿈 : 카니발 4위 난알아요 : 서태지와 아이들 3위 옛사랑 : 이문세 2위 친구여 : 조용필 1위 내사랑 내곁에 : 김현식 [엽기유머] 아직도 터키 형제의 나라 드립이 먹힌다는게 엽기 한국과 터키가 형제국이 된 것은 고구려와 돌궐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터키가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건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였던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환단고기라는 판타지 소설책의 내용을 사실인양 홍보하던 붉은악마란 단체가 터키 응원을 주도하면서 퍼뜨렸던 것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당시 주위엔 중국, 일본, 북한 등 우리 역사에 아픔을 주었던 이웃들 뿐이었고,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는 미국도 당시 벌어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해 반미감정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라 한국인들은 꽤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등장한 '터키가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아주 반갑게 다가왔을 겁니다. 가깝지는 않더라도 이 지구상에 한국을 지지해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소리니까요.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게 된 이 이야기는 급기야 한국과 터키의 3.4위전 관중석에 대형 태극기와 아이일디즈(터키기)가 동시에 펼쳐지게 만들었고, 이는 방송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터키까지 전해져 터키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덕분에 터키인들이 터키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음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왜 터키가 우리를 형제국으로 생각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형제가 아닌 칸가르데쉬, 즉 피를 나눈 형제로 생각하는지 말이죠. 6.25 전쟁때 터키가 미국에 이어 2번째 규모로 파병을 단행했던 것이 그 첫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15000명을 파병한 터키군에서는 3500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발생했죠. 대단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체 왜 터키가 한국에 파병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주장이 '원래 터키는 고구려 때부터 우리를 형제로 생각해왔고 그때문에 형제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파병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정통을 이어받은 국가를 남한으로 한정했다는 그 발상도 웃기지만, 아무튼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수당시절 고구려와 터키의 전신인 돌궐이 동맹을 맺고 중국에 대항을 했었고, 터키에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자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럴듯한 내용은 순식간에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옮겨져 사실인 양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제 조카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국사교사란 양반이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합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구려와 돌궐이 형제를 운운할 정도로 깊은 동맹관계였던 적이 있었는가? 과연 터키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가? 제가 가진 역사지식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관련 자료들을 뒤지며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몇가지 기록을 살피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동로마제국의 역사가 Theophylactus Simocatta가 613년에 저술한 《Historiam》이란 역사서의 <VII. Origin of the Avars>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륙의 북부 전체를 지배했던 강력한 유목민족인 Avars는 그들의 서쪽 관할구에서 흥기한 신흥민족 Turks에게 멸망당했다.그리고 그 잔당들은 Turks로부터 동남쪽으로 1500마일 떨어진 Taugast로 달아났다. Taugast는 India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국가인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barbarian들은 매우 용감하고 그 수가 많아 세상에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 그곳에서 Avars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Taugast의 공격을 받고 다시 한번 비참하게 몰락하여 Taugast와 동쪽으로 이웃해있는 Mouxri로 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 Mouxri라 불리는 나라의 국민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일상처럼 행해지는 혹독한 군사훈련으로 그 투지가 매우 높았다. ...So, when the Avars had been defeated (for we are returning to the account), some of them made their escape to those who inhabit Taugast. Taugast is a famous city, which is a total of one thousand five hundred miles distant from those who are called Turks, and which borders on the Indians. The barbarians whose abode is near Taugast are a very brave and numerous nation, and without rival in size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Others of the Avars, who declined to humbler fortune because of their defeat, came to those who are called Mucri; this nation is the closest neighbor to the men of Taugast; it has great might in battle both because of its daily practice of drill and because of endurance of spirit in danger. http://faction.co.kr/140095546231 여기서 일반적으로 Avars는 유연, Turks는 돌궐, Taugast는 북제(탁발선비), Mouxri는 고구려로 비정합니다. 돌궐은 시베리아에 있었던 고구려의 강력한 동맹 유연을 멸망시키며 등장한 유목국가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유연의 잔존 세력들은 돌궐에 쫓겨 북제로 달아났다가 그곳에서도 쫓겨 결국 고구려에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돌궐이 자신들의 적과 동맹이었던 고구려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고구려로서도 돌궐의 등장은 위협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기록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양원왕 7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을 9월에 돌궐이 와서 신성을 에워 쌌다가 이기지 못하고 백암성으로 옮겨 공격하므로 왕이 장군 고흘을 시켜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대항하게 하여 이기고 적 1000여명을 살획하였다. 秋九月, 突厥來圍新城, 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 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 양원왕 7년은 A.D.551년으로, 552년 초 돌궐이 지금의 하북성 북단인 회황진 북쪽에서 유연을 격파하였으므로 551년에 돌궐이 신성까지 진출하긴 어려울 것이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수서> 권84 돌궐전 문제 개황 2년(A.D.582)의 조서내용에 "왕년에 돌궐의 이계찰이 고려 말갈에 크게 격파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시기가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돌궐의 동방진출 초기인 582년 이전 양자간에 어느정도의 충돌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라 진흥왕이 함흥까지 진출하는 상황에서도 고구려가 그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서북방의 돌궐이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또, 당시 고구려 주변국들의 동향을 살펴보아도 돌궐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당서> 권199 말갈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말갈은 무릇 수십 부로 나뉘어 있으며, 그 각각에 추수(酋帥)가 있어 혹은 고려에 복속하고 혹은 돌궐에 신속하였다. 其國凡爲數十部, 各有酋帥, 或附於高麗, 或臣於突厥. 기존에 대체로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있던 말갈의 일부 세력이 돌궐에 신속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돌궐의 영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말갈은 속말말갈(후에 발해를 세운 말갈인 대조영의 출신부, 구당서 권 39 지리지 2 하북도 신주 및 여주조에 속말말갈을 부유말갈로도 적고 있고, 후에 속말말갈의 돌지계가 부여후로 책봉된 것으로 보아 속말말갈은 멸망한 부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로, 마침 돌궐이 실위에 지방관인 토둔을 두며 고구려 서북방면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6세기 후반 고구려를 자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수서 권81 동이 말갈전) 속말부는 고려와 접하고 있으며, 승병이 수천이고 대부분 용맹하여 자주 고려에 침공하고 노략질하였다. 粟末部, 與高麗相接, 勝兵數千, 多驍武, 每寇高麗中 그런데 동시기 속말말갈은 돌궐과는 싸운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속말말갈의 북쪽에 위치한 실위까지 남진한 돌궐에 속말말갈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돌궐에 신속했다는 말갈(或臣於突厥)은 이 속말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83년 돌궐이 양분되어 수에게 대파되는 시기, 속말말갈은 고구려에게 패해 돌지계 등이 속말말갈의 8부 승병 수천명을 이끌고 수에 내부하게 됩니다(태평환우기 권 71 하북도 연주조 인용 북번풍속기). 이는 속말말갈이 그간 돌궐의 후방지원에 힘입어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줍니다. 또한 547년 이후 물길의 퇴조와 함께 끊겼던 중국에 대한 조공이 563년부터 말갈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위서, 북제서, 책부원구 조공문에 의해 노태돈이 작성한 표 참고)되는데요, 고구려사의 권위자 노태돈교수는 물길(勿吉)과 말갈(靺鞨)의 고음운이 똑같이 Mat-kat으로 같은 민족을 지칭한다고 해도 그 음사의 변동은 그 정치적 주체가 바뀐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고구려와 극렬한 항쟁을 한 속말말갈로 꼽았습니다. 노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속말말갈이 조공을 하러 가기 위해선 고구려의 세력권인 요동을 거쳐 현재의 랴오닝성 차오양 지역인 유성에 진입하는것이 가장 빠르나 고구려가 이를 허락할리가 없고, 거란을 통과하자니 당시 속말말갈과 거란은 해마다 전투를 치루는 적대적 관계(其國西北與契丹相接, 每相劫掠, 수서 말갈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거란의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우회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루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곳은 돌궐의 영역이었으므로 돌궐을 우방으로 두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하는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수서 거란전에 의하면 거란 역시도 고구려와 돌궐의 핍박을 받으며(當後魏時, 爲高麗所侵, 部落萬餘口求內附, 止于白比河. 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각각에 차례로 복속되다 수가 강해지자 수에 내부하게 됩니다. 즉 고구려와 돌궐이 전쟁을 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두개 뿐이지만, 속말말갈과 거란의 당시 동향을 보았을때 양자는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돌궐이 우호적이었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당서> 권75 위운기전과 <신당서> 권116 위운기전, <자치통감> 권180 수기 4 양제 대업 원년(A.D.60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이 영주지역에 들어와 노략질을 하니 위운기에게 명을 내려 돌궐의 병사를 이끌고서 거란부락을 토벌하도록 보냈다. 돌궐의 계민가한이 병사 2만명을 동원했다. (중략) 운기가 거란의 경계에 들어갈 때에 돌궐의 병사 2만을 상인단으로 위장시켜 유성에서 고려와 교역하러 간다고 거란에게 속이고, 무리 가운데 수나라 사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감히 말하는 자는 죽여버렸다. 거란이 방어를 하지 않았다. 會契丹入抄營州, 詔雲起護突厥兵 往討契丹部落 啓民可汗發騎 (중략) 雲起旣入其界, 使突厥詐云向柳城郡 欲共高麗貿易. 勿言營中有隋使, 敢漏泄者斬之. 契丹不備 거란이 동돌궐과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2만명 규모의 교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이러한 교역이 몇차례 행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구려와 돌궐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607년, 수 양제는 동돌궐의 수장 계민가한이 고구려 사신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 18년, 내용 길어 원문 생략). 두 나라의 연합 가능성에 격분한 양제는 고구려에게 위협을 가하고 결국 4년 후 고구려를 친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에 지나치게 굴종적인 계민가한의 태도와 돌궐이 고구려를 도운 흔적이 없는것을 볼때 돌궐과 고구려의 연합은 시도 단계에서 끝나버린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수가 내부분열을 일으켰을때 돌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강성해져 고구려따위(?)와 연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곧이어 중국에 새로이 등장한 당 왕조에 굴복해 당의 고구려 원정에 다수의 돌궐인들이 동참(호쇼촤이담 퀼테긴비문)하게 됩니다. 즉, 고구려와 돌궐이 우호적, 혹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였던 기간은 길어봤자 돌궐이 수에게 굴복하기 시작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의 20여년 뿐이었고, 이 기간 내에서도 동맹이라고 까지 불릴 만한 관계가 형성된 적은 없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궐이 고구려와 피를 나눈 형제라 수당과 함께 맞서 싸웠었고, 이런 역사를 터키에서도 교육해 지금도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국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퍼지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정말 터키 교과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실었나 궁금하여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미 터키 대사관에 누군가 질문글을 올려놓은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사관측의 답변도 되어 있었구요. 질문: 터키역사교과서에서 '돌궐과 고구려'에 관한 이야기 사실인가요? [ 등록일 : 2006.06.15 ] 답변: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을 저희 공관 홈페이지에 남기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터키 교육부에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를 요청, 확인해 본 결과, 고구려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말도 당시에 쓰여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투르크가 돌궐의 다른 발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터키역사에서는 '굑 튜르크'로 알려진 국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인들은 터키를 튜르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튜르키예'라고 부르며, 튜르크는 터키인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ttp://www.mofat.go.kr/incboard/minwondetail.jsp?txtBoardId=M0023&txtBoardSeqNo=142505&txtCurrPage=1&txtLineNo=10&txtSerItem=TITLE&txtSerStr=고구려&txtPwd=&Category=tur-ankara&txtResultURL=sciconfirm.jsp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와의 동맹에 관련된 내용은 커녕 고구려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물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분들도 많지만)이 사실처럼 믿고 있었던 이야기가 완벽한 날조였던 것입니다. 사실 터키인들이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로 부르게 된 배경에는 이슬람권 특유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인 터키인들에게 피를 나눈 형제, 즉 칸가르데쉬라는 표현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람 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관계되는 나라들에는 사이가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모두 칸가르데쉬로 부른다고 합니다. 터키와 인접한 주변국들은 물론 유럽 국가, 중국 일본에게도 이러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 터키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을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실익을 보았습니다. 한국 역시 터키에게 이익을 주는 수많은 형제국중 하나인 칸가르데쉬 코리아가 된 것이죠. 몇달 전, 우리나라로 치면 파코즈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터키의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Donanim Haber에서 "터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제국가는(En sevdiğiniz kardeş ülke hangisi)?" 이란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forum.donanimhaber.com/m_28302100/mpage_2/tm.htm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한국,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기타의 항목중 한국은 1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태극기보다 큰 대형 터키기를 흔들며 형제를 반겼던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설문의 댓글들에는 일본, 쿠바,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등 수많은 나라들이 형제국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식민지배 했던 일본의 경우 수차례 언급되며 강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14%나 차지하며 선전한 건, 월드컵때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결국 터키인들에게 한국은 고구려 돌궐 관계사와는 관계없이 그저 한국전쟁때 인연이 있었던 친근한 국가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터키와 한국이 돌궐과 고구려 때부터 혈맹국이었다는 날조문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던 걸까요? 저는 사실 엉터리 선동문을 작성한 주인공보다, 날조된 내용에 감동받아 사실관계를 파악지도 않고 퍼다 나르기에 열심히였던 한국인들의 고질적 습성이 안쓰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도 네이트나 아고라에 상주하는 네티즌들의 행태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게시판과 댓글란엔 각종 음모론과 루머가 넘쳐나고 읽는 사람들은 먼저 의심하기 보단 고개를 끄덕이며 추천 버튼부터 닥치는대로 눌러댑니다. 2002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에게 먼저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가르쳐주는대로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주입식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같은 대한민국의 멍청한 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출처:http://faction.co.kr/140113894243 시원한냉면님 블로그 요약: 형제의 나라(칸카르데쉬) 는 외교적 언사이다. 고구려와 돌궐은 그다지 친한 외교관계가 아니다. 터키교과서에는 우리나라를 가르키지 않는다. 625전쟁에도 형제의 나라라서 참전한게 아니라 당시 흑해를 둘러싼 소련과의 마찰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거기에 서방국가와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해서임. 덕분에 전후에 터키는 바로 나토가입함. 625참전국 중 2위가 아닌 4위에 해당하는 참전국 미국 1,789,000영국 56,000캐나다 25,687터키 14,936호주 8,407필리핀 7,420타이 6,326 물론 625전쟁시 도움은 상당한 은혜인건 사실이고 양국간 외교관계도 상당히 친밀한 것은 맞지만 궂이 왜곡까지 하면서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엽기유머] 아직도 터키 형제의 나라 드립이 먹힌다는게 엽기 한국과 터키가 형제국이 된 것은 고구려와 돌궐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터키가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건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였던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환단고기라는 판타지 소설책의 내용을 사실인양 홍보하던 붉은악마란 단체가 터키 응원을 주도하면서 퍼뜨렸던 것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당시 주위엔 중국, 일본, 북한 등 우리 역사에 아픔을 주었던 이웃들 뿐이었고,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는 미국도 당시 벌어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해 반미감정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라 한국인들은 꽤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등장한 '터키가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아주 반갑게 다가왔을 겁니다. 가깝지는 않더라도 이 지구상에 한국을 지지해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소리니까요.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게 된 이 이야기는 급기야 한국과 터키의 3.4위전 관중석에 대형 태극기와 아이일디즈(터키기)가 동시에 펼쳐지게 만들었고, 이는 방송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터키까지 전해져 터키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덕분에 터키인들이 터키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음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왜 터키가 우리를 형제국으로 생각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형제가 아닌 칸가르데쉬, 즉 피를 나눈 형제로 생각하는지 말이죠. 6.25 전쟁때 터키가 미국에 이어 2번째 규모로 파병을 단행했던 것이 그 첫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15000명을 파병한 터키군에서는 3500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발생했죠. 대단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체 왜 터키가 한국에 파병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주장이 '원래 터키는 고구려 때부터 우리를 형제로 생각해왔고 그때문에 형제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파병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정통을 이어받은 국가를 남한으로 한정했다는 그 발상도 웃기지만, 아무튼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수당시절 고구려와 터키의 전신인 돌궐이 동맹을 맺고 중국에 대항을 했었고, 터키에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자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럴듯한 내용은 순식간에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옮겨져 사실인 양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제 조카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국사교사란 양반이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합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구려와 돌궐이 형제를 운운할 정도로 깊은 동맹관계였던 적이 있었는가? 과연 터키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가? 제가 가진 역사지식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관련 자료들을 뒤지며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몇가지 기록을 살피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동로마제국의 역사가 Theophylactus Simocatta가 613년에 저술한 《Historiam》이란 역사서의 <VII. Origin of the Avars>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륙의 북부 전체를 지배했던 강력한 유목민족인 Avars는 그들의 서쪽 관할구에서 흥기한 신흥민족 Turks에게 멸망당했다.그리고 그 잔당들은 Turks로부터 동남쪽으로 1500마일 떨어진 Taugast로 달아났다. Taugast는 India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국가인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barbarian들은 매우 용감하고 그 수가 많아 세상에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 그곳에서 Avars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Taugast의 공격을 받고 다시 한번 비참하게 몰락하여 Taugast와 동쪽으로 이웃해있는 Mouxri로 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 Mouxri라 불리는 나라의 국민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일상처럼 행해지는 혹독한 군사훈련으로 그 투지가 매우 높았다. ...So, when the Avars had been defeated (for we are returning to the account), some of them made their escape to those who inhabit Taugast. Taugast is a famous city, which is a total of one thousand five hundred miles distant from those who are called Turks, and which borders on the Indians. The barbarians whose abode is near Taugast are a very brave and numerous nation, and without rival in size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Others of the Avars, who declined to humbler fortune because of their defeat, came to those who are called Mucri; this nation is the closest neighbor to the men of Taugast; it has great might in battle both because of its daily practice of drill and because of endurance of spirit in danger. http://faction.co.kr/140095546231 여기서 일반적으로 Avars는 유연, Turks는 돌궐, Taugast는 북제(탁발선비), Mouxri는 고구려로 비정합니다. 돌궐은 시베리아에 있었던 고구려의 강력한 동맹 유연을 멸망시키며 등장한 유목국가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유연의 잔존 세력들은 돌궐에 쫓겨 북제로 달아났다가 그곳에서도 쫓겨 결국 고구려에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돌궐이 자신들의 적과 동맹이었던 고구려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고구려로서도 돌궐의 등장은 위협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기록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양원왕 7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을 9월에 돌궐이 와서 신성을 에워 쌌다가 이기지 못하고 백암성으로 옮겨 공격하므로 왕이 장군 고흘을 시켜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대항하게 하여 이기고 적 1000여명을 살획하였다. 秋九月, 突厥來圍新城, 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 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 양원왕 7년은 A.D.551년으로, 552년 초 돌궐이 지금의 하북성 북단인 회황진 북쪽에서 유연을 격파하였으므로 551년에 돌궐이 신성까지 진출하긴 어려울 것이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수서> 권84 돌궐전 문제 개황 2년(A.D.582)의 조서내용에 "왕년에 돌궐의 이계찰이 고려 말갈에 크게 격파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시기가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돌궐의 동방진출 초기인 582년 이전 양자간에 어느정도의 충돌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라 진흥왕이 함흥까지 진출하는 상황에서도 고구려가 그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서북방의 돌궐이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또, 당시 고구려 주변국들의 동향을 살펴보아도 돌궐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당서> 권199 말갈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말갈은 무릇 수십 부로 나뉘어 있으며, 그 각각에 추수(酋帥)가 있어 혹은 고려에 복속하고 혹은 돌궐에 신속하였다. 其國凡爲數十部, 各有酋帥, 或附於高麗, 或臣於突厥. 기존에 대체로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있던 말갈의 일부 세력이 돌궐에 신속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돌궐의 영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말갈은 속말말갈(후에 발해를 세운 말갈인 대조영의 출신부, 구당서 권 39 지리지 2 하북도 신주 및 여주조에 속말말갈을 부유말갈로도 적고 있고, 후에 속말말갈의 돌지계가 부여후로 책봉된 것으로 보아 속말말갈은 멸망한 부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로, 마침 돌궐이 실위에 지방관인 토둔을 두며 고구려 서북방면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6세기 후반 고구려를 자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수서 권81 동이 말갈전) 속말부는 고려와 접하고 있으며, 승병이 수천이고 대부분 용맹하여 자주 고려에 침공하고 노략질하였다. 粟末部, 與高麗相接, 勝兵數千, 多驍武, 每寇高麗中 그런데 동시기 속말말갈은 돌궐과는 싸운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속말말갈의 북쪽에 위치한 실위까지 남진한 돌궐에 속말말갈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돌궐에 신속했다는 말갈(或臣於突厥)은 이 속말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83년 돌궐이 양분되어 수에게 대파되는 시기, 속말말갈은 고구려에게 패해 돌지계 등이 속말말갈의 8부 승병 수천명을 이끌고 수에 내부하게 됩니다(태평환우기 권 71 하북도 연주조 인용 북번풍속기). 이는 속말말갈이 그간 돌궐의 후방지원에 힘입어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줍니다. 또한 547년 이후 물길의 퇴조와 함께 끊겼던 중국에 대한 조공이 563년부터 말갈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위서, 북제서, 책부원구 조공문에 의해 노태돈이 작성한 표 참고)되는데요, 고구려사의 권위자 노태돈교수는 물길(勿吉)과 말갈(靺鞨)의 고음운이 똑같이 Mat-kat으로 같은 민족을 지칭한다고 해도 그 음사의 변동은 그 정치적 주체가 바뀐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고구려와 극렬한 항쟁을 한 속말말갈로 꼽았습니다. 노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속말말갈이 조공을 하러 가기 위해선 고구려의 세력권인 요동을 거쳐 현재의 랴오닝성 차오양 지역인 유성에 진입하는것이 가장 빠르나 고구려가 이를 허락할리가 없고, 거란을 통과하자니 당시 속말말갈과 거란은 해마다 전투를 치루는 적대적 관계(其國西北與契丹相接, 每相劫掠, 수서 말갈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거란의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우회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루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곳은 돌궐의 영역이었으므로 돌궐을 우방으로 두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하는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수서 거란전에 의하면 거란 역시도 고구려와 돌궐의 핍박을 받으며(當後魏時, 爲高麗所侵, 部落萬餘口求內附, 止于白比河. 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각각에 차례로 복속되다 수가 강해지자 수에 내부하게 됩니다. 즉 고구려와 돌궐이 전쟁을 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두개 뿐이지만, 속말말갈과 거란의 당시 동향을 보았을때 양자는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돌궐이 우호적이었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당서> 권75 위운기전과 <신당서> 권116 위운기전, <자치통감> 권180 수기 4 양제 대업 원년(A.D.60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이 영주지역에 들어와 노략질을 하니 위운기에게 명을 내려 돌궐의 병사를 이끌고서 거란부락을 토벌하도록 보냈다. 돌궐의 계민가한이 병사 2만명을 동원했다. (중략) 운기가 거란의 경계에 들어갈 때에 돌궐의 병사 2만을 상인단으로 위장시켜 유성에서 고려와 교역하러 간다고 거란에게 속이고, 무리 가운데 수나라 사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감히 말하는 자는 죽여버렸다. 거란이 방어를 하지 않았다. 會契丹入抄營州, 詔雲起護突厥兵 往討契丹部落 啓民可汗發騎 (중략) 雲起旣入其界, 使突厥詐云向柳城郡 欲共高麗貿易. 勿言營中有隋使, 敢漏泄者斬之. 契丹不備 거란이 동돌궐과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2만명 규모의 교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이러한 교역이 몇차례 행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구려와 돌궐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607년, 수 양제는 동돌궐의 수장 계민가한이 고구려 사신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 18년, 내용 길어 원문 생략). 두 나라의 연합 가능성에 격분한 양제는 고구려에게 위협을 가하고 결국 4년 후 고구려를 친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에 지나치게 굴종적인 계민가한의 태도와 돌궐이 고구려를 도운 흔적이 없는것을 볼때 돌궐과 고구려의 연합은 시도 단계에서 끝나버린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수가 내부분열을 일으켰을때 돌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강성해져 고구려따위(?)와 연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곧이어 중국에 새로이 등장한 당 왕조에 굴복해 당의 고구려 원정에 다수의 돌궐인들이 동참(호쇼촤이담 퀼테긴비문)하게 됩니다. 즉, 고구려와 돌궐이 우호적, 혹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였던 기간은 길어봤자 돌궐이 수에게 굴복하기 시작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의 20여년 뿐이었고, 이 기간 내에서도 동맹이라고 까지 불릴 만한 관계가 형성된 적은 없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궐이 고구려와 피를 나눈 형제라 수당과 함께 맞서 싸웠었고, 이런 역사를 터키에서도 교육해 지금도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국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퍼지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정말 터키 교과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실었나 궁금하여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미 터키 대사관에 누군가 질문글을 올려놓은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사관측의 답변도 되어 있었구요. 질문: 터키역사교과서에서 '돌궐과 고구려'에 관한 이야기 사실인가요? [ 등록일 : 2006.06.15 ] 답변: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을 저희 공관 홈페이지에 남기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터키 교육부에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를 요청, 확인해 본 결과, 고구려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말도 당시에 쓰여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투르크가 돌궐의 다른 발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터키역사에서는 '굑 튜르크'로 알려진 국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인들은 터키를 튜르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튜르키예'라고 부르며, 튜르크는 터키인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ttp://www.mofat.go.kr/incboard/minwondetail.jsp?txtBoardId=M0023&txtBoardSeqNo=142505&txtCurrPage=1&txtLineNo=10&txtSerItem=TITLE&txtSerStr=고구려&txtPwd=&Category=tur-ankara&txtResultURL=sciconfirm.jsp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와의 동맹에 관련된 내용은 커녕 고구려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물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분들도 많지만)이 사실처럼 믿고 있었던 이야기가 완벽한 날조였던 것입니다. 사실 터키인들이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로 부르게 된 배경에는 이슬람권 특유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인 터키인들에게 피를 나눈 형제, 즉 칸가르데쉬라는 표현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람 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관계되는 나라들에는 사이가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모두 칸가르데쉬로 부른다고 합니다. 터키와 인접한 주변국들은 물론 유럽 국가, 중국 일본에게도 이러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 터키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을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실익을 보았습니다. 한국 역시 터키에게 이익을 주는 수많은 형제국중 하나인 칸가르데쉬 코리아가 된 것이죠. 몇달 전, 우리나라로 치면 파코즈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터키의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Donanim Haber에서 "터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제국가는(En sevdiğiniz kardeş ülke hangisi)?" 이란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forum.donanimhaber.com/m_28302100/mpage_2/tm.htm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한국,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기타의 항목중 한국은 1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태극기보다 큰 대형 터키기를 흔들며 형제를 반겼던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설문의 댓글들에는 일본, 쿠바,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등 수많은 나라들이 형제국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식민지배 했던 일본의 경우 수차례 언급되며 강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14%나 차지하며 선전한 건, 월드컵때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결국 터키인들에게 한국은 고구려 돌궐 관계사와는 관계없이 그저 한국전쟁때 인연이 있었던 친근한 국가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터키와 한국이 돌궐과 고구려 때부터 혈맹국이었다는 날조문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던 걸까요? 저는 사실 엉터리 선동문을 작성한 주인공보다, 날조된 내용에 감동받아 사실관계를 파악지도 않고 퍼다 나르기에 열심히였던 한국인들의 고질적 습성이 안쓰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도 네이트나 아고라에 상주하는 네티즌들의 행태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게시판과 댓글란엔 각종 음모론과 루머가 넘쳐나고 읽는 사람들은 먼저 의심하기 보단 고개를 끄덕이며 추천 버튼부터 닥치는대로 눌러댑니다. 2002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에게 먼저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가르쳐주는대로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주입식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같은 대한민국의 멍청한 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출처:http://faction.co.kr/140113894243 시원한냉면님 블로그 요약: 형제의 나라(칸카르데쉬) 는 외교적 언사이다. 고구려와 돌궐은 그다지 친한 외교관계가 아니다. 터키교과서에는 우리나라를 가르키지 않는다. 625전쟁에도 형제의 나라라서 참전한게 아니라 당시 흑해를 둘러싼 소련과의 마찰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거기에 서방국가와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해서임. 덕분에 전후에 터키는 바로 나토가입함. 625참전국 중 2위가 아닌 4위에 해당하는 참전국 미국 1,789,000영국 56,000캐나다 25,687터키 14,936호주 8,407필리핀 7,420타이 6,326 물론 625전쟁시 도움은 상당한 은혜인건 사실이고 양국간 외교관계도 상당히 친밀한 것은 맞지만 궂이 왜곡까지 하면서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글터] 대한민국의 풍요는 수많은 희생에서 얻어졌다...... 최근 천안함 1주기, 일본지진, 리비아사태에 묻혔던 기사 중에 찡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육군 39사단 장병들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 격전지서 유해 발굴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기사였습니다.이 일대는 낙동강 돌출지점으로 6.25 전쟁 당시 미 24사단과 한국군 민병대가 1950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남진하던 북한군 4사단을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치뤘던 곳이라고 합니다.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현지 주민의 제보로 한결 수월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보를 준 마을 주민은 전쟁 발발 당시 5살 밖에 안 된 꼬마아이였지만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또렷이 기억해 이번 유해 발굴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유해발굴에 도움을 주신 마을 주민 분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 역시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텐데 사실상 젊은 세대들의 경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기사가 보도 되도 관심은 고사하고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대다수죠...이 유골들이야 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 자유, 번영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깊은 땅 속에 묻힌 이름 모를 장병들이 흘린 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제공해 준 것인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네요.비록 전쟁을 겪진 못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최근 겪었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떠올리며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해 발굴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길 바랄뿐입니다.
[좋은글터] 대한민국의 풍요는 수많은 희생에서 얻어졌다...... 최근 천안함 1주기, 일본지진, 리비아사태에 묻혔던 기사 중에 찡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육군 39사단 장병들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 격전지서 유해 발굴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기사였습니다.이 일대는 낙동강 돌출지점으로 6.25 전쟁 당시 미 24사단과 한국군 민병대가 1950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남진하던 북한군 4사단을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치뤘던 곳이라고 합니다.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현지 주민의 제보로 한결 수월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보를 준 마을 주민은 전쟁 발발 당시 5살 밖에 안 된 꼬마아이였지만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또렷이 기억해 이번 유해 발굴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유해발굴에 도움을 주신 마을 주민 분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 역시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텐데 사실상 젊은 세대들의 경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기사가 보도 되도 관심은 고사하고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대다수죠...이 유골들이야 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 자유, 번영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깊은 땅 속에 묻힌 이름 모를 장병들이 흘린 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제공해 준 것인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네요.비록 전쟁을 겪진 못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최근 겪었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떠올리며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해 발굴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길 바랄뿐입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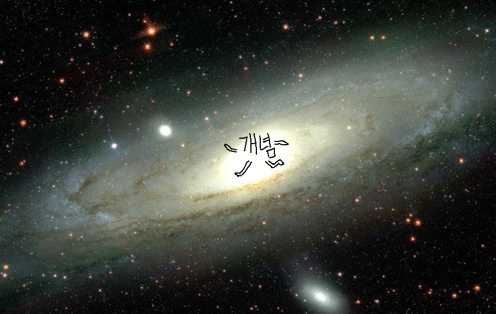 [무서운글터] 세계 고대 건축물들의 미스테리 *스압! [세계7대 불가사의] 1.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pyramid) 피라미드에 대해 현재 남아 있는 최고(最古)의 기록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bc 5세기)의 <역사 designtimesp=14359 designtimesp=12265> 권2에 있다. 그는 기자의 대(大)피라미드에 관하여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건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쿠푸는 카이로 남서쪽 15 km에 위치한 기자에 최대의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것은 대피라미드 또는 제1피라미드라 일컬어지며, 높이 146.5 m(현재 137 m), 저변 230 m, 사면각도는 51 °52 '이다. 각 능선은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오차는 최대의 것이라도 5 °30 '에 지나지 않은 만큼 극히 정교한 것으로, 피트리에 의하면 평균 2.5 t의 돌을 230만개나 쌓아올렸다. 진정 세계 최대의 석조건물로서 그 장대한 규모와 간결한 미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다. 내부구조는 복잡해서 독일의 보르하르트에 의하면 계획이 2번 변경되었다고 한다. 북측의 지면에서 약간 위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 그대로 하강하면 암반 밑에 설치된 방에 도달한다. 이곳이 제1차 계획의 매장실이고, 그 위에 있는 통칭 ‘왕비의 방’이 제2차 계획의 매장실이다. 그리고 제3차 계획에 의해 피라미드는 완성되었다. 제1피라미드 남서쪽에 카프라왕의 제2피라미드가 있다. 높이 136 m, 밑변 216 m, 동쪽에 있는 장제신전에 450 m의 참배로가 뻗어 하곡신전에 이른다. 유명한 스핑크스는 하곡신전에 가까운 참배로 북쪽에 엎드려 있다. 기자에는 그 밖에 멘카우레왕의 제3피라미드와 왕족들의 소(小)피라미드 6기가 있 다. 2.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pharos) 등대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파로스 섬과 헵타스타디온이라고 불리던 1㎞정도의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곳의 동쪽 끝에 세계의 모든 등대의 원조격인 파로스 등대가 서 있었다. 대부분이 대리석 돌로된 등대의 높이가 135m로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으로 소스트라투스가 만들었다. 등대는 3개의 층계로 만들어졌다. 맨 아래층이 4각형, 가운데층이 8각형, 꼭대기 층은 원통형이었다. 각 층은 모두 약간 안쪽으로 기울게 지어졌다(기울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음). 등대 안쪽에는 나선형의 길이 있어서 등대 꼭대기의 옥탑까지 이어져 있었다. 옥탑 위에는 거대한 동상(여신상)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아마도 알렉산드 대왕이나 태양신 헬리오스의 모양을 본떴을 것으로 여기지고 있다. 등대 꼭대기의 전망대에서는 수십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먼 본토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7c이후 이집트를 정복했던 아랍인들에 따르면 램프 뒤쪽의 반사경으로 비치는 타오르는 불길은 43㎞정도 떨어진 바다에서도 볼 수 있었고, 맑은 날에는 콘스탄티노플까지도 반사경이 비쳤으며 또 햇빛을 반사시키면 160㎞ 정도 떨어져 있는 배도 태울 수 있었다고 한다.b.c280년경에 만들어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등대에 불을 지폈을까?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3.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세미라미스 공중 정원(hanging garden) bc 500년경 신(新)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하여 수도인 바빌론에 건설한 정원이다.실제로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있다는 뜻이다. 지구라트에 연속된 계단식 테라스로 된 노대(露臺)에, 성토하여 풀과 꽃, 수목을 심어놓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삼림으로 뒤덮인 작은 산과 같았다고 한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물을 댔다고 전해진다.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왕비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바빌론의 왕이 되자 메디아 왕국의 키약사레스 왕의 딸 아미티스를 왕비로 맞았다. 산이 많아 과일과 꽃이 풍성한 메디아에서 자란 왕비는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빌론에 마음을 두지 못한 채 항상 아름다운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왕은 왕비를 위하여 메디아에 있는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을 바빌론에 만들기로 결심했다.왕의 명령을 받은 재주가 뛰어난 건축가, 기술자, 미장이들은 곧장 작업에 들어가 왕궁의 광장 중앙에 가로·세로 각각 400m, 높이 15m의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계단식 건물을 세웠다.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에 불과했지만 총 높이가 105m로 오늘날의 30층 빌딩 정도의 높이었다. 한 층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수천톤의 기름진 흙을 옮겨 놓고 넓은 발코니에 잘 다듬은 화단을 꾸며 꽃이랑 덩굴초랑 과일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한 이 파라미드형의 정원은 마치 아름다운 녹색의 깔개를 걸어놓은 듯이 보였다.그런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곳에서 이렇게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의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펌프로 길어 올리고 그 물을 펌프로 각 층에 대어줌으로써 화단에 적당한 습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그때그때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정원의 아랫부분에는 항상 서늘함을 유지하는 방을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창 너머로 바라보는 꽃과 나무의 모습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또한 방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방 위에는 갈대나 역청을 펴고 그 위에 납으로 만든 두꺼운 판을 놓았다.공중 정원에 대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 바빌론의 페허는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이 남아있다. 4. 에페수스(ephesus)의 artemis 신전 에페수스 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고대 이오니아 지방의 열두 개 도시 중 하나로서 b.c 6세기 경에 이미 서아시에서 상업의 요충지로 번영하여 가중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다. 이 곳을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다.이 신전은 당시 최고 부자였던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b.c 560∼b.c 546)때 세우기 시작하였다. 높이 20미터 정도의 훌륭한 이오니아풍의 백색 대리석 기둥을 127개나 사용한 이 신전은 완성되기 까지 120년이 걸렸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에페수스를 방문하여 이 신전을 돌아보고는, 기자에 있는 피리미드에도 떨어지지 않는 걸작으로 묘사하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그러나 헤로도토스가 에페수스를 방문한 지 1세기 정도 지난 뒤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전은 어리석은 한 인간에 의해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b.c 356. 10월 "어차피 나쁜 일을 하려면 후세에까지 알려질 수 있는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한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자가 신전을 계획적으로 불태워 버린 것이다. 그 후 디노크라테스가 불타 버린 신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에페수스의 여인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석 등을 팔았고, 왕들은 크로이소스 왕을 본받아 기둥을 기증하기도 했다. 더욱이 아시아 원정 길에 올랐던 알렉산더 대왕은 한층 완성중에 있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았겨 "만일 에페수스인이 이 신전을 나의 이름으로 세워준다면 모든 비용을 내가 내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페수스인들은 다른 나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야심이 강한 에페수스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을 지금까지 어떤 신전보다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신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파르테논은 길이가 69m. 폭이 30m, 높이 10정도로서, 대리석 기둥을 58개나 사용한 신전이었다. 에페수스인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의 두 배 정도의 규모로 만들기 시작했다. 높이 18m짜리 기둥을 127개나 사용했고, 길이는 120m, 폭은 60m로 했다. 또한 신전의 건축용 자재는 가장 순도 높은 백색 대리석만을 사용했으며 중앙의 넓은 홀에는 네 방향으로 대리석 계단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게 하였다. 그 규모나 화려함은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다. 5. 올림피아의 제우스(zeus) 신상(神像) 제우스 상이 있는 올림피아는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쪽 앨리스 지방에 있는 제우스의 신역으로서 완만한 구릉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로 예부터 잘 알려져 있다.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최고의 신 제우스를 믿었다. 제우스는 고대 로마의 최고의 신 '주피터'와 같이 고대 그리스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천둥, 번개와 비바람을 만드는 신이며, 그의 주 무기는 벼락이었다. 제우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며,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시마다 제우스 신을 모신 신전을 짓고 성대한 제사를 지냈다.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앨리스 등의 도시 국가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처음에는 땅의 신 크로노스와 여신 헤라를 숭배했지만 뒤에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되어서 b.c457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고 그 안에 '피디아스'가 만든 제우스 상을 안치하였다.제우스 신상과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네 여신상은 피디아스의 2대 걸작품으로 꼽힌다. 피디아스는 8년여의 작업 끝에 제우스 상을 완성했는데, 그는 제우스의 신성함 위엄과 함께 너그러움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걸작 중의 걸작 제우스 상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남아 있지 않다. 대지 위에 우뚝 세워진 신전에는 양옆에 열세 개씩, 양끝에 여섯 개씩 장엄하고 무거운 도리아식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완만하게 기울어진 지붕이 덮여 있다. 이 신전의 한가운데 있는 제우스 상은 높이가 90㎝, 폭이 6.6m인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12m 정도 되는 상은 거의 천장을 닿고 있다.제우스 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그 위에 보석과 흑단, 상아를 박아 장식한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금으로 된 발 디딤대에 올려져 있는 양다리는 거의 예배자의 눈높이와 일치하였다. 오른손에는 금과 상아로 만든 승리의 여신(nike)상을 떠받치고 있으며 왼손에는 황금을 박아 장식한 지팡이(왕홀)를 쥐고 있다. 지팡이 위에는 매가 앉아 있다. 상아로 만들어진 어깨에는 꽃과 동물이 새겨진 황금의 아름다운 망토가 걸쳐져 있다. 제우스 신전의 발굴 움직임이 18세기 경부터 일어났고 처음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다. 1829년 프랑스인이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를 발굴하기 시작하여 메도프, 기둥, 지붕 등의 파편을 발견하였다. 1875년경에 독일 정부의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의해 올림피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우스상이 있던 신전도 거의 드러나게 되었다. 1950년대 제우스 신전 터에서 피디아스의 작업장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제우스 상이 만들어진 연대가 확실히 밝혀졌다. 6. 할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의 마우솔러스 영묘(靈廟) - mausoleum 페르시아 제국 카리아의 총독 마우솔로스를 위하여 그리스의 할리카르나소스에 건조된 장려한 무덤기념물이다.면적 29×35.6 m, 높이 50 m. 할리카르나소스의 묘묘(墓廟)라고도 한다. 마우솔로스의 생전에 착공되었으나, 그가 죽은 뒤 왕비 아르테미시아가 계속 진행하였으나 완성된 시기는 왕비 아르테미시아가 죽은(bc 350) 뒤로 추측된다.설계는 사티로스와 피테오스가 하였다. 동서남북의 장식조각은 각각 스코파스, 레오카레스, 티모테오스, 브리아크시스가 담당하였다.각 면의 조각·프리즈는 발굴되어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또, 로마인은 비슷한 대규모의 분묘건축(墳墓建築)도 마우솔레움이라고 일컬었다. 마우솔레움은 그 특이한 모양과 복잡한 장식 때문에 세계의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혔다. 7. rhodes항구의 크로이소스 거상(巨像) - colossus 거상(巨像). 그리스어 콜로소스에서 유래한다.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 등을 보고나서 칭한 말이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대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로도스섬의 콜로서스이다.로도스 항구에 서 있던 태양신 <헬리오스 청동상 designtimesp=14403 designtimesp=12321>은 높이가 36 m나 되었으며, 린도스(로도스 섬 동쪽에 있던 고대 도시의 이름)의 카리오스에 의해 bc 280년경 건조되었는데 bc 224년의 지진 때 붕괴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현존하는 것도 많으나 모두 기념비적인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7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다. 1. 이집트의 피라미드 2. 로마의 원형극장(콜로세움) 로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유적지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이탈리아어로는 콜로세오(colosseo)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다.콜로세움이란 이름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콜로사레(colossale)에서, 또 하나는 경기장 옆에 네로 황제가 세운 높이 30m의 거대한 금도금 상 콜로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바로 그것인데 전자의 설이 유력하다.콜로세움은 기원후 72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네로 시대의 이완된 국가 질서를 회복한 후, 네로의 황금궁전의 일부인 인공호수을 만들었던 자리에 착공하여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80년) 때 완공하였다. 완성 축하를 위해 100일 동안 경기가 열렸으며, 그 때 5,000마리의 맹수가 도살되었다고 한다. 장대한 타원형 플랜이 있는 투기장은 아치와 볼트를 구사한 로마 건축기술의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조물로서 거대한 바위 축대위에 축조되었으며, 이 축대는 점토질의 인공호수위에 설치되어 지진이나 기타 천재로 인한 흔들림을 흡수하 도록 설계되었다.약 5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제국 최대의 투기장이었다.콜로세움은 최대 지름188 m, 최소 지름 156 m, 둘레 527 m, 높이 57 m의 4층으로 된 타원형 건물인데, 1층은 토스카나 식, 2층은 이오니아 식, 3층은 코린트 식의 둥근기둥으로 각각의 아치가 장식되어 있다. 또한 4층을 제외하고 원기둥과 원기둥 사이에는 아치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조상(彫像)이 놓여 있다.내부는 긴지름 86m, 짧은지름 54m의 아레나(투기장)를 중심으로 카베아(관객석)가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칸칸마다 나누어진 맹수들의 우리 위에 나무로 바닥을 만들어 지상과 지하를 분리시켰는데 지하의 방에는 맹수뿐만 아니라 검투사, 사형수들이 갇혀 있었다. 이 경기장은 지하의 대기실 및 천막 지붕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곳에서는 검투사의 경기, 맹수와의 싸움이 즐겨 행해졌으며, 심지어는 장내에 물을 채워 전투를 하는 모의 해전 등도 벌였다. 제정 초기 크리스트교 박해 시대에는 많은 신도가 이 콜롯세움에서 야수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다.콜로세움은 완공된 이래 300여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계속 벌어지다가 405년 오노리우스 황제가 격투기를 폐지함에 따라 마침내 처참한 역사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그 후 콜로세움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중세 교회를 짓는데 재료로 쓰이기도 해 외벽의 절반이 없어지는 수난을 겪었다.그러다가 18세기 경 교황의 명에 따라 기독교 수난의 현장으로 복구되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3. 영국의 거석기념물(巨石紀念物, 스톤헨지)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환상열석(環狀列石)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조물의 하나인 스톤헨지(stonehenge)는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야(salisbury plain)에 위치하며, 고대 영어로 '공중에 걸쳐 있는 돌'이라는 의미이다.천년전 이 곳엔 초기 석기시대 사람들이 정착했었다.그렇지만 그들은 별 흔적을 남기진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적들은 청동기인들의 업적이다.스톤헨지의 건조가 착수된 것은 기원전 2800년경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완성된 것은 기원전 156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톤헨지는 원형(圓形)의 유적으로 각각의 거석들은 모두 한 중심점을 향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바깥 도랑과 둑, 네모꼴 광장과 방향표시석인 힐스톤, 돌기둥을 세워 놓은 입석군(立石群), 중앙 석조물 등으로 이루어졌다.기원전 2100년경 스톤헨지로부터 자그마치 385km나 떨어진 웨일즈 남서부의 프레슬리산에서 청석(blue stone)이 이 곳으로 운반되어져 왔는데, 최고 5톤까지 나가는 이 돌들을 옮기는 일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썰매나 뗏목을 이용해 육로와 해상을 번갈아 가며 운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스톤헨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향표시석 힐스톤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그것도 하지(夏至)에 해가 뜨는 방향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하지날 힐스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해가 떠올라 중앙제단을 비췄던 시기는 천문학적으로 bc 184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그리고 힐스톤을 세운 시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한 연대와도 맞아 떨어져 기묘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상당한 천문학적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래서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완전히 파악하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환상열석 중심축에서 30m를 벗어난 자리에는「사르센 원」이라고 불리는 둥근 띠가 있다.사르센 원을 따라 가면 두개의 커다란 돌을 세워 놓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을 눕혀 놓은 삼석탑(三石塔)을 만난다.돌 한개의 무게는 25t에서 최고 50t까지 나간다. 기중기와 같은 기구가 없던 당시에 50t 무게의 돌을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는다.학자들은 지레 받침대와 밧줄을 이용해 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과학적인 추측을 할 뿐이다. 4. 이탈리아의 피사 사탑(斜塔) 이탈리아 중서부에 위치한 피사 대성당(duomo di pisa)의 부속건물(대성당, 세례당, 종탑)중 3번째이며 마지막 구조물로써, 중세 도시국가 피사가 팔레르모 해전에서 사라센 함대에 대승한 것을 기념하기위해 세워진 종탑이다.흰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꼭대기 종루를 포함해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는 55.8m, 무게는 14,500t 이나 된다.탑내부는 나선형으로 된 294개의 계단을 통해 종루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종루에는 각각 다른 음계를 가진 7개의 종이 걸려있다.1174년에 착공된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천재건축가 보라노 피사논의 설계도에따라 탑을 만들어가던 중, 3층까지 쌓아올렸을 때 공사관계자들은 지반 한쪽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책임 기술자였던 보나노 피사노는 기울어진 모양을 보정하기 위해 새로 층을 올릴 때 기울어져 짧아진 쪽을 더 높게 만들었으나, 추가된 석재의 무게로 건물은 더욱 가라앉게 되었다.기술자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몇 번씩 공사를 중단했으나 결국 1350년에 맨 꼭대기층이 기울어진 채 완성되었다. 물론 건축당시부터 의도적으로 기울어진 탑을 세운것은 아니다.1년에 1mm정도 기울어지는 미세한 자연 현상이 누적되다보니 오늘날과 같이 탑의 꼭대기가 수직선에서 무려 5m나 기울어졌다.현재는 탑의 기울기가 멈춘 상태다. 최근 영국 런던대학의 토질 기계학과 존 부를랜드 교수는 "피사의 사탑은 이제 기우는 것은 멈췄다. 이는 지난 7세기만에 이룩한 개가"라고 말했다.사탑이 이처럼 위태로운 상태에서도 수천년 동안 용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5. 이스탄불의 성(聖)소피아 성당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은 이스탄불(현재 터키의 수도이며 이슬람이 많은도시라는 뜻)이 비잔틴제국의 수도로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6세기에 건조되었다.비잔틴 문화의 최고 건축물로써 아야 소피아(aya sophia)라는 현지어로 불리며 현재 소피아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현재의 소피아 대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건립된 것(532~537년)으로 세계의 교회 중 4번째(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런던의 성 바울로 성당,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로 크며, 현존하는 교회 중 가장 오래됐다.소피아 대성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360년 나무 지붕의 작은 교회로 지어졌으나, 404년 알카디우스 황제 때 화재로 무너졌으며 그 후 데오도시우스 2세 때 두 번째 성 소피아 대성당이 완공(415년)되었다. 그러나 이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니카의 반란'으로 다시 파괴되었다.니카의 반란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황비인 데오도라(이집트 출신의 댄서) 때문에 생긴 반란이었다.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그러나 그녀가 천민 출신이라는 것과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의 단성론(콘스탄티노플에서는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하느님 자신이라는 양성론을 채택했다)을 믿는다는 것을 빌미로 히포드롬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 반란군의 기세에 눌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난을 피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려 했으나 그를 데오도라가 저지했다.다음 순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히포드롬에서 농성하는 반란군을 단숨에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제2차 소피아 성당이 파괴되었으며, 그 잔해 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제의 권위와 교회의 영광에 걸맞는 새로운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건축가 안테미우스와 수학자 이시도르를 투입하였다.건축을 시작한 후 5년 10개월 만인537년에 소피아 성당은 마침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6. 중국의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중국 역대 왕조가 변경을 방위하기 위해 축조한 대성벽으로써 보하이 만(渤海灣)에서 중앙 아시아까지 지도상의 총연장은 약 2,700km이나, 실제는 약 6,400㎞(중간에 갈라져 나온 가지를 모두 합하여)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유적이다.춘추시대 제(齊)가 영토방위를 위햐여 국경에 쌓은 것이 장성의 기원이며 전국시대의 여러나라도 이에 따랐다. 진(秦) 시황제(始皇帝)는 중국 통일(bc 221) 후 흉노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간쑤성(甘肅省) 남부로부터 북으로, 황하강(黃河江)의 대굴곡부(大屈曲部)의 북쪽을 따라 동으로 뻗어나가, 둥베이(東北) 지구의 랴오허강(遼河) 하류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는데, 절반 이상은 전국시대의 연(燕)·조(趙) 등이 쌓은 장성을 이용한 것이었다.근년에 이 장성의 동부 유지(遺址)가 둥베이지구에서 발견되고 있다.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허시후이랑(河西回廊)을 흉노로부터 지키려고 장성을 란저우(蘭州) 북방에서 서쪽으로 둔황(敦煌) 서편의 위먼관(玉門關)까지 연장하였다. 남북조시대에는 북방민족의 활동으로 장성 위치는 남하하여, 6세기 중엽 북제(北齊)는 다퉁(大同) 북서에서 쥐융관(居庸關)을 거쳐 산하이관(山海關)에 이르는 장성을 축성하였다.수(隋)는 돌궐·거란 방비를 위하여 오르도스(내몽골자치구의 중남부) 남쪽에 장성을 쌓았다.당대(唐代)에 들어서 북쪽까지 판도를 넓혔기 때문에 방어선으로서의 장성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대(五代) 이후에는 장성지대가 북방민족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었다.장성이 현재의 규모로 된 것은 명(明)나라시대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관광 대상이 되고 있는 바다링〔八達嶺〕 근처의 장성은 높이 8.5m, 두께는 밑부분 6.5m, 윗부분 5.7m이며, 위에는 높이 1.7m의 연속된 철자형(凸字形) 담인 성가퀴(城堞)를 만들고 총안(銃眼)을 냈고, 120m 간격으로 돈대(墩臺)를 만들어 군사의 주둔과 감시에 이용하였다.청대(淸代) 이후에는 군사적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본토와 만주·몽골 지역을 나누는 행정적인 경계선에 불과하게 되었다. 7.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 밖에 l.코트렐이 말한 7대 불가사의 ① 크레타섬의 미노스 궁전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센 공주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테세우스는 트로이센에서 자랐다. 아버지인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에게 테세우스가 자라서 큰 바위를 들어내고 그 아래 감춰 둔 칼과 구두를 꺼낼 수 있을 만큼 장성한 후에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다. 테세우스가 장성한 후 아이트라는 아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테세우스는 그 큰 바위를 간단히 들어내고 칼과 구두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났다. 테세우스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아테네에 도착했다. 당시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부인은 마법사인 메데이아였는데 그녀는 마법으로 이 청년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테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독이 든 술을 권했다. 테세우스가 왕의 앞에 나가 독이 든 술잔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 아이게우스는 청년의 칼과 구두를 보고 자기 자식임을 눈치챘다. 그리고는 그 술잔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소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아시아로 도망을 갔고 테세우스는 친자 인정을 받아 왕위계승자로 결정되었다.당시 아테네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당시 강국이었던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청년과 처녀들을 각각 7명씩 산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해 온 것이었다. 미노스는 몸은 인간이고 머리는 황소인 미노타우로스에게 젊은 남녀를 먹이로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동물은 힘이 장사에다 성질이 난폭해서 특수 설계한 미궁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 이 궁전이 미노스 궁전 혹은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것이다. 테세우스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제물의 한명으로 자원해서 이 괴물을 처치하기로 마음먹었다.케세우스는 출항 전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만일 성공하면 검은 돛 대신 흰 돛을 배에 달고 돌아오기로 말이다. 크레타에 도착한 일행은 미노스 앞에 끌려 갔다. 이 때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는 일행 중에 끼어 있는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렸다. 아이아드네는 미궁의 비밀을 귀띔해 주면서 칼 한 자루와 실 타래를 주었다. 테세우스는 실 타래를 풀면서 미궁 안으로 들어가 괴물을 죽인 후 다시 실 타래를 따라 무사히 빠져 나왔다. 테세우스는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흰 돛을 단다는 것을 깜빡 잊어 버렸다. 이것을 멀리서 본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자결하고 말았다.이것이 궁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실재로 그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무도 그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트로이를 발굴하고 미케네, 티린스를 발굴한 독일의 쉴리만은 현지 총독과 협상하여 발굴권을 겨우 얻어냈다. 궁전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지주와 흥정을 했다. 지주는 2500그루의 올리브 나무 가격을 받아야 한다며 10만 프랑을 요구했다. 결국 4만프랑에 합의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던 중 나무가 888그루밖에 되지 않자 쉴리만은 화가 나서 발굴작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10여년 후 영국인 아서 에반스(arthur evans)가 상형문자 해석에 관한 그의 이론을 확인하고 위해서 크레타 섬에 오게 되었다. 그는 쉴리만이 했던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을 궁전의 위치라고 생각했다. 올리브 나무가 있던 지역은 크레타의 수도 헤라크 레이온(혹은 이라크 레이온)에서 5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었다. 에반스는 신화에서처럼 크레타에 반드시 미노스의 크노소스 궁전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발굴에 착수했다.발굴을 시작한 후, 거대한 궁전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이 1천개가 넘는 궁전은 3~4층으로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각방은 층계를 통해 각 층을 연결하고 있었다. 크노소스 궁전은 다이달로스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알려준 미궁 탈출 방법도 그가 알려준 것이라 한다. 궁전 안에는 수도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수도 시설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각 방의 밝기는 광정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 건물 내부를 밝혔다. 이 광정은 지붕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관통하는 공간인데 이것이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그들의 건축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방과 복도의 벽에는 화려한 프레스코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장난치며 물 속을 헤엄치는 돌고래들, 젊은 청년과 머리를 길게 땋은 젊은 여인들의 행렬, 돌진하는 황소와 곡예사들 등이 벽화를 장식하고 있다. 궁전 안에는 거대한 꽃병들이 발견되었는데 꽃병에는 문어가 한 마리씩 그려져 볼록한 꽃병의 윤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또 궁전 곳곳에서 라비린토스(lavyrinthos)라고 부르는 '쌍날도끼'가 발굴되었다. 이 쌍날 도끼는 일종의 종교 의식의 상징으로 많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악귀를 쫓는다든지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아 받치는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창고였던 것 같다. 이 항아리 모두에 올리브 기름을 채운다면 19,000갤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된다. 이 곳에서는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옥좌가 발굴되었다. 신하들이 앉는 긴 의자 사이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 몸에 독수리 머리와 날개의 괴물인 그리핀 두 마리가 새겨져 있는 옥좌이다. 아직도 의문인 것은 크노소스 궁전과 화려하던 미노아 문명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이다.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지진 등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궁전을 발굴해 낸 에반스는 궁전의 방에서 갑작스런 재해의 증거를 발견했다. 연장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완성되지 못한 예술 작품, 가사 도구가 그대로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크레타가 유럽에서 지진 활동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 재해에 의한 멸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에반스도 강도 높은 지진만이 크노소스 궁전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학자들은 에반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② 테베·네크로폴리스(묘지) 이집트의 룩소르에는 왕들의 무덤인 왕가의 계곡이 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 귀족들의 무덤인 네크로폴리스가 그것이다. 어떤 이들은 왕가의 계곡보다 귀족들의 묘인 네크로폴리스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얘기한다.네크로폴리스는 왕가의 계곡보다는 그 유명세가 덜한게 사실이다. 왕족들보다는 한단계 아래 계급인 귀족들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덤의 크기나 형태로 보면 결코 왕가의 계곡 무덤들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무덤들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묘와는 다르게 벽화나 조각이 무수하게 많으며 그림도 상당한 수준이다. 학자들은 이 귀족들의 무덤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무덤들 가운데 라후미라의 묘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라후미라는 기원전 1502년부터 1448년까지 제 18왕조 토우토메스 3세 때의 재상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무덤은 다른 것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벽화들로 장식되어 있다. 토우토메스 3세는 싸움에 능한 왕으로 전쟁을 즐겼으며 라후미라는 그 빈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아 관리하고 정리하였다.라후미라의 벽화를 보면 외국 사신으로부터 공물을 받는 그림이 몇 개 있으며, 수단 지방의 흑인종인 누비아인이 상아나 기린, 원숭이 그 밖의 아프리카 산물을 운반하는 장면도 있다. 또 시리아 인이 파라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그림도 있다. 미노아 시대의 크레타 섬에서 온 인물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미노아 궁전 안의 그림과 비슷한 점이 많다. 가령 미니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술잔을 든 인물처럼 아주 품위 있는 모습이다. 또한 미노아 특산의 항아리와 손잡이가 있는 술잔 그리고 은제 황소 머리상을 나르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들은 점령국가의 지배시민이 아닌 크레타 시대의 상인으로 나일 강을 거슬러 룩소르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다. 라후미라의 묘에는 파티의 흥겨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의 아내인 메리트가 정장을 하고 자랑스럽게 남편 옆에 서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여성 악사들이 하프, 리라, 탬 버린 등을 들고 풍악을 울리는 모습도 있다. 초대된 손님들은 남녀구분없이 아주 흥겨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남부 테베(현재 룩소르)의 장관이었던 센네펠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 그는 농업과 축산에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는데 그의 묘의 천장에는 포도잎과 늘어진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어 그의 생전의 직업을 연상할 수 있다. 또 하르에포의 묘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들도 남아 있다. 하르에프는 고대 이집트 18왕조 왕이었던 아멘헤테프 3세의 왕비였던 티이의 궁내 시종 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려져 있는 벽화는 왕비 티이와 여신 하트홀을 동반한 아멘헤테프 3세가 그들 부부를 칭송하는 춤을 관람하고 있는 장면이다.파라오의 전답을 관장했던 멘나의 묘에는 파피루스 풀로 만든 배를 타고 호수에서 여가를 즐기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른손에 투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오리를 겨누고 있는 모습이다. 네크로폴리스에는 라후미라, 센네펠, 하르에프, 멘나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그려져 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서민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벽화에 쓰인 물감은 눈부신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어떻게 몇쳔년 전의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③ 왕가(王家)의 계곡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500km떨어진 곳에 룩소르라는 관광지가 있다.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수도 테베의 남쪽 교외에 해당한다. 왕가의 계곡은 나일강 서안의 메마른 계곡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곳에는 아멘호테프 4세가 중부 이집트의 텔엘아마르나에 천도해 있던 시기를 제외하고 신왕국 제 18왕조(기원전 1400년경) 투트메스(thutmose) 1세에서 제20왕조 람세스(ramses) 11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왕의 암굴묘가 세워져 있다. 표고 450m의 알쿠른 바위산이 파라미드 형상을 한 산과 태양이 지는 나일강 서안은 죽은 왕의 매장지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대에는 타이네트(골짜기), 타세트아아트(위대한 장소)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와디알무르크(왕들의 계곡)라 불리고 있다. 왕들의 계곡은 동서로 갈리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여기의 묘와 20여개의 피트(지면에서 곧게 내리 판 굴)가 발견되었다. 1922년 투탕카멘(tutankhamen)의 묘가 발견된 이후 새로운 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새로운 묘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왕가의 계곡에 있는 무덤들은 모두 신왕국 때의 것으로, 왕들의 묘는 험한 바위산을 파고 낭떠러지의 중턱이나 아랫 부분을 파낸 곳에 세워졌다. 그리고 왕묘에 대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 이 묘들은 일반적으로 계단과 경사로로 구성되는 하강 통로, 여러 개의 부속실, 전실,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제 18대 왕조 시대에는 묘의 통로가 도중에 지각으로 구부러지는 직각형이 전형적인 형태였다. 제 18왕조인 이크나톤(ikhnaton) 왕은 도읍을 아마르나로 옮겼고 그 곳의 묘는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구조는 빛의 직진성과 관련되어 태양신을 숭배하던 당시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왕묘는 계속 왕가의 계곡에 세워지게 되었다. 제 18왕조 말의 호르멤헤브(hormemheb) 왕묘 이래로 묘의 구조는 직선형으로 변해갔다. 또 제 20왕조의 람세스 4세 이후는 거대한 입구를 가지게 되었다.1881년 7월, 텔엘바하리의 남쪽 낭떠러지에서 구멍 뚫린 샤프트 묘에서 놀라운 대발견이 있었다. 그 곳에는 금속기나 석제 그릇, 샤프트상 등을 비롯하여 5900점의 부장품과 50구가 넘는 미라가 발견된 것이다. 이 묘는 제 21왕조의 파누젬 2세와 그 가족을 매장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후에 제 22왕조 세숑크(sheshonk) 1세 때 신왕국 시대의 왕과 왕비 미라가 운반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텔엘바하리의 묘를 발견하게 된 것은 한 도굴범의 정보 제공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그의 진술에 따르면 1870년대 초에 이 곳을 발견하여 골동품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많은 부장품이 나돌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더 이상의 도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그로부터 17년 후인 1898년, 프랑스의 한 학자에 의해 왕가의 계곡에서 아멘호테프 2세의 묘가 발견되었다. 그 곳은 입구가 대량의 모래와 자갈에 의해 완전히 매몰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11구의 미라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8개가 왕의 미라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텔엘바하리와 왕가의 계곡에서 2군데의 왕의 미라를 숨겨 놓은 곳이 발견되었다. 왜 이 왕들의 미라는 자신의 묘가 아닌 다른 곳에 숨겨졌을까?신왕국 시대 말기에 왕가의 계곡에서 도굴이 성행하게 되어 많은 왕의 미라가 손상을 입었다. 이 사태를 우려한 아멘 대사제가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송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도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묻혀 있던 수많은 부장품과 금으로 도금한 관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아멘 신관단이 왕의 미라를 옮기면서 부장품을 약탈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합법적인(?) 도굴로 얻은 금은 보화는 아멘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테베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왕의 유체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벌인 일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왕들의 미라는 모두 33구이다. 그 중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은 13구의 미라이다. 그렇다면 또다른 은신처에 이 13구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군데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왕들의 미라를 안장한 목관이나 미라를 쓴 포대에는 미라가 여러 은신처로 이동, 운반되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호르멤헤브 왕묘에는 왕의 미라가 다른 장소로 운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제18왕조 말기에서 제19왕조 초기의 왕들의 미라는 발견되지 않은 제3의 은신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 앞으로의 발굴에서 새로운 왕묘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집트는 이미 기원전 3500년, 부족 국가들이 탄생을 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 경에 최초의 통일 국가인 제1왕조가 세워졌다. 이 때부터 약 2500년동안 26개의 왕조가 생겨났는데 제 10왕조까지를 고왕국, 제17왕조까지를 중왕국, 그 이후를 신왕국이라 부른다. ④ 시리아의 팔미라 고도(古都)사막 위에 솟아오른 환상의 도시 팔미라. 시리아의 동부 사막지대 한복판에 세워진 대도시 팔미라는 흔히 사막의 궁전으로 불리며,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과 경이로 채워준다. 팔미라는 동서를 잇는 교역도시였으며 그로 인해 사방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특유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팔미라가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강과 다마스쿠스 사이의 광할한 사막지대 안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다. 오늘도 이곳의 에프카(efqa)샘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나 일대를 풍요롭게 적셔주고 있다. 이 곳은 10m이상되는 아쟈나무들이 큰 숲을 이뤄 주변의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원래 이 곳 지명의 이름도 타드몰(tadmor : 고대 셈족어로 야자수)이었다. 팔미라는 동쪽의 페르시아 만과 이란, 서쪽의 지중해를 잇는 동서 무역의 중요한 중계지로서 번영하였다. 팔미라에는 많은 상인이 살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인도와 아라비아 산물을 로마 제국으로 운반하였다. 또한 사막을 왕래하며 장사를 하던 카라반(caravan)들이 피곤한 몸을 쉬고 물을 공급받던 사막의 경유지였다. 셀레우스코 왕조 때부터 중개무역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팔미라는 로마가 점령했던 기원전후 약 300년간 전*를 누렸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한 때 이 곳에까지 영향을 * 적도 있었다. 그러나 팔미라는 역사의 대부분을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였다. 이곳을 지나는 대상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사막 교역로를 지켜주는 대가로 통과세를 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팔미라는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희랍과 로마시대가 전*였으며, 이 때 타드몰에서 팔미라로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인 군대를 가진 강력한 도시국가로 발전하기에 이른다.오늘날 팔미라에 남아 있는 유적들의 대부분은 1~3세기의 로마시대에 건축한 것이다. 거친 표면이지만 세련미가 돋보이는 그래서 팔미라를 대표하는 신전인 벨 신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당시의 석조기술을 알 수 있는 원형극장, 벨 신전 맞은편에 있는 나부신전과 개선문, 정치집회장 혹은 시장으로 이용된 아그라와 그 밖의 많은 석주들. 이 모든 유적들을 보면 눈부시고 황홀한 팔미라가 계획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독자성을 유지했던 팔미라의 문화는 그 미술에서 특히 조각에서 확실히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주변의 구릉에 석회암이 풍부했던 덕택이기도 하다. 많은 팔미라의 조각은 양식화된 정적인 미술이고 서아시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팔미라의 서쪽 시외에 북시리아의 황야가 펼치지고 묘지의 계곡이라는 장소에 팔미라 시민의 묘가 있다. 묘는 영원의 집이라 불리며 팔미라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었다. 공동 묘지도 있었으나 유력한 가족은 일족의 묘를 가지고 있었다. 묘의 형식에는 탑묘(塔墓), 가형묘(家形墓), 지하 분묘(地下墳墓) 등이 있었으며 탑묘의 형식은 팔미라 독자의 양식에 근거하고 있다. 서기 260년대에 아데나투스 2세가 팔미라의 왕이 되었다. 그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능해서 팔미라의 융*를 구가했었다. 그러나 그는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272년 그의 왕비 제노비아는 아들에게 황제의 칭호를 수여하고 황제의 어머니로 자처했다. 로마의 황제가 이를 묵과할 리 없었다. 아무렐리안 황제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팔미라로 진군해 성을 포위했다. 제노비아는 포위망을 뚫고 팔미라를 빠져 나왔으나 유프라테스강을 건너려는 순간 로마 기병대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로써 팔미라의 역사를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팔미라는 로마 제국에서 이슬람 왕조로 지배권이 넘어가면서 교통과 군사상 요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오스만 제국 시대가 되자 급속히 쇠퇴하고 말았다. 더욱이 11세기에 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팔미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그 후 몰아치는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팔미라의 유적들은 모조리 모래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1930년대에 와서야 팔미라의 발굴과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16만평에 달하는 팔미라를 발굴하는 작업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금씩 발굴되고 있는 팔미라의 신전과 석주들이 화려했던 팔미라의 옛모습을 현대에 전해주고 있다. ⑤ 바위의 돔 기원전 950년경, 유다 왕국의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안의 동쪽편 산지에 순금으로 장식한 장엄미가 넘치는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성전이 세워진 후 이 지역은 성전산(temple mount)이라 불려지게 되었고 성도 예루살렘의 핵심부가 되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으로 그들 신앙의 중심지요 자부심의 원천이었다.기원전 6세기 초,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도성을 불질렀고 이 때 성전도 소실되게 된다. 유다 왕국의 멸망 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승리로 그들은 해방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폐허가 된 성전을 소규모로 재건하게 된다. 이 때가 기원전 515년경이었다. 성전산 위에 세워진 이 두 번째 성전은 페르시아, 희랍, 로마시대를 거치는 500여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기원전 37년에 로마제국의 후광으로 왕위에 오른 헤롯 왕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을 헐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대규모의 성전과 부속건물, 주변의 요새 등을 원래의 크기와 위용대로 재건하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성전이며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기도 하다.서기 1세기 중엽, 로마제국의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성전 터에 서기 135년경에 하드리안 황제가 이교도의 아도니스(adonis) 신전을 건설하였고, 비잔틴 시대에는 이곳을 통치했던 기독교 인들이 유대인 성전의 파괴를 보여주기 위해 황폐한 모습으로 성전산을 방치하였다. 오직 성전산의 서쪽편 축대인 "통곡의 벽"만이 남아 그곳의 역사를 가늠하게 해 줄 뿐이었다. 서기 638년 이곳을 통치했던 아랍인들은 성전산의 큰 바위 위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선지자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전설에 따라 그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는 바위를 종교적으로 기념 및 보존하기 위해 서기 692년 당시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압둘 말리크는 그들의 대사원을 건축하게 한다.오늘날도 성전산 위에 우뚝 서 있어 예루살렘의 대표적 건축물이 되고 있는 "바위의 돔"이 바로 그것이다. 지름이 78피트, 높이가 108피트인 돔은 구리와 알미늄의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태양빛이 비칠 때는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사된다. 1958~1964년 사이에 사원의 돔을 교체하면서 황금색 칠을 하여 황금사원이라고도 불린다. 정팔각형의 건물인 이 사원 실내 한가운데에는 폭 13m, 높이 1.25~2m, 길이가 18m인 나무로 둘러싸인 넓직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던 제단이라고 전해진다. 표면에는 골이 패어 있어서 제물의 피가 흘러 내리도록 되어 있다.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바위도 바로 이 바위다. 이 때문에 회교에서는 메카 메디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3대 성지로 꼽고 있다.바위의 돔 사원의 모든 벽면에는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랍 건축예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돔 내부에는 대리석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의 색깔, 높이, 두께 등이 모두 제각각이다. 그 이유는 이 기둥들이 비잔틴이나 로마시대 신전의 것으로 복잡한 배경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바위의 돔은 새 단장을 하게 되었다.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650만 달러의 사재로 돔을 24k의 순금으로 씌우게 했다. 1993년 시작된 공사는 15개월간 계속되어 1200장의 얇은 순금 판이 돔 위에 입혀져 진짜 황금의 돔이 되었다 ⑥ 클라크 데 슈발리에(시리아의 십자군 성채) 1096년 유럽 기독교 국가들로 구성된 십자군의 대장정은 오늘날 터키의 최남단 도시 안디옥(현재의 안타키아)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진을 계속하여 1099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교도의 손에서 탈환하자는 구호 밑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승리였다. 이로써 200년간 계속된 십자군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십자군은 남북으로 700km나 되는 이 지역에 50개가 넘는 요새 성채를 축성하였다. 이 성채들은 십자군 건축 양식에 따라 하나같이 장대한 규모를 자랑했지만 13세기말 십자군의 패배와 함께 파괴되었다. 그 후 7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그 골격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 한 곳 예외가 있다. 십자군 시대 성채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 있다. 그 곳은 시리아의 클락 데 슈발리에(crac des chevaliers)라고 부르는 성채이다. 기사의 성채라는 뜻을 가진 이 곳은 당시 성채의 구조와 축성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중세 건축물 가운데 건축법이나 건축미가 매우 뛰어난 것 중 하나로 꼽혀 건축사의 연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십자군은 그 숫자로 볼 때 대군은 아니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십자군 수는 15,000명을 넘지 못했다. 그 후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십자군 기사들은 고작 300명 정도였다. 소수의 십자군이 다수의 적대적인 지역을 관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십자군은 수적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적 요지에 수많은 성채들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장악해 갔다. 십자군 성채는 군사들이 주둔하는 요새였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다. 클락 데 슈발리에는 모슬렘의 중요한 도시 홈스(homs)와 지중해를 잇는 중간지점의 전략적 위치에 세워졌다. 이 성채가 완성되었을 때 모슬렘 사가는 모슬렘 세계의 '목에 박힌 가시'라고 표현했다. 클락 데 슈발리에는 해발 750m의 칼릴(khalil)산 정상에 오각형 형태로 우뚝 서 있다. 길이는 남북으로 200m, 동서로 140m나 되며, 면적만 해도 1만평에 이르는 대단한 규모다. 이 성채의 특징 중 하나는 성벽이 완벽한 이중구조라는 것이다. 우선 든든한 외성이 있고 그 안에 외성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린 내성이 성채를 둘러싸고 있다. 외성과 내성 사이는 도랑을 깊게 파고 물을 채워 해자를 만들었다. 내성은 성벽을 직각으로 쌓지 않고 그 밑부분을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해자를 넘어온 적들이 성밑까지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성 밑부분은 경사지게 만든 것은 성벽자체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지녔다고 한다. 성내부에는 바닥이 꺼지면서 적을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장치, 가득 채우면 몇 년까지 버틸 수 있는 곡식저장소, 거대한 물 저장소, 120m에 달하는 대집회소, 예배소, 식당, 숙소, 미로같은 비밀통로 등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슬람교도인 모슬렘들은 이 성채를 빼앗기 위해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무적의 살라딘도 이 성채를 공략하러 갔다가 성공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다음날 철군했다는 일화도 있다.1271년 이집트의 술탄 베이발스(sultan baybars)는 군대를 이끌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 클락 데 슈발리에를 공격했다. 격전 끝에 외성을 뚫는데는 성공했지만 내성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를 함락시키는 것이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세이발스는 한가지 계략을 꾸몄다.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성안의 십자군들에게 한 통의 밀서가 전달되었다. 그것은 십자군 총사령관이 보낸 밀서였다. 거기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여 유럽으로 퇴각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저항하던 십자군들은 베이발스에게 유럽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귀로를 보장하면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베이발스가 이 조건을 수락하자 십자군 성채에는 백기가 휘날리게 되었다. 사실 그 밀서는 베이발스가 꾸며낸 가짜였다. 그러나 그의 밀서로 인해 성채는 파괴되는 운명을 면할 수 있었다. 1271년 이 성채의 함락을 시작으로 십자군 성채들은 차례로 모슬렘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20년 후인 1291년, 십자군 최후의 보루 아코(acco)가 함락됨으로써 십자군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⑦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를 지구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델포이(델피)를 지구의 배꼽이라 하며 신성시했다. 그리스의 유일한 고고학 유적지라 할 수 있는 델포이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탁의 장소이고 아폴로 신에게 소속된 그리스 최대의 성지로 통한다. 이곳의 델피 박물관에는 이 곳에서 발굴된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델포이 유적의 입구에서 파르나스 산의 구불구불한 참배의 길을 올라가다보면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 아폴로 신전을 볼 수 있다. 길 양쪽으로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헌납한 보물창고와 봉납비, 신상, 건조물이 늘어서 있었으나 지금은 그 대좌와 기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중 프랑스 고고학회가 재건한 아테네인의 보물창고가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는데 도리스식 기둥 2개의 한쪽면에 아테네가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인에게 승리한 것에 대해 아폴로신에게 헌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옆에는 브레프테리온이라는 전물터가 있는데 옛 제전의 평의원들이 사용했던 곳이다. bc 3-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폴로 신전의 내실에는 아폴로 상이 놓여 있었으며 지하실에는 대지의 배꼽(옴파로스)라는 돌이 보관되어 있었다. 현재 이 돌은 델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폴로 신전은 현재 그 기둥과 토대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아폴로 신에 대한 신앙과 그에 의한 신탁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신전이 만들어졌을 당시 그 신전에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곳 바위 틈에서 올라오는 물 기운을 마시며 황홀해진 신관이 아폴로 신에게 신탁을 고했다고 한다. 신전 전실의 벽에는 고대 현인 7명의 격언이 새겨져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아폴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광명, 의술, 궁술, 시, 음악, 예언, 가축의 신이다. 아폴론이라고도 한다. 그는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신이었고 또한 음악의 명수로서 예술의 수호신이 되어 뮤즈의 여신들이 그를 따른다. 그는 때로 태양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폴로가 그리스, 로마인에게는 지성과 문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7대불가사의(7wonders of the modern world) 1)유로터널(영불해협) 영국사람들은 도버해협이라고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칼레해협이라고 일컫는 영불해협의 정식명칭은 '채널(channel)'이라 하며, 이 해협을 육로로 연결시키는 터널의 공식명칭은 '채널터널(channel tunnel)' 또는 채널과 터널을 합성한 신조어인 '처널(chunnel)'로 명명된다.사실상 유로 터널(euro tunnel)이라는 명칭은 이 터널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의 이름이다. 이 회사는 영쇓불 양국정부로부터 건설공사 준공후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권한을 착공시점부터 55년동안 위임받아 관리한 후, 2042년에 양국 정부에 소유권을 넘 겨 주게 된다. 유로 터널사는 15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정부의 자금지이나 보증 없이 주식공모와 은행융자로 조달했다. 이 공사는 국가간의 초대형 인프라건설을 순수민간자본이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94년 터널의 개통이후,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직면했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채무액만 약 750억 프랑(한화 12조원)이고, 한해 지불이자액만 60억 프랑(한화 9600억원)이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96년 12월에는 터널 내부에서 차량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승객과 화물량이 격감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외신에 의하면, '97년도에 이뤄진 유로 터널사의 구 조조정에 이어, 최근 들어 승객과 화물량이 갈수록 폭증하여 머지 않아 흑자전환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즉, 2004년경이면 이자 지급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그 동안 체념(?)하고 있었던 주주들에게 이 익 배당까지 예상된다고 하니, 가히 지옥에서 천당으로의 위상변화 가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나아가서, 제2의 해저터널건설계획이 날 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기존의 포크스톤과 칼레를 왕래하는 기차전용의 터널은 201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제2의 터널은 기존의 터널과 나란히 달리는 자동차 전용터널로 건설되는데, 이 노선의 청사진은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cn tower(캐나다) 지상에서 높이 553m이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라 할만 하다. 워낙 높다 보니 바로 밑에서 보면 바람에 타워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남산 타워처럼 통신용으로 지었다가 개방하였는데 평일에도 줄을 서야 할만큼 붐비는 관광 명소이다.입구로 들어서면 매표소 앞의 인파부터 볼 것이다. 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시설은 빼고 엘리베이터 표만 사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다 보니 탑승 시간이 적혀 있다. 그 동안에는 밖에 나와 타워 외벽에서 등산 연습하는 사람도 보고 군것질 하면서 타워를 올려다 보는 것도 좋을 듯. 초고속 전망 엘리베이터는 58초 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 닿는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출입문 쪽에 서면 전망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줄서서 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보게 된다. 좋은 자리 얻는 것도 운이다. 3)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미국)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건축가 슈립 람하먼의 설계로 뉴욕 한복판에 102층 철골구조로 건축었으며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좁아져야 한다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계단식 설계로 되어 있다.381미터 높이에 6천 4백여 개의 창, 64대의 엘리베이터, 화장실만도 2천 5백 개가 넘는다. 청소부 2백여 명을 합쳐 모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빌딩 안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일 찾는 관광객만도 4만 명이다. 또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최단기 최고층 건설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불과 1년 45일 만에 당초 예정보다 크게 밑도는 비용을 들여 완공했는데, 빠른 시공과 함께 그 견고함은 지금은 건축가들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정도.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는 원래 뉴욕의 별칭이다. 1972년 맨해튼 남쪽에 세 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들어설 때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41년간 세계 최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지금도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린다 4)금문교(미국) 1933년에 착공하여 1937년에 완공한 다리로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머린군을 연결하고 있다. 길이 2730m, 폭 27m로 매일 10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경치를 바라보며 걸어서 건널 수도 있다. 다리의 양쪽에는 비스타 포인트라는 전망대가 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아름답다. 5)이타이푸댐(브라질/파라과이) 댐높이 196m. 길이 7.37km. 저수량 190억m3. 중공중력(中空重力), 록필, 어스필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조합한 콤바인댐으로, 1975년에 착공하여 1982년에 준공되었으며, 총출력 1만 2,600kw이다. 6)북해보호공사(네덜란드) 7)파나마운하(파나마)이다.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에서 대서양 연안의 크리스토발까지 전장 64 km. 카리브해(海)로 흘러드는 차그레스강(江)을 막아 축조한 가툰호(면적 약 420 km2) 안에 만들어진 34 km의 수로 및 파나마만(灣) 쪽의 미라플로레스호(湖) 안에 만들어진 1.6 km의 수로와, 이 두 호수 사이에서 지협의 척추 구실을 하는 구릉지를 15 km나 파헤쳐 만든 쿨레브라 수로(에스파냐어로 ‘새우’라는 뜻, 굴착 감독자의 이름을 기념하여 게일라드 수로라고도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가툰호와 쿨레브라 수로의 수면표고(水面標高)는 25.9 m, 미라플로레스호의 수면표고는 16 m이다. 이 두 호수 사이의 표고차는 물론 호수와 해면(海面)의 표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갑문방식(閘門方式)이 이용되고 있다. 파나마만에서 미라플로레스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2단식(二段式) 미라플로레스 갑문, 여기에서 쿨레브라 수로로 통하는 입구에는 1단식의 페드로미겔 갑문, 가툰호에서 카리브만으로 나가는 출구에는 3단식 가툰 갑문이 건설되어 있다. 연간 평균 이용 선박의 수는 1만 5000척, 운하를 통과하는 데에는 약 8시간이 걸린다. 이거쓴 사람... 그냥 인간 건축물이 다 미스테리라고 할사람인듯... 몇개는 나도 신기하지만.. ㅋㅋ 피라미드는... 아무리생각해도... 그시대에 어떻게 지었는지가 궁금...
[무서운글터] 세계 고대 건축물들의 미스테리 *스압! [세계7대 불가사의] 1.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pyramid) 피라미드에 대해 현재 남아 있는 최고(最古)의 기록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bc 5세기)의 <역사 designtimesp=14359 designtimesp=12265> 권2에 있다. 그는 기자의 대(大)피라미드에 관하여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건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쿠푸는 카이로 남서쪽 15 km에 위치한 기자에 최대의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것은 대피라미드 또는 제1피라미드라 일컬어지며, 높이 146.5 m(현재 137 m), 저변 230 m, 사면각도는 51 °52 '이다. 각 능선은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오차는 최대의 것이라도 5 °30 '에 지나지 않은 만큼 극히 정교한 것으로, 피트리에 의하면 평균 2.5 t의 돌을 230만개나 쌓아올렸다. 진정 세계 최대의 석조건물로서 그 장대한 규모와 간결한 미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다. 내부구조는 복잡해서 독일의 보르하르트에 의하면 계획이 2번 변경되었다고 한다. 북측의 지면에서 약간 위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 그대로 하강하면 암반 밑에 설치된 방에 도달한다. 이곳이 제1차 계획의 매장실이고, 그 위에 있는 통칭 ‘왕비의 방’이 제2차 계획의 매장실이다. 그리고 제3차 계획에 의해 피라미드는 완성되었다. 제1피라미드 남서쪽에 카프라왕의 제2피라미드가 있다. 높이 136 m, 밑변 216 m, 동쪽에 있는 장제신전에 450 m의 참배로가 뻗어 하곡신전에 이른다. 유명한 스핑크스는 하곡신전에 가까운 참배로 북쪽에 엎드려 있다. 기자에는 그 밖에 멘카우레왕의 제3피라미드와 왕족들의 소(小)피라미드 6기가 있 다. 2.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pharos) 등대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파로스 섬과 헵타스타디온이라고 불리던 1㎞정도의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곳의 동쪽 끝에 세계의 모든 등대의 원조격인 파로스 등대가 서 있었다. 대부분이 대리석 돌로된 등대의 높이가 135m로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으로 소스트라투스가 만들었다. 등대는 3개의 층계로 만들어졌다. 맨 아래층이 4각형, 가운데층이 8각형, 꼭대기 층은 원통형이었다. 각 층은 모두 약간 안쪽으로 기울게 지어졌다(기울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음). 등대 안쪽에는 나선형의 길이 있어서 등대 꼭대기의 옥탑까지 이어져 있었다. 옥탑 위에는 거대한 동상(여신상)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아마도 알렉산드 대왕이나 태양신 헬리오스의 모양을 본떴을 것으로 여기지고 있다. 등대 꼭대기의 전망대에서는 수십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먼 본토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7c이후 이집트를 정복했던 아랍인들에 따르면 램프 뒤쪽의 반사경으로 비치는 타오르는 불길은 43㎞정도 떨어진 바다에서도 볼 수 있었고, 맑은 날에는 콘스탄티노플까지도 반사경이 비쳤으며 또 햇빛을 반사시키면 160㎞ 정도 떨어져 있는 배도 태울 수 있었다고 한다.b.c280년경에 만들어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등대에 불을 지폈을까?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3.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세미라미스 공중 정원(hanging garden) bc 500년경 신(新)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하여 수도인 바빌론에 건설한 정원이다.실제로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있다는 뜻이다. 지구라트에 연속된 계단식 테라스로 된 노대(露臺)에, 성토하여 풀과 꽃, 수목을 심어놓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삼림으로 뒤덮인 작은 산과 같았다고 한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물을 댔다고 전해진다.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왕비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바빌론의 왕이 되자 메디아 왕국의 키약사레스 왕의 딸 아미티스를 왕비로 맞았다. 산이 많아 과일과 꽃이 풍성한 메디아에서 자란 왕비는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빌론에 마음을 두지 못한 채 항상 아름다운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왕은 왕비를 위하여 메디아에 있는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을 바빌론에 만들기로 결심했다.왕의 명령을 받은 재주가 뛰어난 건축가, 기술자, 미장이들은 곧장 작업에 들어가 왕궁의 광장 중앙에 가로·세로 각각 400m, 높이 15m의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계단식 건물을 세웠다.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에 불과했지만 총 높이가 105m로 오늘날의 30층 빌딩 정도의 높이었다. 한 층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수천톤의 기름진 흙을 옮겨 놓고 넓은 발코니에 잘 다듬은 화단을 꾸며 꽃이랑 덩굴초랑 과일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한 이 파라미드형의 정원은 마치 아름다운 녹색의 깔개를 걸어놓은 듯이 보였다.그런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곳에서 이렇게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의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펌프로 길어 올리고 그 물을 펌프로 각 층에 대어줌으로써 화단에 적당한 습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그때그때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정원의 아랫부분에는 항상 서늘함을 유지하는 방을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창 너머로 바라보는 꽃과 나무의 모습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또한 방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방 위에는 갈대나 역청을 펴고 그 위에 납으로 만든 두꺼운 판을 놓았다.공중 정원에 대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 바빌론의 페허는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이 남아있다. 4. 에페수스(ephesus)의 artemis 신전 에페수스 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고대 이오니아 지방의 열두 개 도시 중 하나로서 b.c 6세기 경에 이미 서아시에서 상업의 요충지로 번영하여 가중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다. 이 곳을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다.이 신전은 당시 최고 부자였던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b.c 560∼b.c 546)때 세우기 시작하였다. 높이 20미터 정도의 훌륭한 이오니아풍의 백색 대리석 기둥을 127개나 사용한 이 신전은 완성되기 까지 120년이 걸렸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에페수스를 방문하여 이 신전을 돌아보고는, 기자에 있는 피리미드에도 떨어지지 않는 걸작으로 묘사하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그러나 헤로도토스가 에페수스를 방문한 지 1세기 정도 지난 뒤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전은 어리석은 한 인간에 의해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b.c 356. 10월 "어차피 나쁜 일을 하려면 후세에까지 알려질 수 있는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한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자가 신전을 계획적으로 불태워 버린 것이다. 그 후 디노크라테스가 불타 버린 신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에페수스의 여인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석 등을 팔았고, 왕들은 크로이소스 왕을 본받아 기둥을 기증하기도 했다. 더욱이 아시아 원정 길에 올랐던 알렉산더 대왕은 한층 완성중에 있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았겨 "만일 에페수스인이 이 신전을 나의 이름으로 세워준다면 모든 비용을 내가 내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페수스인들은 다른 나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야심이 강한 에페수스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을 지금까지 어떤 신전보다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신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파르테논은 길이가 69m. 폭이 30m, 높이 10정도로서, 대리석 기둥을 58개나 사용한 신전이었다. 에페수스인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의 두 배 정도의 규모로 만들기 시작했다. 높이 18m짜리 기둥을 127개나 사용했고, 길이는 120m, 폭은 60m로 했다. 또한 신전의 건축용 자재는 가장 순도 높은 백색 대리석만을 사용했으며 중앙의 넓은 홀에는 네 방향으로 대리석 계단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게 하였다. 그 규모나 화려함은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다. 5. 올림피아의 제우스(zeus) 신상(神像) 제우스 상이 있는 올림피아는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쪽 앨리스 지방에 있는 제우스의 신역으로서 완만한 구릉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로 예부터 잘 알려져 있다.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최고의 신 제우스를 믿었다. 제우스는 고대 로마의 최고의 신 '주피터'와 같이 고대 그리스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천둥, 번개와 비바람을 만드는 신이며, 그의 주 무기는 벼락이었다. 제우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며,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시마다 제우스 신을 모신 신전을 짓고 성대한 제사를 지냈다.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앨리스 등의 도시 국가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처음에는 땅의 신 크로노스와 여신 헤라를 숭배했지만 뒤에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되어서 b.c457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고 그 안에 '피디아스'가 만든 제우스 상을 안치하였다.제우스 신상과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네 여신상은 피디아스의 2대 걸작품으로 꼽힌다. 피디아스는 8년여의 작업 끝에 제우스 상을 완성했는데, 그는 제우스의 신성함 위엄과 함께 너그러움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걸작 중의 걸작 제우스 상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남아 있지 않다. 대지 위에 우뚝 세워진 신전에는 양옆에 열세 개씩, 양끝에 여섯 개씩 장엄하고 무거운 도리아식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완만하게 기울어진 지붕이 덮여 있다. 이 신전의 한가운데 있는 제우스 상은 높이가 90㎝, 폭이 6.6m인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12m 정도 되는 상은 거의 천장을 닿고 있다.제우스 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그 위에 보석과 흑단, 상아를 박아 장식한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금으로 된 발 디딤대에 올려져 있는 양다리는 거의 예배자의 눈높이와 일치하였다. 오른손에는 금과 상아로 만든 승리의 여신(nike)상을 떠받치고 있으며 왼손에는 황금을 박아 장식한 지팡이(왕홀)를 쥐고 있다. 지팡이 위에는 매가 앉아 있다. 상아로 만들어진 어깨에는 꽃과 동물이 새겨진 황금의 아름다운 망토가 걸쳐져 있다. 제우스 신전의 발굴 움직임이 18세기 경부터 일어났고 처음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다. 1829년 프랑스인이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를 발굴하기 시작하여 메도프, 기둥, 지붕 등의 파편을 발견하였다. 1875년경에 독일 정부의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의해 올림피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우스상이 있던 신전도 거의 드러나게 되었다. 1950년대 제우스 신전 터에서 피디아스의 작업장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제우스 상이 만들어진 연대가 확실히 밝혀졌다. 6. 할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의 마우솔러스 영묘(靈廟) - mausoleum 페르시아 제국 카리아의 총독 마우솔로스를 위하여 그리스의 할리카르나소스에 건조된 장려한 무덤기념물이다.면적 29×35.6 m, 높이 50 m. 할리카르나소스의 묘묘(墓廟)라고도 한다. 마우솔로스의 생전에 착공되었으나, 그가 죽은 뒤 왕비 아르테미시아가 계속 진행하였으나 완성된 시기는 왕비 아르테미시아가 죽은(bc 350) 뒤로 추측된다.설계는 사티로스와 피테오스가 하였다. 동서남북의 장식조각은 각각 스코파스, 레오카레스, 티모테오스, 브리아크시스가 담당하였다.각 면의 조각·프리즈는 발굴되어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또, 로마인은 비슷한 대규모의 분묘건축(墳墓建築)도 마우솔레움이라고 일컬었다. 마우솔레움은 그 특이한 모양과 복잡한 장식 때문에 세계의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혔다. 7. rhodes항구의 크로이소스 거상(巨像) - colossus 거상(巨像). 그리스어 콜로소스에서 유래한다.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 등을 보고나서 칭한 말이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대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로도스섬의 콜로서스이다.로도스 항구에 서 있던 태양신 <헬리오스 청동상 designtimesp=14403 designtimesp=12321>은 높이가 36 m나 되었으며, 린도스(로도스 섬 동쪽에 있던 고대 도시의 이름)의 카리오스에 의해 bc 280년경 건조되었는데 bc 224년의 지진 때 붕괴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현존하는 것도 많으나 모두 기념비적인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7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다. 1. 이집트의 피라미드 2. 로마의 원형극장(콜로세움) 로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유적지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이탈리아어로는 콜로세오(colosseo)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다.콜로세움이란 이름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콜로사레(colossale)에서, 또 하나는 경기장 옆에 네로 황제가 세운 높이 30m의 거대한 금도금 상 콜로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바로 그것인데 전자의 설이 유력하다.콜로세움은 기원후 72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네로 시대의 이완된 국가 질서를 회복한 후, 네로의 황금궁전의 일부인 인공호수을 만들었던 자리에 착공하여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80년) 때 완공하였다. 완성 축하를 위해 100일 동안 경기가 열렸으며, 그 때 5,000마리의 맹수가 도살되었다고 한다. 장대한 타원형 플랜이 있는 투기장은 아치와 볼트를 구사한 로마 건축기술의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조물로서 거대한 바위 축대위에 축조되었으며, 이 축대는 점토질의 인공호수위에 설치되어 지진이나 기타 천재로 인한 흔들림을 흡수하 도록 설계되었다.약 5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제국 최대의 투기장이었다.콜로세움은 최대 지름188 m, 최소 지름 156 m, 둘레 527 m, 높이 57 m의 4층으로 된 타원형 건물인데, 1층은 토스카나 식, 2층은 이오니아 식, 3층은 코린트 식의 둥근기둥으로 각각의 아치가 장식되어 있다. 또한 4층을 제외하고 원기둥과 원기둥 사이에는 아치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조상(彫像)이 놓여 있다.내부는 긴지름 86m, 짧은지름 54m의 아레나(투기장)를 중심으로 카베아(관객석)가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칸칸마다 나누어진 맹수들의 우리 위에 나무로 바닥을 만들어 지상과 지하를 분리시켰는데 지하의 방에는 맹수뿐만 아니라 검투사, 사형수들이 갇혀 있었다. 이 경기장은 지하의 대기실 및 천막 지붕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곳에서는 검투사의 경기, 맹수와의 싸움이 즐겨 행해졌으며, 심지어는 장내에 물을 채워 전투를 하는 모의 해전 등도 벌였다. 제정 초기 크리스트교 박해 시대에는 많은 신도가 이 콜롯세움에서 야수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다.콜로세움은 완공된 이래 300여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계속 벌어지다가 405년 오노리우스 황제가 격투기를 폐지함에 따라 마침내 처참한 역사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그 후 콜로세움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중세 교회를 짓는데 재료로 쓰이기도 해 외벽의 절반이 없어지는 수난을 겪었다.그러다가 18세기 경 교황의 명에 따라 기독교 수난의 현장으로 복구되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3. 영국의 거석기념물(巨石紀念物, 스톤헨지)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환상열석(環狀列石)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조물의 하나인 스톤헨지(stonehenge)는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야(salisbury plain)에 위치하며, 고대 영어로 '공중에 걸쳐 있는 돌'이라는 의미이다.천년전 이 곳엔 초기 석기시대 사람들이 정착했었다.그렇지만 그들은 별 흔적을 남기진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적들은 청동기인들의 업적이다.스톤헨지의 건조가 착수된 것은 기원전 2800년경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완성된 것은 기원전 156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톤헨지는 원형(圓形)의 유적으로 각각의 거석들은 모두 한 중심점을 향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바깥 도랑과 둑, 네모꼴 광장과 방향표시석인 힐스톤, 돌기둥을 세워 놓은 입석군(立石群), 중앙 석조물 등으로 이루어졌다.기원전 2100년경 스톤헨지로부터 자그마치 385km나 떨어진 웨일즈 남서부의 프레슬리산에서 청석(blue stone)이 이 곳으로 운반되어져 왔는데, 최고 5톤까지 나가는 이 돌들을 옮기는 일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썰매나 뗏목을 이용해 육로와 해상을 번갈아 가며 운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스톤헨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향표시석 힐스톤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그것도 하지(夏至)에 해가 뜨는 방향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하지날 힐스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해가 떠올라 중앙제단을 비췄던 시기는 천문학적으로 bc 184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그리고 힐스톤을 세운 시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한 연대와도 맞아 떨어져 기묘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상당한 천문학적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래서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완전히 파악하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환상열석 중심축에서 30m를 벗어난 자리에는「사르센 원」이라고 불리는 둥근 띠가 있다.사르센 원을 따라 가면 두개의 커다란 돌을 세워 놓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을 눕혀 놓은 삼석탑(三石塔)을 만난다.돌 한개의 무게는 25t에서 최고 50t까지 나간다. 기중기와 같은 기구가 없던 당시에 50t 무게의 돌을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는다.학자들은 지레 받침대와 밧줄을 이용해 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과학적인 추측을 할 뿐이다. 4. 이탈리아의 피사 사탑(斜塔) 이탈리아 중서부에 위치한 피사 대성당(duomo di pisa)의 부속건물(대성당, 세례당, 종탑)중 3번째이며 마지막 구조물로써, 중세 도시국가 피사가 팔레르모 해전에서 사라센 함대에 대승한 것을 기념하기위해 세워진 종탑이다.흰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꼭대기 종루를 포함해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는 55.8m, 무게는 14,500t 이나 된다.탑내부는 나선형으로 된 294개의 계단을 통해 종루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종루에는 각각 다른 음계를 가진 7개의 종이 걸려있다.1174년에 착공된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천재건축가 보라노 피사논의 설계도에따라 탑을 만들어가던 중, 3층까지 쌓아올렸을 때 공사관계자들은 지반 한쪽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책임 기술자였던 보나노 피사노는 기울어진 모양을 보정하기 위해 새로 층을 올릴 때 기울어져 짧아진 쪽을 더 높게 만들었으나, 추가된 석재의 무게로 건물은 더욱 가라앉게 되었다.기술자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몇 번씩 공사를 중단했으나 결국 1350년에 맨 꼭대기층이 기울어진 채 완성되었다. 물론 건축당시부터 의도적으로 기울어진 탑을 세운것은 아니다.1년에 1mm정도 기울어지는 미세한 자연 현상이 누적되다보니 오늘날과 같이 탑의 꼭대기가 수직선에서 무려 5m나 기울어졌다.현재는 탑의 기울기가 멈춘 상태다. 최근 영국 런던대학의 토질 기계학과 존 부를랜드 교수는 "피사의 사탑은 이제 기우는 것은 멈췄다. 이는 지난 7세기만에 이룩한 개가"라고 말했다.사탑이 이처럼 위태로운 상태에서도 수천년 동안 용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5. 이스탄불의 성(聖)소피아 성당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은 이스탄불(현재 터키의 수도이며 이슬람이 많은도시라는 뜻)이 비잔틴제국의 수도로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6세기에 건조되었다.비잔틴 문화의 최고 건축물로써 아야 소피아(aya sophia)라는 현지어로 불리며 현재 소피아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현재의 소피아 대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건립된 것(532~537년)으로 세계의 교회 중 4번째(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런던의 성 바울로 성당,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로 크며, 현존하는 교회 중 가장 오래됐다.소피아 대성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360년 나무 지붕의 작은 교회로 지어졌으나, 404년 알카디우스 황제 때 화재로 무너졌으며 그 후 데오도시우스 2세 때 두 번째 성 소피아 대성당이 완공(415년)되었다. 그러나 이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니카의 반란'으로 다시 파괴되었다.니카의 반란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황비인 데오도라(이집트 출신의 댄서) 때문에 생긴 반란이었다.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그러나 그녀가 천민 출신이라는 것과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의 단성론(콘스탄티노플에서는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하느님 자신이라는 양성론을 채택했다)을 믿는다는 것을 빌미로 히포드롬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 반란군의 기세에 눌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난을 피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려 했으나 그를 데오도라가 저지했다.다음 순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히포드롬에서 농성하는 반란군을 단숨에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제2차 소피아 성당이 파괴되었으며, 그 잔해 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제의 권위와 교회의 영광에 걸맞는 새로운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건축가 안테미우스와 수학자 이시도르를 투입하였다.건축을 시작한 후 5년 10개월 만인537년에 소피아 성당은 마침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6. 중국의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중국 역대 왕조가 변경을 방위하기 위해 축조한 대성벽으로써 보하이 만(渤海灣)에서 중앙 아시아까지 지도상의 총연장은 약 2,700km이나, 실제는 약 6,400㎞(중간에 갈라져 나온 가지를 모두 합하여)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유적이다.춘추시대 제(齊)가 영토방위를 위햐여 국경에 쌓은 것이 장성의 기원이며 전국시대의 여러나라도 이에 따랐다. 진(秦) 시황제(始皇帝)는 중국 통일(bc 221) 후 흉노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간쑤성(甘肅省) 남부로부터 북으로, 황하강(黃河江)의 대굴곡부(大屈曲部)의 북쪽을 따라 동으로 뻗어나가, 둥베이(東北) 지구의 랴오허강(遼河) 하류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는데, 절반 이상은 전국시대의 연(燕)·조(趙) 등이 쌓은 장성을 이용한 것이었다.근년에 이 장성의 동부 유지(遺址)가 둥베이지구에서 발견되고 있다.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허시후이랑(河西回廊)을 흉노로부터 지키려고 장성을 란저우(蘭州) 북방에서 서쪽으로 둔황(敦煌) 서편의 위먼관(玉門關)까지 연장하였다. 남북조시대에는 북방민족의 활동으로 장성 위치는 남하하여, 6세기 중엽 북제(北齊)는 다퉁(大同) 북서에서 쥐융관(居庸關)을 거쳐 산하이관(山海關)에 이르는 장성을 축성하였다.수(隋)는 돌궐·거란 방비를 위하여 오르도스(내몽골자치구의 중남부) 남쪽에 장성을 쌓았다.당대(唐代)에 들어서 북쪽까지 판도를 넓혔기 때문에 방어선으로서의 장성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대(五代) 이후에는 장성지대가 북방민족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었다.장성이 현재의 규모로 된 것은 명(明)나라시대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관광 대상이 되고 있는 바다링〔八達嶺〕 근처의 장성은 높이 8.5m, 두께는 밑부분 6.5m, 윗부분 5.7m이며, 위에는 높이 1.7m의 연속된 철자형(凸字形) 담인 성가퀴(城堞)를 만들고 총안(銃眼)을 냈고, 120m 간격으로 돈대(墩臺)를 만들어 군사의 주둔과 감시에 이용하였다.청대(淸代) 이후에는 군사적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본토와 만주·몽골 지역을 나누는 행정적인 경계선에 불과하게 되었다. 7.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 밖에 l.코트렐이 말한 7대 불가사의 ① 크레타섬의 미노스 궁전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센 공주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테세우스는 트로이센에서 자랐다. 아버지인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에게 테세우스가 자라서 큰 바위를 들어내고 그 아래 감춰 둔 칼과 구두를 꺼낼 수 있을 만큼 장성한 후에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다. 테세우스가 장성한 후 아이트라는 아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테세우스는 그 큰 바위를 간단히 들어내고 칼과 구두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났다. 테세우스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아테네에 도착했다. 당시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부인은 마법사인 메데이아였는데 그녀는 마법으로 이 청년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테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독이 든 술을 권했다. 테세우스가 왕의 앞에 나가 독이 든 술잔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 아이게우스는 청년의 칼과 구두를 보고 자기 자식임을 눈치챘다. 그리고는 그 술잔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소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아시아로 도망을 갔고 테세우스는 친자 인정을 받아 왕위계승자로 결정되었다.당시 아테네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당시 강국이었던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청년과 처녀들을 각각 7명씩 산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해 온 것이었다. 미노스는 몸은 인간이고 머리는 황소인 미노타우로스에게 젊은 남녀를 먹이로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동물은 힘이 장사에다 성질이 난폭해서 특수 설계한 미궁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 이 궁전이 미노스 궁전 혹은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것이다. 테세우스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제물의 한명으로 자원해서 이 괴물을 처치하기로 마음먹었다.케세우스는 출항 전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만일 성공하면 검은 돛 대신 흰 돛을 배에 달고 돌아오기로 말이다. 크레타에 도착한 일행은 미노스 앞에 끌려 갔다. 이 때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는 일행 중에 끼어 있는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렸다. 아이아드네는 미궁의 비밀을 귀띔해 주면서 칼 한 자루와 실 타래를 주었다. 테세우스는 실 타래를 풀면서 미궁 안으로 들어가 괴물을 죽인 후 다시 실 타래를 따라 무사히 빠져 나왔다. 테세우스는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흰 돛을 단다는 것을 깜빡 잊어 버렸다. 이것을 멀리서 본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자결하고 말았다.이것이 궁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실재로 그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무도 그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트로이를 발굴하고 미케네, 티린스를 발굴한 독일의 쉴리만은 현지 총독과 협상하여 발굴권을 겨우 얻어냈다. 궁전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지주와 흥정을 했다. 지주는 2500그루의 올리브 나무 가격을 받아야 한다며 10만 프랑을 요구했다. 결국 4만프랑에 합의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던 중 나무가 888그루밖에 되지 않자 쉴리만은 화가 나서 발굴작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10여년 후 영국인 아서 에반스(arthur evans)가 상형문자 해석에 관한 그의 이론을 확인하고 위해서 크레타 섬에 오게 되었다. 그는 쉴리만이 했던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을 궁전의 위치라고 생각했다. 올리브 나무가 있던 지역은 크레타의 수도 헤라크 레이온(혹은 이라크 레이온)에서 5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었다. 에반스는 신화에서처럼 크레타에 반드시 미노스의 크노소스 궁전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발굴에 착수했다.발굴을 시작한 후, 거대한 궁전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이 1천개가 넘는 궁전은 3~4층으로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각방은 층계를 통해 각 층을 연결하고 있었다. 크노소스 궁전은 다이달로스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알려준 미궁 탈출 방법도 그가 알려준 것이라 한다. 궁전 안에는 수도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수도 시설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각 방의 밝기는 광정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 건물 내부를 밝혔다. 이 광정은 지붕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관통하는 공간인데 이것이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그들의 건축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방과 복도의 벽에는 화려한 프레스코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장난치며 물 속을 헤엄치는 돌고래들, 젊은 청년과 머리를 길게 땋은 젊은 여인들의 행렬, 돌진하는 황소와 곡예사들 등이 벽화를 장식하고 있다. 궁전 안에는 거대한 꽃병들이 발견되었는데 꽃병에는 문어가 한 마리씩 그려져 볼록한 꽃병의 윤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또 궁전 곳곳에서 라비린토스(lavyrinthos)라고 부르는 '쌍날도끼'가 발굴되었다. 이 쌍날 도끼는 일종의 종교 의식의 상징으로 많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악귀를 쫓는다든지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아 받치는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창고였던 것 같다. 이 항아리 모두에 올리브 기름을 채운다면 19,000갤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된다. 이 곳에서는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옥좌가 발굴되었다. 신하들이 앉는 긴 의자 사이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 몸에 독수리 머리와 날개의 괴물인 그리핀 두 마리가 새겨져 있는 옥좌이다. 아직도 의문인 것은 크노소스 궁전과 화려하던 미노아 문명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이다.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지진 등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궁전을 발굴해 낸 에반스는 궁전의 방에서 갑작스런 재해의 증거를 발견했다. 연장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완성되지 못한 예술 작품, 가사 도구가 그대로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크레타가 유럽에서 지진 활동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 재해에 의한 멸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에반스도 강도 높은 지진만이 크노소스 궁전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학자들은 에반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② 테베·네크로폴리스(묘지) 이집트의 룩소르에는 왕들의 무덤인 왕가의 계곡이 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 귀족들의 무덤인 네크로폴리스가 그것이다. 어떤 이들은 왕가의 계곡보다 귀족들의 묘인 네크로폴리스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얘기한다.네크로폴리스는 왕가의 계곡보다는 그 유명세가 덜한게 사실이다. 왕족들보다는 한단계 아래 계급인 귀족들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덤의 크기나 형태로 보면 결코 왕가의 계곡 무덤들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무덤들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묘와는 다르게 벽화나 조각이 무수하게 많으며 그림도 상당한 수준이다. 학자들은 이 귀족들의 무덤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무덤들 가운데 라후미라의 묘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라후미라는 기원전 1502년부터 1448년까지 제 18왕조 토우토메스 3세 때의 재상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무덤은 다른 것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벽화들로 장식되어 있다. 토우토메스 3세는 싸움에 능한 왕으로 전쟁을 즐겼으며 라후미라는 그 빈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아 관리하고 정리하였다.라후미라의 벽화를 보면 외국 사신으로부터 공물을 받는 그림이 몇 개 있으며, 수단 지방의 흑인종인 누비아인이 상아나 기린, 원숭이 그 밖의 아프리카 산물을 운반하는 장면도 있다. 또 시리아 인이 파라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그림도 있다. 미노아 시대의 크레타 섬에서 온 인물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미노아 궁전 안의 그림과 비슷한 점이 많다. 가령 미니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술잔을 든 인물처럼 아주 품위 있는 모습이다. 또한 미노아 특산의 항아리와 손잡이가 있는 술잔 그리고 은제 황소 머리상을 나르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들은 점령국가의 지배시민이 아닌 크레타 시대의 상인으로 나일 강을 거슬러 룩소르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다. 라후미라의 묘에는 파티의 흥겨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의 아내인 메리트가 정장을 하고 자랑스럽게 남편 옆에 서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여성 악사들이 하프, 리라, 탬 버린 등을 들고 풍악을 울리는 모습도 있다. 초대된 손님들은 남녀구분없이 아주 흥겨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남부 테베(현재 룩소르)의 장관이었던 센네펠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 그는 농업과 축산에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는데 그의 묘의 천장에는 포도잎과 늘어진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어 그의 생전의 직업을 연상할 수 있다. 또 하르에포의 묘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들도 남아 있다. 하르에프는 고대 이집트 18왕조 왕이었던 아멘헤테프 3세의 왕비였던 티이의 궁내 시종 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려져 있는 벽화는 왕비 티이와 여신 하트홀을 동반한 아멘헤테프 3세가 그들 부부를 칭송하는 춤을 관람하고 있는 장면이다.파라오의 전답을 관장했던 멘나의 묘에는 파피루스 풀로 만든 배를 타고 호수에서 여가를 즐기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른손에 투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오리를 겨누고 있는 모습이다. 네크로폴리스에는 라후미라, 센네펠, 하르에프, 멘나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그려져 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서민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벽화에 쓰인 물감은 눈부신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어떻게 몇쳔년 전의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③ 왕가(王家)의 계곡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500km떨어진 곳에 룩소르라는 관광지가 있다.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수도 테베의 남쪽 교외에 해당한다. 왕가의 계곡은 나일강 서안의 메마른 계곡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곳에는 아멘호테프 4세가 중부 이집트의 텔엘아마르나에 천도해 있던 시기를 제외하고 신왕국 제 18왕조(기원전 1400년경) 투트메스(thutmose) 1세에서 제20왕조 람세스(ramses) 11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왕의 암굴묘가 세워져 있다. 표고 450m의 알쿠른 바위산이 파라미드 형상을 한 산과 태양이 지는 나일강 서안은 죽은 왕의 매장지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대에는 타이네트(골짜기), 타세트아아트(위대한 장소)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와디알무르크(왕들의 계곡)라 불리고 있다. 왕들의 계곡은 동서로 갈리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여기의 묘와 20여개의 피트(지면에서 곧게 내리 판 굴)가 발견되었다. 1922년 투탕카멘(tutankhamen)의 묘가 발견된 이후 새로운 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새로운 묘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왕가의 계곡에 있는 무덤들은 모두 신왕국 때의 것으로, 왕들의 묘는 험한 바위산을 파고 낭떠러지의 중턱이나 아랫 부분을 파낸 곳에 세워졌다. 그리고 왕묘에 대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 이 묘들은 일반적으로 계단과 경사로로 구성되는 하강 통로, 여러 개의 부속실, 전실,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제 18대 왕조 시대에는 묘의 통로가 도중에 지각으로 구부러지는 직각형이 전형적인 형태였다. 제 18왕조인 이크나톤(ikhnaton) 왕은 도읍을 아마르나로 옮겼고 그 곳의 묘는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구조는 빛의 직진성과 관련되어 태양신을 숭배하던 당시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왕묘는 계속 왕가의 계곡에 세워지게 되었다. 제 18왕조 말의 호르멤헤브(hormemheb) 왕묘 이래로 묘의 구조는 직선형으로 변해갔다. 또 제 20왕조의 람세스 4세 이후는 거대한 입구를 가지게 되었다.1881년 7월, 텔엘바하리의 남쪽 낭떠러지에서 구멍 뚫린 샤프트 묘에서 놀라운 대발견이 있었다. 그 곳에는 금속기나 석제 그릇, 샤프트상 등을 비롯하여 5900점의 부장품과 50구가 넘는 미라가 발견된 것이다. 이 묘는 제 21왕조의 파누젬 2세와 그 가족을 매장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후에 제 22왕조 세숑크(sheshonk) 1세 때 신왕국 시대의 왕과 왕비 미라가 운반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텔엘바하리의 묘를 발견하게 된 것은 한 도굴범의 정보 제공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그의 진술에 따르면 1870년대 초에 이 곳을 발견하여 골동품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많은 부장품이 나돌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더 이상의 도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그로부터 17년 후인 1898년, 프랑스의 한 학자에 의해 왕가의 계곡에서 아멘호테프 2세의 묘가 발견되었다. 그 곳은 입구가 대량의 모래와 자갈에 의해 완전히 매몰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11구의 미라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8개가 왕의 미라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텔엘바하리와 왕가의 계곡에서 2군데의 왕의 미라를 숨겨 놓은 곳이 발견되었다. 왜 이 왕들의 미라는 자신의 묘가 아닌 다른 곳에 숨겨졌을까?신왕국 시대 말기에 왕가의 계곡에서 도굴이 성행하게 되어 많은 왕의 미라가 손상을 입었다. 이 사태를 우려한 아멘 대사제가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송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도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묻혀 있던 수많은 부장품과 금으로 도금한 관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아멘 신관단이 왕의 미라를 옮기면서 부장품을 약탈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합법적인(?) 도굴로 얻은 금은 보화는 아멘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테베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왕의 유체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벌인 일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왕들의 미라는 모두 33구이다. 그 중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은 13구의 미라이다. 그렇다면 또다른 은신처에 이 13구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군데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왕들의 미라를 안장한 목관이나 미라를 쓴 포대에는 미라가 여러 은신처로 이동, 운반되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호르멤헤브 왕묘에는 왕의 미라가 다른 장소로 운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제18왕조 말기에서 제19왕조 초기의 왕들의 미라는 발견되지 않은 제3의 은신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 앞으로의 발굴에서 새로운 왕묘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집트는 이미 기원전 3500년, 부족 국가들이 탄생을 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 경에 최초의 통일 국가인 제1왕조가 세워졌다. 이 때부터 약 2500년동안 26개의 왕조가 생겨났는데 제 10왕조까지를 고왕국, 제17왕조까지를 중왕국, 그 이후를 신왕국이라 부른다. ④ 시리아의 팔미라 고도(古都)사막 위에 솟아오른 환상의 도시 팔미라. 시리아의 동부 사막지대 한복판에 세워진 대도시 팔미라는 흔히 사막의 궁전으로 불리며,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과 경이로 채워준다. 팔미라는 동서를 잇는 교역도시였으며 그로 인해 사방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특유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팔미라가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강과 다마스쿠스 사이의 광할한 사막지대 안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다. 오늘도 이곳의 에프카(efqa)샘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나 일대를 풍요롭게 적셔주고 있다. 이 곳은 10m이상되는 아쟈나무들이 큰 숲을 이뤄 주변의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원래 이 곳 지명의 이름도 타드몰(tadmor : 고대 셈족어로 야자수)이었다. 팔미라는 동쪽의 페르시아 만과 이란, 서쪽의 지중해를 잇는 동서 무역의 중요한 중계지로서 번영하였다. 팔미라에는 많은 상인이 살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인도와 아라비아 산물을 로마 제국으로 운반하였다. 또한 사막을 왕래하며 장사를 하던 카라반(caravan)들이 피곤한 몸을 쉬고 물을 공급받던 사막의 경유지였다. 셀레우스코 왕조 때부터 중개무역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팔미라는 로마가 점령했던 기원전후 약 300년간 전*를 누렸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한 때 이 곳에까지 영향을 * 적도 있었다. 그러나 팔미라는 역사의 대부분을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였다. 이곳을 지나는 대상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사막 교역로를 지켜주는 대가로 통과세를 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팔미라는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희랍과 로마시대가 전*였으며, 이 때 타드몰에서 팔미라로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인 군대를 가진 강력한 도시국가로 발전하기에 이른다.오늘날 팔미라에 남아 있는 유적들의 대부분은 1~3세기의 로마시대에 건축한 것이다. 거친 표면이지만 세련미가 돋보이는 그래서 팔미라를 대표하는 신전인 벨 신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당시의 석조기술을 알 수 있는 원형극장, 벨 신전 맞은편에 있는 나부신전과 개선문, 정치집회장 혹은 시장으로 이용된 아그라와 그 밖의 많은 석주들. 이 모든 유적들을 보면 눈부시고 황홀한 팔미라가 계획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독자성을 유지했던 팔미라의 문화는 그 미술에서 특히 조각에서 확실히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주변의 구릉에 석회암이 풍부했던 덕택이기도 하다. 많은 팔미라의 조각은 양식화된 정적인 미술이고 서아시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팔미라의 서쪽 시외에 북시리아의 황야가 펼치지고 묘지의 계곡이라는 장소에 팔미라 시민의 묘가 있다. 묘는 영원의 집이라 불리며 팔미라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었다. 공동 묘지도 있었으나 유력한 가족은 일족의 묘를 가지고 있었다. 묘의 형식에는 탑묘(塔墓), 가형묘(家形墓), 지하 분묘(地下墳墓) 등이 있었으며 탑묘의 형식은 팔미라 독자의 양식에 근거하고 있다. 서기 260년대에 아데나투스 2세가 팔미라의 왕이 되었다. 그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능해서 팔미라의 융*를 구가했었다. 그러나 그는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272년 그의 왕비 제노비아는 아들에게 황제의 칭호를 수여하고 황제의 어머니로 자처했다. 로마의 황제가 이를 묵과할 리 없었다. 아무렐리안 황제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팔미라로 진군해 성을 포위했다. 제노비아는 포위망을 뚫고 팔미라를 빠져 나왔으나 유프라테스강을 건너려는 순간 로마 기병대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로써 팔미라의 역사를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팔미라는 로마 제국에서 이슬람 왕조로 지배권이 넘어가면서 교통과 군사상 요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오스만 제국 시대가 되자 급속히 쇠퇴하고 말았다. 더욱이 11세기에 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팔미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그 후 몰아치는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팔미라의 유적들은 모조리 모래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1930년대에 와서야 팔미라의 발굴과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16만평에 달하는 팔미라를 발굴하는 작업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금씩 발굴되고 있는 팔미라의 신전과 석주들이 화려했던 팔미라의 옛모습을 현대에 전해주고 있다. ⑤ 바위의 돔 기원전 950년경, 유다 왕국의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안의 동쪽편 산지에 순금으로 장식한 장엄미가 넘치는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성전이 세워진 후 이 지역은 성전산(temple mount)이라 불려지게 되었고 성도 예루살렘의 핵심부가 되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으로 그들 신앙의 중심지요 자부심의 원천이었다.기원전 6세기 초,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도성을 불질렀고 이 때 성전도 소실되게 된다. 유다 왕국의 멸망 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승리로 그들은 해방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폐허가 된 성전을 소규모로 재건하게 된다. 이 때가 기원전 515년경이었다. 성전산 위에 세워진 이 두 번째 성전은 페르시아, 희랍, 로마시대를 거치는 500여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기원전 37년에 로마제국의 후광으로 왕위에 오른 헤롯 왕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을 헐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대규모의 성전과 부속건물, 주변의 요새 등을 원래의 크기와 위용대로 재건하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성전이며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기도 하다.서기 1세기 중엽, 로마제국의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성전 터에 서기 135년경에 하드리안 황제가 이교도의 아도니스(adonis) 신전을 건설하였고, 비잔틴 시대에는 이곳을 통치했던 기독교 인들이 유대인 성전의 파괴를 보여주기 위해 황폐한 모습으로 성전산을 방치하였다. 오직 성전산의 서쪽편 축대인 "통곡의 벽"만이 남아 그곳의 역사를 가늠하게 해 줄 뿐이었다. 서기 638년 이곳을 통치했던 아랍인들은 성전산의 큰 바위 위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선지자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전설에 따라 그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는 바위를 종교적으로 기념 및 보존하기 위해 서기 692년 당시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압둘 말리크는 그들의 대사원을 건축하게 한다.오늘날도 성전산 위에 우뚝 서 있어 예루살렘의 대표적 건축물이 되고 있는 "바위의 돔"이 바로 그것이다. 지름이 78피트, 높이가 108피트인 돔은 구리와 알미늄의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태양빛이 비칠 때는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사된다. 1958~1964년 사이에 사원의 돔을 교체하면서 황금색 칠을 하여 황금사원이라고도 불린다. 정팔각형의 건물인 이 사원 실내 한가운데에는 폭 13m, 높이 1.25~2m, 길이가 18m인 나무로 둘러싸인 넓직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던 제단이라고 전해진다. 표면에는 골이 패어 있어서 제물의 피가 흘러 내리도록 되어 있다.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바위도 바로 이 바위다. 이 때문에 회교에서는 메카 메디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3대 성지로 꼽고 있다.바위의 돔 사원의 모든 벽면에는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랍 건축예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돔 내부에는 대리석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의 색깔, 높이, 두께 등이 모두 제각각이다. 그 이유는 이 기둥들이 비잔틴이나 로마시대 신전의 것으로 복잡한 배경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바위의 돔은 새 단장을 하게 되었다.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650만 달러의 사재로 돔을 24k의 순금으로 씌우게 했다. 1993년 시작된 공사는 15개월간 계속되어 1200장의 얇은 순금 판이 돔 위에 입혀져 진짜 황금의 돔이 되었다 ⑥ 클라크 데 슈발리에(시리아의 십자군 성채) 1096년 유럽 기독교 국가들로 구성된 십자군의 대장정은 오늘날 터키의 최남단 도시 안디옥(현재의 안타키아)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진을 계속하여 1099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교도의 손에서 탈환하자는 구호 밑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승리였다. 이로써 200년간 계속된 십자군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십자군은 남북으로 700km나 되는 이 지역에 50개가 넘는 요새 성채를 축성하였다. 이 성채들은 십자군 건축 양식에 따라 하나같이 장대한 규모를 자랑했지만 13세기말 십자군의 패배와 함께 파괴되었다. 그 후 7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그 골격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 한 곳 예외가 있다. 십자군 시대 성채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 있다. 그 곳은 시리아의 클락 데 슈발리에(crac des chevaliers)라고 부르는 성채이다. 기사의 성채라는 뜻을 가진 이 곳은 당시 성채의 구조와 축성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중세 건축물 가운데 건축법이나 건축미가 매우 뛰어난 것 중 하나로 꼽혀 건축사의 연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십자군은 그 숫자로 볼 때 대군은 아니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십자군 수는 15,000명을 넘지 못했다. 그 후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십자군 기사들은 고작 300명 정도였다. 소수의 십자군이 다수의 적대적인 지역을 관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십자군은 수적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적 요지에 수많은 성채들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장악해 갔다. 십자군 성채는 군사들이 주둔하는 요새였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다. 클락 데 슈발리에는 모슬렘의 중요한 도시 홈스(homs)와 지중해를 잇는 중간지점의 전략적 위치에 세워졌다. 이 성채가 완성되었을 때 모슬렘 사가는 모슬렘 세계의 '목에 박힌 가시'라고 표현했다. 클락 데 슈발리에는 해발 750m의 칼릴(khalil)산 정상에 오각형 형태로 우뚝 서 있다. 길이는 남북으로 200m, 동서로 140m나 되며, 면적만 해도 1만평에 이르는 대단한 규모다. 이 성채의 특징 중 하나는 성벽이 완벽한 이중구조라는 것이다. 우선 든든한 외성이 있고 그 안에 외성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린 내성이 성채를 둘러싸고 있다. 외성과 내성 사이는 도랑을 깊게 파고 물을 채워 해자를 만들었다. 내성은 성벽을 직각으로 쌓지 않고 그 밑부분을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해자를 넘어온 적들이 성밑까지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성 밑부분은 경사지게 만든 것은 성벽자체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지녔다고 한다. 성내부에는 바닥이 꺼지면서 적을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장치, 가득 채우면 몇 년까지 버틸 수 있는 곡식저장소, 거대한 물 저장소, 120m에 달하는 대집회소, 예배소, 식당, 숙소, 미로같은 비밀통로 등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슬람교도인 모슬렘들은 이 성채를 빼앗기 위해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무적의 살라딘도 이 성채를 공략하러 갔다가 성공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다음날 철군했다는 일화도 있다.1271년 이집트의 술탄 베이발스(sultan baybars)는 군대를 이끌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 클락 데 슈발리에를 공격했다. 격전 끝에 외성을 뚫는데는 성공했지만 내성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를 함락시키는 것이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세이발스는 한가지 계략을 꾸몄다.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성안의 십자군들에게 한 통의 밀서가 전달되었다. 그것은 십자군 총사령관이 보낸 밀서였다. 거기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여 유럽으로 퇴각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저항하던 십자군들은 베이발스에게 유럽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귀로를 보장하면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베이발스가 이 조건을 수락하자 십자군 성채에는 백기가 휘날리게 되었다. 사실 그 밀서는 베이발스가 꾸며낸 가짜였다. 그러나 그의 밀서로 인해 성채는 파괴되는 운명을 면할 수 있었다. 1271년 이 성채의 함락을 시작으로 십자군 성채들은 차례로 모슬렘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20년 후인 1291년, 십자군 최후의 보루 아코(acco)가 함락됨으로써 십자군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⑦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를 지구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델포이(델피)를 지구의 배꼽이라 하며 신성시했다. 그리스의 유일한 고고학 유적지라 할 수 있는 델포이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탁의 장소이고 아폴로 신에게 소속된 그리스 최대의 성지로 통한다. 이곳의 델피 박물관에는 이 곳에서 발굴된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델포이 유적의 입구에서 파르나스 산의 구불구불한 참배의 길을 올라가다보면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 아폴로 신전을 볼 수 있다. 길 양쪽으로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헌납한 보물창고와 봉납비, 신상, 건조물이 늘어서 있었으나 지금은 그 대좌와 기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중 프랑스 고고학회가 재건한 아테네인의 보물창고가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는데 도리스식 기둥 2개의 한쪽면에 아테네가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인에게 승리한 것에 대해 아폴로신에게 헌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옆에는 브레프테리온이라는 전물터가 있는데 옛 제전의 평의원들이 사용했던 곳이다. bc 3-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폴로 신전의 내실에는 아폴로 상이 놓여 있었으며 지하실에는 대지의 배꼽(옴파로스)라는 돌이 보관되어 있었다. 현재 이 돌은 델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폴로 신전은 현재 그 기둥과 토대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아폴로 신에 대한 신앙과 그에 의한 신탁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신전이 만들어졌을 당시 그 신전에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곳 바위 틈에서 올라오는 물 기운을 마시며 황홀해진 신관이 아폴로 신에게 신탁을 고했다고 한다. 신전 전실의 벽에는 고대 현인 7명의 격언이 새겨져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아폴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광명, 의술, 궁술, 시, 음악, 예언, 가축의 신이다. 아폴론이라고도 한다. 그는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신이었고 또한 음악의 명수로서 예술의 수호신이 되어 뮤즈의 여신들이 그를 따른다. 그는 때로 태양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폴로가 그리스, 로마인에게는 지성과 문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7대불가사의(7wonders of the modern world) 1)유로터널(영불해협) 영국사람들은 도버해협이라고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칼레해협이라고 일컫는 영불해협의 정식명칭은 '채널(channel)'이라 하며, 이 해협을 육로로 연결시키는 터널의 공식명칭은 '채널터널(channel tunnel)' 또는 채널과 터널을 합성한 신조어인 '처널(chunnel)'로 명명된다.사실상 유로 터널(euro tunnel)이라는 명칭은 이 터널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의 이름이다. 이 회사는 영쇓불 양국정부로부터 건설공사 준공후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권한을 착공시점부터 55년동안 위임받아 관리한 후, 2042년에 양국 정부에 소유권을 넘 겨 주게 된다. 유로 터널사는 15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정부의 자금지이나 보증 없이 주식공모와 은행융자로 조달했다. 이 공사는 국가간의 초대형 인프라건설을 순수민간자본이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94년 터널의 개통이후,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직면했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채무액만 약 750억 프랑(한화 12조원)이고, 한해 지불이자액만 60억 프랑(한화 9600억원)이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96년 12월에는 터널 내부에서 차량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승객과 화물량이 격감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외신에 의하면, '97년도에 이뤄진 유로 터널사의 구 조조정에 이어, 최근 들어 승객과 화물량이 갈수록 폭증하여 머지 않아 흑자전환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즉, 2004년경이면 이자 지급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그 동안 체념(?)하고 있었던 주주들에게 이 익 배당까지 예상된다고 하니, 가히 지옥에서 천당으로의 위상변화 가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나아가서, 제2의 해저터널건설계획이 날 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기존의 포크스톤과 칼레를 왕래하는 기차전용의 터널은 201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제2의 터널은 기존의 터널과 나란히 달리는 자동차 전용터널로 건설되는데, 이 노선의 청사진은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cn tower(캐나다) 지상에서 높이 553m이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라 할만 하다. 워낙 높다 보니 바로 밑에서 보면 바람에 타워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남산 타워처럼 통신용으로 지었다가 개방하였는데 평일에도 줄을 서야 할만큼 붐비는 관광 명소이다.입구로 들어서면 매표소 앞의 인파부터 볼 것이다. 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시설은 빼고 엘리베이터 표만 사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다 보니 탑승 시간이 적혀 있다. 그 동안에는 밖에 나와 타워 외벽에서 등산 연습하는 사람도 보고 군것질 하면서 타워를 올려다 보는 것도 좋을 듯. 초고속 전망 엘리베이터는 58초 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 닿는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출입문 쪽에 서면 전망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줄서서 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보게 된다. 좋은 자리 얻는 것도 운이다. 3)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미국)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건축가 슈립 람하먼의 설계로 뉴욕 한복판에 102층 철골구조로 건축었으며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좁아져야 한다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계단식 설계로 되어 있다.381미터 높이에 6천 4백여 개의 창, 64대의 엘리베이터, 화장실만도 2천 5백 개가 넘는다. 청소부 2백여 명을 합쳐 모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빌딩 안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일 찾는 관광객만도 4만 명이다. 또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최단기 최고층 건설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불과 1년 45일 만에 당초 예정보다 크게 밑도는 비용을 들여 완공했는데, 빠른 시공과 함께 그 견고함은 지금은 건축가들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정도.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는 원래 뉴욕의 별칭이다. 1972년 맨해튼 남쪽에 세 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들어설 때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41년간 세계 최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지금도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린다 4)금문교(미국) 1933년에 착공하여 1937년에 완공한 다리로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머린군을 연결하고 있다. 길이 2730m, 폭 27m로 매일 10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경치를 바라보며 걸어서 건널 수도 있다. 다리의 양쪽에는 비스타 포인트라는 전망대가 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아름답다. 5)이타이푸댐(브라질/파라과이) 댐높이 196m. 길이 7.37km. 저수량 190억m3. 중공중력(中空重力), 록필, 어스필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조합한 콤바인댐으로, 1975년에 착공하여 1982년에 준공되었으며, 총출력 1만 2,600kw이다. 6)북해보호공사(네덜란드) 7)파나마운하(파나마)이다.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에서 대서양 연안의 크리스토발까지 전장 64 km. 카리브해(海)로 흘러드는 차그레스강(江)을 막아 축조한 가툰호(면적 약 420 km2) 안에 만들어진 34 km의 수로 및 파나마만(灣) 쪽의 미라플로레스호(湖) 안에 만들어진 1.6 km의 수로와, 이 두 호수 사이에서 지협의 척추 구실을 하는 구릉지를 15 km나 파헤쳐 만든 쿨레브라 수로(에스파냐어로 ‘새우’라는 뜻, 굴착 감독자의 이름을 기념하여 게일라드 수로라고도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가툰호와 쿨레브라 수로의 수면표고(水面標高)는 25.9 m, 미라플로레스호의 수면표고는 16 m이다. 이 두 호수 사이의 표고차는 물론 호수와 해면(海面)의 표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갑문방식(閘門方式)이 이용되고 있다. 파나마만에서 미라플로레스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2단식(二段式) 미라플로레스 갑문, 여기에서 쿨레브라 수로로 통하는 입구에는 1단식의 페드로미겔 갑문, 가툰호에서 카리브만으로 나가는 출구에는 3단식 가툰 갑문이 건설되어 있다. 연간 평균 이용 선박의 수는 1만 5000척, 운하를 통과하는 데에는 약 8시간이 걸린다. 이거쓴 사람... 그냥 인간 건축물이 다 미스테리라고 할사람인듯... 몇개는 나도 신기하지만.. ㅋㅋ 피라미드는... 아무리생각해도... 그시대에 어떻게 지었는지가 궁금... [밀리터리] 해병대 출신 연예인들. 동기하고 전화통화 와중에 몰랐던 사실에 굉장한 흥미를 느껴서 올려봅니다... 이분도 해병대 출신이었네...하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가쉽성으로 재미있게 봐수시실... 허정무 현 축구국가대표 감독님...요즘 국대 욕하고...감독 욕하다 동기에 대선배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농담섞인 핀잔듣고 알았네요...ㅋㅋ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기원합니다...^^ 임혁필 임혁필....많이들 알고 계신분이죠...708기 선배님이시라고...베리모는 쓰고 있지만 수색출신은 아니시라고... 암튼 저희때엔 전설의 700자 이셨군요...ㅋㅋ 개인적으로도 팬이라능...나가있어~~~왜 요즘 안나오시는지... 김상중....570기 선임....IBS제대 출신이라고 하시네요...그렇담 2,3,7연대중 2대대 출신이셨겠네요. 이분도 해병대 연계관계없이 팬이라능...연기 잘하시죠...특히 내남자의 여자...참 재미있게 봤네요. 딱 봐도 멋지죠...아우라가....ㅋ 임채무님....개인적으로 해병대 출신 연예인중 가장 멋있다고 느껴지는 분이십니다. 요즘 MBC일일 드라마에서는 완전 밉상으로 나오신다는데...한번도 본적은 없는데...엄니가 욕하시는걸로 봐선... 굉장한 연기력??을 시전하고 계신듯 합니다...ㅋㅋ 연예계 쪽에서도 덕망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 하다더군요... 송강호님....이십니다....오늘 처음 알았습니다....송강호님 해병대 출신이셨던것은요.... 이분은 제가 진짜 왕팬인데...수많이 좋아하는 이유중 하나가 더 생겼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죠... 조상구님 이십니다...시라소니로 많이들 알고계시더군요...230자 라고 하시더군요.... 배우보다는 번역가...로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남진님 204기 선임이시랍니다....많이들 알고계시듯...월남파병용사 이시죠.... 그래도 노래는 나훈아라능...ㅋㅋㅋ ㅈㅅ....ㅋ 김흥국님은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방송에서 하도 그래서...개인적으로 별로라...제외했음.... ..... 흥미롭거나 의외였던 분들이 꽤 있어서 가쉽성으로 괜찮을듯 해서 올려봅니다.
[밀리터리] 해병대 출신 연예인들. 동기하고 전화통화 와중에 몰랐던 사실에 굉장한 흥미를 느껴서 올려봅니다... 이분도 해병대 출신이었네...하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가쉽성으로 재미있게 봐수시실... 허정무 현 축구국가대표 감독님...요즘 국대 욕하고...감독 욕하다 동기에 대선배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농담섞인 핀잔듣고 알았네요...ㅋㅋ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기원합니다...^^ 임혁필 임혁필....많이들 알고 계신분이죠...708기 선배님이시라고...베리모는 쓰고 있지만 수색출신은 아니시라고... 암튼 저희때엔 전설의 700자 이셨군요...ㅋㅋ 개인적으로도 팬이라능...나가있어~~~왜 요즘 안나오시는지... 김상중....570기 선임....IBS제대 출신이라고 하시네요...그렇담 2,3,7연대중 2대대 출신이셨겠네요. 이분도 해병대 연계관계없이 팬이라능...연기 잘하시죠...특히 내남자의 여자...참 재미있게 봤네요. 딱 봐도 멋지죠...아우라가....ㅋ 임채무님....개인적으로 해병대 출신 연예인중 가장 멋있다고 느껴지는 분이십니다. 요즘 MBC일일 드라마에서는 완전 밉상으로 나오신다는데...한번도 본적은 없는데...엄니가 욕하시는걸로 봐선... 굉장한 연기력??을 시전하고 계신듯 합니다...ㅋㅋ 연예계 쪽에서도 덕망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 하다더군요... 송강호님....이십니다....오늘 처음 알았습니다....송강호님 해병대 출신이셨던것은요.... 이분은 제가 진짜 왕팬인데...수많이 좋아하는 이유중 하나가 더 생겼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죠... 조상구님 이십니다...시라소니로 많이들 알고계시더군요...230자 라고 하시더군요.... 배우보다는 번역가...로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남진님 204기 선임이시랍니다....많이들 알고계시듯...월남파병용사 이시죠.... 그래도 노래는 나훈아라능...ㅋㅋㅋ ㅈㅅ....ㅋ 김흥국님은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방송에서 하도 그래서...개인적으로 별로라...제외했음.... ..... 흥미롭거나 의외였던 분들이 꽤 있어서 가쉽성으로 괜찮을듯 해서 올려봅니다. [정치·경제·사회] 박정희 시대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의 경제쟁책들.. 그니까 5개년 경제개발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전부 박정희가 갈아엎은 장면정부가 구상해놓고 실행 준비하던 것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거기서 외자를 도입하려고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으며 졸속으로 일본과 수교를 맺고 베트남전에 국군을 보냈다고.. 물론 저는 새마을 운동은 꽤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의 원인이 어떤 훌룡한 정책 그니까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 하루 18시간 동안의 노동을 강요하던 노동착취와 국군과 역사를 팔아서 벌어온 외자 덕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정부 당시에는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 교섭을 시도했고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이였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시에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독재체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분권적인 형태였고 북한에서도 평화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고, 그 명분으로 반공을 내세웠기 떄문에 그래서 무조건 적인 반공 정신을 세뇌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맹목적이면서도 극렬한 반공주의자가 생겼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배운거 하나 없는 이분들은 이승만으로부터 내려오는 한민당의 계보 (이승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이명박) 의 집권을 위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거죠 게다가 쿠데타로 인해 정통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만들기위해 교묘하게 지역감정을 유발시켰고, 아직까지 내려오는 지역간의 분쟁과 그에 따라는 폐단은 여기에 기인한다봅니다 다음은 박정희 시대의 여러가지 자료들입니다 1970년 노동착취에 항거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을 그린 영화의 한장면입니다 대선에서 박정희 630만표, 김대중 540만표 박정희가 휘하의 대략 100만명 가까이의 군인 밑 한민당 추종세력을 동원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김대중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시작하는 한편,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유신체제에서 박정희는 초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로서 설치되었습니다 위의 일들보다 조금 먼저 1965년에 있었던 베트남 파병입니다 가수 남진씨도 말했듯이, 겉으로는 의용의 모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것이였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발단이 된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사건입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를 비난하자 박정희는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해버립니다 그러자 부산-마산에서 부마시민항쟁이 터졌고 박정희가 이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려하던 시기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합니다 민중이 현재의 주체가 되려면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 박정희의 업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경제성장의 모습을 자세히 훑어보면 노동착취와 일부 재벌중심 기업구조 등등의 여러가지 폐단이 발견됩니다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보수계열의 언론이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박정희를 평가하는 과오를 범해선 안될거같습니다 출처 : 다음 - 이종격투기 카페 : 베르뎅님..
[정치·경제·사회] 박정희 시대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의 경제쟁책들.. 그니까 5개년 경제개발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전부 박정희가 갈아엎은 장면정부가 구상해놓고 실행 준비하던 것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거기서 외자를 도입하려고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으며 졸속으로 일본과 수교를 맺고 베트남전에 국군을 보냈다고.. 물론 저는 새마을 운동은 꽤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의 원인이 어떤 훌룡한 정책 그니까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 하루 18시간 동안의 노동을 강요하던 노동착취와 국군과 역사를 팔아서 벌어온 외자 덕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정부 당시에는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 교섭을 시도했고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이였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시에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독재체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분권적인 형태였고 북한에서도 평화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고, 그 명분으로 반공을 내세웠기 떄문에 그래서 무조건 적인 반공 정신을 세뇌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맹목적이면서도 극렬한 반공주의자가 생겼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배운거 하나 없는 이분들은 이승만으로부터 내려오는 한민당의 계보 (이승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이명박) 의 집권을 위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거죠 게다가 쿠데타로 인해 정통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만들기위해 교묘하게 지역감정을 유발시켰고, 아직까지 내려오는 지역간의 분쟁과 그에 따라는 폐단은 여기에 기인한다봅니다 다음은 박정희 시대의 여러가지 자료들입니다 1970년 노동착취에 항거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을 그린 영화의 한장면입니다 대선에서 박정희 630만표, 김대중 540만표 박정희가 휘하의 대략 100만명 가까이의 군인 밑 한민당 추종세력을 동원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김대중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시작하는 한편,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유신체제에서 박정희는 초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로서 설치되었습니다 위의 일들보다 조금 먼저 1965년에 있었던 베트남 파병입니다 가수 남진씨도 말했듯이, 겉으로는 의용의 모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것이였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발단이 된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사건입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를 비난하자 박정희는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해버립니다 그러자 부산-마산에서 부마시민항쟁이 터졌고 박정희가 이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려하던 시기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합니다 민중이 현재의 주체가 되려면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 박정희의 업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경제성장의 모습을 자세히 훑어보면 노동착취와 일부 재벌중심 기업구조 등등의 여러가지 폐단이 발견됩니다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보수계열의 언론이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박정희를 평가하는 과오를 범해선 안될거같습니다 출처 : 다음 - 이종격투기 카페 : 베르뎅님.. [밀리터리] 북한의 對南 기습전 시나리오. 주공은 육군, 조공은 해군 주공(主攻)은 ‘서울을 전투화로 밟아버리려는’ 지상전 세력 조공(助攻)은 ‘훅을 날리듯’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해군력이정훈 국방 전문기자가 분석하는 북한의 對南 기습전 시나리오 이정훈│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1월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나서서 전면대결을 선언하더니, 1월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이하 조평통)가 남북 간 모든 정치·군사상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평통 성명의 위협 수위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높았다. 조평통은 ‘리명박 패당’ ‘리명박 역도’란 단어를 써가며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火)과 불, 철(鐵)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 “역적 패당이… 북남 수뇌상봉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전면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론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반(反)공화국 대결 광란의 앞장에는 리명박 역도가 서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nll)상에서 도발할 수 있다. 북한의 협박은 예사로이 보아 넘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민들의 출어 횟수를 급격히 줄이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최악의 상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전면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역량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도발을 남북통일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일으킬 수 있는 전면전의 양상과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통일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자. 제약을 받는 북한군 기습 작전의 요체는 적은 수의 전력으로 최대 전과를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리에 내가 가진 모든 세력을 모아 ‘기습(奇襲)’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군은 ‘집중과 기습’을 핵으로 한 공격 작전을 펼친다. 하지만 집중과 기습 작전은 주변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남북한 군의 전력 차이, 남북한 국력 차이 등 주어진 조건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기습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기습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기습은 기습 대상 포인트로 부대를 기동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기동은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전 능력은, 특히 한미연합군의 정보전 능력은 대단히 발전했기에, 북한은 한미연합군 정보 부대를 완전히 속여 넘기면서까지 부대를 기동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군은 ‘연막’을 피운다. 내부적으로 ‘통상적인 훈련을 한다’는 등의 교신을 주고받으며 부대를 기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많은 부대를 기동시키면 한미연합 정보부대가 통상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므로, 꼭 기동시켜야 하는 부대만 움직인다. 나머지 부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실제 공격에 들어가는 ‘h-아워’를 기다리게 한다. 군사작전 용어 중에 tot라는 것이 있다. 포병사격 때 많이 쓰이는 말인데 ‘time on target’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tot 사격은 동일 시간에 모든 포탄을 같은 목표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기습을 할 때는 tot사격원리를 적용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서울은 휴전선에 아주 가까이 있어 기습전을 펼칠 대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서울이 점령되면 대한민국은 머리를 잡힌 뱀처럼 온몸을 꿈틀거려보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한다. 따라서 단시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미국 증원군이 한반도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기습전이 된다. 공격전은 ‘주공(主攻)’과 ‘조공(助攻)’으로 나눠 감행한다. 목표 달성은 주공세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조공이 달성하기도 한다. 상대가 아군 작전을 눈치 채고 주공 진격루트에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면, 조공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목표점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왼쪽 사진 앞)과 해성 함대함 미사일(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윤영하급 고속함. 한국의 수상함 전력은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경기만(灣) 상륙 노리는 북한 해군 서울은 휴전선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아주 가까이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주공은 ‘서울을 전투화로 밟아버리려는’ 지상전 세력이 되고, 조공은 ‘훅을 날리듯’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해군 세력이 된다. 그러나 조공인 해군 세력도 서울 점령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 휴전선 바로 북쪽에는 서쪽에서부터 4-2-5-1로 이어지는 북한 육군의 4개 전연(前緣) 군단이 있다. 휴전선에 붙어 있기에 북한은 이 군단을 동원해 휴전선 돌파라는 1차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은 바로 nll을 돌파하지 못한다. 이유는 주력 함정이 후방 수역에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데이’가 다가오면 북한 해군은 tot 사격 원리에 따라 후방에 있는 대형 함정을 먼저 기동시키고,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작은 함정을 움직여 모든 함정이 동일 시간에 nll 선상의 한 포인트로 몰려들게 한다. 이러한 공격전을 펼칠 때 북한 해군은 한국 해군(또는 한미 연합해군)과 맞서는 고전적인 해상전은 극력 회피한다. 이유는 북한 해군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이다. 80~100척의 北 수상전단 한국 해군은 만재 t수가 1만t이 넘는 이지스 구축함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은 1500t급인 나진급 구축함 2척뿐이다. 현재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 울산급 호위함 9척 등 1500t이 넘는 함정을 20척 보유하고 있어, 고전적인 해전을 벌이면 한순간에 북한 해군을 궤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해군은 한국 함대와의 교전을 피하며 nll상의 특정 포인트를 뚫고 들어가 인천을 비롯한 경기만(灣) 일대에, 한국 해군의 udt 부대와 비슷한 ‘해상저격여단’ 등 특수부대를 상륙시키는 작전에 주력한다. 해상저격여단을 상륙시킬 수 있다면 여타 함정은 ‘사석(捨石)’으로 버려도 좋다는 것이 북한 해군의 의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 해군은 이 돌격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후방에 있던 나진급 등 대형 함정은 nll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d 마이너스 1일이나 d 마이너스 2일부터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 듯한 교신을 주고받으며 남진에 들어간다. 그리고 소호급 호위함과 사리원급-소주급-오사급 유도탄정 등이 순차적으로 연쇄 남진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동을 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수상전단(sag·surface attack group)’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북한 함정들이 nll의 한 점을 향해 모여드는 것이 발견되면, 한국 해군은 ‘수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대응에 들어간다. 한국 해군이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 해안에 포진해 있는 지대함 미사일부대다. 과거 북한 해군은 서해를 향해 삐죽 나와 있는 황해도 남쪽 해안에, 본래는 구소련에서 개발됐으나 중국이 도입해 복제생산을 많이 했기에, 비단생산이 많은 중국을 빗대 nato가 ‘실크웜(silkworm·비단벌레)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지대함 미사일을 많이 배치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근래 이란 등에 수출하는 형태로 전부 폐기해버리고 자체 개발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최근까지 북한은 새로 개발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성능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면,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투의 기사를 반복해서 보도했다. 북한군이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을 가동하는 것은, ‘표적’인 한국 함정에 추적 레이더를 쏜다는 뜻이 된다. 한국 함정에는 상대가 쏜 추적 레이더파에 접촉됐음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있다. 이 경보가 울리면 한국 함정은 긴장한다. 전투를 할 때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 殺他)’다. 내가 살아야 상대를 죽일 수 있으니,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로 도피해야 한다. 레이더파 수신 경보장치가 울리면 한국 함정은 후방 수역으로 후퇴하거나, 레이더파가 닿지 못하는 섬 뒤로 숨는다. 그로 인해 nll의 방어가 약해지는데 그 틈을 타 북한의 수상전단 세력은 일제히 nll선을 넘는다. 이 수상전단 세력의 최선봉에 선 것이 유도탄정이다. 북한 유도탄정은 사거리가 46km 정도인 ‘스틱스(styx)’ 미사일을 달고 있다. 스틱스도 실크웜 못지않은 구식 무기다. 하지만 북한이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과 연동해 작전을 펼치면 위협이 된다. 유도탄정이 송곳처럼 nll을 뚫어주면 그 뒤를 따라 해상저격여단을 태운 공기부양정과 이들을 엄호하는 고속정 세력이 따라온다. 나진급 등 대형함정은 한국 미사일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지므로 nll 이북에 남아 탑재한 미사일로 엄호하는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도탄정을 선봉에 세운 공격부대의 침로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된다. 첫째 이유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로 침투해야 황해도 해안에 있는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상전단을 따라 들어올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의 특성 때문이다. 구축함이나 유도탄정은 덩치가 크고 탑재하는 연료도 많기에 파도가 높은 외해(外海)를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은 배가 작아 파도가 큰 외해에서는 제대로 항해하지 못한다. 탑재연료량도 적기에 이들의 작전공간은 ‘연안(沿岸)’으로 한정된다. 유도탄정도 한국 함정 기준으로 보면 고속정 크기에 불과하므로 이들도 외해 작전을 하지 못한다. 작은 함정으로 편성된 북한 해군의 한계가 ‘외해 작전 불가(不可)’라는 제약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만 침투라는 목적만큼은 추진해볼 수 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은 한국 해군의 고속정이 들어올 수 없는 수심이 얕은 바다와 갯벌 위에서도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기에, 한국 해군은 두 눈을 뜨고도 이들의 침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공기부양정 세력이 경기만 일대에 상륙해 해상저격여단원을 내려놓게 되면 상황이 급변한다. 경기만 일대는 인천을 비롯해 도시화된 지역이 많기에 상륙한 해상저력여단은 침투지에서 보급문제를 해결해가며 차량 등을 탈취해 서울로 진격하거나,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 수도권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게릴라전을 펼친다. 이것이 유사시 북한 해군이 펼칠 수 있는 기습전 양상인데, 이러한 ‘서든 어택(sudden attack)’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f-15k(왼쪽)과 kf-16(오른쪽)은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북한 육해공군부대를 날려버리는 기동타격대 역할을 한다. 한국 해·공군의 火網 한국군 총사령관은 대통령이다. 유사시 한국의 안전지수는 대통령이 언제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바다에는 숨을 곳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함정이 tot 사격 개념으로 수상한 기동을 하면 그 사실은 금방 한미연합 정보부대에 포착돼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때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대응작전 감행도 건의하는데, 두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바로 대응작전에 들어간다. 대응작전은 한국군 합참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한미연합사 주도로 한미 양군이 연합으로 할 수도 있다. 대응작전은 후방에 있는 북한 함정들이 발진하는 d 마이너스 2일 무렵에 시작된다. 한국 육군의 유도탄사령부는 현무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무는 정밀 타격을 하지 못하기에 함정처럼 작은 목표는 잡지 못한다. 몇 해 전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크루즈 미사일인 ‘천룡’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천룡은 크루즈 미사일이기에 초정밀 사격이 가능하다. 유도탄사령부는 천룡을 발사해 북한 함대기지를 공격한다. 현대전은 미사일과 공군기의 공간인 하늘에서 시작된다. 병력과 병력이 충돌하기 전에 미사일과 공군기가 까맣게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a(air)-데이 작전’이라고 한다. a-데이 작전의 주력은 굉음을 울리며 출격하는 전투기 세력이다. 합참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는 북한 지역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함정 공격에 나선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북한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전 거리가 긴 것은 대구기지와 해미기지 등에 포진한 f-15k와 kf-16이다. 이들은 함정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미제 ‘하푼’ 미사일을 달고 출격한다. 이러한 f-15k와 kf-16에 위협을 주는 것이 휴전선 북방에 포진한 북한의 대공(對空)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 부대다. 이들은 미 공군이 제공하는 대공(對空)제압기 세력으로 일거에 무력화한다. 해군도 a-데이 작전에 참여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천룡을 토대로 함대지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다. 한국형 토마호크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해군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다. 한국형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가 넘는다. 따라서 북한이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훨씬 뒤에서 북한 함정의 발진기지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을지문덕함을 비롯한 한국 해군 2함대 세력의 상당수는 국산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海星)’을 탑재하고 있다. 해성은 미국제 함대함 미사일인 하푼보다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다. 해성의 사거리는 150여 km로 알려져 있다. 북한 수상전단이 연안을 따라 남하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있는 육지로부터 꽤 떨어진 곳으로 항해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나간 한국 함정들은, 북한 수상전단을 해성 미사일 사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북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 포진한 해군 2함대 세력은 해성을 발사해 고속으로 남진하는 북한 함정을 날려버린다. 스틱스 미사일을 싣고 최선봉으로 돌진하는 북한의 유도탄정은 해성 미사일을 탑재한 한국의 윤영하급 고속함이 상대한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레이더파에 덜 접촉되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기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과 스틱스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 작전할 수 있다. 한국 해공군이 펼친 a-데이 작전에 상당수 북한 함정이 격파된다. ‘한국 해공군이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화망(火網)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란 문제는 북한 서해함대가 풀어야 할 최대 고민이다. 그래서 택한 전술이 이른바‘떼거리 전법’이다. 80~100척의 함정을 한꺼번에 돌격시키면, 상당수는 한국 해공군 방어??걸려 격파되어도, 일부는 살아남아 경기만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nll을 돌파한 공기부양정 세력이 경기만에 진입하면 한국 해공군은 한국 국민이 당할 피해를 의식해 마음껏 사격하지 못한다. 그 틈을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꺾으려면 한국은 해성이나 한국형 토마호크를 이용한 ‘큰 타격’이 아니라 북한 공기부양정을 족집게로 집어서 정확히 날려버리는 ‘작은 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륙한 특수부대 향해 포 사격 이러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가 바로 주한 미2사단의 ‘아파치 롱보 헬기 대대’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 간 작전권 이양 합의에 따라 이 대대는 오는 3월 한국에서 철수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간다. 한국으로서는 경기만을 지키는 ‘풀백’을 놓친 셈이 된다. 하지만 준비해놓은 ‘후보’가 있었다. 정식명칭이 공군 성남기지인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5혼성비행단 소속 ka-1 공격기 대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유사시 ka-1 부대는 작전에 큰 지장을 받는다. 긴급 출격하는 ka-1이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때문에 최근 공군은 아예 ka-1 대대를 서울공항에서 빼내기로 했다. 주전 풀백은 다른 팀으로 이전시키고, 후보 풀백은 작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빼내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되면 ‘골키퍼’가 페널티에어리어(육지)에 상륙한 상대 공격수(해상저격여단)를 막아야 한다. 경기도 서부지역을 지키는 ‘골키퍼’는 육군 17사단과 해병 2사단을 주력으로 한 육군의 수도군단이다. 그런데 해병 2사단은 김포반도와 강화도 방어에 주력하므로, 그 후방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해상저격여단을 막는 것은 육군 17사단의 몫이다. 미해군의 공기부양정 앞에서 상륙해 들어오는 한국 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위). 독도함에 전개된 헬기부대. 공격수는 아크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nll상에서부터 상대 수비수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페널티라인까지 들어왔기에 상당히 지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특공대원들이라고 하더라도 30노트(시속 약 60km) 이상으로 달리는 공기부양정을 타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수비수인 한국 해공군이 퍼붓는 화망을 뚫고 나와야 했으니 이들의 속은 까맣게 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7사단은 요소요소에 기동타격대를 배치했다가 이들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날아오면 긴급 출동하는 형식으로 대처한다. 그런데 기동타격대의 출동보다 더 좋은 제압법이 있다. 육지에 상륙한 해상저격여단을 향해 포 사격을 가하는 것이다. 포 사격은 ‘파김치’가 돼 상륙한 해상저격여단원을 기동타격대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강력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서해안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라 곳곳에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인이 희생되더라도 포 사격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17사단을 통제하는 수도군단의 오랜 고민이었다. 수도군단의 포병여단은 17사단의 포병대대보다 월등히 우수한 포를 갖고 있으므로 수도군단은 포 사격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격을 한다’는 것이었다. 대(大)를 위해서는 소(小)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포사격으로 해상저격여단은 거의 전멸될 것으로 보인다. 포사격으로 시작되는 지상전 이렇게 서해를 통한 북한 조공 세력의 공격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지상에서는 북한 주공 세력의 공격을 놓고 보다 심각한 전투가 벌어진다. 지상전은 포격으로 시작된다. tot 사격으로 적진을 초토화하는 틈새를 이용해 아군 기갑과 보병부대를 진격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돌격이기 때문이다. 휴전선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 전연군단도 이런 식으로 기습한다. 북한 화포가 불을 뿜으면 한국 육군 포병도 맞대응한다. 북한은 전연지대에 방사포 등 대형 포를 많이 배치했지만, 한국 육군도 k-9 자주포와 한국판 방사포인 mlrs(다연장로켓) 그리고 155mm 포 등 장사정포를 즐비하게 깔아놓았다. 이러한 장사정포 앞에 105mm 포대가 있다. 이들은 평상시 훈련받은 그대로 tot 사격에 들어간다. 북한군은 한미연합공군의 폭격을 의식해 장사정포를 갱도(지하)진지에 넣어놓았기에 평소에는 장사정 포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연합 정보부대의 고민이다. 그러나 한국 육군은 ‘대(對)포병 레이더’를 갖고 있다. 대포병 레이더는 미 공군의 대공(對空)제압기와 비슷한 구실을 한다. 적이 쏜 포탄이 발사된 곳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포병 레이더가 불을 뿜고 있는 북한군 장사정 포대의 위치를 잡아주면, 한국군 포병부대는 일제히 그쪽으로 화구를 돌린다. 북한군 장사정 포대의 위치가 확인되면 초정밀 레이저 유도폭탄인 jdam을 탑재한 공군기도 공격에 가세한다. 그로 인해 서울에 포탄을 떨어뜨려 공포감을 극대화하던 북한의 장사정 포대는 곧 잠잠해지게 된다. 이러한 포격전은 d 마이너스 2일쯤 시작돼 북한군 보병과 기갑부대가 실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d-데이, h-아워 직전까지 이어진다.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지는 포격전은 전면전으로 이해되기에, 한국 대통령은 이때쯤 수상전단을 만드는 북한 함정을 향한 해·공군의 사격을 ‘충분히’ 허락할 수 있게 된다. 대포병 레이더의 위력 포 사격전의 열세에도 북한군이 정해진 작계(作計)대로 전연군단에 배속된 기갑과 보병부대를 앞세워 군사분계선 돌파를 시도한다면 한국 육군도 대응작전에 들어간다. 4-2-5-1로 이어지는 북한의 4개 군단 가운데 주공은 서울 북방에 있는 4군단과 2군단이 맡을 전망이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5군단과 1군단은 조공이 된다. 각각의 북한 군단은 다시 주공과 조공을 편성하고, 한국 육군을 속이는 양동(陽動)작전을 구사한다. 양동작전이란 성동격서(聲東擊西)전법으로, 소규모 병력을 엉뚱한 곳으로 요란하게 기동시켜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을 전연(前緣)지역이라고 하는 데 반해, 한국군은 페바(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 전투지역전단) 지역이라고 한다. 한국 육군은 페바 지역에 서쪽에서부터 수도-1-5-6-2-3-8의 6개 군단을 깔아 놓았다. 이 가운데 수도군단은 군사분계선 구실을 하는 폭이 매우 넓은 한강 하구 남쪽에 있어 북한군과 직접적인 교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군단은 공기부양정을 타고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북한 해상저격여단을 막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따라서 5개 페바 군단이 북한의 4개 전연군단과 충돌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 주공세력인 4군단과 충돌하는 문산 라인의 1군단과 북한의 2군단과 싸울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 라인의 5군단이다. 한국군 1군단과 5군단에 주어진 최대 임무는 북한군의 돌격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거부 작전’이다. gp, gop 부대의 기능 1군단과 5군단은 다른 군단보다 강한 포병여단을 갖고 있다. 북한군 4군단과 2군단 세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1군단과 5군단 포병은 계속해서 불을 뿜는다. 그러나 이 부대가 포탄을 떨어뜨리는 지점은 이동한다. d-데이, h-아워 이전에는 북한군 포대를 향해 포탄을 쐈으나 인민군의 진격이 시작되면 한국 육군 수색대가 들어가 있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군 수색대가 아군 포격에 희생될 수 있다. 그러나 수색대는 포격전이 시작되는 순간 ‘철옹성’으로 불리는 gp(guard post·경계초소)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안에는 식량과 탄약이 충분히 보관돼 있으므로 수색대원들은 포성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gp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밖에서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부대는 gp를 제압하지 못하고 통과한다. 이러한 수색대의 후방에 gop(general out post·일반전초) 대대들이 포진해 있다. gop 대대들도 후퇴하지 않고 진지 안에 숨는데, 이 진지 또한 난공불락이기에 진격하는 북한군은 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군 페바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 그때부터 gp와 gop에 숨어 있던 한국군들이 나와서 앞쪽으로 전진한 북한군 진격부대의 후방을 교란한다. 공격하는 부대는 숨을 곳이 없기에 방어에 취약하다. 남북한 군이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면 1군단과 5군단은 항공작전사에서 배속받은 코브라 공격헬기 여단과 예하 전차대대를 이용해 북한군 4군단과 2군단을 쓸기 시작한다. 남북한 군의 전력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한국군은 d 플러스 5일이 오기 전에 북한군의 공세를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거부작전이 실패해 서울이 위태로워지면 후방에 있던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이 참전한다. 한국군 7군단은 맹호(수도기계화보병사단)와 불무리 결전(20기계화보병사단) 두 개 사단으로 편성된 전형적인 기계화군단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 출동없이 1군단과 5군단은 북한전연군단의 공격을 막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이 북한군 진격을 막아 세우면 ‘전략 예비부대’인 7군단이 기회를 노린다. 공격하는 부대는 대오가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한미연합 정보부대가 그러한 틈을 찾아주면, 7군단은 전차여단과 장갑차여단을 동원해 벼락같이 그쪽으로 치고 나간다. 이름하여 ‘공세이전’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7군단이 공격에 들어갈 때 항공작전사령부는 코브라 헬기여단을 7군단 예하로 전환시켜준다. 7군단은 하늘에서는 코브라 공격헬기로, 땅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로 밀어붙이는 입체고속기동전을 펼치며 전과를 확대해간다. 7군단의 작전 목표는 경기 지역으로 밀고 내??북한군 4군단과 2군단 뒤로 들어가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 4군단과 2군단은 한국군 1군단과 5군단, 7군단에 포위돼 섬멸 위기에 빠진다. 북한군도 4개 전연군단 뒤에 전략 예비부대를 두고 있다. 815기계화군단-620포병군단-820기갑군단-806기계화군단이 그들이다(서쪽에서부터). 이 4개 기동군단의 임무는 4개 전연군단이 서울까지의 진격로를 뚫어주면 그 후 진격전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전을 하기도 전에 한국군 7군단이 들어와 4군단과 2군단의 후방을 차단해버리면 이 4개 기동부대는 7군단을 잡기 위한 기동에 들어간다. 이때 다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현무와 천룡 미사일을 운용하는 한국 육군의 유도탄사령부와 한국 공군의 작전사령부다. 두 부대는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 4개 기동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한반도 유사시 공군은 포커판의 ‘조커’처럼 활약한다. 육군과 해군은 북한군 주공·조공과 싸우는 고유 임무를 부여받지만, 남북한 공군력은 현격한 차이가 나기에 공군은 조기에 북한 공군을 격멸하고 적기(適期))에 육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을 펼친다. 한국 공군은 jdam을 비롯한 초정밀 무기 확보에 노력해왔다. 공군작전사령부는 개전 직후 예하 북부전투사령부와 전투비행단을 동원해 전연지대에 있는 북한군 레이더 기지와 방공미사일 부대를 격파하고, 7군단이 주도한 공세이전 작전이 성공하면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이 기동하지 못하도록 jdam 같은 초정밀 폭탄을 달고 가 이들을 공격한다. 전세를 결정짓는 공중전 이때 한국에 있는 미7공군은 물론이고 괌에 있는 미 13공군, 알래스카에 있는 미 11공군, 일본에 있는 미 5공군,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母港)으로 한 미 7함대 해군 전투비행단까지 가세한다면, 그리고 한국군 유도탄사령부와 미 7함대 함정이 일제히 현무와 천룡, 토마호크를 쏘아 올리면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돈좌(頓挫)한다. 그러는 사이 경기도 동부에 있는 한국군 6군단과 강원도 전선에 포진한 한국군 2-3-8군단이 북한의 5-1군단을 꽉 붙잡아 놓는다. 이로써 북한군 4-2군단은 고립무원이 돼 궤멸되고 만다. 그리고 a-데이 작전으로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이 꺽이고 동부전선의 북한군 5-1군단도 궤멸된다면 한국 육군은 ‘역사적인’ 격멸(擊滅)작전에 들어간다. 격멸작전은 북한정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격멸작전을 완수하려면 한국군(또는 한미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해야 한다. 전방의 북한 4개 전연군단, 그 후방의 북한 4개 기동군단을 궤멸시켰다고 하지만 북한에는 12-9-7-10-11-6군단과 특수8군단, 108기계화군단, 426기계화군단 그리고 평양방어사령부 등이 남아 있다. 이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격멸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격멸작전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 3원정군이 한반도로 이동해 한국 해병 1사단과 함께 북한 지역으로 상륙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 해병 제3원정군은 미 육군 군단에 비교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진 부대로 3해병사단과 1해병항공단을 주축으로 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이 1해병항공단이다. 1해병항공단은 4만t급인 미 해군의 상륙모함을 타고 이동해오는데, 상륙모함은 한마디로 헬기항모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독도함이 1만3000여t인데, 미 해군의 상륙모함은 2배가 넘는 4만t이니 훨씬 많은 헬기를 탑재한다. 상륙모함을 주축으로 한 미 해군의 상륙함 세력과 독도함을 앞세운 한국 해군의 상륙함정은 한미 해병대 병력을 태우고 발진한다. 역사적인 격멸작전 이때 한미 연합공군과 한미 연합함대는 일제히 항공기와 미사일을 띄워 한미 연합해병대가 상륙하려는 곳을 청소한다. 이러한 탄막을 이용해 북한 해안에 접근한 상륙함에서 일제히 헬기가 떠 해병대 보병대원들을 북한 해안선 너머에 있는 고지로 투하한다. 그리고 대소 상륙함에서 미 해병3사단과 한국 해병 1사단원을 태운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발진해 북한 해안으로 상륙한다. 한미 연합해병대가 바다를 통해 ‘거대한 훅’을 날릴 때 한국 육군은 미 지상군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린다. 이 작전에 주력으로 동원되는 것은 공세 이전 작전을 성공시킨 한국군 7군단이다. 미군에서는 주한 미 2사단을 참전시킨다.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은 코브라 헬기와 아파치 헬기, 그리고 각자가 보유한 k-1전차와 k-200장갑차(한국군), m-1전차와 m-2장갑차(미군)를 앞세워 돌격한다. 두 부대의 머리 위로는 한미 연합공군기가 출격해 ‘에어 캡(air cap)’을 씌워주고 시계청소를 해주므로 이들은 고속으로 진공해 평양을 점령한다. 그리고 해안상륙을 통해 평양까지 진격한 한미 연합해병대와 합세해 평북과 함북에 있는 북한군 부대까지 궤멸시킨다. 남북 간의 국력 차이, 군사력 차이, 더구나 미군의 참전까지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전면전을 살펴본다면 이 전쟁은 이라크전만큼이나 빨리 한미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염려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참전하는 것인데, 현재 중국이 처한 위치를 고려하면 중국군의 참전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권을 지키려면 전쟁을 도발해야 하는데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 선택한 ‘매직 카드’가 바로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다.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란 핵무기나 화학무기, 생물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처럼 국제사회가 조약이나 레짐(regime)으로 보유를 금하는 무기를 개발해 보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은 이 조약과 레짐에 가입했으나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6년 10월9일 조악한 형태의 핵실험을 했고, 화학무기 보유 순위는 세계 3위이며, 1998년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조악한 수준이긴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국가군(群)에 진입했다. 비대칭 전력 분야에서 북한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는 것이다. 북한민주화 혁명 유도해야 전략무기는 좀 더 안전한 후방에 배치하지만, 상대가 미처 방어 준비에 들어가지 못한 초기에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면전을 염두에 둔다면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일 먼저 사용한 후 해군을 동원한 경기만 기습과 지상군을 동원한 서울 공략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한미연합군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략부터 제거하려고 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을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것이므로 한미연합 정보부대는 평소 북한군 미사일 부대의 행적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그러다 이 미사일이 발사될 조짐을 보이면 미사일과 공군기를 동원해 선제 타격을 한다.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하면 패트리어트pac-3 등으로 요격함으로써 이 무기의 위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선제타격 문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나 한미연합사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사시 북한군 비대칭 전력을 선제타격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사전에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면전을 허용한 다음 북핵을 제거하고 김정일 정권을 없애는것은 부담이 크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무력도발을 하려는 시점을 김정일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운동을 일으킬 적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김정일 정권교체 외교를 펼치는 사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는 김정일 정권 붕괴 공작에 나선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내부 혁명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인들이 내부적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북핵 제거를 위한 회담만을 추진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헛된 노력일 뿐이다.(끝) 출처 신동아 3월호 저도 흥미롭게 읽은거라 퍼온건데요. 제가 재대한지가 좀 오래되서 그런진 몰라도... gp/gop에 폭격에도 끄떡없는 난공불락 요세가 있다는 건 첨 듣는 소리네요.ㅎㅎ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니... 분란없히 재밌는 토론을 했어면 합니다.
[밀리터리] 북한의 對南 기습전 시나리오. 주공은 육군, 조공은 해군 주공(主攻)은 ‘서울을 전투화로 밟아버리려는’ 지상전 세력 조공(助攻)은 ‘훅을 날리듯’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해군력이정훈 국방 전문기자가 분석하는 북한의 對南 기습전 시나리오 이정훈│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1월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나서서 전면대결을 선언하더니, 1월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이하 조평통)가 남북 간 모든 정치·군사상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평통 성명의 위협 수위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높았다. 조평통은 ‘리명박 패당’ ‘리명박 역도’란 단어를 써가며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火)과 불, 철(鐵)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 “역적 패당이… 북남 수뇌상봉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전면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론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반(反)공화국 대결 광란의 앞장에는 리명박 역도가 서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nll)상에서 도발할 수 있다. 북한의 협박은 예사로이 보아 넘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민들의 출어 횟수를 급격히 줄이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최악의 상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전면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역량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도발을 남북통일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일으킬 수 있는 전면전의 양상과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통일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자. 제약을 받는 북한군 기습 작전의 요체는 적은 수의 전력으로 최대 전과를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리에 내가 가진 모든 세력을 모아 ‘기습(奇襲)’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군은 ‘집중과 기습’을 핵으로 한 공격 작전을 펼친다. 하지만 집중과 기습 작전은 주변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남북한 군의 전력 차이, 남북한 국력 차이 등 주어진 조건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기습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기습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기습은 기습 대상 포인트로 부대를 기동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기동은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전 능력은, 특히 한미연합군의 정보전 능력은 대단히 발전했기에, 북한은 한미연합군 정보 부대를 완전히 속여 넘기면서까지 부대를 기동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군은 ‘연막’을 피운다. 내부적으로 ‘통상적인 훈련을 한다’는 등의 교신을 주고받으며 부대를 기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많은 부대를 기동시키면 한미연합 정보부대가 통상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므로, 꼭 기동시켜야 하는 부대만 움직인다. 나머지 부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실제 공격에 들어가는 ‘h-아워’를 기다리게 한다. 군사작전 용어 중에 tot라는 것이 있다. 포병사격 때 많이 쓰이는 말인데 ‘time on target’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tot 사격은 동일 시간에 모든 포탄을 같은 목표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기습을 할 때는 tot사격원리를 적용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서울은 휴전선에 아주 가까이 있어 기습전을 펼칠 대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서울이 점령되면 대한민국은 머리를 잡힌 뱀처럼 온몸을 꿈틀거려보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한다. 따라서 단시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미국 증원군이 한반도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기습전이 된다. 공격전은 ‘주공(主攻)’과 ‘조공(助攻)’으로 나눠 감행한다. 목표 달성은 주공세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조공이 달성하기도 한다. 상대가 아군 작전을 눈치 채고 주공 진격루트에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면, 조공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목표점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왼쪽 사진 앞)과 해성 함대함 미사일(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윤영하급 고속함. 한국의 수상함 전력은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경기만(灣) 상륙 노리는 북한 해군 서울은 휴전선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아주 가까이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주공은 ‘서울을 전투화로 밟아버리려는’ 지상전 세력이 되고, 조공은 ‘훅을 날리듯’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해군 세력이 된다. 그러나 조공인 해군 세력도 서울 점령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 휴전선 바로 북쪽에는 서쪽에서부터 4-2-5-1로 이어지는 북한 육군의 4개 전연(前緣) 군단이 있다. 휴전선에 붙어 있기에 북한은 이 군단을 동원해 휴전선 돌파라는 1차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은 바로 nll을 돌파하지 못한다. 이유는 주력 함정이 후방 수역에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데이’가 다가오면 북한 해군은 tot 사격 원리에 따라 후방에 있는 대형 함정을 먼저 기동시키고,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작은 함정을 움직여 모든 함정이 동일 시간에 nll 선상의 한 포인트로 몰려들게 한다. 이러한 공격전을 펼칠 때 북한 해군은 한국 해군(또는 한미 연합해군)과 맞서는 고전적인 해상전은 극력 회피한다. 이유는 북한 해군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이다. 80~100척의 北 수상전단 한국 해군은 만재 t수가 1만t이 넘는 이지스 구축함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은 1500t급인 나진급 구축함 2척뿐이다. 현재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 울산급 호위함 9척 등 1500t이 넘는 함정을 20척 보유하고 있어, 고전적인 해전을 벌이면 한순간에 북한 해군을 궤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해군은 한국 함대와의 교전을 피하며 nll상의 특정 포인트를 뚫고 들어가 인천을 비롯한 경기만(灣) 일대에, 한국 해군의 udt 부대와 비슷한 ‘해상저격여단’ 등 특수부대를 상륙시키는 작전에 주력한다. 해상저격여단을 상륙시킬 수 있다면 여타 함정은 ‘사석(捨石)’으로 버려도 좋다는 것이 북한 해군의 의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 해군은 이 돌격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후방에 있던 나진급 등 대형 함정은 nll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d 마이너스 1일이나 d 마이너스 2일부터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 듯한 교신을 주고받으며 남진에 들어간다. 그리고 소호급 호위함과 사리원급-소주급-오사급 유도탄정 등이 순차적으로 연쇄 남진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동을 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수상전단(sag·surface attack group)’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북한 함정들이 nll의 한 점을 향해 모여드는 것이 발견되면, 한국 해군은 ‘수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대응에 들어간다. 한국 해군이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 해안에 포진해 있는 지대함 미사일부대다. 과거 북한 해군은 서해를 향해 삐죽 나와 있는 황해도 남쪽 해안에, 본래는 구소련에서 개발됐으나 중국이 도입해 복제생산을 많이 했기에, 비단생산이 많은 중국을 빗대 nato가 ‘실크웜(silkworm·비단벌레)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지대함 미사일을 많이 배치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근래 이란 등에 수출하는 형태로 전부 폐기해버리고 자체 개발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최근까지 북한은 새로 개발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성능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면,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투의 기사를 반복해서 보도했다. 북한군이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을 가동하는 것은, ‘표적’인 한국 함정에 추적 레이더를 쏜다는 뜻이 된다. 한국 함정에는 상대가 쏜 추적 레이더파에 접촉됐음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있다. 이 경보가 울리면 한국 함정은 긴장한다. 전투를 할 때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 殺他)’다. 내가 살아야 상대를 죽일 수 있으니,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로 도피해야 한다. 레이더파 수신 경보장치가 울리면 한국 함정은 후방 수역으로 후퇴하거나, 레이더파가 닿지 못하는 섬 뒤로 숨는다. 그로 인해 nll의 방어가 약해지는데 그 틈을 타 북한의 수상전단 세력은 일제히 nll선을 넘는다. 이 수상전단 세력의 최선봉에 선 것이 유도탄정이다. 북한 유도탄정은 사거리가 46km 정도인 ‘스틱스(styx)’ 미사일을 달고 있다. 스틱스도 실크웜 못지않은 구식 무기다. 하지만 북한이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과 연동해 작전을 펼치면 위협이 된다. 유도탄정이 송곳처럼 nll을 뚫어주면 그 뒤를 따라 해상저격여단을 태운 공기부양정과 이들을 엄호하는 고속정 세력이 따라온다. 나진급 등 대형함정은 한국 미사일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지므로 nll 이북에 남아 탑재한 미사일로 엄호하는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도탄정을 선봉에 세운 공격부대의 침로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된다. 첫째 이유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로 침투해야 황해도 해안에 있는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상전단을 따라 들어올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의 특성 때문이다. 구축함이나 유도탄정은 덩치가 크고 탑재하는 연료도 많기에 파도가 높은 외해(外海)를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은 배가 작아 파도가 큰 외해에서는 제대로 항해하지 못한다. 탑재연료량도 적기에 이들의 작전공간은 ‘연안(沿岸)’으로 한정된다. 유도탄정도 한국 함정 기준으로 보면 고속정 크기에 불과하므로 이들도 외해 작전을 하지 못한다. 작은 함정으로 편성된 북한 해군의 한계가 ‘외해 작전 불가(不可)’라는 제약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만 침투라는 목적만큼은 추진해볼 수 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은 한국 해군의 고속정이 들어올 수 없는 수심이 얕은 바다와 갯벌 위에서도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기에, 한국 해군은 두 눈을 뜨고도 이들의 침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공기부양정 세력이 경기만 일대에 상륙해 해상저격여단원을 내려놓게 되면 상황이 급변한다. 경기만 일대는 인천을 비롯해 도시화된 지역이 많기에 상륙한 해상저력여단은 침투지에서 보급문제를 해결해가며 차량 등을 탈취해 서울로 진격하거나,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 수도권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게릴라전을 펼친다. 이것이 유사시 북한 해군이 펼칠 수 있는 기습전 양상인데, 이러한 ‘서든 어택(sudden attack)’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f-15k(왼쪽)과 kf-16(오른쪽)은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북한 육해공군부대를 날려버리는 기동타격대 역할을 한다. 한국 해·공군의 火網 한국군 총사령관은 대통령이다. 유사시 한국의 안전지수는 대통령이 언제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바다에는 숨을 곳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함정이 tot 사격 개념으로 수상한 기동을 하면 그 사실은 금방 한미연합 정보부대에 포착돼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때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대응작전 감행도 건의하는데, 두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바로 대응작전에 들어간다. 대응작전은 한국군 합참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한미연합사 주도로 한미 양군이 연합으로 할 수도 있다. 대응작전은 후방에 있는 북한 함정들이 발진하는 d 마이너스 2일 무렵에 시작된다. 한국 육군의 유도탄사령부는 현무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무는 정밀 타격을 하지 못하기에 함정처럼 작은 목표는 잡지 못한다. 몇 해 전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크루즈 미사일인 ‘천룡’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천룡은 크루즈 미사일이기에 초정밀 사격이 가능하다. 유도탄사령부는 천룡을 발사해 북한 함대기지를 공격한다. 현대전은 미사일과 공군기의 공간인 하늘에서 시작된다. 병력과 병력이 충돌하기 전에 미사일과 공군기가 까맣게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a(air)-데이 작전’이라고 한다. a-데이 작전의 주력은 굉음을 울리며 출격하는 전투기 세력이다. 합참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는 북한 지역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함정 공격에 나선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북한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전 거리가 긴 것은 대구기지와 해미기지 등에 포진한 f-15k와 kf-16이다. 이들은 함정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미제 ‘하푼’ 미사일을 달고 출격한다. 이러한 f-15k와 kf-16에 위협을 주는 것이 휴전선 북방에 포진한 북한의 대공(對空)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 부대다. 이들은 미 공군이 제공하는 대공(對空)제압기 세력으로 일거에 무력화한다. 해군도 a-데이 작전에 참여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천룡을 토대로 함대지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다. 한국형 토마호크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해군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다. 한국형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가 넘는다. 따라서 북한이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훨씬 뒤에서 북한 함정의 발진기지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을지문덕함을 비롯한 한국 해군 2함대 세력의 상당수는 국산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海星)’을 탑재하고 있다. 해성은 미국제 함대함 미사일인 하푼보다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다. 해성의 사거리는 150여 km로 알려져 있다. 북한 수상전단이 연안을 따라 남하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있는 육지로부터 꽤 떨어진 곳으로 항해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나간 한국 함정들은, 북한 수상전단을 해성 미사일 사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북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 포진한 해군 2함대 세력은 해성을 발사해 고속으로 남진하는 북한 함정을 날려버린다. 스틱스 미사일을 싣고 최선봉으로 돌진하는 북한의 유도탄정은 해성 미사일을 탑재한 한국의 윤영하급 고속함이 상대한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레이더파에 덜 접촉되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기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과 스틱스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 작전할 수 있다. 한국 해공군이 펼친 a-데이 작전에 상당수 북한 함정이 격파된다. ‘한국 해공군이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화망(火網)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란 문제는 북한 서해함대가 풀어야 할 최대 고민이다. 그래서 택한 전술이 이른바‘떼거리 전법’이다. 80~100척의 함정을 한꺼번에 돌격시키면, 상당수는 한국 해공군 방어??걸려 격파되어도, 일부는 살아남아 경기만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nll을 돌파한 공기부양정 세력이 경기만에 진입하면 한국 해공군은 한국 국민이 당할 피해를 의식해 마음껏 사격하지 못한다. 그 틈을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꺾으려면 한국은 해성이나 한국형 토마호크를 이용한 ‘큰 타격’이 아니라 북한 공기부양정을 족집게로 집어서 정확히 날려버리는 ‘작은 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륙한 특수부대 향해 포 사격 이러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가 바로 주한 미2사단의 ‘아파치 롱보 헬기 대대’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 간 작전권 이양 합의에 따라 이 대대는 오는 3월 한국에서 철수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간다. 한국으로서는 경기만을 지키는 ‘풀백’을 놓친 셈이 된다. 하지만 준비해놓은 ‘후보’가 있었다. 정식명칭이 공군 성남기지인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5혼성비행단 소속 ka-1 공격기 대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유사시 ka-1 부대는 작전에 큰 지장을 받는다. 긴급 출격하는 ka-1이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때문에 최근 공군은 아예 ka-1 대대를 서울공항에서 빼내기로 했다. 주전 풀백은 다른 팀으로 이전시키고, 후보 풀백은 작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빼내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되면 ‘골키퍼’가 페널티에어리어(육지)에 상륙한 상대 공격수(해상저격여단)를 막아야 한다. 경기도 서부지역을 지키는 ‘골키퍼’는 육군 17사단과 해병 2사단을 주력으로 한 육군의 수도군단이다. 그런데 해병 2사단은 김포반도와 강화도 방어에 주력하므로, 그 후방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해상저격여단을 막는 것은 육군 17사단의 몫이다. 미해군의 공기부양정 앞에서 상륙해 들어오는 한국 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위). 독도함에 전개된 헬기부대. 공격수는 아크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nll상에서부터 상대 수비수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페널티라인까지 들어왔기에 상당히 지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특공대원들이라고 하더라도 30노트(시속 약 60km) 이상으로 달리는 공기부양정을 타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수비수인 한국 해공군이 퍼붓는 화망을 뚫고 나와야 했으니 이들의 속은 까맣게 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7사단은 요소요소에 기동타격대를 배치했다가 이들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날아오면 긴급 출동하는 형식으로 대처한다. 그런데 기동타격대의 출동보다 더 좋은 제압법이 있다. 육지에 상륙한 해상저격여단을 향해 포 사격을 가하는 것이다. 포 사격은 ‘파김치’가 돼 상륙한 해상저격여단원을 기동타격대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강력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서해안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라 곳곳에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인이 희생되더라도 포 사격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17사단을 통제하는 수도군단의 오랜 고민이었다. 수도군단의 포병여단은 17사단의 포병대대보다 월등히 우수한 포를 갖고 있으므로 수도군단은 포 사격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격을 한다’는 것이었다. 대(大)를 위해서는 소(小)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포사격으로 해상저격여단은 거의 전멸될 것으로 보인다. 포사격으로 시작되는 지상전 이렇게 서해를 통한 북한 조공 세력의 공격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지상에서는 북한 주공 세력의 공격을 놓고 보다 심각한 전투가 벌어진다. 지상전은 포격으로 시작된다. tot 사격으로 적진을 초토화하는 틈새를 이용해 아군 기갑과 보병부대를 진격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돌격이기 때문이다. 휴전선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 전연군단도 이런 식으로 기습한다. 북한 화포가 불을 뿜으면 한국 육군 포병도 맞대응한다. 북한은 전연지대에 방사포 등 대형 포를 많이 배치했지만, 한국 육군도 k-9 자주포와 한국판 방사포인 mlrs(다연장로켓) 그리고 155mm 포 등 장사정포를 즐비하게 깔아놓았다. 이러한 장사정포 앞에 105mm 포대가 있다. 이들은 평상시 훈련받은 그대로 tot 사격에 들어간다. 북한군은 한미연합공군의 폭격을 의식해 장사정포를 갱도(지하)진지에 넣어놓았기에 평소에는 장사정 포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연합 정보부대의 고민이다. 그러나 한국 육군은 ‘대(對)포병 레이더’를 갖고 있다. 대포병 레이더는 미 공군의 대공(對空)제압기와 비슷한 구실을 한다. 적이 쏜 포탄이 발사된 곳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포병 레이더가 불을 뿜고 있는 북한군 장사정 포대의 위치를 잡아주면, 한국군 포병부대는 일제히 그쪽으로 화구를 돌린다. 북한군 장사정 포대의 위치가 확인되면 초정밀 레이저 유도폭탄인 jdam을 탑재한 공군기도 공격에 가세한다. 그로 인해 서울에 포탄을 떨어뜨려 공포감을 극대화하던 북한의 장사정 포대는 곧 잠잠해지게 된다. 이러한 포격전은 d 마이너스 2일쯤 시작돼 북한군 보병과 기갑부대가 실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d-데이, h-아워 직전까지 이어진다.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지는 포격전은 전면전으로 이해되기에, 한국 대통령은 이때쯤 수상전단을 만드는 북한 함정을 향한 해·공군의 사격을 ‘충분히’ 허락할 수 있게 된다. 대포병 레이더의 위력 포 사격전의 열세에도 북한군이 정해진 작계(作計)대로 전연군단에 배속된 기갑과 보병부대를 앞세워 군사분계선 돌파를 시도한다면 한국 육군도 대응작전에 들어간다. 4-2-5-1로 이어지는 북한의 4개 군단 가운데 주공은 서울 북방에 있는 4군단과 2군단이 맡을 전망이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5군단과 1군단은 조공이 된다. 각각의 북한 군단은 다시 주공과 조공을 편성하고, 한국 육군을 속이는 양동(陽動)작전을 구사한다. 양동작전이란 성동격서(聲東擊西)전법으로, 소규모 병력을 엉뚱한 곳으로 요란하게 기동시켜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을 전연(前緣)지역이라고 하는 데 반해, 한국군은 페바(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 전투지역전단) 지역이라고 한다. 한국 육군은 페바 지역에 서쪽에서부터 수도-1-5-6-2-3-8의 6개 군단을 깔아 놓았다. 이 가운데 수도군단은 군사분계선 구실을 하는 폭이 매우 넓은 한강 하구 남쪽에 있어 북한군과 직접적인 교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군단은 공기부양정을 타고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북한 해상저격여단을 막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따라서 5개 페바 군단이 북한의 4개 전연군단과 충돌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 주공세력인 4군단과 충돌하는 문산 라인의 1군단과 북한의 2군단과 싸울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 라인의 5군단이다. 한국군 1군단과 5군단에 주어진 최대 임무는 북한군의 돌격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거부 작전’이다. gp, gop 부대의 기능 1군단과 5군단은 다른 군단보다 강한 포병여단을 갖고 있다. 북한군 4군단과 2군단 세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1군단과 5군단 포병은 계속해서 불을 뿜는다. 그러나 이 부대가 포탄을 떨어뜨리는 지점은 이동한다. d-데이, h-아워 이전에는 북한군 포대를 향해 포탄을 쐈으나 인민군의 진격이 시작되면 한국 육군 수색대가 들어가 있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군 수색대가 아군 포격에 희생될 수 있다. 그러나 수색대는 포격전이 시작되는 순간 ‘철옹성’으로 불리는 gp(guard post·경계초소)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안에는 식량과 탄약이 충분히 보관돼 있으므로 수색대원들은 포성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gp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밖에서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부대는 gp를 제압하지 못하고 통과한다. 이러한 수색대의 후방에 gop(general out post·일반전초) 대대들이 포진해 있다. gop 대대들도 후퇴하지 않고 진지 안에 숨는데, 이 진지 또한 난공불락이기에 진격하는 북한군은 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군 페바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 그때부터 gp와 gop에 숨어 있던 한국군들이 나와서 앞쪽으로 전진한 북한군 진격부대의 후방을 교란한다. 공격하는 부대는 숨을 곳이 없기에 방어에 취약하다. 남북한 군이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면 1군단과 5군단은 항공작전사에서 배속받은 코브라 공격헬기 여단과 예하 전차대대를 이용해 북한군 4군단과 2군단을 쓸기 시작한다. 남북한 군의 전력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한국군은 d 플러스 5일이 오기 전에 북한군의 공세를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거부작전이 실패해 서울이 위태로워지면 후방에 있던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이 참전한다. 한국군 7군단은 맹호(수도기계화보병사단)와 불무리 결전(20기계화보병사단) 두 개 사단으로 편성된 전형적인 기계화군단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 출동없이 1군단과 5군단은 북한전연군단의 공격을 막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이 북한군 진격을 막아 세우면 ‘전략 예비부대’인 7군단이 기회를 노린다. 공격하는 부대는 대오가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한미연합 정보부대가 그러한 틈을 찾아주면, 7군단은 전차여단과 장갑차여단을 동원해 벼락같이 그쪽으로 치고 나간다. 이름하여 ‘공세이전’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7군단이 공격에 들어갈 때 항공작전사령부는 코브라 헬기여단을 7군단 예하로 전환시켜준다. 7군단은 하늘에서는 코브라 공격헬기로, 땅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로 밀어붙이는 입체고속기동전을 펼치며 전과를 확대해간다. 7군단의 작전 목표는 경기 지역으로 밀고 내??북한군 4군단과 2군단 뒤로 들어가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 4군단과 2군단은 한국군 1군단과 5군단, 7군단에 포위돼 섬멸 위기에 빠진다. 북한군도 4개 전연군단 뒤에 전략 예비부대를 두고 있다. 815기계화군단-620포병군단-820기갑군단-806기계화군단이 그들이다(서쪽에서부터). 이 4개 기동군단의 임무는 4개 전연군단이 서울까지의 진격로를 뚫어주면 그 후 진격전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전을 하기도 전에 한국군 7군단이 들어와 4군단과 2군단의 후방을 차단해버리면 이 4개 기동부대는 7군단을 잡기 위한 기동에 들어간다. 이때 다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현무와 천룡 미사일을 운용하는 한국 육군의 유도탄사령부와 한국 공군의 작전사령부다. 두 부대는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 4개 기동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한반도 유사시 공군은 포커판의 ‘조커’처럼 활약한다. 육군과 해군은 북한군 주공·조공과 싸우는 고유 임무를 부여받지만, 남북한 공군력은 현격한 차이가 나기에 공군은 조기에 북한 공군을 격멸하고 적기(適期))에 육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을 펼친다. 한국 공군은 jdam을 비롯한 초정밀 무기 확보에 노력해왔다. 공군작전사령부는 개전 직후 예하 북부전투사령부와 전투비행단을 동원해 전연지대에 있는 북한군 레이더 기지와 방공미사일 부대를 격파하고, 7군단이 주도한 공세이전 작전이 성공하면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이 기동하지 못하도록 jdam 같은 초정밀 폭탄을 달고 가 이들을 공격한다. 전세를 결정짓는 공중전 이때 한국에 있는 미7공군은 물론이고 괌에 있는 미 13공군, 알래스카에 있는 미 11공군, 일본에 있는 미 5공군,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母港)으로 한 미 7함대 해군 전투비행단까지 가세한다면, 그리고 한국군 유도탄사령부와 미 7함대 함정이 일제히 현무와 천룡, 토마호크를 쏘아 올리면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돈좌(頓挫)한다. 그러는 사이 경기도 동부에 있는 한국군 6군단과 강원도 전선에 포진한 한국군 2-3-8군단이 북한의 5-1군단을 꽉 붙잡아 놓는다. 이로써 북한군 4-2군단은 고립무원이 돼 궤멸되고 만다. 그리고 a-데이 작전으로 북한군 4개 기동군단이 꺽이고 동부전선의 북한군 5-1군단도 궤멸된다면 한국 육군은 ‘역사적인’ 격멸(擊滅)작전에 들어간다. 격멸작전은 북한정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격멸작전을 완수하려면 한국군(또는 한미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해야 한다. 전방의 북한 4개 전연군단, 그 후방의 북한 4개 기동군단을 궤멸시켰다고 하지만 북한에는 12-9-7-10-11-6군단과 특수8군단, 108기계화군단, 426기계화군단 그리고 평양방어사령부 등이 남아 있다. 이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격멸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격멸작전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 3원정군이 한반도로 이동해 한국 해병 1사단과 함께 북한 지역으로 상륙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 해병 제3원정군은 미 육군 군단에 비교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진 부대로 3해병사단과 1해병항공단을 주축으로 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이 1해병항공단이다. 1해병항공단은 4만t급인 미 해군의 상륙모함을 타고 이동해오는데, 상륙모함은 한마디로 헬기항모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독도함이 1만3000여t인데, 미 해군의 상륙모함은 2배가 넘는 4만t이니 훨씬 많은 헬기를 탑재한다. 상륙모함을 주축으로 한 미 해군의 상륙함 세력과 독도함을 앞세운 한국 해군의 상륙함정은 한미 해병대 병력을 태우고 발진한다. 역사적인 격멸작전 이때 한미 연합공군과 한미 연합함대는 일제히 항공기와 미사일을 띄워 한미 연합해병대가 상륙하려는 곳을 청소한다. 이러한 탄막을 이용해 북한 해안에 접근한 상륙함에서 일제히 헬기가 떠 해병대 보병대원들을 북한 해안선 너머에 있는 고지로 투하한다. 그리고 대소 상륙함에서 미 해병3사단과 한국 해병 1사단원을 태운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발진해 북한 해안으로 상륙한다. 한미 연합해병대가 바다를 통해 ‘거대한 훅’을 날릴 때 한국 육군은 미 지상군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린다. 이 작전에 주력으로 동원되는 것은 공세 이전 작전을 성공시킨 한국군 7군단이다. 미군에서는 주한 미 2사단을 참전시킨다. 한국군 7군단과 미 2사단은 코브라 헬기와 아파치 헬기, 그리고 각자가 보유한 k-1전차와 k-200장갑차(한국군), m-1전차와 m-2장갑차(미군)를 앞세워 돌격한다. 두 부대의 머리 위로는 한미 연합공군기가 출격해 ‘에어 캡(air cap)’을 씌워주고 시계청소를 해주므로 이들은 고속으로 진공해 평양을 점령한다. 그리고 해안상륙을 통해 평양까지 진격한 한미 연합해병대와 합세해 평북과 함북에 있는 북한군 부대까지 궤멸시킨다. 남북 간의 국력 차이, 군사력 차이, 더구나 미군의 참전까지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전면전을 살펴본다면 이 전쟁은 이라크전만큼이나 빨리 한미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염려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참전하는 것인데, 현재 중국이 처한 위치를 고려하면 중국군의 참전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권을 지키려면 전쟁을 도발해야 하는데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 선택한 ‘매직 카드’가 바로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다.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란 핵무기나 화학무기, 생물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처럼 국제사회가 조약이나 레짐(regime)으로 보유를 금하는 무기를 개발해 보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은 이 조약과 레짐에 가입했으나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6년 10월9일 조악한 형태의 핵실험을 했고, 화학무기 보유 순위는 세계 3위이며, 1998년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조악한 수준이긴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국가군(群)에 진입했다. 비대칭 전력 분야에서 북한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는 것이다. 북한민주화 혁명 유도해야 전략무기는 좀 더 안전한 후방에 배치하지만, 상대가 미처 방어 준비에 들어가지 못한 초기에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면전을 염두에 둔다면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일 먼저 사용한 후 해군을 동원한 경기만 기습과 지상군을 동원한 서울 공략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한미연합군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략부터 제거하려고 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을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것이므로 한미연합 정보부대는 평소 북한군 미사일 부대의 행적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그러다 이 미사일이 발사될 조짐을 보이면 미사일과 공군기를 동원해 선제 타격을 한다.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하면 패트리어트pac-3 등으로 요격함으로써 이 무기의 위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선제타격 문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나 한미연합사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사시 북한군 비대칭 전력을 선제타격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사전에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면전을 허용한 다음 북핵을 제거하고 김정일 정권을 없애는것은 부담이 크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무력도발을 하려는 시점을 김정일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운동을 일으킬 적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김정일 정권교체 외교를 펼치는 사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는 김정일 정권 붕괴 공작에 나선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내부 혁명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인들이 내부적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북핵 제거를 위한 회담만을 추진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헛된 노력일 뿐이다.(끝) 출처 신동아 3월호 저도 흥미롭게 읽은거라 퍼온건데요. 제가 재대한지가 좀 오래되서 그런진 몰라도... gp/gop에 폭격에도 끄떡없는 난공불락 요세가 있다는 건 첨 듣는 소리네요.ㅎㅎ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니... 분란없히 재밌는 토론을 했어면 합니다. [밀리터리] 도라!도라!도라!(태평양전쟁) ....11편 도라!도라!도라!.... 제 11편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대장은 1939년 8월 13일 일본 제국 해군의 최고 전투사령부를 지휘하는 중대한 지위인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에 임명 되었다. 평소 금주주의자였던 야마모토는 사령장관에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큰 컵에 가득 담긴 맥주를 단숨에 꿀꺽 들이켰다한다. 야마모토가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에 임명된 2주일 뒤,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일본이 조만간 틀림없이 이 전쟁에 휩쓸려 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전쟁준비를 위해서 일본 해군을 전통적인 맹훈련으로 단련하는 임무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나의 지휘 아래에서는 항공훈련에 최중점을 둔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가슴 속에는 만약 조국 일본이 무분별하게도 대미 전쟁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미국의 태평양함대를 격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궁리하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원래 전쟁 반대주의자였다. 이 때문에 일본 극우 정치가들의 비위를 거슬려 야마모토는 친미파로 낙인찍혔고 해군 차관 시절에도 반전 신념을 내세웠던 때문에 극우파로부터 암살위협을 받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미국 하버드대학 유학시절 워싱턴 주재 해군무관으로서 당시 미국의 거대한 공업력을 직접 보고 그 규모를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야마모토의 기질은 오직 무사도의 전통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황에 대해서 또 조국에 대해서 그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른 모든 것보다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궁극적 책무는 조국 방위였다. 야마모토는 1927년 부터 이미 항공력을 해군 전략의 새로운 결정적 요소로 보고 있었다. 그 이듬해 새로 건조된 항공모함 아카기의 함장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항공전쟁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간직했던 실제적인 여러문제에 전력을 쏟아 넣었다. 풍운아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39세에 해군 대좌(대령), 44세에 해군 소장, 이어 1937년에는 해군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일본의 허왕된 꿈을 보여준 야마토전함 1934년의 런던 해군군축회의에서 야마모토는 일본 대표단의 주요 수행원이었지만 이 회의 후부터는 일본은 대규모의 전함 건조 계획에 착수했다. 이것은 주력함의 우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거대한 전함 4척(18.1 인치 포 9문 장비)건조 계획 중 첫 번째 함인 야마또는 1941년 12월에 완공되었고 두 번째인 무사시는 그 여덟달 뒤에 완공했다. 세 번째 함인 시나노는 그 후에 설계를 변경하여 항공모함이 되었고, 이 후의 건조계획들은 모두 취소되게된다. 미국측에선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군함을 건조할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의 전통적인 이념에 따른 해전에선 총톤수가 우세한 거함거포야말로 일본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또 평화시에는 이 최신형 거대 전함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주고 미,영 양국과의 교섭에 커다란 이익을 주리라 기대되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철옹성과 같은 단단한 안전보장으로써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 제독들 가운데 단 한사람 야마모토만은 이와같은 거대 전함의 건조에 대해서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같은 거함은 아직 그 건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야마모토는 "이 거함들은 마치 노인들이 각 가정에 소중한 것처럼 걸어두는 정밀한 종교적 족자같은 것이다. 그것은 실용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지 신앙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근대 전쟁에선 사무라이의 칼 정도쯤밖에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으로선 장차의 해전에서 재해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열쇠는 순양함과 구축함에 둘러싸여 호위된 항공모함 함대라는 것이다. 거대 전함에 쓰여지는 막대한 돈은 항공모함과 비행기에 쓰여지는 편이 훨씬 좋으리라는 것이었다.야마모토는 어뢰를 장비한 뇌격기에 의한 공격이야말로 전함을 격파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임을 주장했다. "아무리 큰 구렁이라도 수믾은 개미 떼한테는 당하지 못한다."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야마모토의 주장은 차츰 받아들여졌다.그의 끈질긴 주장으로 3만톤급 신형 항공모함 2척(35노트급-시속63km/h의 쇼가쿠, 즈이가쿠)이 건조되었다. 그리고 극비리에 신형 전투기가 생산 단계에 들어갔는데, 태평양 전쟁 개전 초기부터 2년동안 태평양을 주름잡는 제로 기였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항공기술력을 여전히 형편없는 것으로 얕잡아 보고 있었다. 야마모토 제독은 연합함대 사령관에 취임한지 두달이 채 못되어 일본 해군의 기본적인 전략 계획에 관한 일련의 대변혁 가운데서 최초의 개혁에 착수했다. 첫 번째 개혁작업은 가상적국 제1호였던 미국을 일본 근해에서 격멸한다는 기존의 작전계획을 변경하여 마샬제도를 포함시키는 동쪽방면으로의 확장계획이었다.이 변경은 사소한 것이었고 별로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령부에서는 의의없이 승인되었다. 야마모토의 다음 조치는 연합함대를 이름 그대로 충실하게 충족시키는 일이었다. 그가 사령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대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두 함대가 별도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데 통합하여 그의 직접 작전 지휘하에 두었다. 이리하여 항모와 전함, 순양함, 그리고 보조 함정을 모두 합동시켜, 단일의 강대한 함대로 만들었다. 1940년 봄 그의 지휘하에 실시된 최초의 해군 대훈련에서 야마모토는 항모를 기지로 하는 비행기로 적군함을 공격하는 훈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좀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실로 진주만 공격 감행하기 약 2년전의 일이었지만 야마모토 제독이 내린 훈시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엄격한 훈련 계획이 암암리에 실시되었던 것이다. 1941년 12월까지 일본 해군의 조종사들의 항공전투 기량은 극히 높은 수준까지 숙달되어 있었다. 일본은 절망에 가깝도록 석유가 부족해 있었다. 그리고 만일에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의 석유 자원이 단절된다면 일본 해군의 비행기마저 행동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 야마모토 자신이 정세를 판단한 것처럼, 일본군이 영국 및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대해서 남진한다면 그것은 대미전쟁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태평양 함대는 일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지만, 남방 지역의 일본군 파견부대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군의 보급선을 확보하는 단 하나의 방책은 미 함대를 그 기지에서 격멸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었다. 야마모토는 참모인 구사카 류노스케(진주만 공격의 제1 항공함대 참모장) 소장에게 은밀히 털어 놓았다. "만일 우리들이 미국과 싸우라고 명령받는다면 치고 빠지는 힛트 앤드 런 방식으로 기발한 승리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손색없이 일본의 입장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년째 부터는 미군이 그 군사력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우리들이 최후 승리의 희망을 품고 싸우기란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야마모토의 진주만 기습 공격 구상은 러일 전쟁 당시의 도고 헤이아치로 해군 대장의 여순 항구 기습 작전, 비록 실패했지만 지중해에서 이탈리아군이 어뢰를 탑재한 항공기로 영국의 순양함 알렉산드리아를 격침하려했던 작전과 타란토 항의 이탈리아 함대를 공격했던 영국 구식 복엽기 소드 피쉬의 성공적인 기습공격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8인치 어뢰 발사 훈련중인 영국군 쇼드 피쉬 하와이 제도는 미국 본토인 샌프란시스코 서남으로부터 약 360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1941년 당시에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주민의 약 90%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하와이 제도의 진주만은 미 해군의 전략적 배치에 아주 적합한 항만이고 그 장소도 편리한 곳에 있는 이점이 있었다. 진주만은 1919년에 해군 기지가 되었지만, 미 함대가 거기에 항구적으로 배치하게 된 것은 1940년부터였으나 미해군 제독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던 곳이었다. 우선 4000km나 멀리 떨어진 미 본토의 서해안에서 직접 받아야하는 보급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것도 문제였지만, 이 항만은 완전히 육지에 둘러싸이고 출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항상 골치아픈 문제거리로 여겨졌다. 출입구인 해협에 단한척의 배를 가라앉히기만 해도 이 군항을 봉쇄할 수가 있었다. 또한 출입구인 해협을 지나 함대가 공해상으로 나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함대가 항내에 정박하고 있을 때에는 함선, 연료, 수리시설, 보급물자직접장 등 모든 것이 붐비고 하늘로부터의 공격을 유인하기 쉬운 목표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와이 수역에 주력함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지만, 급한대로 이 수역내에는 진주만 외에 그것과 비슷한 시설을 갖춘 항만이 아무데도 없었던 것이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리차드슨 대장은 진주만을 함대의 항구적 기지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는 미국 대륙 서해안의 좀 더 좋은 기지로 후퇴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까지 반대 의견을 상신했기 때문에 사령관직을 해임당하고, 킴멜 대장이 후임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타란토항에 대한 영국군의 기습공격을 바라본 미국이 그저 수수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헨리 녹스 해군 장관은 미일 전쟁이 발생하면 최대의 위협은 항공 어뢰에 의한 공격이며, 요격기, 대공포의 강화 및 레이더 시설의 증설을 최우선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1940년 12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킴멜 제독은 진주만에서의 어뢰방어망 설치는 해협의 통로를 좁게 하며 함선의 항해를 제약하게된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킴멜 제독이 어뢰방어망에 의한 예방조치를 거부한 거의 같은 무렵에 야마모토는 그의 참모장 후쿠도메 시게루 해군 소장에게 비로소 진주만 기습 공격의 구상을 털어 놓았다. 야마모토는 일본의 연안을 항해하며 해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장소를 물색하다가 큐슈의 가고시마 만의 지형이 진주만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함대를 이곳으로 이동했다. 매일같이 함재기는 해면을 스칠 듯이 비행하며 저공에서의 어뢰 발사와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지만 그 아무도 훈련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다. 야마모토는 진주만 기습공격작전의 암호명을 Z작전으로 명명하려 했는데, 이것은 36년 전 쓰시마 해전에서 저 유명한 " 황국의 흥망은 이 일전에 달려있다"고 절규하던 도고 제독의 Z신호를 본뜬 것이었다. 오니시 다키지로 해군소장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하기위해 야마모토는 믿을 수 있는 동지들을 골라 의견을 물었다. 우선 그가 점찍은 동지는 오니시 다키지로 해군소장이었다. 오니시는 해군에서 극히 드물게 항공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장성이었으며 훗일 전쟁 말기에 가미가제 특공대를 최초로 조직하게되는 인물이다. 제11항공함대의 참모장인 오니시 소장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가능한출격이긴 하지만 마샬제도의 일본군 기지로부터 하와이 공격작전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동남 아시아의 석유지대 점령을 노리는 작전의 선행준비로서 기습의 일격을 가해 미 태평양함대를유린해 버릴 작전계획의 기본 개요를 오니시에게 설명했다. 야마모토의 작전계획을 경청한 오니시는 겐다 미노루 중좌와 의논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뇌가 명석하고 경험이 풍부한 항공참모인 겐다 중좌는 규슈에서 항공모함 가가에 근무하고 있었다. 36살의 겐다는 영국 런던 주재 일본 대사관 해군 무관 보좌관 으로 해외근무를 갓 끝낸 직후였다. 그는 런던 주재 해군 무관 보좌관 자격으로 참관했던 타란토 항 기습작전의 보고서를 도쿄에 보낸 장본인이었다. 오니시나 야마모토와 마찬가지로 겐다는 해군 항공병력이 극히 중요하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타란토 항 공격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Z작전 계획에 찬성해 줄것으로 기대했다. 10일간에 걸쳐 겐다는 이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오니시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계획은 곤란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겐다 미노루 중좌 야마모토는 가장 먼저 미국의 전함에 공격을 집중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항공모함쪽이 공격 부대로서는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 대개의 미국인처럼, 또 대다수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전함이야말로 함대의 주축이며 이것을 격파함으로써 보다 괴멸적인 타격을 적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처음에는 공격기가 항공모함으로 귀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도 해보았다.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아군의 작전영역 밖으로 출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와이에는 그다지 근접할 필요가 없다. 또 공격기가 출격하자마자 조국을 향해 귀환 길에 오를 수도 있다. 공격이 끝나면 조종사는 해상에 불시착하여 구축함이나 잠수함의 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겐다는 이러한 구상에는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의 제일 목표는 항공모함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항모는 일본 해군에게 있어 최대의 잠재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 최상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항모는 되도록 진주만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살적인 무모한 공격은 조종사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준다. 또 전쟁이라는 중대국면에 비추어 섣불리 항공기와 조종사를 동시에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공격기의 귀함을 기다리지 않고 귀항길에 오른다면 미국측이 반격해 올 경우 이에 대항할 비행기가 없는 항모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항모 아카기 항모 가가 진주만 공격 작전에 유리한 하나의 요인은, 일본 해군이 충분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36500톤의 아카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력있는 항공모함의 하나였다. 이 항모는 미 해군의 렉싱턴이나 사라토가보다도 한층 대형함이었다. 아카기는 1936년부터 1938년에 걸친 개장작업으로 91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기와 비슷한 항모는 38200톤급의 가가였고, 이것보다 소형의 항모 히류와 소류도 취역하고 있었다. 각각 25675톤급인 다른 두척의 항모 즈이가쿠와 쇼가쿠도 1941년 8월에 취역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야마모토 함대가 확보한 항모는 모두 6척으로 증강되는 셈이었다. 겐다 중좌는 이 항모 6척 전부를 Z작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다는 오니시에게 첫째, 이 임무에는 가장 유능한 장교와 가장 잘 훈련된 조종사들만을 선발 할것과 둘째로는 공격 직전의 최후 순간까지 작전은 극비에 붙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란토 항을 공격했던 쇼드 피쉬에 장착된 18인치 (45.7cm)어뢰 야마모토 제독의 승인을 받아 오니시는 겐다로 하여금 작전계획 원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3월 말 경에는 계획 원안이 차츰 구체화 되어 갔다. 즉, 공격은 특별기동부대가 담당한다. 이 부대는 호위함을 동반한 약 20척의 이(伊)잠수함과 5척의 특수잠항정으로 구성된 선견부대와 6척의 항모를 중심으로 한 주력 공격부대로 편성된다. 이 기동부대는 이미 알려진 항로를 피하고 우회 루트를 이용한다. 이 루트로 하와이까지 360km의 지점에 접근하여 여기서 항모로부터 항공기가 출격하고 미군기의 초계비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믿어지는 공중을 따라 진주만을 향해 침입한다. 공격에는 360대의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급강하폭격기, 고도수평폭격기, 뇌격기, 전투기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뢰는 폭탄보다도 파괴력이 크다. 더구나 근거리에서의 공격에선 명중률이 높으므로 미 해군함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다. 진주만의 수심이 매우 얕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항공어뢰로서는 통상방법으로 발사한다면 해저에 부딪치고 만다. 그러나 타란토 항의 수심은 41피트 이하였으면서도 영국 해군은 항공기에서 어뢰로 적함을 격침할 수가 있었다. 진주만의 수심은 45피트이므로 이 문제는 명백하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폭탄의 경우는 미 전함 갑판의 장갑을 관통시키기 위해 대형의 철갑탄이 필 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습이 절대로 필요하다. 만일 기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을 받기 쉬운 귀항 도중에 기동부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습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전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측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군령부는 Z작전이 매우 무모한 짓이라며 반대했다. 오니시 자신도 이 작전의 성공률을 60%로 전망하고 있었고, 후쿠도메 참모장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마모토만은 역시 항공모함에 의한 진주만의 항공기습 공격은 실행 가능하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었다. 이리하여 3월 말 경까지는 계획이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누가 기습을 담당하는 기동부대의 지휘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야마모토는 자신이 몸소 지휘하고 싶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서, 그에게는 수 많은 임무가 있었다. 그리하여 하급자 중에서 한명을 엄중히 선발하여 임명해야 했다. 그 결과 선임 소장인 나구모 주이치 해군소장이 기동부대 지휘관으로 결정되었다. 나구모는 완고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고루한 해군장성으로, 항공기나 항모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의 전문지식이라고 한다면 항해기술에 관한 것 뿐이었다. 도중에서 연료를 보급하며, 탐지되지 않아야 하며 더구나 엄밀한 계획에 따라 태평양의 수천킬로를 항행하여 적의 군항 가까이까지 대함대를 통솔해 간다는 대임무가 맡겨지자 나구모는 대경실색 했다. 작전의 성공은 주로 기습에 달려 있다. 만일 순조롭지 않다면 일본은 해군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즉 그는 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 작전이 실시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구모 자신도 한시름 놓았다. 당시로서는 아직도 대미 개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진주만 기습 계획도 군령부의 승인을 아직 받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위 사진은 프랑스가 다시 인도차이나를 접수하는 시점의 인도차이나 주둔 일본군 모습이다 프랑스가 독일에 패한 것을 이용하여 1940년, 일본군은 비로소 중국 이남으로 진출했다.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베트남 지역)의 루트를 통해 중요 물자가 중국의 장개석군에게 수송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이 지역의 북부가 일본군에 의해 관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비시 정권에 대한 독일의 압박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에 대한 일본측의 협박이 겹쳐 마침내 일본군에 의한 북부 인도차이나의 점령에 동의하게된다. 일본군은 인도차이나에 진주한 다음, 다시 인도차이나 총독인 카토르 장군을 협박하여 인도차이나 전체를 일본군의 보호 아래에 둔다는 강요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인도차이나의 공군, 해군 기지를 장악하게된 일본군은 다시 태국으로의 남진 태세를 갖 추었다. 태국 정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예를 따르도록 강요 당한 끝에 일본 정부의 보호조치를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말았다. 일본이 동남 아시아의 극히 중요한 전략 지역에 강력한 군대를 진출시킨 사태에 분노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세 나라는 일본군의 점령확대가 결정된 48시간 이내에 일본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대일본 금수조치에 들어갔다. 그 며칠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일체의 석유 수출금지를 단행하였고, 이어서 네덜란드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유전에서의 대일 석유공급을 중지시켰다. 경제봉쇄에 직면하자 일본은 서서히 목이 조이듯 궁핍으로 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석유 금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유전을 점령하는 조치는 해군에 있어 사활의 관건이었다. 석유의 비축량은 불과 몇 달치밖에 없다. 문제는 유전을 점령해야 하는 필요성의 여부가 아니고 그것을 감행하는데 얼마만의 시간적 여유가 남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태에 직면하자 해군의 수뇌부는 수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 "일본은 석유가 필요하다. 전쟁이냐, 평화냐, 늦어도 10월까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워싱턴에서는 노무라 기찌사부로 주미 일본대사가 외교교섭에 나서고 있었지만 코델 헐 미 국무장관은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물러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다 제 12편에서 계속...... 자료제공 : H/ 채널 (히스토리) ㅎㅎ 목이 다 뻐근하네 ^^;; 캔맥주 한개 묵고 자야징 짱/밀리 가족여러분들 편안하고 포근한 밤이되실길
[밀리터리] 도라!도라!도라!(태평양전쟁) ....11편 도라!도라!도라!.... 제 11편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대장은 1939년 8월 13일 일본 제국 해군의 최고 전투사령부를 지휘하는 중대한 지위인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에 임명 되었다. 평소 금주주의자였던 야마모토는 사령장관에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큰 컵에 가득 담긴 맥주를 단숨에 꿀꺽 들이켰다한다. 야마모토가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에 임명된 2주일 뒤,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일본이 조만간 틀림없이 이 전쟁에 휩쓸려 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전쟁준비를 위해서 일본 해군을 전통적인 맹훈련으로 단련하는 임무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나의 지휘 아래에서는 항공훈련에 최중점을 둔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가슴 속에는 만약 조국 일본이 무분별하게도 대미 전쟁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미국의 태평양함대를 격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궁리하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원래 전쟁 반대주의자였다. 이 때문에 일본 극우 정치가들의 비위를 거슬려 야마모토는 친미파로 낙인찍혔고 해군 차관 시절에도 반전 신념을 내세웠던 때문에 극우파로부터 암살위협을 받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미국 하버드대학 유학시절 워싱턴 주재 해군무관으로서 당시 미국의 거대한 공업력을 직접 보고 그 규모를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야마모토의 기질은 오직 무사도의 전통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황에 대해서 또 조국에 대해서 그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른 모든 것보다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궁극적 책무는 조국 방위였다. 야마모토는 1927년 부터 이미 항공력을 해군 전략의 새로운 결정적 요소로 보고 있었다. 그 이듬해 새로 건조된 항공모함 아카기의 함장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항공전쟁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간직했던 실제적인 여러문제에 전력을 쏟아 넣었다. 풍운아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39세에 해군 대좌(대령), 44세에 해군 소장, 이어 1937년에는 해군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일본의 허왕된 꿈을 보여준 야마토전함 1934년의 런던 해군군축회의에서 야마모토는 일본 대표단의 주요 수행원이었지만 이 회의 후부터는 일본은 대규모의 전함 건조 계획에 착수했다. 이것은 주력함의 우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거대한 전함 4척(18.1 인치 포 9문 장비)건조 계획 중 첫 번째 함인 야마또는 1941년 12월에 완공되었고 두 번째인 무사시는 그 여덟달 뒤에 완공했다. 세 번째 함인 시나노는 그 후에 설계를 변경하여 항공모함이 되었고, 이 후의 건조계획들은 모두 취소되게된다. 미국측에선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군함을 건조할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의 전통적인 이념에 따른 해전에선 총톤수가 우세한 거함거포야말로 일본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또 평화시에는 이 최신형 거대 전함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주고 미,영 양국과의 교섭에 커다란 이익을 주리라 기대되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철옹성과 같은 단단한 안전보장으로써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 제독들 가운데 단 한사람 야마모토만은 이와같은 거대 전함의 건조에 대해서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같은 거함은 아직 그 건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야마모토는 "이 거함들은 마치 노인들이 각 가정에 소중한 것처럼 걸어두는 정밀한 종교적 족자같은 것이다. 그것은 실용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지 신앙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근대 전쟁에선 사무라이의 칼 정도쯤밖에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으로선 장차의 해전에서 재해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열쇠는 순양함과 구축함에 둘러싸여 호위된 항공모함 함대라는 것이다. 거대 전함에 쓰여지는 막대한 돈은 항공모함과 비행기에 쓰여지는 편이 훨씬 좋으리라는 것이었다.야마모토는 어뢰를 장비한 뇌격기에 의한 공격이야말로 전함을 격파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임을 주장했다. "아무리 큰 구렁이라도 수믾은 개미 떼한테는 당하지 못한다."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야마모토의 주장은 차츰 받아들여졌다.그의 끈질긴 주장으로 3만톤급 신형 항공모함 2척(35노트급-시속63km/h의 쇼가쿠, 즈이가쿠)이 건조되었다. 그리고 극비리에 신형 전투기가 생산 단계에 들어갔는데, 태평양 전쟁 개전 초기부터 2년동안 태평양을 주름잡는 제로 기였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항공기술력을 여전히 형편없는 것으로 얕잡아 보고 있었다. 야마모토 제독은 연합함대 사령관에 취임한지 두달이 채 못되어 일본 해군의 기본적인 전략 계획에 관한 일련의 대변혁 가운데서 최초의 개혁에 착수했다. 첫 번째 개혁작업은 가상적국 제1호였던 미국을 일본 근해에서 격멸한다는 기존의 작전계획을 변경하여 마샬제도를 포함시키는 동쪽방면으로의 확장계획이었다.이 변경은 사소한 것이었고 별로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령부에서는 의의없이 승인되었다. 야마모토의 다음 조치는 연합함대를 이름 그대로 충실하게 충족시키는 일이었다. 그가 사령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대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두 함대가 별도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데 통합하여 그의 직접 작전 지휘하에 두었다. 이리하여 항모와 전함, 순양함, 그리고 보조 함정을 모두 합동시켜, 단일의 강대한 함대로 만들었다. 1940년 봄 그의 지휘하에 실시된 최초의 해군 대훈련에서 야마모토는 항모를 기지로 하는 비행기로 적군함을 공격하는 훈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좀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실로 진주만 공격 감행하기 약 2년전의 일이었지만 야마모토 제독이 내린 훈시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엄격한 훈련 계획이 암암리에 실시되었던 것이다. 1941년 12월까지 일본 해군의 조종사들의 항공전투 기량은 극히 높은 수준까지 숙달되어 있었다. 일본은 절망에 가깝도록 석유가 부족해 있었다. 그리고 만일에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의 석유 자원이 단절된다면 일본 해군의 비행기마저 행동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 야마모토 자신이 정세를 판단한 것처럼, 일본군이 영국 및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대해서 남진한다면 그것은 대미전쟁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태평양 함대는 일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지만, 남방 지역의 일본군 파견부대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군의 보급선을 확보하는 단 하나의 방책은 미 함대를 그 기지에서 격멸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었다. 야마모토는 참모인 구사카 류노스케(진주만 공격의 제1 항공함대 참모장) 소장에게 은밀히 털어 놓았다. "만일 우리들이 미국과 싸우라고 명령받는다면 치고 빠지는 힛트 앤드 런 방식으로 기발한 승리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손색없이 일본의 입장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년째 부터는 미군이 그 군사력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우리들이 최후 승리의 희망을 품고 싸우기란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야마모토의 진주만 기습 공격 구상은 러일 전쟁 당시의 도고 헤이아치로 해군 대장의 여순 항구 기습 작전, 비록 실패했지만 지중해에서 이탈리아군이 어뢰를 탑재한 항공기로 영국의 순양함 알렉산드리아를 격침하려했던 작전과 타란토 항의 이탈리아 함대를 공격했던 영국 구식 복엽기 소드 피쉬의 성공적인 기습공격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8인치 어뢰 발사 훈련중인 영국군 쇼드 피쉬 하와이 제도는 미국 본토인 샌프란시스코 서남으로부터 약 360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1941년 당시에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주민의 약 90%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하와이 제도의 진주만은 미 해군의 전략적 배치에 아주 적합한 항만이고 그 장소도 편리한 곳에 있는 이점이 있었다. 진주만은 1919년에 해군 기지가 되었지만, 미 함대가 거기에 항구적으로 배치하게 된 것은 1940년부터였으나 미해군 제독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던 곳이었다. 우선 4000km나 멀리 떨어진 미 본토의 서해안에서 직접 받아야하는 보급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것도 문제였지만, 이 항만은 완전히 육지에 둘러싸이고 출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항상 골치아픈 문제거리로 여겨졌다. 출입구인 해협에 단한척의 배를 가라앉히기만 해도 이 군항을 봉쇄할 수가 있었다. 또한 출입구인 해협을 지나 함대가 공해상으로 나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함대가 항내에 정박하고 있을 때에는 함선, 연료, 수리시설, 보급물자직접장 등 모든 것이 붐비고 하늘로부터의 공격을 유인하기 쉬운 목표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와이 수역에 주력함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지만, 급한대로 이 수역내에는 진주만 외에 그것과 비슷한 시설을 갖춘 항만이 아무데도 없었던 것이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리차드슨 대장은 진주만을 함대의 항구적 기지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는 미국 대륙 서해안의 좀 더 좋은 기지로 후퇴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까지 반대 의견을 상신했기 때문에 사령관직을 해임당하고, 킴멜 대장이 후임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타란토항에 대한 영국군의 기습공격을 바라본 미국이 그저 수수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헨리 녹스 해군 장관은 미일 전쟁이 발생하면 최대의 위협은 항공 어뢰에 의한 공격이며, 요격기, 대공포의 강화 및 레이더 시설의 증설을 최우선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1940년 12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킴멜 제독은 진주만에서의 어뢰방어망 설치는 해협의 통로를 좁게 하며 함선의 항해를 제약하게된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킴멜 제독이 어뢰방어망에 의한 예방조치를 거부한 거의 같은 무렵에 야마모토는 그의 참모장 후쿠도메 시게루 해군 소장에게 비로소 진주만 기습 공격의 구상을 털어 놓았다. 야마모토는 일본의 연안을 항해하며 해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장소를 물색하다가 큐슈의 가고시마 만의 지형이 진주만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함대를 이곳으로 이동했다. 매일같이 함재기는 해면을 스칠 듯이 비행하며 저공에서의 어뢰 발사와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지만 그 아무도 훈련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다. 야마모토는 진주만 기습공격작전의 암호명을 Z작전으로 명명하려 했는데, 이것은 36년 전 쓰시마 해전에서 저 유명한 " 황국의 흥망은 이 일전에 달려있다"고 절규하던 도고 제독의 Z신호를 본뜬 것이었다. 오니시 다키지로 해군소장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하기위해 야마모토는 믿을 수 있는 동지들을 골라 의견을 물었다. 우선 그가 점찍은 동지는 오니시 다키지로 해군소장이었다. 오니시는 해군에서 극히 드물게 항공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장성이었으며 훗일 전쟁 말기에 가미가제 특공대를 최초로 조직하게되는 인물이다. 제11항공함대의 참모장인 오니시 소장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가능한출격이긴 하지만 마샬제도의 일본군 기지로부터 하와이 공격작전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 야마모토는 동남 아시아의 석유지대 점령을 노리는 작전의 선행준비로서 기습의 일격을 가해 미 태평양함대를유린해 버릴 작전계획의 기본 개요를 오니시에게 설명했다. 야마모토의 작전계획을 경청한 오니시는 겐다 미노루 중좌와 의논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뇌가 명석하고 경험이 풍부한 항공참모인 겐다 중좌는 규슈에서 항공모함 가가에 근무하고 있었다. 36살의 겐다는 영국 런던 주재 일본 대사관 해군 무관 보좌관 으로 해외근무를 갓 끝낸 직후였다. 그는 런던 주재 해군 무관 보좌관 자격으로 참관했던 타란토 항 기습작전의 보고서를 도쿄에 보낸 장본인이었다. 오니시나 야마모토와 마찬가지로 겐다는 해군 항공병력이 극히 중요하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타란토 항 공격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Z작전 계획에 찬성해 줄것으로 기대했다. 10일간에 걸쳐 겐다는 이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오니시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계획은 곤란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겐다 미노루 중좌 야마모토는 가장 먼저 미국의 전함에 공격을 집중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항공모함쪽이 공격 부대로서는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 대개의 미국인처럼, 또 대다수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전함이야말로 함대의 주축이며 이것을 격파함으로써 보다 괴멸적인 타격을 적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처음에는 공격기가 항공모함으로 귀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도 해보았다.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아군의 작전영역 밖으로 출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와이에는 그다지 근접할 필요가 없다. 또 공격기가 출격하자마자 조국을 향해 귀환 길에 오를 수도 있다. 공격이 끝나면 조종사는 해상에 불시착하여 구축함이나 잠수함의 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겐다는 이러한 구상에는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의 제일 목표는 항공모함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항모는 일본 해군에게 있어 최대의 잠재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 최상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항모는 되도록 진주만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살적인 무모한 공격은 조종사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준다. 또 전쟁이라는 중대국면에 비추어 섣불리 항공기와 조종사를 동시에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공격기의 귀함을 기다리지 않고 귀항길에 오른다면 미국측이 반격해 올 경우 이에 대항할 비행기가 없는 항모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항모 아카기 항모 가가 진주만 공격 작전에 유리한 하나의 요인은, 일본 해군이 충분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36500톤의 아카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력있는 항공모함의 하나였다. 이 항모는 미 해군의 렉싱턴이나 사라토가보다도 한층 대형함이었다. 아카기는 1936년부터 1938년에 걸친 개장작업으로 91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기와 비슷한 항모는 38200톤급의 가가였고, 이것보다 소형의 항모 히류와 소류도 취역하고 있었다. 각각 25675톤급인 다른 두척의 항모 즈이가쿠와 쇼가쿠도 1941년 8월에 취역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야마모토 함대가 확보한 항모는 모두 6척으로 증강되는 셈이었다. 겐다 중좌는 이 항모 6척 전부를 Z작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다는 오니시에게 첫째, 이 임무에는 가장 유능한 장교와 가장 잘 훈련된 조종사들만을 선발 할것과 둘째로는 공격 직전의 최후 순간까지 작전은 극비에 붙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란토 항을 공격했던 쇼드 피쉬에 장착된 18인치 (45.7cm)어뢰 야마모토 제독의 승인을 받아 오니시는 겐다로 하여금 작전계획 원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3월 말 경에는 계획 원안이 차츰 구체화 되어 갔다. 즉, 공격은 특별기동부대가 담당한다. 이 부대는 호위함을 동반한 약 20척의 이(伊)잠수함과 5척의 특수잠항정으로 구성된 선견부대와 6척의 항모를 중심으로 한 주력 공격부대로 편성된다. 이 기동부대는 이미 알려진 항로를 피하고 우회 루트를 이용한다. 이 루트로 하와이까지 360km의 지점에 접근하여 여기서 항모로부터 항공기가 출격하고 미군기의 초계비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믿어지는 공중을 따라 진주만을 향해 침입한다. 공격에는 360대의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급강하폭격기, 고도수평폭격기, 뇌격기, 전투기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뢰는 폭탄보다도 파괴력이 크다. 더구나 근거리에서의 공격에선 명중률이 높으므로 미 해군함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다. 진주만의 수심이 매우 얕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항공어뢰로서는 통상방법으로 발사한다면 해저에 부딪치고 만다. 그러나 타란토 항의 수심은 41피트 이하였으면서도 영국 해군은 항공기에서 어뢰로 적함을 격침할 수가 있었다. 진주만의 수심은 45피트이므로 이 문제는 명백하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폭탄의 경우는 미 전함 갑판의 장갑을 관통시키기 위해 대형의 철갑탄이 필 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습이 절대로 필요하다. 만일 기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을 받기 쉬운 귀항 도중에 기동부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습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전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측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군령부는 Z작전이 매우 무모한 짓이라며 반대했다. 오니시 자신도 이 작전의 성공률을 60%로 전망하고 있었고, 후쿠도메 참모장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마모토만은 역시 항공모함에 의한 진주만의 항공기습 공격은 실행 가능하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었다. 이리하여 3월 말 경까지는 계획이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누가 기습을 담당하는 기동부대의 지휘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야마모토는 자신이 몸소 지휘하고 싶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서, 그에게는 수 많은 임무가 있었다. 그리하여 하급자 중에서 한명을 엄중히 선발하여 임명해야 했다. 그 결과 선임 소장인 나구모 주이치 해군소장이 기동부대 지휘관으로 결정되었다. 나구모는 완고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고루한 해군장성으로, 항공기나 항모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의 전문지식이라고 한다면 항해기술에 관한 것 뿐이었다. 도중에서 연료를 보급하며, 탐지되지 않아야 하며 더구나 엄밀한 계획에 따라 태평양의 수천킬로를 항행하여 적의 군항 가까이까지 대함대를 통솔해 간다는 대임무가 맡겨지자 나구모는 대경실색 했다. 작전의 성공은 주로 기습에 달려 있다. 만일 순조롭지 않다면 일본은 해군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즉 그는 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 작전이 실시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구모 자신도 한시름 놓았다. 당시로서는 아직도 대미 개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진주만 기습 계획도 군령부의 승인을 아직 받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위 사진은 프랑스가 다시 인도차이나를 접수하는 시점의 인도차이나 주둔 일본군 모습이다 프랑스가 독일에 패한 것을 이용하여 1940년, 일본군은 비로소 중국 이남으로 진출했다.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베트남 지역)의 루트를 통해 중요 물자가 중국의 장개석군에게 수송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이 지역의 북부가 일본군에 의해 관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비시 정권에 대한 독일의 압박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에 대한 일본측의 협박이 겹쳐 마침내 일본군에 의한 북부 인도차이나의 점령에 동의하게된다. 일본군은 인도차이나에 진주한 다음, 다시 인도차이나 총독인 카토르 장군을 협박하여 인도차이나 전체를 일본군의 보호 아래에 둔다는 강요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인도차이나의 공군, 해군 기지를 장악하게된 일본군은 다시 태국으로의 남진 태세를 갖 추었다. 태국 정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예를 따르도록 강요 당한 끝에 일본 정부의 보호조치를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말았다. 일본이 동남 아시아의 극히 중요한 전략 지역에 강력한 군대를 진출시킨 사태에 분노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세 나라는 일본군의 점령확대가 결정된 48시간 이내에 일본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대일본 금수조치에 들어갔다. 그 며칠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일체의 석유 수출금지를 단행하였고, 이어서 네덜란드도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유전에서의 대일 석유공급을 중지시켰다. 경제봉쇄에 직면하자 일본은 서서히 목이 조이듯 궁핍으로 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석유 금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유전을 점령하는 조치는 해군에 있어 사활의 관건이었다. 석유의 비축량은 불과 몇 달치밖에 없다. 문제는 유전을 점령해야 하는 필요성의 여부가 아니고 그것을 감행하는데 얼마만의 시간적 여유가 남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태에 직면하자 해군의 수뇌부는 수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 "일본은 석유가 필요하다. 전쟁이냐, 평화냐, 늦어도 10월까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워싱턴에서는 노무라 기찌사부로 주미 일본대사가 외교교섭에 나서고 있었지만 코델 헐 미 국무장관은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물러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다 제 12편에서 계속...... 자료제공 : H/ 채널 (히스토리) ㅎㅎ 목이 다 뻐근하네 ^^;; 캔맥주 한개 묵고 자야징 짱/밀리 가족여러분들 편안하고 포근한 밤이되실길 [밀리터리] 도라!도라!도라!(태평양전쟁) ....10편 도라!도라!도라!.... 10편 한편 아시아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에 실패한 때로부터 꼭 3세기가 지나고서 일본은 다시 중국침략전을 수립했다. 당시 러시아는 한반도에대한 세력확장을 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조선 국내에 있는 일본의 중요한 상업적 권익이 위협을 받았다. 또 한편 1898년에는 러시아가 만주의 여순을 획득하여 군대와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서 여순항구와 유럽방면을 철도로 연결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19세기 말까지 일본의 신문들은 거대국가인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었고 일본 육, 해군은 급속한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정식발효 되었지만 이미 이보다 48시간이나 앞서 러일 양군은 각각 최초의 일발을 쏘아대면서 불꽃을 튕기고 있었다. 여기서 야기된 상황은 이로부터 38년후 진주만에 대해 예견케하는 불길한 전조가 되었다.거대한 적국 러시아에 대해 인적으로나 물자면에서 매우 열세였던 일본의 희망은 제해권을 차지하는 일과 개전 초기에 조선을 지배하는데 있었다. 이 두가지 수단에 의해 러시아군은 일본 본토에 대해 군사작전을 강행할 수 있는 조선의 어떠한 항구도 모두 잃어 버리는 셈이 된다. 즉 조선 서해안의 항구는 어느 것이나 일본 함대의 기지로서 이용될 수 있는 좋은 항구였다. 그리고 일본군 부대는 러시아측이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압도적인 대군을 유럽방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이전에 해상과 육상의 두 루트에 의해 조선을 경유하여 만주에 출동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중립국인 조선의 인천항에서 러시아 군함 한척이 격침당했으며 일본군 부대가 조선에 처음으로 상륙했다.그 동안 도고 헤이아치로 해군대장이 이끄는 일본함대 주력은 여순 항구를 향해 고속 항진하고 있었다. 1904년 2월 8일 자정 조금 앞서 항구에 정박중이던 러시아 전함 3척이 일본 해군구축함들에게서 일제히 어뢰공격을 받았다. 그 이튿날 정오에 제2차 공격이 감행되어 러시아 순양함 4척에 어뢰가 명중했다. 그리고나서 도고 사령장관은 여순항을 봉쇄했다. 다섯달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여순 요새는 일본군 부대에 함락되고 러시아 함대의 잔여함정은 전부 일본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일본의 넬슨 제독이란 칭호를 얻은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영국 넬슨 제독은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멸시켰다. 영국 포트마우스 드라이 도크/ 도고 제독의 기함 미가사. 러일 전쟁 당시 영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였다. 여순 항구가 함락되기 몇 달전에 러시아측에선 여순항의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발트해 방면에 있었던 강력한 발틱함대를 파견하였다.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이 함대는 극동의 전역에 도달하기까지 실로 일곱달이나 걸렸다. 그리고 불과 하루새에 대한해협(일본은 일본해해전이라하며 전사는 쓰시마해전이라 함)에서 허무하게도 격멸당하고 말았다. 이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멸하기 위해 게양했던 상승 기인 Z깃발은훗날 진주만 기습공격 때 항공모함 아카기에 게양된다.이것은 러시아함대를 격멸한 일본이 세계열강 중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과함께 조선, 나아가 만주의 남부를 사실상 점유하는 결과가 되었다. 러일전쟁 동안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일본인 노동자의 물결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오는데 대한 미국인의 분노는 한층 높았다. 1905년 봄에는 일본인 이민을 저지하는 요구가 높아졌고 미국내의 일본인 상사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조와 더불어 상품 불매운동, 배일운동이 이는등 미,일간의 마찰이 증대되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 짐꾼들을 이용하여 보급품을 수송하는 모습이다.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조선은 나라를 잃는 비극을 맞게된다. 패전국 러시아는 일본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아시아 대륙 주둔 일본군에게 보급물자를 전달하는 것을 간섭할 수 없었다. 다시는 이러한 치욕스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여 정신차리자... 1898년, 미국은 하와이와 필리핀을 접수했으므로 이 새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가 필요했으며,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데오도어 루즈벨트는 7년간의 재임기간동안 미국해군의 규모를 두배로 확충하려 노력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대로 러시아함대를 격멸한 일본은 해군력을 더욱 더 증강해나갔다. 1913년까지 일본정부의 해군 지출은 국가 예산의 35%를 소요한다고 설명되었다. 더 나아가 1920년에 가결된 88함대 계획(대형 전함 8척, 고속 순양 전함 8척을 기간으로하는 편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이 태평양 제해권을 노리며 미국에 당당히 도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영국과 독일 양국간의 군함 건조 경쟁이 제1차세계대전을 조장한 유력한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일본, 미국, 영국의 해군력 확장경쟁이 그야말로 다음 전쟁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1920년대를 통해서 일본의 해군병력은 5:5:3의 비율 협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건조할 수 있는 주력함의 수가 5척인데 반해 일본은 겨우 주력함 3척만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의미했다. (1922년, 워싱턴 군축조약이라 불리우는 해군 군비제한 협정에서 주력전함의 보유 비율을 미국과영국은 각각 5, 일본 3,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67로 합의하여 미국과 영국은 135000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60000톤, 일본이 81000톤으로하며 비율을 초과한 함정은 폐기처분한다는 것) 워싱턴 군축회의. 1921년 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군축조약은 사실상 일본을 3등국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었으며 또 일본 제국해군의 역할을 단지 전쟁억제력의 역할로만 담당하게끔 조치한 것이다. 우선 회의 벽두에 일본 전권위원 가또 도모사부로 해군대장은 미,영,일 3국의 함대비율을 10:10:7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의 해군 전문가들은 지키는 함대는 공격하는 함대보다 50%나 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10:7의 비율을 양보해서 인정 한다는 것은 미국 해군이 아슬아슬하게 우세한 한계를 잃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함에 관해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 대하여 이 비율을 수락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5:5:3의 비율은, 태평양에서 미국이 계속 우세를 유지하는 상태를 보증하는 것이었다. 태평양의 지배권을 결정할 항공모함에 관해 이 워싱턴 회의에서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각국 모두 항공모함은 다섯 손가락으로 헤일 수 있을만큼 불과 몇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수년동안 일본이 워싱턴 조약을 원칙대로 준수했으나 일본 해군력은 차츰 이 조약의 한도까지 확장되었다. 그런데 1930년까지 일본의 군국주의적 당파는 일본의 지배에 의해 움직이는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를 꿈꾸고 있었다. 그리하여 5:5:3의 불평등한 조약이 해군력의 확장에 방해가 되므로, 조약을 폐기시키든가 아니면 좀더 유리한 비율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1930년의 런던 군축회의에서는 워싱턴 조약의 폐기나 주력함 비율의 변경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이 일본정부 지배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들의 런던조약과 앞서의 워싱턴 조약에 대한 비난은 격화되었다. 이어서 제2회 군축회의는 1935년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맹렬한 항의가 높아져 갔으므로 예비회의를 그 전해인 1934년에 우선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는 해군 병력을 조약에 의해 제한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가 되었던 셈인데, 아직 시작도 되기도 전부터 실패가 운명되어져 있었다. 회담은 두 달동안이나 지연 되었으나 일본 대표단은 어떠한 협정도 성립시키지 않으리라는 움직임으로 보였다.일본이 요구한 것은 군비는 독립국 주권으로서 민족자결(民族自決)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력함 비율은 협정한 대로 존속시키는 한편, 얼마간의 타협을 모색한다는 영국과 미국의 제안은 단호히 거부되었다. 그해 가을에 일본은 워싱턴 조약을 금후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무익하다고 설명하고, 일본은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통고했다. 이당시 일본의 정권은 군인정치가들로 구성된 강경한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으므로, 전국에 소용돌이는 치는 전쟁의 물결을 저지하기란 극히 곤란했다.군축협정으로 인한 제한에서 탈퇴하자 일본은 제국 해군을 재정적 자원이 허락되는 한 확장하는데 자유로워 졌다. 1941년까지 일본 해군은 태평양 방면에서 미, 영 양국의 합동 함대보다도 더 강대해졌다. 즉 일본은 세계가 이제까지 본 일도 없는 최대의 전함 2척(6만9천톤급 거대전함 야마또와 무사시)을 보유할 뿐아니라 항공모함 10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당시 미국은 겨우 3척의 항공모함을, 영국은 단 1척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보다 더욱 중대한 일은 일본 제국 해군은 이미 공격용 병기로써 항공모함을 사용하는 새 전략을 채용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항공모함이 전함 그룹에 대공용으로서 우산을 제공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함 가가 진수식 1921년 고베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던 전함 가가는 워싱턴 조약에 의해 완공이 연기되었으나1928년, 고노카 조선소에서 항공모함으로 개조 되었다.(아래 그림) 여기서... 일본의 중국침략 만주를 침공, 점령한 일본 관동군 제12사단 병사들.상공에 애국 헌납 1호기인 K-37 경폭격기가 비행중이다 1931년에 일본은 만주 북부지방을 점령했다. 일본군의 주장에 의하면 이 결정은 오만하고 도전적인 중국군에 의해 떠 맡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급속한 군사작전의 확대로 인해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할 것을 미리부터 계획해왔다는 사실이 곧 폭로되었다. 그 진상은 바야흐로 일본 정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또한 애국적 열광을 국내에 부채질하고 있던 호전주의자들이 일본은 크게 발전되어야한다고 결정한데서 비롯되었다. 자신들의 조국 일본열도는 그 산이 많은 지세 때문에 현대산업에 공급하기위한 원료물자가 부족했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더 넓은 영토가 필요했다. 일본은 만주 점령 후 6년이 지나 중국대륙 침략을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8월까지 8년 동안이나 이 전쟁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일본군 96식 함상 폭격기 / 중국 전선 아무튼 1939년까지 일본은 전쟁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일본군이 아시아 대륙의 광대한 지역에서 연전연승을 할 때마다 호전파의 지배력은 팽창했으며 육군 장군들이 중국 북부에 더욱 더 깊숙이 전진하고 있을 때 해군 제독들은 일본이 소련과의 격돌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은 만일 일본이 강대국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 방향은 제국 해군의 실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미 중국 대륙에서 전쟁에 깊이 말려들어가 있었으므로 이 궁지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논리적인 방법은 육군 부대를 북쪽으로 진격시켜 소련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도 오히려 해군력을 중국 연안에 사용하는 일이라고 전망하였다. 해군은 육, 해군의 합동작전을 계속할 경우에 비교적 소수의 육군부대로 병력이 우세한 중국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또는 신축성있는 행동으로 대항사켜 사용할 수 있다면 이와같은 전술은 이중의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 보았다. 우선 첫째로는 일본보다 인구가 많은 두 개의 대륙국(중국, 소련)을 상대로 하는 소모전에서 일본이 수렁에 빠져 허덕일 위험은 적다. 둘째로는 동안 아시아 방면에서 작전을 전개할 강력한 일본 해군이 출항하는 것은 그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일본의 외교적, 상업적 기도를 크게 뒷 받칠 하게 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어떤 시기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와의 무역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했었다. 중국에 있어서의 전쟁의 긴장이 계속되고 게다가 석유를 비롯한 그밖의 중요한 원료물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자 해군 제독들에게 있어서 이 동인도 방면이 사활을 걸 만큼 중대한 지역으로 보이게 되었다. 일본군의 중국 대륙침략 / 일본군 94식 전차. 1938년까지 일본군은 항상 소련을 일본의 주된 가상적군이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일전쟁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압박을 가해 왔으므로 일본은 더 더욱 분노를 증대시켜 최대의 적을 소련에서 미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일본 육군수뇌부는 중국정복의 공로를 내세우며 과시했고 스스로 전능인 것처럼 광신하고 있었으므로 전쟁에 찬성했으며 또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삼국 동맹에 일본이 참가하기를 강력히 권하고 있었고, 일본의 장군들은 이 동맹에의 참가를 적극지지했다. 히틀러는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태평양을 맡아준다면 영국을 돕고 있는 미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영국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여 1940년 9월,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일본으로서는 독일이 유럽에서 프랑스를 누르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발판으로 남진하여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를 손에 넣는 기회를 잡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은 독일과 협상 끝에 9월 27일 베를린에서 3국동맹 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첫째,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하여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그들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하며 둘째, 독일과 이탈리아가 일본에 대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그 지도적 지위를 인정한다. 셋째, 동맹의 세 나라 중 어떤 나라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중, 일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는 세 나라가 모두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원조한다는 것 등이었는데 거기에 이 조약을 맺은 세 나라와 소련 사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음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명백했다. 하지만 육군과는 달리 대부분의 해군 제독들은 3국 동맹을 찬성하지 않았다. 왼쪽에서부터 일본 구르스 대사, 이탈리아 외상 치아노, 히틀러, 리벤트로프 독일 외상이 3국동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1940년 9월 27일 독일 베를린 3국 동맹을 축하하기 위하여 도쿄의 공원에 걸린 3국의 국기 그러나 동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이미 미 태평양함대에게 본토 서해안의 군항을 출항하여 태평양 상의 진주만 기지에 집결하도록 명령하였으므로 정세는 일변하고 말았다. 루즈벨트는 이미 일본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었고 그것은 차츰 일본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이 함대의 이동은 미국 대통령이 무력간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엿보이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결국 1941년 7월에 미국의 대일 통상무역이 단절되고 일본의 미국내 자산이 일체 동결당하자 전쟁은 눈앞에 닥친 것처럼 보였다 항모 사라토가 과연 일본은 정말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콧털만 뽑은 것일까?? 11편으로 계속... 아공 나만 이런건가?? 인터넷 접속이 엄청느리고 자꾸만 짱공 웹사이트 에러가 뜨네요.. 자료는 더 올리고 싶지만 오늘은 요기까만 할게요 ^^;;
[밀리터리] 도라!도라!도라!(태평양전쟁) ....10편 도라!도라!도라!.... 10편 한편 아시아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에 실패한 때로부터 꼭 3세기가 지나고서 일본은 다시 중국침략전을 수립했다. 당시 러시아는 한반도에대한 세력확장을 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조선 국내에 있는 일본의 중요한 상업적 권익이 위협을 받았다. 또 한편 1898년에는 러시아가 만주의 여순을 획득하여 군대와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서 여순항구와 유럽방면을 철도로 연결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19세기 말까지 일본의 신문들은 거대국가인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었고 일본 육, 해군은 급속한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정식발효 되었지만 이미 이보다 48시간이나 앞서 러일 양군은 각각 최초의 일발을 쏘아대면서 불꽃을 튕기고 있었다. 여기서 야기된 상황은 이로부터 38년후 진주만에 대해 예견케하는 불길한 전조가 되었다.거대한 적국 러시아에 대해 인적으로나 물자면에서 매우 열세였던 일본의 희망은 제해권을 차지하는 일과 개전 초기에 조선을 지배하는데 있었다. 이 두가지 수단에 의해 러시아군은 일본 본토에 대해 군사작전을 강행할 수 있는 조선의 어떠한 항구도 모두 잃어 버리는 셈이 된다. 즉 조선 서해안의 항구는 어느 것이나 일본 함대의 기지로서 이용될 수 있는 좋은 항구였다. 그리고 일본군 부대는 러시아측이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압도적인 대군을 유럽방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이전에 해상과 육상의 두 루트에 의해 조선을 경유하여 만주에 출동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중립국인 조선의 인천항에서 러시아 군함 한척이 격침당했으며 일본군 부대가 조선에 처음으로 상륙했다.그 동안 도고 헤이아치로 해군대장이 이끄는 일본함대 주력은 여순 항구를 향해 고속 항진하고 있었다. 1904년 2월 8일 자정 조금 앞서 항구에 정박중이던 러시아 전함 3척이 일본 해군구축함들에게서 일제히 어뢰공격을 받았다. 그 이튿날 정오에 제2차 공격이 감행되어 러시아 순양함 4척에 어뢰가 명중했다. 그리고나서 도고 사령장관은 여순항을 봉쇄했다. 다섯달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여순 요새는 일본군 부대에 함락되고 러시아 함대의 잔여함정은 전부 일본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일본의 넬슨 제독이란 칭호를 얻은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영국 넬슨 제독은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멸시켰다. 영국 포트마우스 드라이 도크/ 도고 제독의 기함 미가사. 러일 전쟁 당시 영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였다. 여순 항구가 함락되기 몇 달전에 러시아측에선 여순항의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발트해 방면에 있었던 강력한 발틱함대를 파견하였다.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이 함대는 극동의 전역에 도달하기까지 실로 일곱달이나 걸렸다. 그리고 불과 하루새에 대한해협(일본은 일본해해전이라하며 전사는 쓰시마해전이라 함)에서 허무하게도 격멸당하고 말았다. 이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멸하기 위해 게양했던 상승 기인 Z깃발은훗날 진주만 기습공격 때 항공모함 아카기에 게양된다.이것은 러시아함대를 격멸한 일본이 세계열강 중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과함께 조선, 나아가 만주의 남부를 사실상 점유하는 결과가 되었다. 러일전쟁 동안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일본인 노동자의 물결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오는데 대한 미국인의 분노는 한층 높았다. 1905년 봄에는 일본인 이민을 저지하는 요구가 높아졌고 미국내의 일본인 상사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조와 더불어 상품 불매운동, 배일운동이 이는등 미,일간의 마찰이 증대되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 짐꾼들을 이용하여 보급품을 수송하는 모습이다.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조선은 나라를 잃는 비극을 맞게된다. 패전국 러시아는 일본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아시아 대륙 주둔 일본군에게 보급물자를 전달하는 것을 간섭할 수 없었다. 다시는 이러한 치욕스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여 정신차리자... 1898년, 미국은 하와이와 필리핀을 접수했으므로 이 새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가 필요했으며,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데오도어 루즈벨트는 7년간의 재임기간동안 미국해군의 규모를 두배로 확충하려 노력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대로 러시아함대를 격멸한 일본은 해군력을 더욱 더 증강해나갔다. 1913년까지 일본정부의 해군 지출은 국가 예산의 35%를 소요한다고 설명되었다. 더 나아가 1920년에 가결된 88함대 계획(대형 전함 8척, 고속 순양 전함 8척을 기간으로하는 편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이 태평양 제해권을 노리며 미국에 당당히 도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영국과 독일 양국간의 군함 건조 경쟁이 제1차세계대전을 조장한 유력한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일본, 미국, 영국의 해군력 확장경쟁이 그야말로 다음 전쟁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1920년대를 통해서 일본의 해군병력은 5:5:3의 비율 협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건조할 수 있는 주력함의 수가 5척인데 반해 일본은 겨우 주력함 3척만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의미했다. (1922년, 워싱턴 군축조약이라 불리우는 해군 군비제한 협정에서 주력전함의 보유 비율을 미국과영국은 각각 5, 일본 3,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67로 합의하여 미국과 영국은 135000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60000톤, 일본이 81000톤으로하며 비율을 초과한 함정은 폐기처분한다는 것) 워싱턴 군축회의. 1921년 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군축조약은 사실상 일본을 3등국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었으며 또 일본 제국해군의 역할을 단지 전쟁억제력의 역할로만 담당하게끔 조치한 것이다. 우선 회의 벽두에 일본 전권위원 가또 도모사부로 해군대장은 미,영,일 3국의 함대비율을 10:10:7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의 해군 전문가들은 지키는 함대는 공격하는 함대보다 50%나 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10:7의 비율을 양보해서 인정 한다는 것은 미국 해군이 아슬아슬하게 우세한 한계를 잃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함에 관해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 대하여 이 비율을 수락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5:5:3의 비율은, 태평양에서 미국이 계속 우세를 유지하는 상태를 보증하는 것이었다. 태평양의 지배권을 결정할 항공모함에 관해 이 워싱턴 회의에서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각국 모두 항공모함은 다섯 손가락으로 헤일 수 있을만큼 불과 몇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수년동안 일본이 워싱턴 조약을 원칙대로 준수했으나 일본 해군력은 차츰 이 조약의 한도까지 확장되었다. 그런데 1930년까지 일본의 군국주의적 당파는 일본의 지배에 의해 움직이는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를 꿈꾸고 있었다. 그리하여 5:5:3의 불평등한 조약이 해군력의 확장에 방해가 되므로, 조약을 폐기시키든가 아니면 좀더 유리한 비율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1930년의 런던 군축회의에서는 워싱턴 조약의 폐기나 주력함 비율의 변경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이 일본정부 지배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들의 런던조약과 앞서의 워싱턴 조약에 대한 비난은 격화되었다. 이어서 제2회 군축회의는 1935년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맹렬한 항의가 높아져 갔으므로 예비회의를 그 전해인 1934년에 우선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는 해군 병력을 조약에 의해 제한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가 되었던 셈인데, 아직 시작도 되기도 전부터 실패가 운명되어져 있었다. 회담은 두 달동안이나 지연 되었으나 일본 대표단은 어떠한 협정도 성립시키지 않으리라는 움직임으로 보였다.일본이 요구한 것은 군비는 독립국 주권으로서 민족자결(民族自決)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력함 비율은 협정한 대로 존속시키는 한편, 얼마간의 타협을 모색한다는 영국과 미국의 제안은 단호히 거부되었다. 그해 가을에 일본은 워싱턴 조약을 금후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무익하다고 설명하고, 일본은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통고했다. 이당시 일본의 정권은 군인정치가들로 구성된 강경한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으므로, 전국에 소용돌이는 치는 전쟁의 물결을 저지하기란 극히 곤란했다.군축협정으로 인한 제한에서 탈퇴하자 일본은 제국 해군을 재정적 자원이 허락되는 한 확장하는데 자유로워 졌다. 1941년까지 일본 해군은 태평양 방면에서 미, 영 양국의 합동 함대보다도 더 강대해졌다. 즉 일본은 세계가 이제까지 본 일도 없는 최대의 전함 2척(6만9천톤급 거대전함 야마또와 무사시)을 보유할 뿐아니라 항공모함 10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당시 미국은 겨우 3척의 항공모함을, 영국은 단 1척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보다 더욱 중대한 일은 일본 제국 해군은 이미 공격용 병기로써 항공모함을 사용하는 새 전략을 채용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항공모함이 전함 그룹에 대공용으로서 우산을 제공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함 가가 진수식 1921년 고베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던 전함 가가는 워싱턴 조약에 의해 완공이 연기되었으나1928년, 고노카 조선소에서 항공모함으로 개조 되었다.(아래 그림) 여기서... 일본의 중국침략 만주를 침공, 점령한 일본 관동군 제12사단 병사들.상공에 애국 헌납 1호기인 K-37 경폭격기가 비행중이다 1931년에 일본은 만주 북부지방을 점령했다. 일본군의 주장에 의하면 이 결정은 오만하고 도전적인 중국군에 의해 떠 맡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급속한 군사작전의 확대로 인해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할 것을 미리부터 계획해왔다는 사실이 곧 폭로되었다. 그 진상은 바야흐로 일본 정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또한 애국적 열광을 국내에 부채질하고 있던 호전주의자들이 일본은 크게 발전되어야한다고 결정한데서 비롯되었다. 자신들의 조국 일본열도는 그 산이 많은 지세 때문에 현대산업에 공급하기위한 원료물자가 부족했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더 넓은 영토가 필요했다. 일본은 만주 점령 후 6년이 지나 중국대륙 침략을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8월까지 8년 동안이나 이 전쟁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일본군 96식 함상 폭격기 / 중국 전선 아무튼 1939년까지 일본은 전쟁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일본군이 아시아 대륙의 광대한 지역에서 연전연승을 할 때마다 호전파의 지배력은 팽창했으며 육군 장군들이 중국 북부에 더욱 더 깊숙이 전진하고 있을 때 해군 제독들은 일본이 소련과의 격돌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은 만일 일본이 강대국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 방향은 제국 해군의 실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미 중국 대륙에서 전쟁에 깊이 말려들어가 있었으므로 이 궁지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논리적인 방법은 육군 부대를 북쪽으로 진격시켜 소련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도 오히려 해군력을 중국 연안에 사용하는 일이라고 전망하였다. 해군은 육, 해군의 합동작전을 계속할 경우에 비교적 소수의 육군부대로 병력이 우세한 중국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또는 신축성있는 행동으로 대항사켜 사용할 수 있다면 이와같은 전술은 이중의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 보았다. 우선 첫째로는 일본보다 인구가 많은 두 개의 대륙국(중국, 소련)을 상대로 하는 소모전에서 일본이 수렁에 빠져 허덕일 위험은 적다. 둘째로는 동안 아시아 방면에서 작전을 전개할 강력한 일본 해군이 출항하는 것은 그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일본의 외교적, 상업적 기도를 크게 뒷 받칠 하게 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어떤 시기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와의 무역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했었다. 중국에 있어서의 전쟁의 긴장이 계속되고 게다가 석유를 비롯한 그밖의 중요한 원료물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자 해군 제독들에게 있어서 이 동인도 방면이 사활을 걸 만큼 중대한 지역으로 보이게 되었다. 일본군의 중국 대륙침략 / 일본군 94식 전차. 1938년까지 일본군은 항상 소련을 일본의 주된 가상적군이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일전쟁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압박을 가해 왔으므로 일본은 더 더욱 분노를 증대시켜 최대의 적을 소련에서 미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일본 육군수뇌부는 중국정복의 공로를 내세우며 과시했고 스스로 전능인 것처럼 광신하고 있었으므로 전쟁에 찬성했으며 또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삼국 동맹에 일본이 참가하기를 강력히 권하고 있었고, 일본의 장군들은 이 동맹에의 참가를 적극지지했다. 히틀러는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태평양을 맡아준다면 영국을 돕고 있는 미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영국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여 1940년 9월,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일본으로서는 독일이 유럽에서 프랑스를 누르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발판으로 남진하여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를 손에 넣는 기회를 잡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은 독일과 협상 끝에 9월 27일 베를린에서 3국동맹 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첫째,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하여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그들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하며 둘째, 독일과 이탈리아가 일본에 대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그 지도적 지위를 인정한다. 셋째, 동맹의 세 나라 중 어떤 나라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중, 일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는 세 나라가 모두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원조한다는 것 등이었는데 거기에 이 조약을 맺은 세 나라와 소련 사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음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명백했다. 하지만 육군과는 달리 대부분의 해군 제독들은 3국 동맹을 찬성하지 않았다. 왼쪽에서부터 일본 구르스 대사, 이탈리아 외상 치아노, 히틀러, 리벤트로프 독일 외상이 3국동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1940년 9월 27일 독일 베를린 3국 동맹을 축하하기 위하여 도쿄의 공원에 걸린 3국의 국기 그러나 동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이미 미 태평양함대에게 본토 서해안의 군항을 출항하여 태평양 상의 진주만 기지에 집결하도록 명령하였으므로 정세는 일변하고 말았다. 루즈벨트는 이미 일본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었고 그것은 차츰 일본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이 함대의 이동은 미국 대통령이 무력간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엿보이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결국 1941년 7월에 미국의 대일 통상무역이 단절되고 일본의 미국내 자산이 일체 동결당하자 전쟁은 눈앞에 닥친 것처럼 보였다 항모 사라토가 과연 일본은 정말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콧털만 뽑은 것일까?? 11편으로 계속... 아공 나만 이런건가?? 인터넷 접속이 엄청느리고 자꾸만 짱공 웹사이트 에러가 뜨네요.. 자료는 더 올리고 싶지만 오늘은 요기까만 할게요 ^^;; [연예인] 이 정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화제를 모은 가수 이정이 KBS 2TV '해피선데이'의 '남자의 자격'에 깜짝 출연해 어머님께 인사를 전했다.지난 10월 20일 해병대에 입대한 이정은 26일 방송된 '남자의 자격'의 '남자, 그리고 두번 군대가기'의 일환으로 해병대 체험에 나선 멤버들 앞에 깜짝 등장했다.지난주 19일에 이어 해병대 체험에 나선 이경규, 김태원, 김성민, 김국진, 이윤석, 윤형빈, 이정진 등 멤버들은 해병대 출신 가수 남진의 지도하에 하룻동안 훈련을 마쳤다. 순검을 마치고, 취침에 들어가기 전 내무반에 가수 김흥국과 이정이 나타났다.이날 해병대 401기 출신인 김흥국과 현재 일병인 1080기 이정은 남진과 함께 해병대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이정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후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당당하게 입대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이제 후회할껄"이라며 독설을 날리기도 한 '왕비호' 윤형빈은 이정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 김흥국은 "내 자식도 아닌데 참고 이겨내라며 이정에게 해병대를 강요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고 전했다.이경규의 '몰래카메라'에서 해병대 입대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전한 이정은 이날 방송에서 "TV 통해 해병대 가겠다고 공언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고 우스갯 소리를 했다.해병대의 무한 사랑을 보인 남진과 김흥국은 "해병대 전우들 4,000여명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다. 또 WBC의 준우승을 이끈 김인식 감독도 축구 대표팀의 허정무 감독도 해병대 출신이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잘되면 해병대 때문이라고 자랑하던 선배 남진과 김흥국의 말에 이정은 "훈련소에 있을 때 항상 무언가를 배워갈 것 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전우애와 결속력인 것 같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정은 해병대의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러 늠름한 군인으로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특히 이날 이정은 어머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이정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해 걱정이 많으 실 것이다"며 "편찮으신 어머니 두고 입대를 하게 돼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지만, 건강하게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제대하고 나서 못다한 효도 다하겠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필승!"이라고 말하며 눈물이 맺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남자의 자격'에 깜짝 출연한 일병 이정. 사진 = KBS화면캡처]
[연예인] 이 정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화제를 모은 가수 이정이 KBS 2TV '해피선데이'의 '남자의 자격'에 깜짝 출연해 어머님께 인사를 전했다.지난 10월 20일 해병대에 입대한 이정은 26일 방송된 '남자의 자격'의 '남자, 그리고 두번 군대가기'의 일환으로 해병대 체험에 나선 멤버들 앞에 깜짝 등장했다.지난주 19일에 이어 해병대 체험에 나선 이경규, 김태원, 김성민, 김국진, 이윤석, 윤형빈, 이정진 등 멤버들은 해병대 출신 가수 남진의 지도하에 하룻동안 훈련을 마쳤다. 순검을 마치고, 취침에 들어가기 전 내무반에 가수 김흥국과 이정이 나타났다.이날 해병대 401기 출신인 김흥국과 현재 일병인 1080기 이정은 남진과 함께 해병대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이정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후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당당하게 입대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이제 후회할껄"이라며 독설을 날리기도 한 '왕비호' 윤형빈은 이정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 김흥국은 "내 자식도 아닌데 참고 이겨내라며 이정에게 해병대를 강요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고 전했다.이경규의 '몰래카메라'에서 해병대 입대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전한 이정은 이날 방송에서 "TV 통해 해병대 가겠다고 공언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고 우스갯 소리를 했다.해병대의 무한 사랑을 보인 남진과 김흥국은 "해병대 전우들 4,000여명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다. 또 WBC의 준우승을 이끈 김인식 감독도 축구 대표팀의 허정무 감독도 해병대 출신이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잘되면 해병대 때문이라고 자랑하던 선배 남진과 김흥국의 말에 이정은 "훈련소에 있을 때 항상 무언가를 배워갈 것 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전우애와 결속력인 것 같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정은 해병대의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러 늠름한 군인으로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특히 이날 이정은 어머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이정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해 걱정이 많으 실 것이다"며 "편찮으신 어머니 두고 입대를 하게 돼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지만, 건강하게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제대하고 나서 못다한 효도 다하겠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필승!"이라고 말하며 눈물이 맺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남자의 자격'에 깜짝 출연한 일병 이정. 사진 = KBS화면캡처] [연예인] 김흥국땜에 해병대지원ㅋㅋ 2008년 10월 남몰래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이정은 선배가수 김흥국과 오랜만에 tv에 함께 출연. 오랜만의 tv 출연에 긴장감을 내보이며 "너무 반갑다. 그동안 내가 가수였나 싶다. 선배님들과 함께 출연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반가움을 전했다.해병대의 늠름한 모습으로 얼굴을 비친 이정은 남진과 김흥국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김흥국 선배님 때문에 해병대에 지원했다"며 “김흥국 선배님이 TV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해병대에 지원한다고 말해 안 갈 수 없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역시 ㅋㅋㅋ
[연예인] 김흥국땜에 해병대지원ㅋㅋ 2008년 10월 남몰래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이정은 선배가수 김흥국과 오랜만에 tv에 함께 출연. 오랜만의 tv 출연에 긴장감을 내보이며 "너무 반갑다. 그동안 내가 가수였나 싶다. 선배님들과 함께 출연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반가움을 전했다.해병대의 늠름한 모습으로 얼굴을 비친 이정은 남진과 김흥국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김흥국 선배님 때문에 해병대에 지원했다"며 “김흥국 선배님이 TV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해병대에 지원한다고 말해 안 갈 수 없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역시 ㅋㅋㅋ [밀리터리] 조선일보"북한 수류탄투척기 80만 정 보유" 한국은 현재 겨우 분대당 1정이 지급되어 남한의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의 기계화 전력을 감축할 경우 절대적인 군사력의 열세에 놓이게 된다. 한 페이지 전에 올라왔던 사진을 재구성해봤습니다.(실제 기사가 아님 북한의 실체와 수구언론의 작태를 비꼬은 게시물입니다) 이것이 현재 수구꼴통 언론과 세력들의 현실 입니다. 물런 저 새총같은게 북한에 실제 있을리가 없지만 얼마전에 나돌았던 80년대 선거철에나 자주 접했던 숫적우세 기사를 보고있노라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인간들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숫적우세론은 실체를 알면 알수록 어처구니 없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북한도 결국엔 통일 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될테니까...어찌보면 한민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것일수도.... 패배의식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미국과 북한의 전쟁조차 북한의 승리로 생각하게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북미전쟁에서 북한이 이긴다는 이분은 소설을 쓰고 계신건가... http://blog.daum.net/hahnwool/1129644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ahnwool%2F11296449 미 항모전단과 북한 해군의 싸움조차 북한이 이겨버린다는 이분의 주장.. 통일이후까지도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인가.....거참... http://blog.daum.net/kone1/1571265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kone1%2F15712659 적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것도 오판이지만 과대평가하는것도 오판입니다. 북한의 3대 전력 1. 야포 2. 생화학전 3. 특수부대 이렇게 세가지가 객관적인 위협전력입니다. 이중에서 야포는 가장 실질적인 위협이며 개전과 동시에 이 야포때문에 최전방의 군인들이 자다가 전사하게됩니다. 따라서 최전방 부대의 시설이나 전력은 사실 매우 형편없습니다. 굳이 돈들여서 빵빵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개전과 동시에 먼지처럼 공중에서 사리지기 때문이죠...97년도에 자대 배치받았는데 식당에는 백열전구 하나.. 내무반과 중대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는 촛불... 전쟁이 발발하면 반사적으로 첫 작계를 실행하게되는데 1만여문의 휴전선에 밀집된 북한의 야포는 선제물량 포격으로 전방부대를 무조건 궤멸시키는게 목표이기때문에 눈앞의 정규군이라는 대어를 두고 후방의 수도권에 포격할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김정일이라도 눈앞의 정규군을 잡지 후방 민간인을 먼저 잡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학탄을 쓰더라도 일단 휴전선 부근의 정규군부터 조질것입니다. 따라서 전방부대는 개전과 동시에 무조건 후퇴하고 무조건 숨어서 살아남는게 최대 목표입니다. 얼마전에 논란이 됐던 3일치 물자는 명백하게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군장에 3일치 탄약이랑 3일치 전투식량 3일치 전투식량이지만 총9개의 전투식량 군장에 싸기도 버겁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완전군장 싸더라도 전투식량 넣어 본적은 없지만 상당히 의문인게 완전군장 싸면 꽉 차서 더이상 넣을게 없는데 대체 전투식량을 어디다 넣으란 말인가.. 창고에 가면 널리고 널린게 물자입니다. 3일치 걱정되시면 다 싸짊어져 작계가면됩니다. 어떤 미친놈이 군장이라도 쌀수 있을지 의문이지만...(대부분 최전방 부대는 군장이고 나발이고 없을 것임) 또한 탄약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태워버립니다. 초기 선제 물량 포격만 미리 알아내고 그 피해를 줄이면 이후에는 크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일단 물량 포격을 하겠죠...그러면 남한은 전력을 짜내서 이 야포전력을 궤멸시키는게 목표입니다. 이것은 지네와 닭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지네가 닭을 먼저보면 닭이 죽지만 닭이 지네를 먼저보면 지네를 잡아 먹죠...이 상황에서 알보병이 그 말만던 3일치 물자들고 껴들 상황도 없습니다. (아마도 개전1주에서 최대 15일 정도까지 실질적인 알보병들이 적을 쳐 무찌르는 공격적인 작전을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화학탄을 써버리면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군의 북진을 지체시키고 어느정도 시간을 벌겠지만 거꾸로 북한의 남진도 애를 먹게 됩니다. 남북의 전쟁은 시간싸움에 모든것이 달려있습니다. 북한은 무조건 미군의 대규모 지원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끝내야하며 남한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훨씬 유리해집니다. 2주정도 남한의 물량 폭격이 진행됨에 따라 야포전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겠죠...북한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야포로 한번 내 지르고 안된다 싶으면 화학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니다. 휴전선 근처에 밀집된 야포정도는 공군에 의한 궤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숙히 들어가면 남북모두 상식을 뛰어넘는 미친 방공망이 너무 촘촘해서 미군조차 공군이 맘놓고 활개 치지는 못한다는게 정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대지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합니다.
[밀리터리] 조선일보"북한 수류탄투척기 80만 정 보유" 한국은 현재 겨우 분대당 1정이 지급되어 남한의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의 기계화 전력을 감축할 경우 절대적인 군사력의 열세에 놓이게 된다. 한 페이지 전에 올라왔던 사진을 재구성해봤습니다.(실제 기사가 아님 북한의 실체와 수구언론의 작태를 비꼬은 게시물입니다) 이것이 현재 수구꼴통 언론과 세력들의 현실 입니다. 물런 저 새총같은게 북한에 실제 있을리가 없지만 얼마전에 나돌았던 80년대 선거철에나 자주 접했던 숫적우세 기사를 보고있노라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인간들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숫적우세론은 실체를 알면 알수록 어처구니 없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북한도 결국엔 통일 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될테니까...어찌보면 한민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것일수도.... 패배의식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미국과 북한의 전쟁조차 북한의 승리로 생각하게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북미전쟁에서 북한이 이긴다는 이분은 소설을 쓰고 계신건가... http://blog.daum.net/hahnwool/1129644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ahnwool%2F11296449 미 항모전단과 북한 해군의 싸움조차 북한이 이겨버린다는 이분의 주장.. 통일이후까지도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인가.....거참... http://blog.daum.net/kone1/1571265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kone1%2F15712659 적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것도 오판이지만 과대평가하는것도 오판입니다. 북한의 3대 전력 1. 야포 2. 생화학전 3. 특수부대 이렇게 세가지가 객관적인 위협전력입니다. 이중에서 야포는 가장 실질적인 위협이며 개전과 동시에 이 야포때문에 최전방의 군인들이 자다가 전사하게됩니다. 따라서 최전방 부대의 시설이나 전력은 사실 매우 형편없습니다. 굳이 돈들여서 빵빵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개전과 동시에 먼지처럼 공중에서 사리지기 때문이죠...97년도에 자대 배치받았는데 식당에는 백열전구 하나.. 내무반과 중대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는 촛불... 전쟁이 발발하면 반사적으로 첫 작계를 실행하게되는데 1만여문의 휴전선에 밀집된 북한의 야포는 선제물량 포격으로 전방부대를 무조건 궤멸시키는게 목표이기때문에 눈앞의 정규군이라는 대어를 두고 후방의 수도권에 포격할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김정일이라도 눈앞의 정규군을 잡지 후방 민간인을 먼저 잡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학탄을 쓰더라도 일단 휴전선 부근의 정규군부터 조질것입니다. 따라서 전방부대는 개전과 동시에 무조건 후퇴하고 무조건 숨어서 살아남는게 최대 목표입니다. 얼마전에 논란이 됐던 3일치 물자는 명백하게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군장에 3일치 탄약이랑 3일치 전투식량 3일치 전투식량이지만 총9개의 전투식량 군장에 싸기도 버겁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완전군장 싸더라도 전투식량 넣어 본적은 없지만 상당히 의문인게 완전군장 싸면 꽉 차서 더이상 넣을게 없는데 대체 전투식량을 어디다 넣으란 말인가.. 창고에 가면 널리고 널린게 물자입니다. 3일치 걱정되시면 다 싸짊어져 작계가면됩니다. 어떤 미친놈이 군장이라도 쌀수 있을지 의문이지만...(대부분 최전방 부대는 군장이고 나발이고 없을 것임) 또한 탄약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태워버립니다. 초기 선제 물량 포격만 미리 알아내고 그 피해를 줄이면 이후에는 크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일단 물량 포격을 하겠죠...그러면 남한은 전력을 짜내서 이 야포전력을 궤멸시키는게 목표입니다. 이것은 지네와 닭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지네가 닭을 먼저보면 닭이 죽지만 닭이 지네를 먼저보면 지네를 잡아 먹죠...이 상황에서 알보병이 그 말만던 3일치 물자들고 껴들 상황도 없습니다. (아마도 개전1주에서 최대 15일 정도까지 실질적인 알보병들이 적을 쳐 무찌르는 공격적인 작전을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화학탄을 써버리면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군의 북진을 지체시키고 어느정도 시간을 벌겠지만 거꾸로 북한의 남진도 애를 먹게 됩니다. 남북의 전쟁은 시간싸움에 모든것이 달려있습니다. 북한은 무조건 미군의 대규모 지원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끝내야하며 남한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훨씬 유리해집니다. 2주정도 남한의 물량 폭격이 진행됨에 따라 야포전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겠죠...북한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야포로 한번 내 지르고 안된다 싶으면 화학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니다. 휴전선 근처에 밀집된 야포정도는 공군에 의한 궤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숙히 들어가면 남북모두 상식을 뛰어넘는 미친 방공망이 너무 촘촘해서 미군조차 공군이 맘놓고 활개 치지는 못한다는게 정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대지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합니다.